
- [황학주의 詩읽는 화요일] (94)설원을 마주한 저녁-선안영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 입력 : 2024. 12.03. 02:00:00

[한라일보]
저 흰빛을 나 차마 감당 못하겠어요.
나는 흰 호청의 요 위에 붉은 꽃잎 피울 수가 없고, 흰 종이에 이 세상 밤과 낮을 띄울 수가 없고, 너무 늦고, 너무 늙어 잎이 아닌 가시뿐인걸요. 봄은 빈말 건네다 갔고요. 여름은 잠 밖으로, 가을은 긴 마취 중에 자연 지나갔으니, 얼룩무늬 외투를 껴입은 동명이인(同名異人)으로 나, 타인의 씨방을 훔쳐 겨울보다 더 겨울을 살았나 봐요. 이제 눈 부신 저 눈밭을 오래 굴러 기억보다 몸 나가는 죄를 삭이고
어디에 표류할 줄 모르는 물병편지를 띄웁니다.
겨울은 나를 낳아준 친아버지 같아서
눈길 위에 반지랍도록 눈사람을 굴리며
거듭 나, 숨을 끌고서 당신께 살러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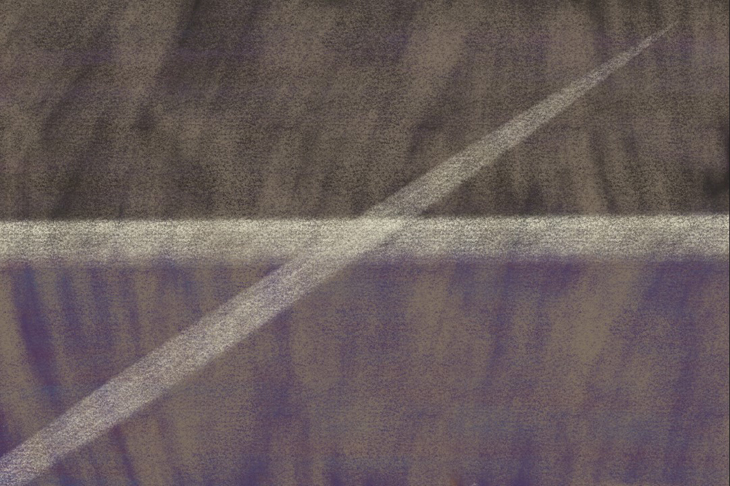
곧 늦고, 곧 늙을 텐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 다시 뒤돌아보는 긴 사계절은 동명이인으로 겨울을 살았다고 할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으려나. 결국 그 겨울은 나를 낳아준 친아버지 같다고나 하고. 그만큼 아프기만 한 사람이 거듭 살러 가려는 와중에 두 사람이 한 사람같이 나달던 급한 마음의 시간은, 겨울 눈밭까지 굴러온 내밀한 간원이 소소한 구석에서 어루만지는 숨은, 떨리고 가쁘기만 했을 텐데. 어디로 가나. 모진 겨울만 산 사람이 살아서 한 번 겨울 밖으로 "반지랍도록 눈사람을 굴리며" 살러 가고 싶은 이생의 운명은 모두 비슷했던 걸로 안다. 그러니 '표류'라는 물병편지는 지리상으로 갈 수 없는 장소에 닿을 수 있는 발걸음이라는 듯이 아직도 흘러가는 거겠지. "당신께 살러" 간다는 눈밭의 다짐으로 흰 호청의 요 같은 눈부신 "흰빛"이 나오고, 세상 어디서는 차가워진 볕 자락이 깔리는 눈길 위에 굴러가는 눈사람이 또 있을 것이다. 시여, 아름다움을 겪기 위한 것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시인>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 흰빛을 나 차마 감당 못하겠어요.
나는 흰 호청의 요 위에 붉은 꽃잎 피울 수가 없고, 흰 종이에 이 세상 밤과 낮을 띄울 수가 없고, 너무 늦고, 너무 늙어 잎이 아닌 가시뿐인걸요. 봄은 빈말 건네다 갔고요. 여름은 잠 밖으로, 가을은 긴 마취 중에 자연 지나갔으니, 얼룩무늬 외투를 껴입은 동명이인(同名異人)으로 나, 타인의 씨방을 훔쳐 겨울보다 더 겨울을 살았나 봐요. 이제 눈 부신 저 눈밭을 오래 굴러 기억보다 몸 나가는 죄를 삭이고
어디에 표류할 줄 모르는 물병편지를 띄웁니다.
겨울은 나를 낳아준 친아버지 같아서
눈길 위에 반지랍도록 눈사람을 굴리며
거듭 나, 숨을 끌고서 당신께 살러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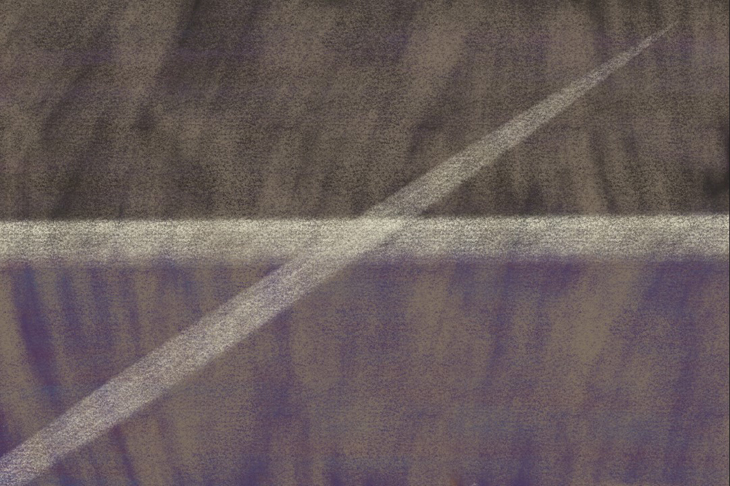
삽화=배수연
곧 늦고, 곧 늙을 텐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 다시 뒤돌아보는 긴 사계절은 동명이인으로 겨울을 살았다고 할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으려나. 결국 그 겨울은 나를 낳아준 친아버지 같다고나 하고. 그만큼 아프기만 한 사람이 거듭 살러 가려는 와중에 두 사람이 한 사람같이 나달던 급한 마음의 시간은, 겨울 눈밭까지 굴러온 내밀한 간원이 소소한 구석에서 어루만지는 숨은, 떨리고 가쁘기만 했을 텐데. 어디로 가나. 모진 겨울만 산 사람이 살아서 한 번 겨울 밖으로 "반지랍도록 눈사람을 굴리며" 살러 가고 싶은 이생의 운명은 모두 비슷했던 걸로 안다. 그러니 '표류'라는 물병편지는 지리상으로 갈 수 없는 장소에 닿을 수 있는 발걸음이라는 듯이 아직도 흘러가는 거겠지. "당신께 살러" 간다는 눈밭의 다짐으로 흰 호청의 요 같은 눈부신 "흰빛"이 나오고, 세상 어디서는 차가워진 볕 자락이 깔리는 눈길 위에 굴러가는 눈사람이 또 있을 것이다. 시여, 아름다움을 겪기 위한 것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시인>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