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6] 3부 오름-(75)남조순오름과 민오름, 등성마루가 평평한 크고 작은 오름
- 낭떠러지와 샘이 있는 등성마루오름 '낭마루세미'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 입력 : 2025. 02.18. 0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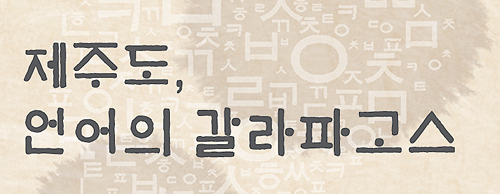
숲이 울창하면 남조순, 민둥산이면 민오름?
[한라일보] 제주시 연동 25번지 일대, 표고 296.7m, 자체높이 167m, 둘레 3072m다. 이 오름 지명을 고전에는 어떻게 표기했을까? 17세기 말에 나온 탐라도에 도내악(道內岳)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지명들은 모두 모으면 11개다. 이들은 크게 남조순오름계열과 도노미계열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남조순오름계열은 남조봉(南朝峰), 남조순오름, 남짓은오름, 목밀악(木密岳), 목밀오름, 목탁악(木啄岳), 목탁악(木琢岳), 탁목조봉(啄木鳥峰) 등 8개다. 도노미계열은 도내산(道內山), 도내악(道內岳), 도노미 등 3개다.
 우선 남조순오름이라는 지명은 무슨 뜻일까? 다음은 이 오름의 지명을 설명하는 이 오름 탐방로 돌판에 새겨진 글의 일부다. "옛날부터 우마(牛馬)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남(나무)이 짓다(무성하다)고 하여 남짓은오름 또는 나는 새(鳥)가 나무를 쪼는 지세(地勢)라고 하여 '남좃인오름·남조순오름·남주순오름' 이라 했다는 설(說)이 있다."
우선 남조순오름이라는 지명은 무슨 뜻일까? 다음은 이 오름의 지명을 설명하는 이 오름 탐방로 돌판에 새겨진 글의 일부다. "옛날부터 우마(牛馬)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남(나무)이 짓다(무성하다)고 하여 남짓은오름 또는 나는 새(鳥)가 나무를 쪼는 지세(地勢)라고 하여 '남좃인오름·남조순오름·남주순오름' 이라 했다는 설(說)이 있다."
'남짓은오름'이라는 지명이 '나무가 조밀하게 자라는 오름'으로 해석한 결과다. 특히 목밀악(木密岳)이라는 지명도 있는 걸 보면 당연한 해석일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된다. 그러다 생각해 보니 남좃인오름이 문제가 되게 되었다. 더구나 목탁악(木啄岳)이라든지 남조봉(南鳥峰) 같은 표기까지 나오니 이런 해석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던 듯하다. 그래서 동원한 설(說)이 '나는 새(鳥)가 나무를 쪼는 지세(地勢)'라고 덧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목탁악(木啄岳)의 '탁(啄)'은 '부리로 쪼을 탁'이니 '나무를 쪼는 오름'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조봉(南鳥峰)은 그냥 음가자로 보아 역시 '나무를 쪼는 오름'이라는 것이다.
 낭과 샘, 그리고 등성마루
낭과 샘, 그리고 등성마루
이같이 남조순오름, 남짓은오름, 목밀악(木密岳) 등을 나무가 조밀하게 자라는 뜻의 제주어 '남 짓은' 오름의 뜻이라는 한다든가, 남좃인오름, 목탁악(木啄岳), 남조봉(南朝峰), 남조봉(南鳥峰) 등을 '나무를 쪼는' 오름이라는 식의 해석을 어형의 유사성에 기댄 해석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말은 다의어가 많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지명을 해석하는 데는 현장의 상황은 어떤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가까이에 민오름이 있다. 제주시 오라동 산28번지 일대다. 남조순오름과 거의 붙어 있다. 이 오름은 남조순오름과 마찬가지로 분석구다. 자체높이 117m로 남조순오름에 비해 조금 낮다. 둘레는 2968m로 남조순오름과 거의 같다. 전체적으로 다소 작지만 식생에 차이가 날 만큼은 아니다. 그런데 민오름에 비해 유별나게 남조순오름은 나무가 밀생했다니 어떻게 수긍하란 말인가? 현재 상태를 보더라도 두 오름은 식생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조순오름에만 새들이 쪼는 것도 아니다.
 남조순이란 '남+조+순'의 구조다. 남이란 '낭'의 다른 발음이다. 지금도 제주어에서는 '낭'이나 '남'은 거의 같은 발음이다. 여기서 '낭'이란 나무가 아니다. 지금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낭떠러지라고 할 때 '낭'이다. 이 말은 중세까지만 해도 '낭' 단독으로 사용했다. 1615년에 편찬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는 '낭의 더러뎌 주그니라(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 오름에는 어위창이라고 하는 높고 넓은 낭떠러지가 있다. 바로 옆의 민오름에는 없는데 이런 낭떠러지 특성을 지명에 담은 것이다. '조'라는 말은 '자'의 변음이다. 평평한 등성이를 한 오름에 붙는 지명어다. 제주어에서는 '마루'가 산등성이라는 의미로 흔히 쓴다. 이걸 한자로 표기하면서 '마루 지(旨)'를 차용하게 되었는데, 이 오름에서는 '조', 좌보미오름에서는 '좌', 한자두(수월봉)에서는 '자' 등으로 나타난다. '순'이라는 말은 '샘'의 고어형이다. 남조순오름이란 낭떠러지가 있고 위가 평평하며 샘이 있는 오름이라는 뜻이다. 제주어로는 '낭마루세미'라 했을 것이다.
남조순이란 '남+조+순'의 구조다. 남이란 '낭'의 다른 발음이다. 지금도 제주어에서는 '낭'이나 '남'은 거의 같은 발음이다. 여기서 '낭'이란 나무가 아니다. 지금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낭떠러지라고 할 때 '낭'이다. 이 말은 중세까지만 해도 '낭' 단독으로 사용했다. 1615년에 편찬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는 '낭의 더러뎌 주그니라(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 오름에는 어위창이라고 하는 높고 넓은 낭떠러지가 있다. 바로 옆의 민오름에는 없는데 이런 낭떠러지 특성을 지명에 담은 것이다. '조'라는 말은 '자'의 변음이다. 평평한 등성이를 한 오름에 붙는 지명어다. 제주어에서는 '마루'가 산등성이라는 의미로 흔히 쓴다. 이걸 한자로 표기하면서 '마루 지(旨)'를 차용하게 되었는데, 이 오름에서는 '조', 좌보미오름에서는 '좌', 한자두(수월봉)에서는 '자' 등으로 나타난다. '순'이라는 말은 '샘'의 고어형이다. 남조순오름이란 낭떠러지가 있고 위가 평평하며 샘이 있는 오름이라는 뜻이다. 제주어로는 '낭마루세미'라 했을 것이다.
등성마루가 평평하나 남조순보다는 작다
이웃하는 민오름의 지명은 또 뭘까? '민악(珉岳)', '민악(敏岳)', '문악(文岳)', '미악(米岳)', '쌀오름', '소독악(小禿岳)', 족은민오름', '술악(戌岳)', '괴오름(개오름)'이 검색된다.
이 오름은 원래 믜오름으로 부르던 것이 민오름 또는 믜오름, 미오름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한자로 차용한 지명이 '민악(珉岳)', '민악(敏岳)', '문악(文岳)' 등이라고 설명한 책이 있다. 민둥산이었다는 데서 붙인 이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모두 오버센스다. 이 오름은 등성마루가 평평하다. '마루' 오름이다. '마루'는 '미'로도 축약된다. 그러니 미오름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여기에 관형격 'ㄴ'이 붙으면 민오름이 된다. 쌀오름은 미악을 한자로 차자표기한 것을 다시 쌀오름으로 번역한 오독이다. '술악(戌岳)' 역시 쌀을 중세에는 '살'이라 했으므로 이의 다른 표기다. '괴오름'은 '술악(戌岳)'의 술(戌)이 '개 술'이니 여기서 분화한 표기다.
 작은 민오름이라는 뜻의 '소독악(小禿岳)'과 '족은민오름' 등은 봉개동의 민오름에 비해 작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건 너무 나간 것이다. 이 두 오름 간의 직선거리는 약 24㎞다. 이 두 오름 사이에 여러 모름이 있다. 각 오름 주위에 또 여러 오름이 있다. 이 두 오름을 비교한다는 건 거의 가능한 일이 아니다. 봉개동의 민오름과 비교한 게 아니라 바로 옆의 남조순과 비교한 것이다. 둘 다 등성마루가 평평한 오름이니 그중 작은 오름이라는 뜻이다.
작은 민오름이라는 뜻의 '소독악(小禿岳)'과 '족은민오름' 등은 봉개동의 민오름에 비해 작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건 너무 나간 것이다. 이 두 오름 간의 직선거리는 약 24㎞다. 이 두 오름 사이에 여러 모름이 있다. 각 오름 주위에 또 여러 오름이 있다. 이 두 오름을 비교한다는 건 거의 가능한 일이 아니다. 봉개동의 민오름과 비교한 게 아니라 바로 옆의 남조순과 비교한 것이다. 둘 다 등성마루가 평평한 오름이니 그중 작은 오름이라는 뜻이다.
남조순오름은 낭떠러지가 있고 위가 평평하며 샘이 있는 오름, 민오름은 위가 평명한 오름이면서 남조순오름에 비해 작은 오름이라는 뜻이다. 도내미의 의미는 이후로 미룬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한라일보] 제주시 연동 25번지 일대, 표고 296.7m, 자체높이 167m, 둘레 3072m다. 이 오름 지명을 고전에는 어떻게 표기했을까? 17세기 말에 나온 탐라도에 도내악(道內岳)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지명들은 모두 모으면 11개다. 이들은 크게 남조순오름계열과 도노미계열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남조순오름계열은 남조봉(南朝峰), 남조순오름, 남짓은오름, 목밀악(木密岳), 목밀오름, 목탁악(木啄岳), 목탁악(木琢岳), 탁목조봉(啄木鳥峰) 등 8개다. 도노미계열은 도내산(道內山), 도내악(道內岳), 도노미 등 3개다.

남조순오름, 등성마루가 평평하며 길게 늘어진 모습이다. 김찬수
'남짓은오름'이라는 지명이 '나무가 조밀하게 자라는 오름'으로 해석한 결과다. 특히 목밀악(木密岳)이라는 지명도 있는 걸 보면 당연한 해석일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된다. 그러다 생각해 보니 남좃인오름이 문제가 되게 되었다. 더구나 목탁악(木啄岳)이라든지 남조봉(南鳥峰) 같은 표기까지 나오니 이런 해석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던 듯하다. 그래서 동원한 설(說)이 '나는 새(鳥)가 나무를 쪼는 지세(地勢)'라고 덧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목탁악(木啄岳)의 '탁(啄)'은 '부리로 쪼을 탁'이니 '나무를 쪼는 오름'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조봉(南鳥峰)은 그냥 음가자로 보아 역시 '나무를 쪼는 오름'이라는 것이다.

민오름, 남조순오름 바로 동쪽에 있으며, 아연로 양쪽으로 거의 맞닿아 있다. 김찬수
이같이 남조순오름, 남짓은오름, 목밀악(木密岳) 등을 나무가 조밀하게 자라는 뜻의 제주어 '남 짓은' 오름의 뜻이라는 한다든가, 남좃인오름, 목탁악(木啄岳), 남조봉(南朝峰), 남조봉(南鳥峰) 등을 '나무를 쪼는' 오름이라는 식의 해석을 어형의 유사성에 기댄 해석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말은 다의어가 많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지명을 해석하는 데는 현장의 상황은 어떤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가까이에 민오름이 있다. 제주시 오라동 산28번지 일대다. 남조순오름과 거의 붙어 있다. 이 오름은 남조순오름과 마찬가지로 분석구다. 자체높이 117m로 남조순오름에 비해 조금 낮다. 둘레는 2968m로 남조순오름과 거의 같다. 전체적으로 다소 작지만 식생에 차이가 날 만큼은 아니다. 그런데 민오름에 비해 유별나게 남조순오름은 나무가 밀생했다니 어떻게 수긍하란 말인가? 현재 상태를 보더라도 두 오름은 식생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조순오름에만 새들이 쪼는 것도 아니다.

남조순오름에는 어위창이라고 하는 큰 규모의 낭떠러지가 있다. 김찬수
등성마루가 평평하나 남조순보다는 작다
이웃하는 민오름의 지명은 또 뭘까? '민악(珉岳)', '민악(敏岳)', '문악(文岳)', '미악(米岳)', '쌀오름', '소독악(小禿岳)', 족은민오름', '술악(戌岳)', '괴오름(개오름)'이 검색된다.
이 오름은 원래 믜오름으로 부르던 것이 민오름 또는 믜오름, 미오름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한자로 차용한 지명이 '민악(珉岳)', '민악(敏岳)', '문악(文岳)' 등이라고 설명한 책이 있다. 민둥산이었다는 데서 붙인 이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모두 오버센스다. 이 오름은 등성마루가 평평하다. '마루' 오름이다. '마루'는 '미'로도 축약된다. 그러니 미오름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여기에 관형격 'ㄴ'이 붙으면 민오름이 된다. 쌀오름은 미악을 한자로 차자표기한 것을 다시 쌀오름으로 번역한 오독이다. '술악(戌岳)' 역시 쌀을 중세에는 '살'이라 했으므로 이의 다른 표기다. '괴오름'은 '술악(戌岳)'의 술(戌)이 '개 술'이니 여기서 분화한 표기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남조순오름은 낭떠러지가 있고 위가 평평하며 샘이 있는 오름, 민오름은 위가 평명한 오름이면서 남조순오름에 비해 작은 오름이라는 뜻이다. 도내미의 의미는 이후로 미룬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