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8] 3부 오름-(77)각시바위, 바위로 된 오름
- 전국 갓바위에서 각시들이 꽃잎처럼 떨어졌다?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 입력 : 2025. 03.04. 0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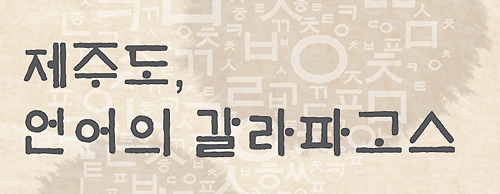
각시가 떨어져 죽은 슬픈 봉우리?
[한라일보] 서귀포시 호근동 2112번지 일대이다. 표고 394m, 자체높이 140m이며, 주위의 완만한 지형과 대비되어 독특한 경관을 보인다. 이 오름 지명은 1709년 탐라지도를 비롯한 여러 고전에 기록돼 있고, 지역에서는 각수악(角首岳), 각수암(角秀岩), 학수암(鶴首岩), 학암(鶴岩) 등으로 표기한다. 네이버 지도에는 각시바위오름, 카카오맵에는 각시바위(각수바위)로 표기했다.
 이 지명들을 모으면 각수악(角秀岳), 각수악(角首岳), 각수암(角秀岩), 각시바위(각수바위), 각시바위오름, 상계암(雙溪岩), 씨암(氏岩), 처암(妻岩), 학수암(鶴首岩), 학암(鶴岩) 등 10개가 된다.
이 지명들을 모으면 각수악(角秀岳), 각수악(角首岳), 각수암(角秀岩), 각시바위(각수바위), 각시바위오름, 상계암(雙溪岩), 씨암(氏岩), 처암(妻岩), 학수암(鶴首岩), 학암(鶴岩) 등 10개가 된다.
여기 나오는 이름 중 상계암(雙溪岩)이란 마치 쌍둥이처럼 봉우리가 두 개인 데서 붙인 이름으로 보인다. 씨암은 씨(氏)가 각시를 뜻하기도 하므로 각시를 나타내려고 쓴 한자 지명일 것이다. 처암 역시 처(妻)가 '각시 처'이므로 각시바위를 표현하려고 한 것이다. 이제 바위, 암(岩), 오름, 악(岳) 등 뒷부분을 나타내는 요소를 제외하면 각수, 각시, 학수가 남는다. 과연 이 말들이 무엇인지가 지명해독의 본질이 된다.
이 말들은 어딘가 익숙해 보여 그 뜻을 명쾌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기록자들이 각수악(角秀), 각수악(角首), 각시, 씨암(氏岩), 처암(妻岩), 학수암(鶴首)처럼 이런저런 온갖 궁리를 다 해 본 것이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제주도에서 발간한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 유래는 어느 양가의 며느리가 아들을 얻고자 인근 절에 들어가 100일 기도를 드리는 중 중에게 겁탈을 당하여 이 바위에 올라가 울부짖다가 자살했다. 이런 연유로 각시바위라 하게 되었다. 그냥 지어낸 전설의 고향식 설명이다.
문제는 학술 연구서에도 그대로 인용한다는 데 있다. 실제로 한 각시가 떨어져 죽은 바위라는 데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고 쓴 책이 있다. 마을에서는 이걸 근거로 안내판도 설치하고(지금은 낡아 사라졌음), 해설사들은 그대로 인용하여 전파하는 실정이다.
 15세기에 멸종한 언어의 화석
15세기에 멸종한 언어의 화석
이 지명은 트랜스 유라시아어 중 여러 언어(알타이어)에 널리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현재 영어 알파벳으로 'kad'으로 표기하므로 훈민정음으로 표기한다면 '갇'이 맞을 것이다. 이 말은 바위를 지시한다. 퉁구스어권의 여러 언어에사 '카다', '가다', '카대', '캇', '하데' 등으로 쓴다. 몽골어권의 언어에서도 거의 같은 발음, 같은 뜻으로 쓴다. 몽골어권의 칼카어, 부랴트어, 오르도스어 등에서는 'xad'으로 발음하는데 이는 우리 발음 '갇' 혹은 '갓'과 거의 같다.
그런데 이 '갓'이라는 발음으로 바위를 지시하는 말은 우리 국어에서는 15세기에 이미 완전히 사라졌다. 다만 지명에서는 여러 곳에 화석화하여 박혀 있다. 지명에는 남아 있으되 실생활에서는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15세기 국어에 '갓'이 쓰이긴 했지만 그 뜻은 완전히 바뀌었다. 1527년에 나온 한자 학습서 훈몽자회에 '갇'을 '립(笠)'이라 했다. 모자를 지시한다. 1670년에 나온 노걸대언해라는 중국어 학습서에 '갓'을 '관(冠)'이라 했다. 그 이후 모자는 '갓' 혹은 '관'이라 하고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개념이 끼어든다. '갓'이라는 발음과 표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다. 우선 모자 혹은 관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벼슬이라는 은유가 들어있다. 벼슬을 하면 관복을 입고 관을 쓴다. 오늘날도 벼슬을 삭탈하는 것을 '옷을 벗긴다'거나 '모자를 벗긴다'라고 표현한다. 이런 관념에서 '갓'은 '학(學)'과 연관시키기도 했다. 공부를 잘해야 벼슬을 한다는 뜻이다. 입학시험 날이면 전국의 모든 '학바위', '갓바위'에서 치성드리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겨난 것이다. 각수바위를 학바위(鶴-)라 하는 것은 이의 변형이다.
 절꼭지, 제재기, 절우리도 같은 지명 기원
절꼭지, 제재기, 절우리도 같은 지명 기원
두 번째 뜻은 아내 혹은 여자도 '갓'이라고 한다. 제주도에서 장인 장모를 '가시아방', '가시어멍'하는 것은 이런 뜻이다. 이 말은 각시로 분화하고 여기에서 각시바위니 '각시'와 연관한 말들이 생겨난 것이다. '씨암'이니 '처암'이니 하는 표기도 이에 유래한다. 사실 바위가 '갇' 혹은 '갓'에서 기원했으니 이런 어원으로 본다면 각시바위는 '바위바위'라는 첩어의 구조다.
제주도 내에 관련 지명들이 산재한다. 관탈섬은 바위섬, 광치기해변은 바위 해변이다. 전국에 갓바위가 널려 있다. 팔공산 갓바위는 유명하다. 북한의 관모봉, 서울의 관악산, 모두 바위산이다. 이곳들에서 각시들이 떨어졌다는 설명은 아닐테지요?
 각시바위와 연관해 짚고 넘어가야 할 지명이 있다. '절꼭지'다. 지금은 봉우리가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다소 떨어져 있는 용천수가 있는 곳 일대를 지시하는 지명으로 쓴다. 그러나 이 '절꼭지'는 '벼랑이 심한 뾰족한 봉우리'라는 뜻이니 지금의 각시바위 봉우리를 지시하는 말이다. '절'이란 벼랑을 지시하는 순우리말이다. 역시 지금은 잊힌 화석어가 되었다. 흔히 절벽(絶壁)이란 한자 말에 너무 함몰되어 순우리말 '절'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 '절'이란 절벽의 '절'에서 온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역시 지명에는 잘 남아있다. 바로 이곳 '절꼭지', 송악산을 지시하는 '절우리'에도 남아있다. '절꼭지'와 쌍둥이 지명이 있다. 보목동에 있는 '제재기오름'이다. 이 오름 역시 '절꼭지'였던 것이 한자로 표기하면서 '절즉이(絶卽-)'로 쓰던 것이 지금의 제재기오름으로 굳어졌다. 여기서 '즉(卽'이란 '곧 즉'이므로 '절즉이'는 '절곧이'에서 온 것이다. 각시바위오름이란 바위로 된 오름이라는 뜻이다.
각시바위와 연관해 짚고 넘어가야 할 지명이 있다. '절꼭지'다. 지금은 봉우리가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다소 떨어져 있는 용천수가 있는 곳 일대를 지시하는 지명으로 쓴다. 그러나 이 '절꼭지'는 '벼랑이 심한 뾰족한 봉우리'라는 뜻이니 지금의 각시바위 봉우리를 지시하는 말이다. '절'이란 벼랑을 지시하는 순우리말이다. 역시 지금은 잊힌 화석어가 되었다. 흔히 절벽(絶壁)이란 한자 말에 너무 함몰되어 순우리말 '절'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 '절'이란 절벽의 '절'에서 온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역시 지명에는 잘 남아있다. 바로 이곳 '절꼭지', 송악산을 지시하는 '절우리'에도 남아있다. '절꼭지'와 쌍둥이 지명이 있다. 보목동에 있는 '제재기오름'이다. 이 오름 역시 '절꼭지'였던 것이 한자로 표기하면서 '절즉이(絶卽-)'로 쓰던 것이 지금의 제재기오름으로 굳어졌다. 여기서 '즉(卽'이란 '곧 즉'이므로 '절즉이'는 '절곧이'에서 온 것이다. 각시바위오름이란 바위로 된 오름이라는 뜻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한라일보] 서귀포시 호근동 2112번지 일대이다. 표고 394m, 자체높이 140m이며, 주위의 완만한 지형과 대비되어 독특한 경관을 보인다. 이 오름 지명은 1709년 탐라지도를 비롯한 여러 고전에 기록돼 있고, 지역에서는 각수악(角首岳), 각수암(角秀岩), 학수암(鶴首岩), 학암(鶴岩) 등으로 표기한다. 네이버 지도에는 각시바위오름, 카카오맵에는 각시바위(각수바위)로 표기했다.

각시바위오름, 왼쪽 봉우리를 주로 각시바위라 부른다. 김찬수
여기 나오는 이름 중 상계암(雙溪岩)이란 마치 쌍둥이처럼 봉우리가 두 개인 데서 붙인 이름으로 보인다. 씨암은 씨(氏)가 각시를 뜻하기도 하므로 각시를 나타내려고 쓴 한자 지명일 것이다. 처암 역시 처(妻)가 '각시 처'이므로 각시바위를 표현하려고 한 것이다. 이제 바위, 암(岩), 오름, 악(岳) 등 뒷부분을 나타내는 요소를 제외하면 각수, 각시, 학수가 남는다. 과연 이 말들이 무엇인지가 지명해독의 본질이 된다.
이 말들은 어딘가 익숙해 보여 그 뜻을 명쾌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기록자들이 각수악(角秀), 각수악(角首), 각시, 씨암(氏岩), 처암(妻岩), 학수암(鶴首)처럼 이런저런 온갖 궁리를 다 해 본 것이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제주도에서 발간한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 유래는 어느 양가의 며느리가 아들을 얻고자 인근 절에 들어가 100일 기도를 드리는 중 중에게 겁탈을 당하여 이 바위에 올라가 울부짖다가 자살했다. 이런 연유로 각시바위라 하게 되었다. 그냥 지어낸 전설의 고향식 설명이다.
문제는 학술 연구서에도 그대로 인용한다는 데 있다. 실제로 한 각시가 떨어져 죽은 바위라는 데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고 쓴 책이 있다. 마을에서는 이걸 근거로 안내판도 설치하고(지금은 낡아 사라졌음), 해설사들은 그대로 인용하여 전파하는 실정이다.

각시바위오름 정상, 바위로 이루어졌다. 김찬수
이 지명은 트랜스 유라시아어 중 여러 언어(알타이어)에 널리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현재 영어 알파벳으로 'kad'으로 표기하므로 훈민정음으로 표기한다면 '갇'이 맞을 것이다. 이 말은 바위를 지시한다. 퉁구스어권의 여러 언어에사 '카다', '가다', '카대', '캇', '하데' 등으로 쓴다. 몽골어권의 언어에서도 거의 같은 발음, 같은 뜻으로 쓴다. 몽골어권의 칼카어, 부랴트어, 오르도스어 등에서는 'xad'으로 발음하는데 이는 우리 발음 '갇' 혹은 '갓'과 거의 같다.
그런데 이 '갓'이라는 발음으로 바위를 지시하는 말은 우리 국어에서는 15세기에 이미 완전히 사라졌다. 다만 지명에서는 여러 곳에 화석화하여 박혀 있다. 지명에는 남아 있으되 실생활에서는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15세기 국어에 '갓'이 쓰이긴 했지만 그 뜻은 완전히 바뀌었다. 1527년에 나온 한자 학습서 훈몽자회에 '갇'을 '립(笠)'이라 했다. 모자를 지시한다. 1670년에 나온 노걸대언해라는 중국어 학습서에 '갓'을 '관(冠)'이라 했다. 그 이후 모자는 '갓' 혹은 '관'이라 하고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개념이 끼어든다. '갓'이라는 발음과 표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다. 우선 모자 혹은 관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벼슬이라는 은유가 들어있다. 벼슬을 하면 관복을 입고 관을 쓴다. 오늘날도 벼슬을 삭탈하는 것을 '옷을 벗긴다'거나 '모자를 벗긴다'라고 표현한다. 이런 관념에서 '갓'은 '학(學)'과 연관시키기도 했다. 공부를 잘해야 벼슬을 한다는 뜻이다. 입학시험 날이면 전국의 모든 '학바위', '갓바위'에서 치성드리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겨난 것이다. 각수바위를 학바위(鶴-)라 하는 것은 이의 변형이다.

각시바위오름의 상수도시설, 지역에서는 이 일대를 절꼭지라 한다. 김찬수
두 번째 뜻은 아내 혹은 여자도 '갓'이라고 한다. 제주도에서 장인 장모를 '가시아방', '가시어멍'하는 것은 이런 뜻이다. 이 말은 각시로 분화하고 여기에서 각시바위니 '각시'와 연관한 말들이 생겨난 것이다. '씨암'이니 '처암'이니 하는 표기도 이에 유래한다. 사실 바위가 '갇' 혹은 '갓'에서 기원했으니 이런 어원으로 본다면 각시바위는 '바위바위'라는 첩어의 구조다.
제주도 내에 관련 지명들이 산재한다. 관탈섬은 바위섬, 광치기해변은 바위 해변이다. 전국에 갓바위가 널려 있다. 팔공산 갓바위는 유명하다. 북한의 관모봉, 서울의 관악산, 모두 바위산이다. 이곳들에서 각시들이 떨어졌다는 설명은 아닐테지요?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