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학주의 詩읽는 화요일] (67)애월 혹은 - 서안나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 입력 : 2024. 05.14. 00:00:00

애월(涯月)에선 취한 밤도 문장이다 팽나무 아래서 당신과 백 년 동안 술잔을 기울이고 싶었다 서쪽을 보는 당신의 먼 눈 울음이라는 것 느리게 걸어보는 것 나는 썩은 귀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애월에서 사랑은 비루해진다
애월이라 처음 소리 내어 부른 사람, 물가에 달을 끌어와 젖은 달빛 건져 올리고 소매가 젖었을 것이다 그가 빛나는 이마를 대던 계절은 높고 환했으리라 달빛과 달빛이 겹쳐지는 어금니같이 아려오는 검은 문장, 애월
나는 물가에 앉아 짐승처럼 달의 문장을 빠져나가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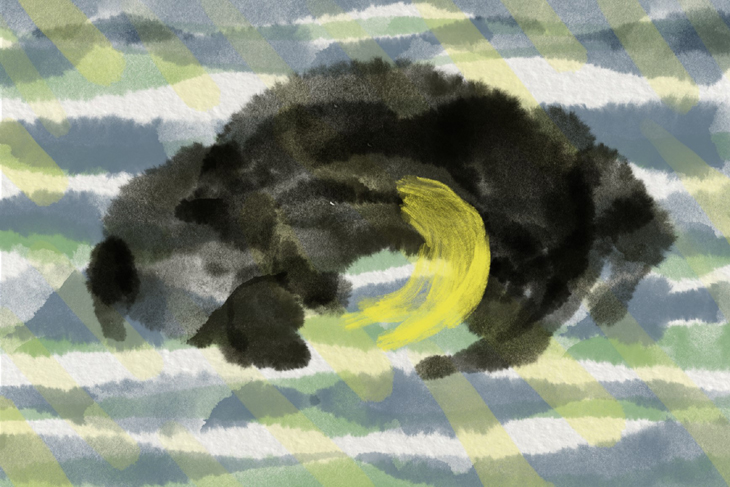
애월은 물가(涯)와 달(月)이 합쳐진 말이지만, 애월은 또 얼마든지 그 장소성이 확장될 수 있는 말이다. 많은 지명들이 그러하듯. 이 시에서는 '애월'이 가지는 과거의 부재와 '혹은'이 가지는 현재의 부재를 겹쳐놓고 인간의 마음에서 좀체 빠져나가기 어려운 사랑과 본능을 첨부시킨다. 애월을 애월이라 처음 소리 내어 부른 사람은 처음으로 꿈을 꾼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의 계절은 높고 환했으며 그는 화자가 백 년 동안 술잔을 같이 기울이고 싶은 사람이라는데, 지금 달빛이 겹쳐지며 어금니같이 아려오는 어두운 문장이 사랑과 본능이라면 그것은 너와 나의 구분을 어느 정도 무효화시키며 인간을 비루한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더하여 "짐승처럼"이란 "짐승처럼 울며"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시간은 이어 지지만 한편으론 소멸되는 것이어서 '애월'은 어느 날 세간의 시선을 피하고 시간의 경계를 넘어 우연히 당신의 수중에 들어온다. 잠시 잠깐! <시인>
애월이라 처음 소리 내어 부른 사람, 물가에 달을 끌어와 젖은 달빛 건져 올리고 소매가 젖었을 것이다 그가 빛나는 이마를 대던 계절은 높고 환했으리라 달빛과 달빛이 겹쳐지는 어금니같이 아려오는 검은 문장, 애월
나는 물가에 앉아 짐승처럼 달의 문장을 빠져나가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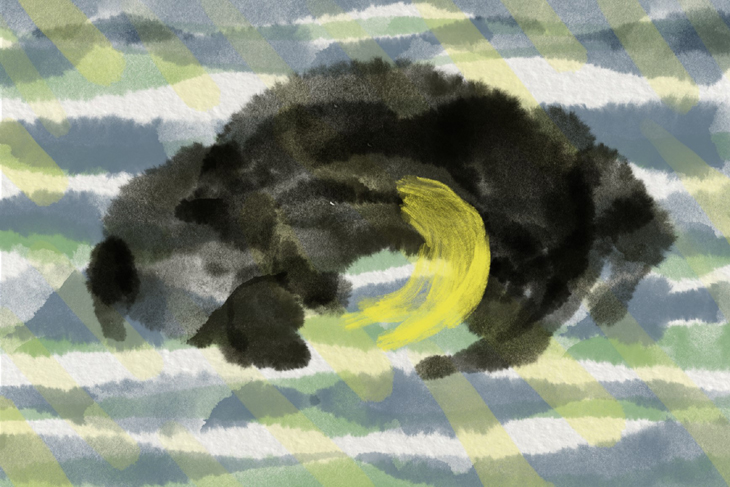
삽화=배수연
애월은 물가(涯)와 달(月)이 합쳐진 말이지만, 애월은 또 얼마든지 그 장소성이 확장될 수 있는 말이다. 많은 지명들이 그러하듯. 이 시에서는 '애월'이 가지는 과거의 부재와 '혹은'이 가지는 현재의 부재를 겹쳐놓고 인간의 마음에서 좀체 빠져나가기 어려운 사랑과 본능을 첨부시킨다. 애월을 애월이라 처음 소리 내어 부른 사람은 처음으로 꿈을 꾼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의 계절은 높고 환했으며 그는 화자가 백 년 동안 술잔을 같이 기울이고 싶은 사람이라는데, 지금 달빛이 겹쳐지며 어금니같이 아려오는 어두운 문장이 사랑과 본능이라면 그것은 너와 나의 구분을 어느 정도 무효화시키며 인간을 비루한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더하여 "짐승처럼"이란 "짐승처럼 울며"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시간은 이어 지지만 한편으론 소멸되는 것이어서 '애월'은 어느 날 세간의 시선을 피하고 시간의 경계를 넘어 우연히 당신의 수중에 들어온다. 잠시 잠깐! <시인>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