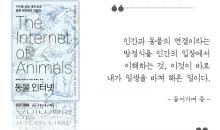[진선희기자의 문화현장] 잊혀진 소리꾼이 한둘이랴
이명숙 명창 1주기 추모공연
- 입력 : 2008. 04.22(화) 00:00
- 진선희 기자 jin@hallailbo.co.kr

모처럼 제주 명창 한자리에…'제주의 소리꾼' 기획공연을
○… 무대와 미술, 그 현장을 다시 보고 새로 본다. 오늘부터 매주 한차례씩 '진선희 기자의 문화 현장'을 싣는다. 때로 달콤하고, 때론 쓰디쓴 현장의 이야기가 '제주 문화'라는 나무가 커가는 거름이 되길 기대해본다. …○
그 무대에 꽃상여가 오른 게 처음이 아닐까. 하얀 국화를 든 이를 앞세우고 색색의 꽃치장을 한 상여가 뒤따랐다. '꽃염불소리'가 이어졌다. 망자가 땅에 묻히기 전날, 동네 사람들은 빈 꽃상여를 메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렇듯 노래를 불렀다.
봄비가 흩뿌리던 지난 16일 저녁 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도무형문화재 제주농요 보유자였던 이명숙 명창 1주기를 맞아 추모공연이 열렸다. 제주농요를 전승하고 있는 고인의 두 딸이 국악협회제주도지회와 함께 마련한 행사였다.
이날 무대에는 어머니의 소리를 대물림한 듯한 김향옥씨는 물론이고 박순재 홍송월 고성옥 등 제주지역 명창들이 한데 모여들었다. 드문 일이다. 촐비는 소리, 검질 매는 소리, 마당질 소리 등 제주노동요가 익살스런 무대 연출로 신명나게 불려졌다. '잘한다, 잘한다'는 추임새가 객석에서 터져나왔다. 이즈막에 한창 무대를 누비고 있는 소리꾼들은 먼저 세상을 뜬 이 명창에 대한 애도를 제주 민요에 대한 한없는 애정으로 드러냈다.
제주는 노래의 섬이다. 일찍이 청춘을 제주에서 보냈던 시인 고은은 이렇게 말했다. 하루 종일이 아니라 석달 열흘을 불러도 아직 부를 노래가 있고, 한라산이 닳고 닳아서 한 칸의 집이 될 때쯤에나 노래를 있는 대로 다 부르고 입을 다물 수 있을 거라고. 어느 시절, 밭과 바다에서 생을 일궜던 제주의 여인들은 그래서 다 소리꾼이었다.
이 섬에서 이름을 날렸던 소리꾼을 떠올려본다. 성읍의 조을선, 구좌읍 월정리 출신 김주옥, 방앗돌굴리는 노래의 강원호, 해녀노래 안도인….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젊은 소리꾼들의 스승으로 살아생전 존경을 받았던 이들이지만 어느새 희미해져가는 이름이 되고 있다. 질박한 민요가 불려졌던 노동의 현장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그곳에서 만들어진 노래의 맛이 차츰 변하고 있는 터에 소리꾼마저 잊혀진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유족들이 애틋한 마음으로 이명숙 명창 추모공연을 마련했듯, 제주섬 소리꾼들을 조명하는 작업이 이어졌으면 한다. 적어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이라면 탐라문화제때 이루어지는 공개발표회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든 소리를 배우겠다고 하면 가진 것을 다 내주겠다고 했다던 김주옥 명창처럼 민요 전승의 기회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악협회도지회에서는 이 참에 '제주의 소리꾼'시리즈를 기획공연으로 이어가면 어떨까. 불러도 불러도 못다부르는 그 노래를 듣고 싶다.
○… 무대와 미술, 그 현장을 다시 보고 새로 본다. 오늘부터 매주 한차례씩 '진선희 기자의 문화 현장'을 싣는다. 때로 달콤하고, 때론 쓰디쓴 현장의 이야기가 '제주 문화'라는 나무가 커가는 거름이 되길 기대해본다. …○
그 무대에 꽃상여가 오른 게 처음이 아닐까. 하얀 국화를 든 이를 앞세우고 색색의 꽃치장을 한 상여가 뒤따랐다. '꽃염불소리'가 이어졌다. 망자가 땅에 묻히기 전날, 동네 사람들은 빈 꽃상여를 메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렇듯 노래를 불렀다.
봄비가 흩뿌리던 지난 16일 저녁 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도무형문화재 제주농요 보유자였던 이명숙 명창 1주기를 맞아 추모공연이 열렸다. 제주농요를 전승하고 있는 고인의 두 딸이 국악협회제주도지회와 함께 마련한 행사였다.
이날 무대에는 어머니의 소리를 대물림한 듯한 김향옥씨는 물론이고 박순재 홍송월 고성옥 등 제주지역 명창들이 한데 모여들었다. 드문 일이다. 촐비는 소리, 검질 매는 소리, 마당질 소리 등 제주노동요가 익살스런 무대 연출로 신명나게 불려졌다. '잘한다, 잘한다'는 추임새가 객석에서 터져나왔다. 이즈막에 한창 무대를 누비고 있는 소리꾼들은 먼저 세상을 뜬 이 명창에 대한 애도를 제주 민요에 대한 한없는 애정으로 드러냈다.
제주는 노래의 섬이다. 일찍이 청춘을 제주에서 보냈던 시인 고은은 이렇게 말했다. 하루 종일이 아니라 석달 열흘을 불러도 아직 부를 노래가 있고, 한라산이 닳고 닳아서 한 칸의 집이 될 때쯤에나 노래를 있는 대로 다 부르고 입을 다물 수 있을 거라고. 어느 시절, 밭과 바다에서 생을 일궜던 제주의 여인들은 그래서 다 소리꾼이었다.
이 섬에서 이름을 날렸던 소리꾼을 떠올려본다. 성읍의 조을선, 구좌읍 월정리 출신 김주옥, 방앗돌굴리는 노래의 강원호, 해녀노래 안도인….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젊은 소리꾼들의 스승으로 살아생전 존경을 받았던 이들이지만 어느새 희미해져가는 이름이 되고 있다. 질박한 민요가 불려졌던 노동의 현장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그곳에서 만들어진 노래의 맛이 차츰 변하고 있는 터에 소리꾼마저 잊혀진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유족들이 애틋한 마음으로 이명숙 명창 추모공연을 마련했듯, 제주섬 소리꾼들을 조명하는 작업이 이어졌으면 한다. 적어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이라면 탐라문화제때 이루어지는 공개발표회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든 소리를 배우겠다고 하면 가진 것을 다 내주겠다고 했다던 김주옥 명창처럼 민요 전승의 기회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악협회도지회에서는 이 참에 '제주의 소리꾼'시리즈를 기획공연으로 이어가면 어떨까. 불러도 불러도 못다부르는 그 노래를 듣고 싶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다음달 토트넘 합류하는 양민혁 제주 외가 찾는다
- 2

'비공개 오찬' 오영훈 지사 음식값 1인당 3만원 초과
- 3

읍면동 예산 최대 40% '싹둑'… "이래 놓고 '민생 예산'?"
- 4

제주행 항공기 탑승 50대 착륙 후 의식 잃고 쓰러져 사망
- 5

'오등봉 위파크 충격' 제주 10월 미분양 주택 물량 급증
- 6

'매각 무산' 927억 제주 주상복합용지 매매가 재산정 논란
- 7

'아우성'에도 제주 차고지증명제 폐지-유지 입장차 '팽팽'
- 8

조국혁신당, 29일 제주도당 창당대회 개최
- 9

제주드림타워 개관 4주년 도민 1600명에 숙박권 등 제공 이벤…
- 10

'신규 마을기업' 모집 1년만에 재개… 현장 혼란은 불가피
- 00:00

[진선희기자의 문화현장]담담하고 끔찍하게 그…
- 00:00

[진선희기자의 문화현장]제주영상위원회, 너무 …
- 00:00

[진선희기자의 문화현장]"도미술대전 사유화 안…
- 00:00

[진선희기자의 문화현장]대중성과 전문성 '아슬…
- 00:00

[진선희기자의 문화현장]'제주도 축소판'이란 그…
- 00:00

[진선희기자의 문화현장]손발 안맞는 '자부담' …
- 00:00

[진선희기자의 문화현장]김만덕의 '할매'같은 멘…
- 00:00

[진선희기자의 문화현장]4·3미술제의 궁색한 탈…
- 00:00

[진선희기자의 문화현장]비상임 지휘자, 이젠 돌…
- 00:00

[진선희기자의 문화현장]평화로의 제주어 홍보…















 2024.12.01(일) 18:29
2024.12.01(일)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