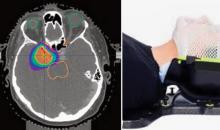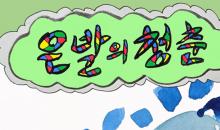[이방훈의 건강&생활] 통풍과 가우트(GOUT) 이야기
- 입력 : 2025. 02.05(수) 06:0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한라일보] 통풍은 글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바람에 스치기만 해도 관절 통증이 아주 심하게 느껴지는 병이다.
서양에서는 통풍을 '가우트(GOUT)'라 한다. 어원인 라틴어 '구타(GUTTA)'는 '한 방울'이라는 뜻을 갖는데, 13세기 유럽에서는 관절에 생긴 모든 병을 구타라고 불렀다. 고대의학에서는 혈액에서 나쁜 체액이 관절에 방울방울 떨어져 관절 질환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또한 당시에는 몸에 돌아다니는 체액이 어느 장기에서 흐르는 것이 멈추게 되면 그 장기에 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현대 과학적 설명과 아주 근접하다. 가우트라는 병명은 랜돌푸스에 의해 처음 사용됐고, 19세기까지는 임상적으로 비슷한 류마티스 질환과도 혼재돼 사용됐다. 17세기에 레벤후크가 통풍 결정체를 발견하고, 시드넘이 통풍과 류마티스 질환이 별개의 질환이라고 주장하면서 통풍은 점차 독자적인 질병으로 인식됐다. 1984년 게로드가 혈중에서 요산 결정체를 추출해 통풍의 원인과 발병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면서 가우트는 진짜 하나의 질병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가우트가 최초로 번역된 서적을 보면 통풍이 아니라 '주풍각'으로 쓰여 있고, 20세기 초부터 통풍으로 번역됐다. 일본은 1862년부터 가우트를 통풍으로 번역해 사용됐고, 한국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과정을 흡수해 통풍이라 쓰고 있다.
퓨린 성분이 많은 음식 즉, 붉은 고기와 술, 그리고 각종 동물의 간을 즐겨 먹을 수 있었던 과거 유럽의 귀족과 왕들은 그것이 원인이 돼 극도로 고통을 받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단백질에 포함된 퓨린이 대사과정 마지막에 요산으로 나오는데 약 10% 환자에서는 요산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90% 환자에서는 콩팥으로 배출 못해서 결과적으로 몸 안에 요산이 많게 된다. 하지만, 고요산혈증이 있다고 통풍이 모두 발생하지는 않고, 일생에 거쳐 약 10%에서 통풍으로 발전하게 된다. 체액 속에 녹아있는 요산은 독성이 없으나 요산 결정체는 인체에 여러 가지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는 독성이 있다. 체온 저하, 산성화 그리고 요산증가가 요산 결정화의 가속화 요인이 된다. 섭씨 37도, pH7.4 일 때 요산이 용해될 수 있는 최고의 농도는 7㎎/dl 정도인데, 체온이 몸통보다는 손발이 차갑기 때문에 요산 농도가 7㎎/dl 이상이면 결정체 상태로 쉽게 변해 특히 손발 관절들에 잘 온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치료는 요산수치를 7 이하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에 따라서 요산 생성을 억제시키는 약을 쓰거나 혹은 요산을 빨리 배출시키는 약을 선택해서 투여하면 치료는 쉽게 된다.
관절통 증세가 없어지면 환자들이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생각이다. 지속적으로 혈중 요산수치를 관찰하면서 통증이 없어도 통풍치료제를 복용해야 한다. 최근에 통풍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복부비만이 특징인 대사증후군 환자의 증가, 식습관 변화 그리고 수명이 길어지는 것과 연관이 많다. <이방훈 의학박사·재활의학 전문의>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서양에서는 통풍을 '가우트(GOUT)'라 한다. 어원인 라틴어 '구타(GUTTA)'는 '한 방울'이라는 뜻을 갖는데, 13세기 유럽에서는 관절에 생긴 모든 병을 구타라고 불렀다. 고대의학에서는 혈액에서 나쁜 체액이 관절에 방울방울 떨어져 관절 질환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또한 당시에는 몸에 돌아다니는 체액이 어느 장기에서 흐르는 것이 멈추게 되면 그 장기에 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현대 과학적 설명과 아주 근접하다. 가우트라는 병명은 랜돌푸스에 의해 처음 사용됐고, 19세기까지는 임상적으로 비슷한 류마티스 질환과도 혼재돼 사용됐다. 17세기에 레벤후크가 통풍 결정체를 발견하고, 시드넘이 통풍과 류마티스 질환이 별개의 질환이라고 주장하면서 통풍은 점차 독자적인 질병으로 인식됐다. 1984년 게로드가 혈중에서 요산 결정체를 추출해 통풍의 원인과 발병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면서 가우트는 진짜 하나의 질병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가우트가 최초로 번역된 서적을 보면 통풍이 아니라 '주풍각'으로 쓰여 있고, 20세기 초부터 통풍으로 번역됐다. 일본은 1862년부터 가우트를 통풍으로 번역해 사용됐고, 한국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과정을 흡수해 통풍이라 쓰고 있다.
퓨린 성분이 많은 음식 즉, 붉은 고기와 술, 그리고 각종 동물의 간을 즐겨 먹을 수 있었던 과거 유럽의 귀족과 왕들은 그것이 원인이 돼 극도로 고통을 받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단백질에 포함된 퓨린이 대사과정 마지막에 요산으로 나오는데 약 10% 환자에서는 요산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90% 환자에서는 콩팥으로 배출 못해서 결과적으로 몸 안에 요산이 많게 된다. 하지만, 고요산혈증이 있다고 통풍이 모두 발생하지는 않고, 일생에 거쳐 약 10%에서 통풍으로 발전하게 된다. 체액 속에 녹아있는 요산은 독성이 없으나 요산 결정체는 인체에 여러 가지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는 독성이 있다. 체온 저하, 산성화 그리고 요산증가가 요산 결정화의 가속화 요인이 된다. 섭씨 37도, pH7.4 일 때 요산이 용해될 수 있는 최고의 농도는 7㎎/dl 정도인데, 체온이 몸통보다는 손발이 차갑기 때문에 요산 농도가 7㎎/dl 이상이면 결정체 상태로 쉽게 변해 특히 손발 관절들에 잘 온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치료는 요산수치를 7 이하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에 따라서 요산 생성을 억제시키는 약을 쓰거나 혹은 요산을 빨리 배출시키는 약을 선택해서 투여하면 치료는 쉽게 된다.
관절통 증세가 없어지면 환자들이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생각이다. 지속적으로 혈중 요산수치를 관찰하면서 통증이 없어도 통풍치료제를 복용해야 한다. 최근에 통풍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복부비만이 특징인 대사증후군 환자의 증가, 식습관 변화 그리고 수명이 길어지는 것과 연관이 많다. <이방훈 의학박사·재활의학 전문의>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제주지방 주말 올 겨울들어 가장 춥다.. 최고 25㎝ 폭설
- 2

제주도교육청 3월1일 정기인사... 교육국장에 윤철훈
- 3

오영훈 지사 재선 도전 '시동'...책 출간으로 신호탄
- 4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가능성 낮아지나
- 5

더 빨라진 괭생이모자반의 습격… 제주바다 '몸살'
- 6

제주지방 내일까지 새봄 막는 강추위.. 해안지역 15㎝ 폭설
- 7

제주지방 2월 첫 주말 30㎝ 폭설.. 도로·공항 '비상'
- 8

'가격 하락' 제주 당근 3000톤 수매 후 출하 정지 초강수
- 9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직원 전부 일반직 채용"
- 10

행안부·국회 제주도의원 정수 확대 신중.. 문턱 못넘나
- 00:00

[김형미의 현장시선]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
- 20:18

[열린마당]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외식
- 03:00

[양상철의 목요담론] 제주 성곽, 삶의 경계와 저…
- 01:00

[열린마당]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 01:00

[열린마당] 스토리텔링으로 전하는 봉사
- 02:00

[이영웅의 한라시론] 타당성 없는 LNG발전소 계획…
- 02:00

[열린마당] 안전한 설, 화재예방은 작은 실천에…
- 01:00

[한치화의 건강&생활] 호스피스를 아시나요?
- 03:00

[열린마당] 상호존중,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
- 01:00

[열린마당] 소통으로 회복을 잇는 회복적 경찰활…















 2026.02.08(일) 18:34
2026.02.08(일)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