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1) 디지털 시대 미디어 문해력 업(UP)
미디어의 세계로… 디지털 문해력 키우는 여정
- 입력 : 2024. 05.29(수) 00:00
-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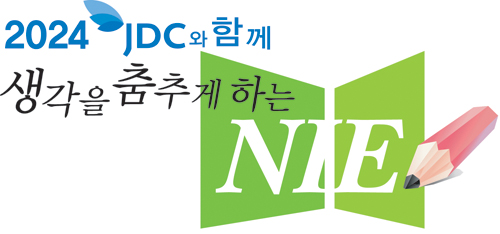
최고 수준 IT인프라… 디지털 세대 미흡한 문해력
미래 핵심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
미디어 비판적으로 읽으며 자신의 생각 다듬기
[한라일보] 연일 보도되는 인공지능 AI의 기술의 발전은 영화 속의 상상의 세계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느껴질 정도로 실로 놀랍다.
디지털과 인터넷은 지식과 정보의 세계에 또 한 번의 혁명을 가져왔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누구나 손안에서 거의 공짜로 언제나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선물했다. 정보사회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예고한 대로 지식과 정보가 가장 큰 권력이 되는 사회다. 문맹률은 제로에 가깝고, 누구나 스마트폰이라는 강력하고 편리한 정보 단말기를 이용해 쉼 없이 읽고 쓰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정보 이용과 생산이 어느 때보다 활발해진 오늘날 문해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일까?
디지털 세대의 문해력 문제를 얘기하려면 먼저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문해력이 전통적 문해력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짚어봐야 한다. 리터러시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고대엔 '학식 있는 사람', 중세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근대국가 시기엔 '모국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이었다. 리터러시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해왔는데, 책의 그림과 글자보다 스마트폰이나 패드로 동영상을 먼저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가 늘어나고 있다.
 유네스코는 리터러시를 "다양한 맥락과 연관된 인쇄 및 필기 자료를 활용해 정보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만들어내고, 소통하고, 계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종이에 쓰인 글의 내용을 읽는 것을 넘어 종합적인 사회적 능력이라고 정의내렸다. '문해력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문맹'과는 다르다.
유네스코는 리터러시를 "다양한 맥락과 연관된 인쇄 및 필기 자료를 활용해 정보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만들어내고, 소통하고, 계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종이에 쓰인 글의 내용을 읽는 것을 넘어 종합적인 사회적 능력이라고 정의내렸다. '문해력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문맹'과는 다르다.
디지털 문해력에 대해 미국의 미디어 교육학자 루블라와 베일리는 '디지털 기술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아는 능력'이라고 설명했고, 미국도서관협회(ALA)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탐색·평가·창조·소통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다시 말해 디지털 문해력은 기술과 도구 사용 능력, 뉴스 등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이해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해력이 디지털 세상에서 더 중요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대중들의 문해력 저하 현상이 말해주듯 갈수록 희소해지는 능력인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은 더 높은 리터러시 능력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정보를 연결하고 선택하고 분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은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질 것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딥페이크와 메타버스처럼 가상과 현실의 뒤섞임이 불가피한 미래다. 단순한 정보 접근과 수용으로는 점점 복잡해질 현실의 문제를 풀 수 없다. 우리에게 손쉬운 정보 접근과 이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기술의 편리함이 거꾸로 이용자들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리터러시 능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문해력이 중요해진 또 하나의 이유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 왜곡정보의 범람과 영향력 확대다.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면서 디지털 정보 구조와 새로운 문해력에 관한 전문적 기술을 갖추고 이를 조작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편향적이고 분절적인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인 이용자들을 주로 공략하고 있다. 허위 왜곡정보의 문제가 특정 국가나 계층을 넘어 범사회적이고 글로벌 차원의 문제가 되는 배경이다.
실제 현실에서의 우리나라 리터러시 역량은 어떨까?
'사흘 연휴'가 생겼다는 보도에 "왜 3일 연휴인데 사(4)흘이라고 보도하냐"는 댓글과 함께 '사흘'이 포털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국민적인 문해력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1년 5월 발표한 '피사(PISA)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보고서에서 한국의 만 15살 학생(중3, 고1)들의 디지털 문해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디지털 강국이자 문맹률이 최저 수준인 높은 교육열의 국가 한국에서 왜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 수준은 그만큼 높지 않을까?
이런 문제인식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디지털 교육 환경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탐색, 선택하고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미래 핵심역량으로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미디어로 세상을 보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미디어(매체)가 각각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또한 디지털 세상에서의 윤리적인 측면, 허위조작정보, 알고리즘과 필터버블, 확증편향으로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 연계되어야 한다.
2024년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연재는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문해력을 키우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미디어 비판적 읽기를 진행한다. ▷게임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광고 리터러시 ▷영상 리터러시 ▷책 리터러시 ▷인공지능AI 리터러시 ▷웹툰 리터러시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 ▷음악 리터러시 ▷영화 리터러시 등 10가지의 미디어 특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미디어 특성별 이해를 바탕으로 활동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으로 진행된 수업 현장 내용을 싣고자 한다.
이번 연재는 미디어교육연구회 'ON'(옛 제주NIE학회) 소속 강은숙, 김경화, 박진희, 이현화, 채경진 강사가 참여한다.
<이현화/미디어교육연구회'ON'>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미래 핵심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
미디어 비판적으로 읽으며 자신의 생각 다듬기
[한라일보] 연일 보도되는 인공지능 AI의 기술의 발전은 영화 속의 상상의 세계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느껴질 정도로 실로 놀랍다.
디지털과 인터넷은 지식과 정보의 세계에 또 한 번의 혁명을 가져왔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누구나 손안에서 거의 공짜로 언제나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선물했다. 정보사회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예고한 대로 지식과 정보가 가장 큰 권력이 되는 사회다. 문맹률은 제로에 가깝고, 누구나 스마트폰이라는 강력하고 편리한 정보 단말기를 이용해 쉼 없이 읽고 쓰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정보 이용과 생산이 어느 때보다 활발해진 오늘날 문해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일까?
디지털 세대의 문해력 문제를 얘기하려면 먼저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문해력이 전통적 문해력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짚어봐야 한다. 리터러시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고대엔 '학식 있는 사람', 중세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근대국가 시기엔 '모국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이었다. 리터러시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해왔는데, 책의 그림과 글자보다 스마트폰이나 패드로 동영상을 먼저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가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문해력에 대해 미국의 미디어 교육학자 루블라와 베일리는 '디지털 기술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아는 능력'이라고 설명했고, 미국도서관협회(ALA)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탐색·평가·창조·소통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다시 말해 디지털 문해력은 기술과 도구 사용 능력, 뉴스 등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이해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해력이 디지털 세상에서 더 중요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대중들의 문해력 저하 현상이 말해주듯 갈수록 희소해지는 능력인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은 더 높은 리터러시 능력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정보를 연결하고 선택하고 분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은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질 것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딥페이크와 메타버스처럼 가상과 현실의 뒤섞임이 불가피한 미래다. 단순한 정보 접근과 수용으로는 점점 복잡해질 현실의 문제를 풀 수 없다. 우리에게 손쉬운 정보 접근과 이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기술의 편리함이 거꾸로 이용자들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리터러시 능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문해력이 중요해진 또 하나의 이유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 왜곡정보의 범람과 영향력 확대다.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면서 디지털 정보 구조와 새로운 문해력에 관한 전문적 기술을 갖추고 이를 조작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편향적이고 분절적인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인 이용자들을 주로 공략하고 있다. 허위 왜곡정보의 문제가 특정 국가나 계층을 넘어 범사회적이고 글로벌 차원의 문제가 되는 배경이다.
실제 현실에서의 우리나라 리터러시 역량은 어떨까?
'사흘 연휴'가 생겼다는 보도에 "왜 3일 연휴인데 사(4)흘이라고 보도하냐"는 댓글과 함께 '사흘'이 포털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국민적인 문해력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1년 5월 발표한 '피사(PISA)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보고서에서 한국의 만 15살 학생(중3, 고1)들의 디지털 문해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디지털 강국이자 문맹률이 최저 수준인 높은 교육열의 국가 한국에서 왜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 수준은 그만큼 높지 않을까?
이런 문제인식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디지털 교육 환경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탐색, 선택하고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미래 핵심역량으로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미디어로 세상을 보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미디어(매체)가 각각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또한 디지털 세상에서의 윤리적인 측면, 허위조작정보, 알고리즘과 필터버블, 확증편향으로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 연계되어야 한다.
2024년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연재는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문해력을 키우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미디어 비판적 읽기를 진행한다. ▷게임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광고 리터러시 ▷영상 리터러시 ▷책 리터러시 ▷인공지능AI 리터러시 ▷웹툰 리터러시 ▷소셜 미디어 리터러시 ▷음악 리터러시 ▷영화 리터러시 등 10가지의 미디어 특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미디어 특성별 이해를 바탕으로 활동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으로 진행된 수업 현장 내용을 싣고자 한다.
이번 연재는 미디어교육연구회 'ON'(옛 제주NIE학회) 소속 강은숙, 김경화, 박진희, 이현화, 채경진 강사가 참여한다.
<이현화/미디어교육연구회'ON'>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04:00

[2024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5)영상리…
- 00:00

[2024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4)광고리…
- 00:00

[2024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3)뉴스 …
- 00:00

[2024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2)게임리…
- 00:00

[2024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1) 디지…
- 00:00

[2023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21)세계…
- 00:00

[2023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20)세계…
- 00:00

[2023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19)세계…
- 00:00

[2023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18)세계…
- 00:00

[2023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17)세계 …














 2024.06.26(수) 21:03
2024.06.26(수) 2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