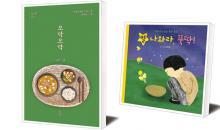[백록담]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사회
- 입력 : 2014. 12.22(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교육은 오랫동안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꼽혔다. 우리가 양반만이 과거를 보고 합격할 수 있다고 여겨온 조선시대에도 그랬다. 조선시대 양반의 신분과 특권이 세습됐다는 기존 학계의 통념과 달리 신분의 낮은 집안의 자제들도 대거 과거에 급제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다.
'과거, 출세의 사다리'를 펴낸 한영우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조선시대는 신분 이동이 다이내믹 했으며,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였다고 했다. 조선 초기만 해도 평민 등 신분이 낮은 급제자의 비중은 과거시험 합격자의 40~50%나 됐다. 고종 때는 그 비율이 50%를 훌쩍 넘겨 거의 60%대에 이르렀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은 오늘날도 유효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 이유는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기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근본적으로는 지역 간 격차와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의 격차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있다. 지역 간 격차와 빈부의 차이는 교육양극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스펙과 학벌의 차이로 이어지고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출발점이 달라진다. 부의 대물림과 가난의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학벌사회에 갇혀있고 소위 잘 나가는 명문대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목을 매는 현실이다. 없는 사람들에게 '개천에서 용 나기'는 그만큼 힘들다. 부모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리 할 수밖에 없는 자기모순의 합리화에 빠져든다.
한 개인의 인생이 10대 중반의 고교입시나 19세에 치르는 대학입시 연령대에서 거의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회. 어쩌면 우리는 조선시대보다도 계층과 신분이동이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왜곡되고 불편한 현실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제주지역 고교입시 현실을 보자. 올해도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입학정원을 84명 초과했다.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이는 정원이 지난해에 비해 늘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완화된 것은 아니다. 읍면의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는 정원을 늘렸음에도 올해도 정원을 밑돌았다. 제주시 지역 일반고 쏠림현상은 읍면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고 명문대학에 보낼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지역은 교육 공동화의 위기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이 고교체제개편에 나선 것은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읍면지역 고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 육성, 평준화지역 일반고 개선 등을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고교체제를 개편하겠다고 한다. 계획대로라면 2017년도부터는 수 십 년 동안 이어져온 고교체제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단기간의 결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과 미래비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제주고교체제개편 시도가 끊어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희망의 사다리로 이어주는 의미있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윤형 교육체육부장>
'과거, 출세의 사다리'를 펴낸 한영우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조선시대는 신분 이동이 다이내믹 했으며,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였다고 했다. 조선 초기만 해도 평민 등 신분이 낮은 급제자의 비중은 과거시험 합격자의 40~50%나 됐다. 고종 때는 그 비율이 50%를 훌쩍 넘겨 거의 60%대에 이르렀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은 오늘날도 유효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 이유는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기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근본적으로는 지역 간 격차와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의 격차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있다. 지역 간 격차와 빈부의 차이는 교육양극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스펙과 학벌의 차이로 이어지고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출발점이 달라진다. 부의 대물림과 가난의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학벌사회에 갇혀있고 소위 잘 나가는 명문대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목을 매는 현실이다. 없는 사람들에게 '개천에서 용 나기'는 그만큼 힘들다. 부모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리 할 수밖에 없는 자기모순의 합리화에 빠져든다.
한 개인의 인생이 10대 중반의 고교입시나 19세에 치르는 대학입시 연령대에서 거의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회. 어쩌면 우리는 조선시대보다도 계층과 신분이동이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왜곡되고 불편한 현실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제주지역 고교입시 현실을 보자. 올해도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입학정원을 84명 초과했다.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이는 정원이 지난해에 비해 늘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완화된 것은 아니다. 읍면의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는 정원을 늘렸음에도 올해도 정원을 밑돌았다. 제주시 지역 일반고 쏠림현상은 읍면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고 명문대학에 보낼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지역은 교육 공동화의 위기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이 고교체제개편에 나선 것은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읍면지역 고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 육성, 평준화지역 일반고 개선 등을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고교체제를 개편하겠다고 한다. 계획대로라면 2017년도부터는 수 십 년 동안 이어져온 고교체제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단기간의 결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과 미래비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제주고교체제개편 시도가 끊어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희망의 사다리로 이어주는 의미있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윤형 교육체육부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제주 경매 찬바람' 150억원대 리조트 낙찰가 고작 45억원
- 2

대통령 지시에… 제주 중문관광단지 매입 미궁 속으로
- 3

올겨울 눈 많다는데 '도로 제설제·모래 어딨지?'
- 4

제주동부서 재건축 101억 추가 확보… "2029년 준공"
- 5

노지감귤 가격 호조세... 12월에도 이어질 듯
- 6

제주도심 한복판 해병대 제9여단 이전 가능할까
- 7

'수도권 규제' 제주지역 외지인 주택 매입 41개월 만에 최대
- 8

제주 공공체육시설·직장 선수단 예산 감액 편성 도마
- 9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건립업체 선정 특혜 의심"
- 10

일부 종교계 반발에도 제주평화인권헌장 10일 선포















 2025.12.06(토) 17:27
2025.12.06(토)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