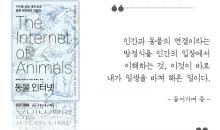[고찬미의 한라칼럼] 코로나 시대, 세상을 보고 여는 우리의 시야
- 입력 : 2020. 10.27(화) 00:00
-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는 여전히 멀어 보인다. 코로나 시대를 어느덧 적응하며 견디고는 있지만, 기약 없는 대면과 이동 제한에는 사람들의 피로와 불만이 한계에 달한 것 같다. 휴가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가족을 만나거나 사업 또는 공부 등의 이유로 멀리 떠나야 할 이들이 닫힌 하늘길로 겪게 된 불편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최근 출발지와 목적지가 기이하게도 같은 비행 상품이 바로 매진된 사례는 여행을 목말라하는 코로나 시대 사람들의 과열 반응으로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흔히 새로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일상에서 벗어나기 그 자체를 여행의 목적으로 삼는 이들 또한 꽤 많아졌다. 도착지 없는 비행으로라도 아쉬움을 달래고 있지 않은가. 하긴, 여행이 소기의 성과를 이뤄야 할 과업도 아닐뿐더러 심적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유익하기에 이런 '비일상'으로의 여정도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기쁨을 더 누리지 못하게 된 이들이 따분한 일상에 갇힌 듯, 코로나뿐 아니라 코로나 블루 위협까지 이중고를 겪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문득 모두가 발이 묶인 이 시기에 80여년 평생 고향을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던 철학자 칸트가 떠오른다. 세상을 뒤바꾼 지동설에 빗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인식론 철학에 가져온 것으로 그는 유명하다. 대상을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주체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 대상이 달리 보이는 거라고 주장했다. 지금은 당연한 말 같지만 이에 충격을 받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된 당시 18세기 사람들은 그제야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알게 된 것이다. 자기 집에서 100마일 이상 벗어난 적 없이 좁은 행동반경 내에서 규칙적 일상만 반복하며 살았지만, 칸트는 보편적 인간성과 도덕률을 매개로 세계시민주의를 구상하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공동체까지도 꿈꾼 자이다. 세계화가 익숙한 현대인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그는 이미 세상을 넓게 세상사를 깊이 바라본 것이다. 마음먹기에 따라 한정된 공간도 우주처럼 더 많은 것을 보고 생각할 수 있음을 자신의 삶 자체로 입증한 '자유'로운 철학자 칸트를 이 시대에 소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삶이 힘들다고 '테스형'도 불렀으니…)
사실 필자의 행동반경도 올해는 모두가 그렇듯 가장 좁고 단순했다. 그런데도 이전에 모르던 우리 사회 온갖 소식들을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많이 접하게 됐다. 약자에게 더 가혹한 재난 코로나로 인해 뚜렷해진 부와 계층의 격차,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와 일용직 사고사를 포함한 불평등 고용의 민낯, 더 빈번해진 (혹은 수면으로 드러난) 아동학대 및 성적학대, 종교·성·인종 차별 등 이 사회에서 숨겨졌던 병폐들을 마주보게 됐다. 윤색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비로소 이 사회의 아픔을 발견하고 조금은 이해하게 됐다.
더 많이 보고 알게 되는 게 새로운 풍경의 여행처럼 마냥 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밀려드는 책임감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일인 것도 알게 됐다.
그래도 새삼 다시 그리고 달리 보게 된 세상이 내가 원래 있던 곳이고 그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칸트형'의 정언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고찬미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문위원·문학박사>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흔히 새로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일상에서 벗어나기 그 자체를 여행의 목적으로 삼는 이들 또한 꽤 많아졌다. 도착지 없는 비행으로라도 아쉬움을 달래고 있지 않은가. 하긴, 여행이 소기의 성과를 이뤄야 할 과업도 아닐뿐더러 심적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유익하기에 이런 '비일상'으로의 여정도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기쁨을 더 누리지 못하게 된 이들이 따분한 일상에 갇힌 듯, 코로나뿐 아니라 코로나 블루 위협까지 이중고를 겪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문득 모두가 발이 묶인 이 시기에 80여년 평생 고향을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던 철학자 칸트가 떠오른다. 세상을 뒤바꾼 지동설에 빗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인식론 철학에 가져온 것으로 그는 유명하다. 대상을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주체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 대상이 달리 보이는 거라고 주장했다. 지금은 당연한 말 같지만 이에 충격을 받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된 당시 18세기 사람들은 그제야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알게 된 것이다. 자기 집에서 100마일 이상 벗어난 적 없이 좁은 행동반경 내에서 규칙적 일상만 반복하며 살았지만, 칸트는 보편적 인간성과 도덕률을 매개로 세계시민주의를 구상하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공동체까지도 꿈꾼 자이다. 세계화가 익숙한 현대인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그는 이미 세상을 넓게 세상사를 깊이 바라본 것이다. 마음먹기에 따라 한정된 공간도 우주처럼 더 많은 것을 보고 생각할 수 있음을 자신의 삶 자체로 입증한 '자유'로운 철학자 칸트를 이 시대에 소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삶이 힘들다고 '테스형'도 불렀으니…)
사실 필자의 행동반경도 올해는 모두가 그렇듯 가장 좁고 단순했다. 그런데도 이전에 모르던 우리 사회 온갖 소식들을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많이 접하게 됐다. 약자에게 더 가혹한 재난 코로나로 인해 뚜렷해진 부와 계층의 격차,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와 일용직 사고사를 포함한 불평등 고용의 민낯, 더 빈번해진 (혹은 수면으로 드러난) 아동학대 및 성적학대, 종교·성·인종 차별 등 이 사회에서 숨겨졌던 병폐들을 마주보게 됐다. 윤색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비로소 이 사회의 아픔을 발견하고 조금은 이해하게 됐다.
더 많이 보고 알게 되는 게 새로운 풍경의 여행처럼 마냥 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밀려드는 책임감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일인 것도 알게 됐다.
그래도 새삼 다시 그리고 달리 보게 된 세상이 내가 원래 있던 곳이고 그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칸트형'의 정언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고찬미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문위원·문학박사>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다음달 토트넘 합류하는 양민혁 제주 외가 찾는다
- 2

'비공개 오찬' 오영훈 지사 음식값 1인당 3만원 초과
- 3

읍면동 예산 최대 40% '싹둑'… "이래 놓고 '민생 예산'?"
- 4

제주행 항공기 탑승 50대 착륙 후 의식 잃고 쓰러져 사망
- 5

'오등봉 위파크 충격' 제주 10월 미분양 주택 물량 급증
- 6

'매각 무산' 927억 제주 주상복합용지 매매가 재산정 논란
- 7

'아우성'에도 제주 차고지증명제 폐지-유지 입장차 '팽팽'
- 8

조국혁신당, 29일 제주도당 창당대회 개최
- 9

제주드림타워 개관 4주년 도민 1600명에 숙박권 등 제공 이벤…
- 10

'신규 마을기업' 모집 1년만에 재개… 현장 혼란은 불가피















 2024.12.01(일) 20:01
2024.12.01(일)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