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의 제주문화사전] (36)도새기의 생태학
사람→돼지→농작물→사람으로 순환했던 제주 생태계
- 입력 : 2020. 11.23(월)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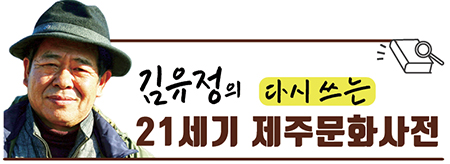
돗기름으로 부드럽게 만드는 빙떡
척박한 땅 지력을 높이는 돗걸름
돗추렴에 분육 통한 화합과 공존
#돗통시의 기능
제주도 서촌(옛 대정현)과 동촌(옛 정의현)이 다른 문화적 정서가 남아 있어, 여전히 동·서촌에 대한 각각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보이고 있다. 돗통·돗통시만 봐도 동촌·서촌의 모양이 다르다. 돗집(돼지가 사는 집), 즉 도새기가 잠을 자는 집은 동·서 지역이 모두 같지만 사람이 일을 보는 측간(厠間)은 서촌에는 집 없이 노출되었지만 동촌에는 측간에 초가로 집을 만들어 사방을 가리고 비를 피할 수 있게 했었다.
그렇다면 돗통·돗통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할까. 첫째 돼지를 키우는 장소로서의 기능이다. 돼지는 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육류이다. 특히 기름기가 많아 팍팍한 음식에 기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일례로 빙떡은 메밀로 만들기 때문에 물기가 없고 굳히는 장력이 약하기 때문에 돼지기름을 쓰게 되면 촉촉해져 부드럽고 까칠한 메밀의 맛도 좋다. 또 돼지는 잔치 때는 고깃반으로, 제사 때는 돼지고기 적(炙)은 물론, 몸국, 고기국수, 순대, 돗궤기 엿 등 생활의 식재료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두 번째로 농사용 거름을 생산하는 발효 장소의 기능이다. 돗통·돗통시를 만들 때에는 그 구덩이를 깊게 판다. 적어도 사람 키 깊이가 더 되도록 파서 보리짚이나 산듸짚 등 마른 농작물의 잎을 잔뜩 깔고 먹지 않는 농산물을 돼지가 먹도록 시간이 날 때마다 던져놓으면 돼지는 돌아다닐 때마다 그것들을 먹으려고 자연히 밟게 되고 돼지똥과 돼지 오줌, 사람똥이 계속 버무려지면서 암모니아가 발생해 그것들이 거름으로 발효하게 된다. 이 거름을 돗걸름이라고 하는데 콩이나 조, 고구마 등 가을 농사가 끝나면 11월 말에서 12월 초 보리농사를 앞두고 돗걸름을 내었다가 15일 이상 충분히 '궂인 물'을 빼고 발효시킨 다음에 "마당에서 앙(펼쳐) 보리씨를 삐어서(뿌려서) 소로 밝아, 뿌린 보리씨가 골고루 가게끔 쇠스랑으로 엎어 뒈싸 뒤짚어서, 또 씨를 뿌령 반복적으로 밝은후 마차)에 싣고 밭에다 날랐다." 마차가 없는 사람은 이 돗걸름을 망탱이(가마니 모양의 바구니)에 담아서 소 등에 양쪽으로 걸치는데 이것을 '걸름맥'이라고 해, 한쪽이 가벼워 기울면 돌멩이를 넣고 균형을 맞춰 밭에다 나르면 여자가 이것을 손으로 찢으면서 골고루 뿌린다(김성백, 1936년생).
두 번째로 농사용 거름을 생산하는 발효 장소의 기능이다. 돗통·돗통시를 만들 때에는 그 구덩이를 깊게 판다. 적어도 사람 키 깊이가 더 되도록 파서 보리짚이나 산듸짚 등 마른 농작물의 잎을 잔뜩 깔고 먹지 않는 농산물을 돼지가 먹도록 시간이 날 때마다 던져놓으면 돼지는 돌아다닐 때마다 그것들을 먹으려고 자연히 밟게 되고 돼지똥과 돼지 오줌, 사람똥이 계속 버무려지면서 암모니아가 발생해 그것들이 거름으로 발효하게 된다. 이 거름을 돗걸름이라고 하는데 콩이나 조, 고구마 등 가을 농사가 끝나면 11월 말에서 12월 초 보리농사를 앞두고 돗걸름을 내었다가 15일 이상 충분히 '궂인 물'을 빼고 발효시킨 다음에 "마당에서 앙(펼쳐) 보리씨를 삐어서(뿌려서) 소로 밝아, 뿌린 보리씨가 골고루 가게끔 쇠스랑으로 엎어 뒈싸 뒤짚어서, 또 씨를 뿌령 반복적으로 밝은후 마차)에 싣고 밭에다 날랐다." 마차가 없는 사람은 이 돗걸름을 망탱이(가마니 모양의 바구니)에 담아서 소 등에 양쪽으로 걸치는데 이것을 '걸름맥'이라고 해, 한쪽이 가벼워 기울면 돌멩이를 넣고 균형을 맞춰 밭에다 나르면 여자가 이것을 손으로 찢으면서 골고루 뿌린다(김성백, 1936년생).
돗걸름은 쉐걸름에 비해서 곡식을 잘 자라게 하고 밭이 식는 것(산성이 되는 것)을 방지하므로 농가에서는 대개 돗걸름을 선호했다. 1970년대 감귤밭이 늘어나자 돗걸름을 사려고 농가마다 다니면서 거름을 확보하고는 트럭으로 나르기도 했었다.
또 돗통·돗통시 옆에는 '오좀독(오줌항아리)'이나 오좀허벅(오줌허벅)을 넣어두는데 이것들은 대개 보기가 흉하게 윗부분이 깨졌거나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옹기를 두어 오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오줌독은 높은 항아리는 안 되고 남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언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오줌허벅의 크기가 적당했다. 남자들은 오며 가며 오줌이 마렵게 되면 급히 집으로 와 오줌독에 오줌을 누어야 하며 이 오줌들은 한 두 달이 지나면 발효가 돼 지독히 독한 냄새가 나는데 색깔은 누런색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푸른 초록빛이 감돈다. 집안의 여성은 이 오줌허벅을 지고 가서 조롱박을 이용하여 배추나 채소에 오줌을 일일이 뿌리게 되면 그 채소들이 잘 자라게 된다.
셋째, 사람의 똥을 처리하는 곳이다. 오늘날도 사람의 똥을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항상 도시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지만, 돼지를 이용한 똥의 처리는 듣거나 말하기는 거북하지만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자연순환체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자연순환체계는 섬에 사는 사람들의 궁여지책이었던 것이고 제주도 환경이 낳은, 혹은 농업중심의 사회에서 나오는 생활방식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똥은 돼지가 먹고 돼지는 사람이 먹고
사람은 살기 위해 먹어야만 한다. 그러나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거름이 필요하고, 노동을 위해서는 고기를 먹어야 하며, 또 먹으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일정량을 다시 싸야만 한다.
 사람, 돼지, 농작물의 순환체계가 바로 위생에는 찝찝하지만 생태계에는 매우 우호적인 작용을 한다. 사람→돼지→농작물→다시 사람으로 도는 생태 순환체계가 과거 제주에서는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돼지는 더운 것을 참지 못한다. 그래서 돼지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 이유 또한 뱀이 돼지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또 돗통시 옆에는 대개 손바닥 만한 크기의 잎이 달리는 무화과나무가 그늘을 드리운다. 돼지는 털이 듬성듬성 나 있어 햇볕을 견디기 어려우며 30℃가 넘는 여름날에는 뜨거운 몸을 식히려고 통시에서 뒹굴면서 몸을 시원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원래 돼지는 더럽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뒹굴지도 않으며, 사람의 똥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프니 똥을 먹기 시작한 것이다. 환경이 돼지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똥은 오히려 개가 더 잘 먹는다. 예전에 뚫은 바지를 입고 다니던 아기가 마당에서 똥을 싸게 되면 재빨리 달려와 그것을 훌륭히 처리한 것도 바로 개였다.
사람, 돼지, 농작물의 순환체계가 바로 위생에는 찝찝하지만 생태계에는 매우 우호적인 작용을 한다. 사람→돼지→농작물→다시 사람으로 도는 생태 순환체계가 과거 제주에서는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돼지는 더운 것을 참지 못한다. 그래서 돼지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 이유 또한 뱀이 돼지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또 돗통시 옆에는 대개 손바닥 만한 크기의 잎이 달리는 무화과나무가 그늘을 드리운다. 돼지는 털이 듬성듬성 나 있어 햇볕을 견디기 어려우며 30℃가 넘는 여름날에는 뜨거운 몸을 식히려고 통시에서 뒹굴면서 몸을 시원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원래 돼지는 더럽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뒹굴지도 않으며, 사람의 똥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프니 똥을 먹기 시작한 것이다. 환경이 돼지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똥은 오히려 개가 더 잘 먹는다. 예전에 뚫은 바지를 입고 다니던 아기가 마당에서 똥을 싸게 되면 재빨리 달려와 그것을 훌륭히 처리한 것도 바로 개였다.
돼지가 먹성이 좋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돼지를 키우는 것도 버거운 일이었다. 그래서 고구마 전분 공장이 들어서자 돼지 먹이로 고구마 전분을 갈아 남은 찌꺼기를 마차로 실어다 돼지를 먹였다. 일명 '감제쭈시'가 그것이다. 이렇게라도 어렵게 돼지를 키우고 나면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 많았다.
#고기 나눔(分肉), 화합과 공존을 위한 행동
또 과거에는 돼지를 분육(分肉)하던 돗추렴 문화가 있었다. 돗추렴이란 가까운 몇몇의 사람이 모여 설을 앞두거나 보신의 목적이 있을 때 돼지를 공동으로 사거나, 혹은 공동의 기금으로 돼지를 잡아 공동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 돗추렴은 갑장회나 제(契:접,契) 단위로, 혹은 접 내에서도 의기가 투합한 사람 대여섯 명 미만으로 구성해서 추진된다. 이는 사람이 많게 되면 돼지고기의 공동분배가 그만큼 적어지므로 인원의 제한이 필요했다. 돗추렴은 여럿이 돈을 모아 큰 돼지를 잡아 나누는 것"으로서 돼지를 잡는 일에서부터 순대를 만드는 일 모두를 돗추렴 멤버들이 스스로 책임진다.
 예를 들어 대정읍 '낭뿔리계(契)'의 사례를 보면, 낭뿔리계란 잘린 소나무의 뿌리[낭뿌리]를 파서 말렸다가 후일 큰일집(잔치, 장례)에 땔감으로 팔아서 돈을 버는 모임이었는데 인원은 갑장 중 여섯 명이었다. 당시 소나무 뿌리는 송진이 남아 있어 큰불을 때기가 유용했으므로, 고기를 삶거나 하루 종일 밥을 해야 하는 잔칫집이나 상갓집에서 선호하는 땔감이었다. 소나무 뿌리는 화력(火力)이 좋고 단단해 오래 타는 장점이 있어 3~4일 정도 계속 불을 때야 하는 큰일집에서는 몇 가마니 단위로 구입을 해 땔감으로 썼다. 이 모임은 어느 정도 명절 전에 결산하고 돈을 조금 남겨 돼지 한 마리를 산다. 돼지는 설 명절에 쓸 고기를 마련하기 위해 명절 사나흘을 앞두고 돗추렴을 했다. 고기는 여섯 모듬으로 나누어 계원이 자발적으로 한 모듬씩 무작위 선택을 했으며, 돼지머리는 고기를 잡은 집에서 삶아 머릿고기로 썰어먹고, 내장은 수애(순대)를 만들고, 남은 내장은 배추나물과 몸(모자반)을 넣어 계꾼과 구경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줄 몸국을 만들었다(김성룡, 1935년생). 이런 돗추렴의 의미는 갑장회(계모임)의 화합은 물론 자신과 가족의 몸보신을 위하고 조상을 위해 명절의 제사용 고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한 분육(分肉) 행위였다. 돼지를 잡았을 때 가끔 그 돼지 고깃살에 쌀방울이 박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든 궤기'라고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선모충이라고 부른다. 선모충은 1859년 날돼지고기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그 숙주가 멧돼지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예를 들어 대정읍 '낭뿔리계(契)'의 사례를 보면, 낭뿔리계란 잘린 소나무의 뿌리[낭뿌리]를 파서 말렸다가 후일 큰일집(잔치, 장례)에 땔감으로 팔아서 돈을 버는 모임이었는데 인원은 갑장 중 여섯 명이었다. 당시 소나무 뿌리는 송진이 남아 있어 큰불을 때기가 유용했으므로, 고기를 삶거나 하루 종일 밥을 해야 하는 잔칫집이나 상갓집에서 선호하는 땔감이었다. 소나무 뿌리는 화력(火力)이 좋고 단단해 오래 타는 장점이 있어 3~4일 정도 계속 불을 때야 하는 큰일집에서는 몇 가마니 단위로 구입을 해 땔감으로 썼다. 이 모임은 어느 정도 명절 전에 결산하고 돈을 조금 남겨 돼지 한 마리를 산다. 돼지는 설 명절에 쓸 고기를 마련하기 위해 명절 사나흘을 앞두고 돗추렴을 했다. 고기는 여섯 모듬으로 나누어 계원이 자발적으로 한 모듬씩 무작위 선택을 했으며, 돼지머리는 고기를 잡은 집에서 삶아 머릿고기로 썰어먹고, 내장은 수애(순대)를 만들고, 남은 내장은 배추나물과 몸(모자반)을 넣어 계꾼과 구경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줄 몸국을 만들었다(김성룡, 1935년생). 이런 돗추렴의 의미는 갑장회(계모임)의 화합은 물론 자신과 가족의 몸보신을 위하고 조상을 위해 명절의 제사용 고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한 분육(分肉) 행위였다. 돼지를 잡았을 때 가끔 그 돼지 고깃살에 쌀방울이 박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든 궤기'라고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선모충이라고 부른다. 선모충은 1859년 날돼지고기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그 숙주가 멧돼지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김유정 미술평론가(전문가)>
척박한 땅 지력을 높이는 돗걸름
돗추렴에 분육 통한 화합과 공존
#돗통시의 기능
제주도 서촌(옛 대정현)과 동촌(옛 정의현)이 다른 문화적 정서가 남아 있어, 여전히 동·서촌에 대한 각각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보이고 있다. 돗통·돗통시만 봐도 동촌·서촌의 모양이 다르다. 돗집(돼지가 사는 집), 즉 도새기가 잠을 자는 집은 동·서 지역이 모두 같지만 사람이 일을 보는 측간(厠間)은 서촌에는 집 없이 노출되었지만 동촌에는 측간에 초가로 집을 만들어 사방을 가리고 비를 피할 수 있게 했었다.
그렇다면 돗통·돗통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할까. 첫째 돼지를 키우는 장소로서의 기능이다. 돼지는 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육류이다. 특히 기름기가 많아 팍팍한 음식에 기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일례로 빙떡은 메밀로 만들기 때문에 물기가 없고 굳히는 장력이 약하기 때문에 돼지기름을 쓰게 되면 촉촉해져 부드럽고 까칠한 메밀의 맛도 좋다. 또 돼지는 잔치 때는 고깃반으로, 제사 때는 돼지고기 적(炙)은 물론, 몸국, 고기국수, 순대, 돗궤기 엿 등 생활의 식재료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도새기가 기다리는 돗통시.
돗걸름은 쉐걸름에 비해서 곡식을 잘 자라게 하고 밭이 식는 것(산성이 되는 것)을 방지하므로 농가에서는 대개 돗걸름을 선호했다. 1970년대 감귤밭이 늘어나자 돗걸름을 사려고 농가마다 다니면서 거름을 확보하고는 트럭으로 나르기도 했었다.
또 돗통·돗통시 옆에는 '오좀독(오줌항아리)'이나 오좀허벅(오줌허벅)을 넣어두는데 이것들은 대개 보기가 흉하게 윗부분이 깨졌거나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옹기를 두어 오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오줌독은 높은 항아리는 안 되고 남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언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오줌허벅의 크기가 적당했다. 남자들은 오며 가며 오줌이 마렵게 되면 급히 집으로 와 오줌독에 오줌을 누어야 하며 이 오줌들은 한 두 달이 지나면 발효가 돼 지독히 독한 냄새가 나는데 색깔은 누런색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푸른 초록빛이 감돈다. 집안의 여성은 이 오줌허벅을 지고 가서 조롱박을 이용하여 배추나 채소에 오줌을 일일이 뿌리게 되면 그 채소들이 잘 자라게 된다.
셋째, 사람의 똥을 처리하는 곳이다. 오늘날도 사람의 똥을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항상 도시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지만, 돼지를 이용한 똥의 처리는 듣거나 말하기는 거북하지만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자연순환체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자연순환체계는 섬에 사는 사람들의 궁여지책이었던 것이고 제주도 환경이 낳은, 혹은 농업중심의 사회에서 나오는 생활방식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똥은 돼지가 먹고 돼지는 사람이 먹고
사람은 살기 위해 먹어야만 한다. 그러나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거름이 필요하고, 노동을 위해서는 고기를 먹어야 하며, 또 먹으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일정량을 다시 싸야만 한다.

김산, 돗통시, 52.5×52.5,cm, 캔버스에 아크릴릭, 2019.
돼지가 먹성이 좋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돼지를 키우는 것도 버거운 일이었다. 그래서 고구마 전분 공장이 들어서자 돼지 먹이로 고구마 전분을 갈아 남은 찌꺼기를 마차로 실어다 돼지를 먹였다. 일명 '감제쭈시'가 그것이다. 이렇게라도 어렵게 돼지를 키우고 나면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 많았다.
#고기 나눔(分肉), 화합과 공존을 위한 행동
또 과거에는 돼지를 분육(分肉)하던 돗추렴 문화가 있었다. 돗추렴이란 가까운 몇몇의 사람이 모여 설을 앞두거나 보신의 목적이 있을 때 돼지를 공동으로 사거나, 혹은 공동의 기금으로 돼지를 잡아 공동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 돗추렴은 갑장회나 제(契:접,契) 단위로, 혹은 접 내에서도 의기가 투합한 사람 대여섯 명 미만으로 구성해서 추진된다. 이는 사람이 많게 되면 돼지고기의 공동분배가 그만큼 적어지므로 인원의 제한이 필요했다. 돗추렴은 여럿이 돈을 모아 큰 돼지를 잡아 나누는 것"으로서 돼지를 잡는 일에서부터 순대를 만드는 일 모두를 돗추렴 멤버들이 스스로 책임진다.

돼지갈비집 앞의 현무암 석상.
<김유정 미술평론가(전문가)>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법 설치".. 철거 명령 '파장'
- 2

[종합] 민주당 도지사 선거 경선 구도 이번 주 '윤곽'
- 3

'14명 사상' 우도 승합차 사고 운전자 5초 전 액셀 밟았다
- 4

제주출신 강금실 전 장관, 글로벌기후환경대사 임명
- 5

이재명 대통령, 부승찬 의원 온두라스 특사 파견
- 6

'횡령·공정성 시비' 민간위탁사업 밑바닥까지 훑는다
- 7

K-패스 탐나는전 체크카드 출시... 버스비 최대 50% 환급
- 8

제주도정 향해 포문 연 문대림 "서광로 중앙차로 졸속행정"
- 9

문대림 의원, 민주당 제주시갑 지역위원장직 사퇴
- 10

민주당 위성곤 서귀포시위원장 사퇴.. 지방선거 출마 본격화
- 00:00

[김유정의 제주문화사전] (39·끝)현행복의 귤록
- 00:00

[김유정의 제주문화사전] (38)선비장인 현병찬
- 00:00

[김유정의 제주문화사전] (37)노스탤지어
- 00:00

[김유정의 제주문화사전] (36)도새기의 생태학
- 00:00

[김유정의 제주문화사전] (35) 앞바르 생태관
- 00:00

[김유정의 제주문화사전] (34)화가 김강훈
- 00:00

[김유정의 제주문화사전] (33)돌문화의 본질
- 00:00

[김유정의 제주문화사전] (32)제주공예박물관개…
- 00:00

[김유정의 제주문화사전] (31)공필화가 이미선
- 00:00

[김유정의 제주문화사전] (30)동자석의 다문화 상…















 2026.02.03(화) 15:09
2026.02.03(화) 1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