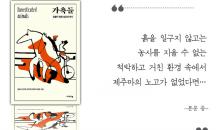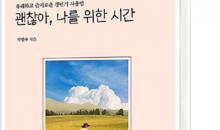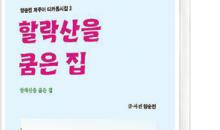[김연의 하루를 시작하며] 흔들리는 길 위에서
- 입력 : 2021. 12.22(수)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불행한 과거를 지닌 사람은 그 과거를 현재로 살고 있을 때 더 불행했다. 광주항쟁 때 자식을 잃은 사람들은 남의 자식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 속에 그 자식의 자리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다친 다리를 끌고 세상을 헤쳐오던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고달플 때마다 아픈 다리를 만지며 회한을 되씹었다. (송기숙 장편소설 ‘오월의 미소’ 中)
지난 12월 5일 송기숙 작가가 삶의 긴 복무기간을 마감했다. 우리에게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녹두장군’으로 알려진 작가는 1935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해방과 한국전쟁, 유신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등을 온 몸으로 겪은 시대의 산증인이자 지식인이었다. 사회적 모순에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더 나은 현재의 길을 탐색하는 실천으로써 펜을 놓지 않았던 작가였기에 그의 작품은 곧 삶의 공간이었고 허구이면서 현실이었다. 2000년에 발표한 ‘오월의 미소’ 역시 17년이 지났음에도 진정한 책임규명이 부재한 현실에 결코 미소 지을 수 없는 광주를 상기시키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10월, 11월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이은 작가의 별세는 우연치고는 쓸쓸하고 허망하게 다가왔다.
전 세계가 끝나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이어가며 평범한 일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에도 역사는 또, 이렇게도 흘러간다. 걸어 온 발자취가 아픈 역사를 딛고 있기에 죽음 뒤에도 수많은 논란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그 논란들은 다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과제로 던져졌다. 송기숙 작가는 ‘오월의 미소’ 후기에 공교롭게도 광주항쟁 가해자들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일어난 버스 운전기사 박기서씨의 사건을 언급하며 일심 재판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사면의 소리에 우리 사는 현실은 나보다 앞서 소설을 만들고 있다며 이 소설은 그런 현실의 뒷전에서 거세게 고개를 젓는 사람들 이야기라며 그 창작 동기를 밝혔다. 온전히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찾는데서 시작하고 잘못은 용서 받으려는 자세에서 비롯돼야 화해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은 일면 당연한 상식일 텐데 그러한 상식조차 걸치고 있는 옷가지가 겹겹이라 긴긴 설득의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각각이 다른 상식의 범주, 그 틈에는 끝나지 않는 긴 울음과 눈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살아남은 자는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는 각자의 길을 찾으며 오늘을 살아간다. 그러나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의 일상을 빼앗은 바이러스처럼 삶의 저변에는 무수한 변수가 숨어 있고 언제 고개를 들어 길의 방향을 틀지 모른다. 이토록 불명확하고 불안정하기에 여전히 길을 찾아야하는 것이고 그 과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마련이다. 다시 꽁꽁 얼어붙은 한 해의 끝자락, 일 년 동안 우리는 또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을까. 지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흔들리는 길 위에서 우리는 또, 주어진 무게를 견디며 모두가 살기 좋은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연 시인>
지난 12월 5일 송기숙 작가가 삶의 긴 복무기간을 마감했다. 우리에게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녹두장군’으로 알려진 작가는 1935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해방과 한국전쟁, 유신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등을 온 몸으로 겪은 시대의 산증인이자 지식인이었다. 사회적 모순에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더 나은 현재의 길을 탐색하는 실천으로써 펜을 놓지 않았던 작가였기에 그의 작품은 곧 삶의 공간이었고 허구이면서 현실이었다. 2000년에 발표한 ‘오월의 미소’ 역시 17년이 지났음에도 진정한 책임규명이 부재한 현실에 결코 미소 지을 수 없는 광주를 상기시키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10월, 11월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이은 작가의 별세는 우연치고는 쓸쓸하고 허망하게 다가왔다.
전 세계가 끝나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이어가며 평범한 일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이에도 역사는 또, 이렇게도 흘러간다. 걸어 온 발자취가 아픈 역사를 딛고 있기에 죽음 뒤에도 수많은 논란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그 논란들은 다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과제로 던져졌다. 송기숙 작가는 ‘오월의 미소’ 후기에 공교롭게도 광주항쟁 가해자들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일어난 버스 운전기사 박기서씨의 사건을 언급하며 일심 재판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사면의 소리에 우리 사는 현실은 나보다 앞서 소설을 만들고 있다며 이 소설은 그런 현실의 뒷전에서 거세게 고개를 젓는 사람들 이야기라며 그 창작 동기를 밝혔다. 온전히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찾는데서 시작하고 잘못은 용서 받으려는 자세에서 비롯돼야 화해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은 일면 당연한 상식일 텐데 그러한 상식조차 걸치고 있는 옷가지가 겹겹이라 긴긴 설득의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각각이 다른 상식의 범주, 그 틈에는 끝나지 않는 긴 울음과 눈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살아남은 자는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는 각자의 길을 찾으며 오늘을 살아간다. 그러나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의 일상을 빼앗은 바이러스처럼 삶의 저변에는 무수한 변수가 숨어 있고 언제 고개를 들어 길의 방향을 틀지 모른다. 이토록 불명확하고 불안정하기에 여전히 길을 찾아야하는 것이고 그 과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마련이다. 다시 꽁꽁 얼어붙은 한 해의 끝자락, 일 년 동안 우리는 또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을까. 지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흔들리는 길 위에서 우리는 또, 주어진 무게를 견디며 모두가 살기 좋은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연 시인>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고의숙 "제주교육 올바른 이정표 세울 것" 교육감선거 출사…
- 2

제주 '준공후 미분양 주택' 또 역대 최고치 갈아치웠다
- 3

[현장] 끊기고 뒤엉킨 통신선.. 미관 해치고 안전 '위협'
- 4

[종합] 도련동 가건물서 불… 2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 5

1t 트럭 수로에 빠져 60대 운전자 사망
- 6

25년 뒤 제주 청년 인구 40% 증발 10만명선도 붕괴
- 7

화장실·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지 '농지'에 포함
- 8

제주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 지정 심의 도입 "어렵네"
- 9

“한 돈 100만원 넘어”… 금값 폭등에 금은방 ‘한산’
- 10

[인사] 제주경찰청 경정 이하 심사 승진 예정자 발표
- 01:00

[성상훈의 현장시선] 다시 힘차게 비상하는 제주…
- 20:23

[열린마당] 오늘의 전기점검, 내일의 화재예방
- 01:00

[유동형의 한라시론] 노동의 종말
- 01:00

[최화열의 목요담론] 육지의 속도와 제주의 온도…
- 05:00

[열린마당] 설명절 차례상에 레드향을 진상하자!
- 04:00

[열린마당] 설 명절 화재예방, ‘관심’에서 시…
- 01:00

[강철흔의 건강&생활] 양치질에 대하여
- 03:30

[열린마당] 제주 경제 사는 길, 도정과 상권의 어…
- 02:30

[열린마당] 음주운전·교통사고예방 우리 스스로…
- 02:00

[고나해의 하루를 시작하며] 2026 제주 농업, 위기…















 2026.02.01(일) 18:17
2026.02.01(일)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