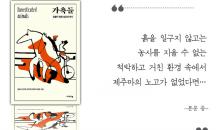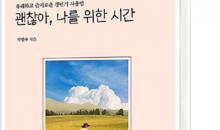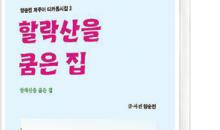- 입력 : 2025. 01.21(화) 04: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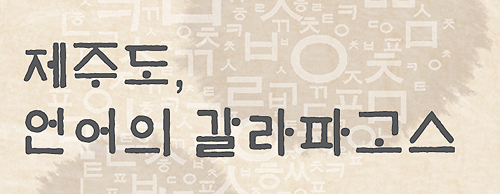
버선 신고 발바닥 긁는 격
[한라일보]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705번지 일대다. 표고 148m, 자체 높이 118m다. 세종실록을 비롯한 16세기 여러 고전에 차귀악(遮歸岳) 또는 당산(堂山), 17세기 말 탐라도에 당산망(堂山望), 저생문(這生門) 등 이후 다양한 표기가 등장했다.
일제강점기 지도에 고산악(高山岳)으로 표기하였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 당산봉으로 나온다. 이 지명들을 모으면 8개 정도로 압축된다. 그중 당산(堂山), 당산망(堂山望), 당산봉(堂山烽), 당산악(堂山岳), 당산봉(唐山烽) 등 당산으로 묶을 수 있는 이름이 5개였다. 고전에 인용한 횟수를 본다면 이 이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당산을 표기하면서 당산(堂山)과 당산(唐山) 두 가지가 나타나는 점이 눈에 띈다.
당산 외의 지명으로 차귀악(遮歸岳)이라는 지명이 있다. "'자귓벵듸(遮歸坪代뒤)'와 '자귀내·자구내(遮歸浦)' 가까이에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일찍부터 차귀악으로 표기하였다. 이 오름에 신당을 설치하면서 그 당을 차귀당(遮歸堂)이라 하였는데, 그 신당이 유명해지면서 그 오름 이름이 '당산오름' 또는 '당오름'으로 부르고 당악(堂岳) 또는 당산(堂山)으로도 표기하였다." 어느 책에 나오는 이 지명의 유래다. 버선 신고 발바닥 긁는 격이다.
사귀에서 차귀가 나왔다는
500년간의 설

높은 해안 너머로 보이는 차귀오름(빨간선), 이곳은 완만하게 바다로 이어지는 해안과 달리 높은 언덕으로 되어 있다. 김찬수
이러한 설은 신빙성이 있을까? 우선 사귀(蛇鬼)든 차귀(遮歸)든 이 말은 한자어다. 제주도에 한자가 들어온 것은 서기 7세기 경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전에 이 오름은 뭐라 했을까? 이게 본질이다. 이 인근 지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곳에는 자구내가 있다. 이 내는 1709년 탐라지도에 차귀천(遮歸川)으로 표기될 만큼 주요 지형으로 인식해 왔다. 차귀악 혹은 당산이라는 이 오름의 남쪽을 마치 해자처럼 휘감고 돈다. 사실 차귀당이라는 이름은 애초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차귀는 '자구리'에서 기원,
'높은 해안'

등성이가 평평하여 당오름이라고 한다. 차귀오름과 당오름은 같은 오름이다. 김찬수
이곳에서 수월봉까지를 '자구리'라고 한다. 서귀포에도 '자구리'가 있다. 차귀는 자구내 혹은 자구리의 한자 차용 표기다. 이 '자구리'란 무슨 말일까? 중앙아시아 여러 언어, 특히 원시 돌궐어에 '작-', '자구-'를 어근으로 '높은 해안'을 지시한다. 투르크어. 투르크메니스탄어, 칼라즈어, 타타르어, 바슈크어 등 여러 언어에서 '자구리', '주가리' 등으로 발음한다. 자구리 일대는 다른 곳에 비해서 해안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육지에서 바다로 완만하게 이어지는 일반적인 해안과 다르다.
원시 퉁구스어에 '녹게', '녹구'가 있다. 지난 회에서 수월봉을 '녹고메'라고도 하는 것은 북방어로 습지에 샘이 있는 오름이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 자구리와 관련한 어원으로 볼 때 '높은 해안에 샘이 있는 오름'이기도 하다. 이 점을 명기하니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
당목잇당은 당마루당,
저생문은 절생물
당산(堂山)이란 무슨 말인가? 어떤 이는 차귀당(遮歸堂)이 들어서면서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사실 이 오름의 동쪽에는 차귀당이 있었고 지금도 당이 있다. 그러나 당이 있어서 당산이 아니다. 당오름(堂-). 당산(堂山), 당악(堂岳)의 '당(堂)'이란 '집 당'이지만 '마루 당'이기도 하다. 당상관(堂上官), 당하관(堂下官)이란 말이 있다. 당상관이란 당(堂) 위에 올라앉을 수 있는 관직이라는 뜻에서 유래한다. 이 오름은 등성이가 평평하여 '마루'가 붙은 것이다. 차귀당을 '당목잇당'이라고도 한다. '당마루의 당'이라는 뜻일 것이다. '당마루'란 '마루마루'로 이중첩어 지명이다. 당산봉(唐山烽)의 당(唐)은 좀 다르다. 이 말은 고대어 '닥-'에서 파생한 말로 '산'을 지시한다. '닥오름'은 '당오름'으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당(唐)'이란 음가자로 그저 '당'이라는 소리만을 취했다. 고산악(高山岳)도 여기서 파생한 지명이다. 또한, 제주지명에 흔한 '마루'를 '뫼'로 보고 '산(山)으로 쓴 예도 많다.

당산봉은 차귀오름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차귀오름이란 높은 해안을 의미하는 '자구리'에서 기원한 지명이다. 차귀당과 무관하다. 높은 해안에 있는 오름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1

제주 '준공후 미분양 주택' 또 역대 최고치 갈아치웠다
- 2

[현장] 끊기고 뒤엉킨 통신선.. 미관 해치고 안전 '위협'
- 3

[종합] 도련동 가건물서 불… 2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 4

1t 트럭 수로에 빠져 60대 운전자 사망
- 5

25년 뒤 제주 청년 인구 40% 증발 10만명선도 붕괴
- 6

화장실·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지 '농지'에 포함
- 7

“한 돈 100만원 넘어”… 금값 폭등에 금은방 ‘한산’
- 8

제주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 지정 심의 도입 "어렵네"
- 9

[인사] 제주경찰청 경정 이하 심사 승진 예정자 발표
- 10

제주출신 공직자 모임 제공회 2026년 신년인사회 개최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61] 3부 오름-(120)더…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60] 3부 오름-(119)넉…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9] 3부 오름-(118)여…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8] 3부 오름-(117)들…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7] 3부 오름-(116)부…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6] 3부 오름-(115) 돌…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5] 3부 오름-(114)성…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4] 3부 오름-(113) 이…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3] 3부 오름-(112) 새…
- 02: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52] 3부 오름-(111)비…















 2026.02.01(일) 21:31
2026.02.01(일)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