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의 제주문화사전] (22)생태미술가 강술생
그가 일깨운다 "지구가 바로 내 옆에서 신음하고 있네"
- 입력 : 2020. 08.10(월)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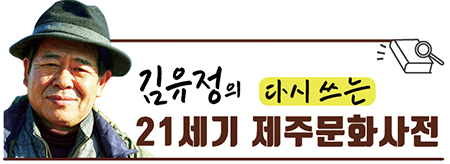
수눔, 일굼에서 가꿈까지 미학
‘씻음' '비움'으로 지은 마음 집
인간 욕심에 자연 역습 늘어나
#'내'가 자연임을 일깨워주는 사람
산다는 것은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존재라는 말인, '현재 내가 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과제이기도 하다. 제주에서 세대에 전승되는 말 가운데 "살암시민 살아진다"라는 말이 있다. 그 말 속에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작은 의지의 힘이 담겨 있다고나 할까. 그러나 이 말을 제주인의 강인함으로 미화시켜서도 안 되고, 패배한 섬의 하염없는 체념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존재가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적인 자기의지"라고 할 수 있고 제주인들이 그 말을 적절하게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자기의 역사를 만들고 지키려는 동안 진화를 겪었다. 거기에는 생존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돼 여러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며 자신들의 세상을 이룬 것이다.
 한반도 남쪽 섬에서 세상을 보는 방법을 고민하는 예술가가 있다. 강술생, 생태미술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바로 바랑진 어머니의 기운을 받았다.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를 모방한다. 의식하지 않아도. 누구의 딸이자 다시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그 습성을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는다.
한반도 남쪽 섬에서 세상을 보는 방법을 고민하는 예술가가 있다. 강술생, 생태미술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바로 바랑진 어머니의 기운을 받았다.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를 모방한다. 의식하지 않아도. 누구의 딸이자 다시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그 습성을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는다.
강술생은 1995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2020년 7월 '마음의 집'까지 17회를 열었다. 160회 가까이 단체전에 참가하면서 생태미술가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 성신여대에서 박사과정까지 서양화를 전공한 그는 회화에서 설치 프로젝트, 배양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초기의 회화적 화면을 확장시키며, 입체, 공간 설치, 현장 작업 등 미술에서 시간의 전개와 공간의 변화에 주목하기도 했다. 현상은 본질의 외피이자 결론으로 본질은 보이지 않는 원리이지만 현상은 보이는 운동이다. 시간은 자연에서 삶과 죽음을 연주하는 리듬이다. 자연의 생태적 삶에서 인간으로 관심을 가진 이후 마음에 주목한다.
제주, 지리적으로 말하면 보잘 것 없는 손바닥만한 고립무원의 장소일 뿐이지만 그에게서 이 작은 섬은 새로운 지평을 찾을 수 있는 생명의 터이다. 사람들이 화려한 세상에 도취돼 있거나, 아직 자기 최면에서 깨어나지 못할 때 은은한 빛처럼 커지는 생명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작은 것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대한 생명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싹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작은 것이 보잘 것 없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의 원리와 같은 것이다. 크고 작음은 상대적이다. 어디까지 작다고 할 것이며, 어느 만큼까지 크다고 할 것인가. 크고 작음은 보는 대상의 상대적 판단에 달렸다.
생태미술가는 자연을 보는 눈이 크다. 아마도 줌 렌즈 배율로 말할 수 있겠다. 미세한 곰팡이균에서 대지의 큰 나무까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눈에 꽉 차는 것까지 통틀어서 말이다. 전통적 방식의 장르 개념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시간의 흐름을 생태미술은 현장에서 보여준다. 자연에는 생과 사, 탄생과 사라짐이 있다. 미가 아니라 생성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 경이로운 생성, 슬픈 소멸, 인간의 감정 중에 놀라움과 기쁨을 일깨우는 일, 무관심한 일상에서 그야말로 배제된 생명의 움직임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예술, 바로 생태미술가의 역할이다.
나로부터 자연이 시작되고 또 끝나고 있음을 우리는 늘 놓치고 산다. 자연을 저 멀리 있는 풍경과도 같은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우리의 일상은 이미 죽어가는 자연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졌다. 지구가 바로 내 옆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지구 하면 멀리 해외의 한 지점, 나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심리적 거리로 가로막힌 행성일 뿐이다. 내 눈이 우주를 보고 있고, 내가 우주의 시작점이자 끝점인 것을, 강술생이 일깨워주는 일을 한다.
 #현장작업, 자연공동체 무당벌레 꽃
#현장작업, 자연공동체 무당벌레 꽃
2005년 세간에 관심을 끈 현장 생태작업이 있었고 거기서 그녀의 세계관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생태미술프로젝트 '무당벌레 꽃이 되다'라는 이름으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과 도남동 밭에서 동시에 보여준 것이다. 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꽃과 식물로 키운 무당벌레 모습이 계절이 가면서 탄생했고, 또 거기는 무당벌레 무리들이 사는 집이 됐다. 생물은 자연을 따른다. 자연에서 다시 자연이 산다. 혼돈에서 조화가 탄생하고, 정갈함에서 다시 흩어진다. 밭은 무에서 유가 되고 다시 유에서 무로 돌아간다. '무당벌레 꽃이 되다'는 생태미술프로젝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여러 사람들의 손들과 적지 않은 시간과, 그리고 밭이라는 경작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꽃씨와 사람이 모여 일굼에서 가꿈까지, 또 살핌에서 기록까지 손을 모은 '수눔'공동체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연은 우리 모두의 것이자 우리 자신 또한 자연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인데 우리가 그것을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분리하고자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닌가. 작품 '무당벌레 꽃이 되다'가 주는 큰 의미는 다름 아니라 자연은 우주의 원리이며, 생성 속에 사멸이 있다는 것, 곧 생과 사는 대별 되는 것이 아니라 생이 시작된 이후에 사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생성은 더없이 경이로운 것이 된다.
 #마음의 무게에 자연이 달려 있다
#마음의 무게에 자연이 달려 있다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무색무취다. 그럼에도 마음은 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강술생은 마음의 실체에 관심을 가졌다. 마음 탐색은 2016년 '洗세心심:마음을 씻다', 2018년 '텅 빈 마음' 2020년 '마음의 집'을 갤러리 비오톱에서 열었다. "마음을 씻는다"는 전제에는 마음이 더럽혀져서 씻어야 할 그 무엇이 있다는 의미다. 청결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 강술생의 작품은 마음을 흰색으로 말한다. 더 정확히는 바탕색이다. 그리고 바탕색에서 보여주는 감정의 동요는 틈과 색채로 말하고 있다. 틈은 분노와 슬픔, 기쁨 등의 크기일 것이다. 색채는 불안한 욕망으로 씻어야 할 감정일 것이다.
실체에는 바탕이 있다. 바탕을 인간의 본성으로 여긴다면, 사실 바탕에는 본래의 색이 있을 것이고, 바탕을 얼룩 지우는 바탕에 끼어든 요소가 있으며, 그 요소란 삶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삶의 스크래치를 치유해야 한다. 삶은 병이 드는 과정이자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삶은 얼룩과 흠에다 덧씌우고 지우고 메꾸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이미 삶이라는 말, 살아가는 일에는 감정, 욕망이 숨을 쉬면서 때로는 상처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싸매기도 하는 것이다. 마음을 씻는다는 것은 더 물들게 하지 않게 하려는 행위이기도 하다.
강술생은 '텅 빈 마음'에 '마음의 집'을 지었다.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는 것'은 외부적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또 몸은 감각으로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은 바로 인륜이며, 만물의 이치이니, 옷 입고 밥 먹는 일을 빼면, 인륜이고 이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의 온갖 일들은 다 옷이나 밥 같은 종류인 까닭에 옷과 밥을 거론하면, 세상에 모든 일이 자연스레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뼈저리게 어려운 시절을 겪은 이탁오의 물질성에 대한 지혜다. 인륜이니, 예의니 하는 격식도 밥을 떠나서 설명할 길이 없다. 밥과 옷이 풍족하면 자연 세상은 도덕과 예의가 바르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세상 사람들의 탐욕의 얼룩진 마음을 '씻음'으로써 마음의 '비움'을 이루어내고, 자발적 가난이라는 실천을 통해서 '마음의 집'을 짓게 되면, 그 마음에선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강술생의 예술론이다. 거대한 것들이 보여주는 쓰나미는 2020년 코로나 19의 소용돌이가 되었고, 결국 그것의 바탕에는 생태와 환경을 파괴한 자연의 역습일 수가 있다. 강술생이 인간 마음의 헛된 욕망이 2020년 분노한 자연으로 돌아온 역설을 말하는 것 같다. 무당벌레의 메시지가 새롭게 전해온다. <김유정 미술평론가(전문가)>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씻음' '비움'으로 지은 마음 집
인간 욕심에 자연 역습 늘어나
#'내'가 자연임을 일깨워주는 사람
산다는 것은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존재라는 말인, '현재 내가 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과제이기도 하다. 제주에서 세대에 전승되는 말 가운데 "살암시민 살아진다"라는 말이 있다. 그 말 속에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작은 의지의 힘이 담겨 있다고나 할까. 그러나 이 말을 제주인의 강인함으로 미화시켜서도 안 되고, 패배한 섬의 하염없는 체념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존재가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적인 자기의지"라고 할 수 있고 제주인들이 그 말을 적절하게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자기의 역사를 만들고 지키려는 동안 진화를 겪었다. 거기에는 생존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돼 여러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며 자신들의 세상을 이룬 것이다.

'마음의 집' 설치 작업 앞에 선 강술생 작가.
강술생은 1995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2020년 7월 '마음의 집'까지 17회를 열었다. 160회 가까이 단체전에 참가하면서 생태미술가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 성신여대에서 박사과정까지 서양화를 전공한 그는 회화에서 설치 프로젝트, 배양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초기의 회화적 화면을 확장시키며, 입체, 공간 설치, 현장 작업 등 미술에서 시간의 전개와 공간의 변화에 주목하기도 했다. 현상은 본질의 외피이자 결론으로 본질은 보이지 않는 원리이지만 현상은 보이는 운동이다. 시간은 자연에서 삶과 죽음을 연주하는 리듬이다. 자연의 생태적 삶에서 인간으로 관심을 가진 이후 마음에 주목한다.
제주, 지리적으로 말하면 보잘 것 없는 손바닥만한 고립무원의 장소일 뿐이지만 그에게서 이 작은 섬은 새로운 지평을 찾을 수 있는 생명의 터이다. 사람들이 화려한 세상에 도취돼 있거나, 아직 자기 최면에서 깨어나지 못할 때 은은한 빛처럼 커지는 생명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작은 것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대한 생명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싹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작은 것이 보잘 것 없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의 원리와 같은 것이다. 크고 작음은 상대적이다. 어디까지 작다고 할 것이며, 어느 만큼까지 크다고 할 것인가. 크고 작음은 보는 대상의 상대적 판단에 달렸다.
생태미술가는 자연을 보는 눈이 크다. 아마도 줌 렌즈 배율로 말할 수 있겠다. 미세한 곰팡이균에서 대지의 큰 나무까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눈에 꽉 차는 것까지 통틀어서 말이다. 전통적 방식의 장르 개념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시간의 흐름을 생태미술은 현장에서 보여준다. 자연에는 생과 사, 탄생과 사라짐이 있다. 미가 아니라 생성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 경이로운 생성, 슬픈 소멸, 인간의 감정 중에 놀라움과 기쁨을 일깨우는 일, 무관심한 일상에서 그야말로 배제된 생명의 움직임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예술, 바로 생태미술가의 역할이다.
나로부터 자연이 시작되고 또 끝나고 있음을 우리는 늘 놓치고 산다. 자연을 저 멀리 있는 풍경과도 같은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우리의 일상은 이미 죽어가는 자연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졌다. 지구가 바로 내 옆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지구 하면 멀리 해외의 한 지점, 나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심리적 거리로 가로막힌 행성일 뿐이다. 내 눈이 우주를 보고 있고, 내가 우주의 시작점이자 끝점인 것을, 강술생이 일깨워주는 일을 한다.

강술생의 생태미술프로젝트 '무당벌레 꽃이 되다', 제주시 도남동 밭 500평, 2005.
2005년 세간에 관심을 끈 현장 생태작업이 있었고 거기서 그녀의 세계관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생태미술프로젝트 '무당벌레 꽃이 되다'라는 이름으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과 도남동 밭에서 동시에 보여준 것이다. 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꽃과 식물로 키운 무당벌레 모습이 계절이 가면서 탄생했고, 또 거기는 무당벌레 무리들이 사는 집이 됐다. 생물은 자연을 따른다. 자연에서 다시 자연이 산다. 혼돈에서 조화가 탄생하고, 정갈함에서 다시 흩어진다. 밭은 무에서 유가 되고 다시 유에서 무로 돌아간다. '무당벌레 꽃이 되다'는 생태미술프로젝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여러 사람들의 손들과 적지 않은 시간과, 그리고 밭이라는 경작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꽃씨와 사람이 모여 일굼에서 가꿈까지, 또 살핌에서 기록까지 손을 모은 '수눔'공동체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연은 우리 모두의 것이자 우리 자신 또한 자연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인데 우리가 그것을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분리하고자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닌가. 작품 '무당벌레 꽃이 되다'가 주는 큰 의미는 다름 아니라 자연은 우주의 원리이며, 생성 속에 사멸이 있다는 것, 곧 생과 사는 대별 되는 것이 아니라 생이 시작된 이후에 사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생성은 더없이 경이로운 것이 된다.

강술생의 '백야'(white night),184x46cm, 혼합재료, 2010.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무색무취다. 그럼에도 마음은 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강술생은 마음의 실체에 관심을 가졌다. 마음 탐색은 2016년 '洗세心심:마음을 씻다', 2018년 '텅 빈 마음' 2020년 '마음의 집'을 갤러리 비오톱에서 열었다. "마음을 씻는다"는 전제에는 마음이 더럽혀져서 씻어야 할 그 무엇이 있다는 의미다. 청결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 강술생의 작품은 마음을 흰색으로 말한다. 더 정확히는 바탕색이다. 그리고 바탕색에서 보여주는 감정의 동요는 틈과 색채로 말하고 있다. 틈은 분노와 슬픔, 기쁨 등의 크기일 것이다. 색채는 불안한 욕망으로 씻어야 할 감정일 것이다.
실체에는 바탕이 있다. 바탕을 인간의 본성으로 여긴다면, 사실 바탕에는 본래의 색이 있을 것이고, 바탕을 얼룩 지우는 바탕에 끼어든 요소가 있으며, 그 요소란 삶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삶의 스크래치를 치유해야 한다. 삶은 병이 드는 과정이자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삶은 얼룩과 흠에다 덧씌우고 지우고 메꾸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이미 삶이라는 말, 살아가는 일에는 감정, 욕망이 숨을 쉬면서 때로는 상처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싸매기도 하는 것이다. 마음을 씻는다는 것은 더 물들게 하지 않게 하려는 행위이기도 하다.
강술생은 '텅 빈 마음'에 '마음의 집'을 지었다.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는 것'은 외부적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또 몸은 감각으로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은 바로 인륜이며, 만물의 이치이니, 옷 입고 밥 먹는 일을 빼면, 인륜이고 이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의 온갖 일들은 다 옷이나 밥 같은 종류인 까닭에 옷과 밥을 거론하면, 세상에 모든 일이 자연스레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뼈저리게 어려운 시절을 겪은 이탁오의 물질성에 대한 지혜다. 인륜이니, 예의니 하는 격식도 밥을 떠나서 설명할 길이 없다. 밥과 옷이 풍족하면 자연 세상은 도덕과 예의가 바르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세상 사람들의 탐욕의 얼룩진 마음을 '씻음'으로써 마음의 '비움'을 이루어내고, 자발적 가난이라는 실천을 통해서 '마음의 집'을 짓게 되면, 그 마음에선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강술생의 예술론이다. 거대한 것들이 보여주는 쓰나미는 2020년 코로나 19의 소용돌이가 되었고, 결국 그것의 바탕에는 생태와 환경을 파괴한 자연의 역습일 수가 있다. 강술생이 인간 마음의 헛된 욕망이 2020년 분노한 자연으로 돌아온 역설을 말하는 것 같다. 무당벌레의 메시지가 새롭게 전해온다. <김유정 미술평론가(전문가)>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법 설치".. 철거 명령 '파장'
- 2

제주도민 세금 들인 하수시설인데.. 국가로 넘어갈 판
- 3

민주당 도지사 경선 가상대결 문대림 37% vs 오영훈 31%
- 4

'횡령·공정성 시비' 민간위탁사업 밑바닥까지 훑는다
- 5

3000만원 없어 '국대' 꿈 앗아가는 제주 체육행정
- 6

6·3지방선거 제주 예비후보 등록.. 송문석 전 교장 첫 스타트
- 7

민주당 위성곤 서귀포시위원장 사퇴.. 지방선거 출마 본격화
- 8

6·3지방선거 제주 언론4사 1차 여론조사 9일 발표
- 9

"제주 폐교 활용 폭 넓힌다" 3개년 로드맵 발표
- 10

제주고는 과학, 제주여상은 AI… 일반고 전환 밑그림
- 00:00

[김유정의 제주문화사전] (39·끝)현행복의 귤록
- 00:00

[김유정의 제주문화사전] (38)선비장인 현병찬
- 00:00

[김유정의 제주문화사전] (37)노스탤지어
- 00:00

[김유정의 제주문화사전] (36)도새기의 생태학
- 00:00

[김유정의 제주문화사전] (35) 앞바르 생태관
- 00:00

[김유정의 제주문화사전] (34)화가 김강훈
- 00:00

[김유정의 제주문화사전] (33)돌문화의 본질
- 00:00

[김유정의 제주문화사전] (32)제주공예박물관개…
- 00:00

[김유정의 제주문화사전] (31)공필화가 이미선
- 00:00

[김유정의 제주문화사전] (30)동자석의 다문화 상…















 2026.02.04(수) 12:55
2026.02.04(수) 1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