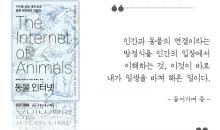[영화觀] 광란의 사랑
- 입력 : 2023. 02.17(금)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영화 '바빌론'.
[한라일보] '위플래시'와 '라라랜드'로 평단과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신작 '바빌론'은 여러모로 실패작에 가깝다. 3시간이 훌쩍 넘는 러닝타임은 난잡하고 장황하며 구구절절한 데다 엔딩에 이르면 실소가 나올 정도로 대책이 없다. 물론 완성도가 떨어진다고는 말할 수 없을 기술적 요소들이 세련되게 영화 전체를 휘감고 있지만 영화는 기어코 포장을 뚫고 나온다. 그렇다고 포장만 화려하고 내용이 부실한 영화는 또 아니다. 포장도 화려하지만 내용물이 포장지를 뚫고 나와 흘러넘치는 영화다. 과하기 이를 데 없다. 단 하룻밤의 펜트하우스 숙박 같기도 하고, 금으로 만든 카드에 손글씨를 빼곡히 써놓은 러브레터 같기도 하다. '바빌론'은 다양한 방식으로 만취한 이들을 위한 애프터 클럽 같은 영화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기어코 한 병 더를 외치는 이들을 위해 사방에서 돌아가는 미러볼, 그 휘황한 조명 아래서 느끼는 기쁨과 슬픔과 그리움. 무엇보다 영화관이라는 공간을 선택한 외톨이들에게 던지는 지독하게 유혹적인 추파. '바빌론'을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미워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영화가 적어도 스스로에게 무척이나 솔직한 주정뱅이를 닮았기 때문이다.
무성영화기에서 유성영화기로 넘어가던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영화 산업계에 몸 담은 배우, 제작자, 스태프, 지망생 등 영화인들의 낮과 밤을 다룬 '바빌론'은 스타가 되고 싶은 이들과 스타가 된 이들 그리고 스타로 태어난 이들의 흥망성쇠를 마치 불꽃놀이처럼 그려낸다. 많은 관객들이 언급하는 것처럼 이 영화에는 절제를 모르는 쾌락과 보고 싶지 않은 토사물이 끊임없이 스크린을 가득 채운다. 영화를 다룬 영화들은 이미 많았고 영화인들을 영화 안에 담은 영화 또한 많았지만 이토록 산업과 산업 안의 인물들에게 경탄과 조소를 동시에 보내는 영화는 찾기가 어렵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영화의 초반 난잡하기 그지없는 파티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 넬리(마고 로비)는 우연한 행운으로 파티에 발을 들인 후 밤새도록 파티장을 휘젓는다. 아무도 그녀를 모르고 오직 그녀만이 자신을 안다. 나는 이미 스타로 태어났고 어떤 별들보다 빛날 수 있다는 넬리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기묘한 빛을 발하는데 결국 그녀는 무대의 한복판에서 모두의 주목을 받게 되고 밤을 지새운 새벽녘 파티장에서는 마침내 꿈꾸던 기회를 손에 쥔다. 들어올 때는 불청객이었지만 파티장 문을 나설 때는 떠오르는 태양 아래 홀로 주인공이 되는 넬리. 아무도 모르던 별이 하룻밤 사이에 단 하나의 태양이 되는 일. 거짓말 같지만 진짜로 벌어지는 일. 황홀하고 두근대지만 이상하게도 슬픔과 염려가 스며드는 기분. '바빌론'은 흥과 망, 성과 쇠를 동시에 싣고 달리는 마차 같다. 하룻밤의 꿈을 지나 넬리는 두 시간을 허름한 자신의 집에서 자고 나온 뒤 처음으로 촬영장을 찾는다. 역시 문 앞에서 그녀는 환대받지 못하지만 스스로를 믿는 별에게 기적은 가끔 져주곤 한다. '바빌론'은 종종 이러한 기적 같은 순간들을 보여주는데 그 톤은 꿈은 이루어진다 같은 건강한 열망과는 다르다. 꿈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 모든 것은 유한하지만 어떤 것은 영원하기도 하다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것이 어쩌면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화를 일지도 모른다는 것. 이 비관과 낙관의 뒤엉킨 사나운 애정이 '바빌론'을 구성하는 가장 큰 무엇이 아닐까 생각했다.
데이트를 하러 영화관에 가지 않는 관객들은 오직 영화만을 사랑한다. 팬데믹 기간에 좌석 간 거리 두기를 실시했을 때 환호했다는 관객들이 있을 정도로 어떤 이들에게 영화관은 자신과 영화관만의 공간이다. 그 안에서 겪는 감정은 당연히 뜨겁고 열렬하고 온전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스크린은 일방적으로 관객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이면이 아닌 것이다. '바빌론'은 어쩌면 그런 관객들을 위한 영화다. 한 잔 더를 외치는 이 옆에 있어줄 사람, 잠들지도 않고 집에도 가지 않고 무언가를 주절대는 친구에게 맞장구를 쳐 줄 사람. '바빌론'을 보는 것은 마블의 블럭버스터나 '아바타' 시리즈를 겪는 체험적 관람과는 또 다르다. 이 미친 사랑의 노래를 계속 부르는 영화에게 화음을 맞춰주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다수의 평론가들이 '바빌론'의 엔딩 시퀀스에 등장하는 영화사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장면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과한 착오였다는 평가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스크린에 펼쳐지는 장면들보다 영화관에 앉아 그 장면들을 보며 울고 웃고 자고 옆사람과 키스하고 심드렁해하거나 열광하는 각양각색의 관객들이 스크린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어쨌거나 이 자리에 함께 있으라는 전언. 그것이 어떤 영화이든 어떤 관객이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을 거라는 과감하고 애타는 낙관이 이상하게도 좋았다. 사랑을 할 땐 누구나 어느 정도 과해진다. 보내지 말았으면 좋았을 문자를 보내고 안 하는 게 천 번은 유리했을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영화를 너무 사랑해서 영화에 미친 사람들이 만들어낸 과유불급의 영화 '바빌론'은 부러진 상다리 위에 놓인 누군가의 일품요리다. 이 이상한 파티를 미워하기엔 나 또한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다수의 평론가들이 '바빌론'의 엔딩 시퀀스에 등장하는 영화사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장면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과한 착오였다는 평가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스크린에 펼쳐지는 장면들보다 영화관에 앉아 그 장면들을 보며 울고 웃고 자고 옆사람과 키스하고 심드렁해하거나 열광하는 각양각색의 관객들이 스크린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어쨌거나 이 자리에 함께 있으라는 전언. 그것이 어떤 영화이든 어떤 관객이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을 거라는 과감하고 애타는 낙관이 이상하게도 좋았다. 사랑을 할 땐 누구나 어느 정도 과해진다. 보내지 말았으면 좋았을 문자를 보내고 안 하는 게 천 번은 유리했을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영화를 너무 사랑해서 영화에 미친 사람들이 만들어낸 과유불급의 영화 '바빌론'은 부러진 상다리 위에 놓인 누군가의 일품요리다. 이 이상한 파티를 미워하기엔 나 또한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무성영화기에서 유성영화기로 넘어가던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영화 산업계에 몸 담은 배우, 제작자, 스태프, 지망생 등 영화인들의 낮과 밤을 다룬 '바빌론'은 스타가 되고 싶은 이들과 스타가 된 이들 그리고 스타로 태어난 이들의 흥망성쇠를 마치 불꽃놀이처럼 그려낸다. 많은 관객들이 언급하는 것처럼 이 영화에는 절제를 모르는 쾌락과 보고 싶지 않은 토사물이 끊임없이 스크린을 가득 채운다. 영화를 다룬 영화들은 이미 많았고 영화인들을 영화 안에 담은 영화 또한 많았지만 이토록 산업과 산업 안의 인물들에게 경탄과 조소를 동시에 보내는 영화는 찾기가 어렵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영화의 초반 난잡하기 그지없는 파티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 넬리(마고 로비)는 우연한 행운으로 파티에 발을 들인 후 밤새도록 파티장을 휘젓는다. 아무도 그녀를 모르고 오직 그녀만이 자신을 안다. 나는 이미 스타로 태어났고 어떤 별들보다 빛날 수 있다는 넬리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기묘한 빛을 발하는데 결국 그녀는 무대의 한복판에서 모두의 주목을 받게 되고 밤을 지새운 새벽녘 파티장에서는 마침내 꿈꾸던 기회를 손에 쥔다. 들어올 때는 불청객이었지만 파티장 문을 나설 때는 떠오르는 태양 아래 홀로 주인공이 되는 넬리. 아무도 모르던 별이 하룻밤 사이에 단 하나의 태양이 되는 일. 거짓말 같지만 진짜로 벌어지는 일. 황홀하고 두근대지만 이상하게도 슬픔과 염려가 스며드는 기분. '바빌론'은 흥과 망, 성과 쇠를 동시에 싣고 달리는 마차 같다. 하룻밤의 꿈을 지나 넬리는 두 시간을 허름한 자신의 집에서 자고 나온 뒤 처음으로 촬영장을 찾는다. 역시 문 앞에서 그녀는 환대받지 못하지만 스스로를 믿는 별에게 기적은 가끔 져주곤 한다. '바빌론'은 종종 이러한 기적 같은 순간들을 보여주는데 그 톤은 꿈은 이루어진다 같은 건강한 열망과는 다르다. 꿈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 모든 것은 유한하지만 어떤 것은 영원하기도 하다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것이 어쩌면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화를 일지도 모른다는 것. 이 비관과 낙관의 뒤엉킨 사나운 애정이 '바빌론'을 구성하는 가장 큰 무엇이 아닐까 생각했다.
데이트를 하러 영화관에 가지 않는 관객들은 오직 영화만을 사랑한다. 팬데믹 기간에 좌석 간 거리 두기를 실시했을 때 환호했다는 관객들이 있을 정도로 어떤 이들에게 영화관은 자신과 영화관만의 공간이다. 그 안에서 겪는 감정은 당연히 뜨겁고 열렬하고 온전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스크린은 일방적으로 관객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이면이 아닌 것이다. '바빌론'은 어쩌면 그런 관객들을 위한 영화다. 한 잔 더를 외치는 이 옆에 있어줄 사람, 잠들지도 않고 집에도 가지 않고 무언가를 주절대는 친구에게 맞장구를 쳐 줄 사람. '바빌론'을 보는 것은 마블의 블럭버스터나 '아바타' 시리즈를 겪는 체험적 관람과는 또 다르다. 이 미친 사랑의 노래를 계속 부르는 영화에게 화음을 맞춰주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제주영어교육도시 FSAA 국제학교 건축 허가 승인
- 2

다음달 토트넘 합류하는 양민혁 제주 외가 찾는다
- 3

'비공개 오찬' 오영훈 지사 음식값 1인당 3만원 초과
- 4

읍면동 예산 최대 40% '싹둑'… "이래 놓고 '민생 예산'?"
- 5

제주행 항공기 탑승 50대 착륙 후 의식 잃고 쓰러져 사망
- 6

"인구 더 많은데 예산은?"… 행정시 예산 놓고 의원 '설전'
- 7

제주시 아라2동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들어선다
- 8

'매각 무산' 927억 제주 주상복합용지 매매가 재산정 논란
- 9

제주도청 주변 삼다공원·녹지공간 묶어 '도민의 숲' 조성
- 10

'아우성'에도 제주 차고지증명제 폐지-유지 입장차 '팽팽'















 2024.11.30(토) 11:32
2024.11.30(토)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