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학주의 詩읽는 화요일] (59)촛불-김귀례
- 입력 : 2024. 03.19(화)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나의 눈물을 위로한다고
말하지 말라
나의 삶은 눈물 흘리는 데 있다
너희의 무릎을 꿇리는 데 있다
십자고상과 만다라 곁에
청순한 모습으로 서 있다고 좋아하지 말라
눈물 흘리지 않는 삶과 무릎 꿇지 못하는 삶을
오래 사는 삶이라고 부러워하지 말라
작아지지 않는 삶을 박수치지 말라
나는 커갈수록 작아져야 하고
나는 아름다워질수록 눈물이 많아야 하고
나는 높아질수록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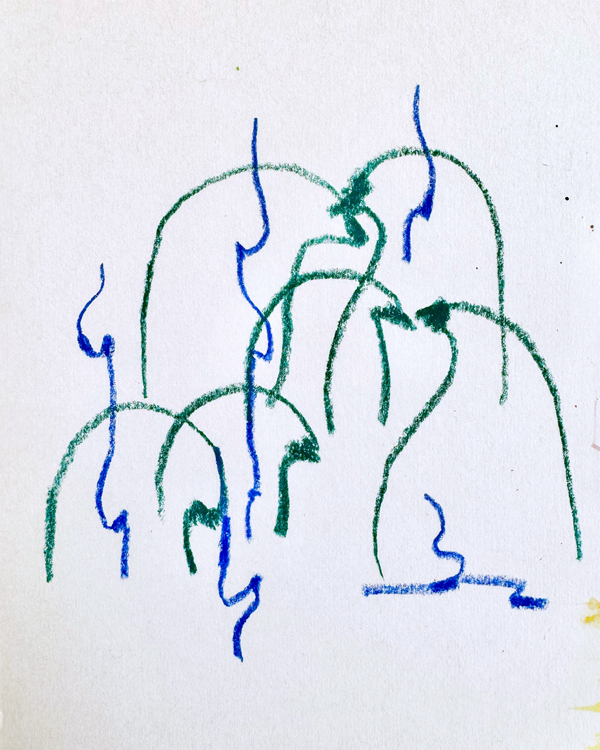
외딴길에서 작은 교회를 만나면 발길을 멈추고 들어가 보는 경우가 있다. 거북한 데가 없는 그런 공간에 마음이 끌리기 때문이다. 불빛이 없고 자연광에 깔린 사물들이 보드랍게 낮아져 있을 때 문득 긴 의자 한쪽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실루엣은 울고 있다 해도 맞고, 무릎을 꿇고 있다 해도 맞다. 내가 눈물 흘려 내 무릎을 꿇릴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기도이겠는가. 내가 눈물 흘려 너의 무릎을 꿇릴 수 있다는 건 건 꿈 같은 일에 속하지만.
하라, 마라 같은 말은 강한 인상을 띠고 있지만 시에서는 힘을 쓰기가 어렵다. 그만큼 명상과 사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말에 딸린 땅이 작을수록 따스함이나 다정함도 적어진다. 그럼에도, 확고한 전언을 던지고 싶은 시인은 촛불을 비유 삼는다. 가녀린 눈물과 작아짐과 사라짐의 그 뜨거운 존재를 높이며. 마치 촛불의 경작지는 인간의 어두운 영혼이라는 듯.
그리고 우리-나와 너-말고는 다른 촛불이 없다는 말을 드러나지 않게 숨겨둔다. 오! 어둑한 데서 타고, 남은 빛이 꺼져가며 우리를 사로잡는 힘-부끄러움에 대하여. <시인>
말하지 말라
나의 삶은 눈물 흘리는 데 있다
너희의 무릎을 꿇리는 데 있다
십자고상과 만다라 곁에
청순한 모습으로 서 있다고 좋아하지 말라
눈물 흘리지 않는 삶과 무릎 꿇지 못하는 삶을
오래 사는 삶이라고 부러워하지 말라
작아지지 않는 삶을 박수치지 말라
나는 커갈수록 작아져야 하고
나는 아름다워질수록 눈물이 많아야 하고
나는 높아질수록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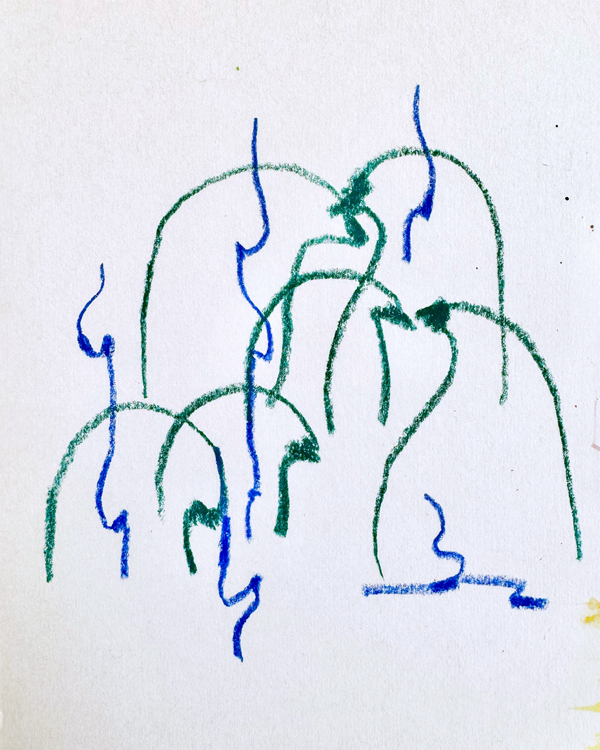
삽화=배수연
외딴길에서 작은 교회를 만나면 발길을 멈추고 들어가 보는 경우가 있다. 거북한 데가 없는 그런 공간에 마음이 끌리기 때문이다. 불빛이 없고 자연광에 깔린 사물들이 보드랍게 낮아져 있을 때 문득 긴 의자 한쪽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실루엣은 울고 있다 해도 맞고, 무릎을 꿇고 있다 해도 맞다. 내가 눈물 흘려 내 무릎을 꿇릴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기도이겠는가. 내가 눈물 흘려 너의 무릎을 꿇릴 수 있다는 건 건 꿈 같은 일에 속하지만.
하라, 마라 같은 말은 강한 인상을 띠고 있지만 시에서는 힘을 쓰기가 어렵다. 그만큼 명상과 사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말에 딸린 땅이 작을수록 따스함이나 다정함도 적어진다. 그럼에도, 확고한 전언을 던지고 싶은 시인은 촛불을 비유 삼는다. 가녀린 눈물과 작아짐과 사라짐의 그 뜨거운 존재를 높이며. 마치 촛불의 경작지는 인간의 어두운 영혼이라는 듯.
그리고 우리-나와 너-말고는 다른 촛불이 없다는 말을 드러나지 않게 숨겨둔다. 오! 어둑한 데서 타고, 남은 빛이 꺼져가며 우리를 사로잡는 힘-부끄러움에 대하여. <시인>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제주 7월 주택사업경기전망 호전.. 국제학교 신규 설립 영향
- 2

제주 용두암 해산물 바가지 논란 상인들 형사 처벌되나
- 3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상 타결… 8월 말 착공
- 4

제주 노지감귤 생산량 감소 전망에 벌써 밭떼기 거래
- 5

제주 신석기 유물 매장지 무단 훼손..유산청 감사 청구
- 6

'갑질 NO' 제주 해수욕장 파라솔 요금 2만원 통일
- 7

취임 김승욱 위원장, 오영훈 제주도정-의회 싸잡아 비판
- 8

행정 있으나 마나? '한림해상풍력' 제주도의회도 질타
- 9

[오경수의 목요담론] 올레길 위에 경영리더들이 몰려온다
- 10

윤 대통령, '4·3 망언' 태영호 전 의원 민주평통 사무처장 임…
- 19:25

'제주아트플랫폼'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 완료 "…
- 09:39

'제주 추상미술 1세대' 백광익 작가 별세
- 19:37

놀이패 한라산, 공동체 복원 꿈꾸는 신명난 몸짓
- 19:33

한림작은영화관 올해 기획전 '화목한 주말'로 관…
- 19:18

꿈과 현실의 간극 이겨낸 흔적... 제주 여성작가…
- 16:40

"수평선 문학 정신 지향" 문학웹진 '산15-1' 창간 …
- 16:02

소암기념관 소장품전 '경운조월, 구름을 일구고 …
- 19:52

제주브라스밴드 첫걸음... 이달 21일 창단연주회
- 17:14

인간의 가치·삶의 모습 바라본 다양한 시선
- 15:31

4·3영화제, '제주4·3영화제'로 명칭 바꿔 명맥 잇…















 2024.07.20(토) 22:53
2024.07.20(토)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