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섬 박물관 순례Ⅱ](5)김영갑갤러리두모악
제주를 그리워해야 할 또하나의 이유
- 입력 : 2009. 03.05(목) 00:00
- 진선희 기자 jin@hallailbo.co.kr

▲김영갑갤러리두모악 전시실. 옛 주인이 떠난 갤러리에서 감동을 받은 관람객들은 순례 코스처럼 방명록이 있는 곳에 들른다. /사진=강희만기자
오름· 바다· 무속굿 등 제주에 사는 모든 것 사진에
고요·평화 메시지 무분별 개발에 대한 성찰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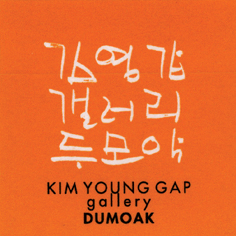 이어폰을 귀에 꽂은 청년이 무언가를 끄적이는 중이었다. 홀로 제주여행중인 듯 했다. 한참을 끙끙대며 방명록을 채워갔다. 그만이 아니다. 순례 코스처럼 이곳에 들른 이들은 관람 소감을 남긴다. 어떤 이는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당신의 영혼을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적었다. 어떤 이는 '제주를 그리워할 또하나의 이유가 생겼습니다'라고 썼다.
이어폰을 귀에 꽂은 청년이 무언가를 끄적이는 중이었다. 홀로 제주여행중인 듯 했다. 한참을 끙끙대며 방명록을 채워갔다. 그만이 아니다. 순례 코스처럼 이곳에 들른 이들은 관람 소감을 남긴다. 어떤 이는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당신의 영혼을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적었다. 어떤 이는 '제주를 그리워할 또하나의 이유가 생겼습니다'라고 썼다.
감동을 주는 박물관은 흔치 않다. 그런 점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삼달초등학교에 들어선 김영갑갤러리두모악은 행복하다. 두모악을 만든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옛 주인의 흔적을 더듬으려는 발길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관람객들은 제주와 아무런 연고가 없던 사진가가 제주섬에 풀어냈던 열정에 마음이 움직이고, 힘겨운 투병 끝에 생을 마감한 고인의 삶에 눈시울을 붉힌다.

 김영갑(1957~2005)은 1982년부터 제주를 오가며 사진작업을 벌였다. 그로부터 3년뒤인 1985년 제주섬에 아예 둥지를 튼다. 김영갑하면, 파노라마로 찍은 오름 풍경에 익숙하지만 흑백에 담은 해녀, 무속굿 사진도 여럿이다. 그래서 그가 찍지 않은 것은 제주도에 없다는 말을 한다.
김영갑(1957~2005)은 1982년부터 제주를 오가며 사진작업을 벌였다. 그로부터 3년뒤인 1985년 제주섬에 아예 둥지를 튼다. 김영갑하면, 파노라마로 찍은 오름 풍경에 익숙하지만 흑백에 담은 해녀, 무속굿 사진도 여럿이다. 그래서 그가 찍지 않은 것은 제주도에 없다는 말을 한다.
갤러리는 2002년에 문을 열었다. 개관 이전에 루게릭병 발병 사실을 전해듣고 일주일동안 음식을 끊고 자리에 누웠던 그였지만 갤러리를 조성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점점 움직임이 더디어지는 근육을 놀리지 않으려고 더 바삐 몸을 움직였고 갤러리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았다.
여러 권의 사진집과 에세이집을 냈던 고인은 온전히 자신과 마주한 시간속에서 제주에 대한 인상, 삶의 단상을 조분조분한 문장으로 기록했다. 80여점이 걸린 갤러리 내부엔 그런 글귀가 새겨졌다.
"혼자 지내는 하루는 느리고, 지루하다. 불평불만으로 가득찼던 그 시절이 지금은 그립다. 온 종일 침대에서 지내야 하는 지금은, 카메라를 메고 들녘을 쏘아다니던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깨닫는다."

 그의 책속에는 고요와 평화란 말이 곧잘 등장한다. 발길 드문 중산간에 몸을 풀었던 그는 비포장의 도로가 어느날 아스팔트로 뒤덮이고,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전봇대가 세워지고, 펜션이 지어지는 변화의 과정을 곁에서 지켜봤다. 이대로 '탐라인들이 느꼈던 고요와 적막, 평화'는 사라지는 게 아닐까. 김영갑은 그런 생각을 했다. 갤러리는 그래서 땅을 파헤치고 속살을 헤집는 명분없는 개발에 대한 성찰의 공간이 된다.
그의 책속에는 고요와 평화란 말이 곧잘 등장한다. 발길 드문 중산간에 몸을 풀었던 그는 비포장의 도로가 어느날 아스팔트로 뒤덮이고,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전봇대가 세워지고, 펜션이 지어지는 변화의 과정을 곁에서 지켜봤다. 이대로 '탐라인들이 느꼈던 고요와 적막, 평화'는 사라지는 게 아닐까. 김영갑은 그런 생각을 했다. 갤러리는 그래서 땅을 파헤치고 속살을 헤집는 명분없는 개발에 대한 성찰의 공간이 된다.
지금 김영갑갤러리두모악은 고인을 '삼춘'으로 부르며 따랐던 박훈일씨가 관장을 맡고 있다. 두모악후원회도 갤러리를 꾸려가는 든든한 힘이다. 5월 중순쯤엔 서울 중구청 충무아트홀에서 4주기를 기리는 전시가 예정되어 있다.
갤러리는 이즈음 고인이 남긴 필름을 보존 처리하고 분류하는 일을 계획중이다. 장비 구입비나 인력 문제로 그동안 손놓고 있어야 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고인의 작품 세계를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3~5월은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www.dumoak.com. 784-9907.

고요·평화 메시지 무분별 개발에 대한 성찰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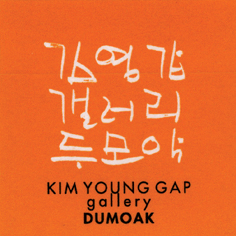
감동을 주는 박물관은 흔치 않다. 그런 점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삼달초등학교에 들어선 김영갑갤러리두모악은 행복하다. 두모악을 만든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옛 주인의 흔적을 더듬으려는 발길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관람객들은 제주와 아무런 연고가 없던 사진가가 제주섬에 풀어냈던 열정에 마음이 움직이고, 힘겨운 투병 끝에 생을 마감한 고인의 삶에 눈시울을 붉힌다.

▲사진가 김영갑이 담은 제주의 풍경 중 하나

▲두모악갤러리 전시실
갤러리는 2002년에 문을 열었다. 개관 이전에 루게릭병 발병 사실을 전해듣고 일주일동안 음식을 끊고 자리에 누웠던 그였지만 갤러리를 조성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점점 움직임이 더디어지는 근육을 놀리지 않으려고 더 바삐 몸을 움직였고 갤러리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았다.
여러 권의 사진집과 에세이집을 냈던 고인은 온전히 자신과 마주한 시간속에서 제주에 대한 인상, 삶의 단상을 조분조분한 문장으로 기록했다. 80여점이 걸린 갤러리 내부엔 그런 글귀가 새겨졌다.
"혼자 지내는 하루는 느리고, 지루하다. 불평불만으로 가득찼던 그 시절이 지금은 그립다. 온 종일 침대에서 지내야 하는 지금은, 카메라를 메고 들녘을 쏘아다니던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깨닫는다."

▲삼달초등학교에 들어선 두모악갤러리

▲관람객들이 김영갑사진집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 김영갑갤러리두모악은 고인을 '삼춘'으로 부르며 따랐던 박훈일씨가 관장을 맡고 있다. 두모악후원회도 갤러리를 꾸려가는 든든한 힘이다. 5월 중순쯤엔 서울 중구청 충무아트홀에서 4주기를 기리는 전시가 예정되어 있다.
갤러리는 이즈음 고인이 남긴 필름을 보존 처리하고 분류하는 일을 계획중이다. 장비 구입비나 인력 문제로 그동안 손놓고 있어야 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고인의 작품 세계를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3~5월은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www.dumoak.com. 784-9907.

▲갤러리입구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11월 직무수행평가 오영훈- 김광수 '희비 교차' [리얼미터]
- 2

'수확량 15%↑' 제주 만감류 '미래향' 본격 출하 준비
- 3

박진경 미화 논란 추도비 옆에 세운 '바로 세운 진실'
- 4

내년 지방선거, 2022년 복사판 될까?
- 5

개관 5주년 드림타워, 도민 2200명 초청 이벤트
- 6

[현장] ‘울퉁불퉁’ 용담 해안도로… 운전자 불편 ↑
- 7

자리젓 제조 제주 고창덕 대표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 선정
- 8

[기획] 제주형 주거복지를 말한다(2)맞춤형 입주민 주거 서비…
- 9

제주 삼성혈 인근 휠체어 이동 60대 남성 차량 치여 중상
- 10

기획처 예산실장에 제주출신 조용범 예산총괄기획관 발탁















 2025.12.17(수) 21:20
2025.12.17(수) 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