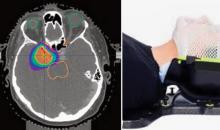[책세상] 범죄소설로 그려낸 복지국가의 맨얼굴
‘마르틴 베크'시리즈 국내 첫 번역 출간
- 입력 : 2017. 03.17(금)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기자출신 셰발·발뢰 공동 저자
60년대 스웨덴의 빈곤과 범죄
평범한 인물이 파헤친 사회상
범죄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어느 범죄심리학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사회의 구조가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었다. 한 나라에서 빈도가 높은 범죄 유형은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드러낸다.
북유럽 범죄소설인 '마르틴 베크'시리즈는 그런 점에서 주목을 끈다. 시리즈는 그전까지 이어져온 범죄소설과 거리를 두고 있다. 범인의 정체를 알아내거나 수수께끼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인물이 나와 사회의 문제점을 파헤친다. 범죄소설이 곧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기자 출신인 마이 셰발과 페르 발뢰가 공동 저자인 '마르틴 베크'시리즈는 1960년대 중반 스웨덴의 여러 사회제도와 구조를 묘파해낸다. 이 시리즈 열 권 가운데 1·2권인 '로재나'와 '연기처럼 사라진 남자'가 동시에 번역 출간됐다. 각 권엔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의 지도를 덧붙여 낯선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 시리즈는 스웨덴 국가범죄수사국에 근무하는 형사 마르틴 베크를 주인공으로 했다. 셰발이 직접 쓴 '한국어판 서문'엔 시리즈의 탄생 배경이 흥미롭게 쓰여있다. 두 사람이 스톡홀름에서 예테보리로 운하 여행을 할 때였다. 발뢰가 배에 늘 홀로 서 있던 아름다운 미국인 여성을 쳐다보는 걸 알아차리고 셰발이 말한다. "저 여자를 죽이는 걸로 책을 시작하는 건 어때?" 바로 그 아이디어가 시리즈의 첫 권 '로재나'로 이어졌다.
'로재나'엔 그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수사관들이 있다. 경찰관들은 반년이 흐르고서야 비로소 범죄를 해결한다. 그때 독자들은 알게 된다. "수사에 오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도 경찰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연기처럼 사라진 남자'는 냉전 시절의 부다페스트를 배경으로 한다. 실종된 스웨덴 기자를 추적하는 수사는 고비마다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고 하나의 사정이 밝혀질 때마다 점점 혼란스러워진다.
두 저자는 열 권에 등장하는 범죄를 통해 스웨덴 사회가 십년에 걸쳐 변해가는 모습을 기록하려 했다. 시리즈엔 '범죄 이야기'란 부제가 달렸다. 부르주아 복지국가인 스웨덴이 숨기고 있는 빈곤과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사용한 범죄란 말은 사회가 노동계급을 버렸다는 의미였다. 김명남 옮김. 엘릭시르. 1권 1만3800원, 2권 1만2800원.
60년대 스웨덴의 빈곤과 범죄
평범한 인물이 파헤친 사회상
범죄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어느 범죄심리학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사회의 구조가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었다. 한 나라에서 빈도가 높은 범죄 유형은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드러낸다.
북유럽 범죄소설인 '마르틴 베크'시리즈는 그런 점에서 주목을 끈다. 시리즈는 그전까지 이어져온 범죄소설과 거리를 두고 있다. 범인의 정체를 알아내거나 수수께끼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인물이 나와 사회의 문제점을 파헤친다. 범죄소설이 곧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기자 출신인 마이 셰발과 페르 발뢰가 공동 저자인 '마르틴 베크'시리즈는 1960년대 중반 스웨덴의 여러 사회제도와 구조를 묘파해낸다. 이 시리즈 열 권 가운데 1·2권인 '로재나'와 '연기처럼 사라진 남자'가 동시에 번역 출간됐다. 각 권엔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의 지도를 덧붙여 낯선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 시리즈는 스웨덴 국가범죄수사국에 근무하는 형사 마르틴 베크를 주인공으로 했다. 셰발이 직접 쓴 '한국어판 서문'엔 시리즈의 탄생 배경이 흥미롭게 쓰여있다. 두 사람이 스톡홀름에서 예테보리로 운하 여행을 할 때였다. 발뢰가 배에 늘 홀로 서 있던 아름다운 미국인 여성을 쳐다보는 걸 알아차리고 셰발이 말한다. "저 여자를 죽이는 걸로 책을 시작하는 건 어때?" 바로 그 아이디어가 시리즈의 첫 권 '로재나'로 이어졌다.
'로재나'엔 그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수사관들이 있다. 경찰관들은 반년이 흐르고서야 비로소 범죄를 해결한다. 그때 독자들은 알게 된다. "수사에 오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도 경찰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연기처럼 사라진 남자'는 냉전 시절의 부다페스트를 배경으로 한다. 실종된 스웨덴 기자를 추적하는 수사는 고비마다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고 하나의 사정이 밝혀질 때마다 점점 혼란스러워진다.
두 저자는 열 권에 등장하는 범죄를 통해 스웨덴 사회가 십년에 걸쳐 변해가는 모습을 기록하려 했다. 시리즈엔 '범죄 이야기'란 부제가 달렸다. 부르주아 복지국가인 스웨덴이 숨기고 있는 빈곤과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사용한 범죄란 말은 사회가 노동계급을 버렸다는 의미였다. 김명남 옮김. 엘릭시르. 1권 1만3800원, 2권 1만2800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03:00

[새로나온책] 허즈번즈 外
- 02:30

[책세상] 탄자니아로 간 시인… 허망함에서 찾은…
- 03:00

[새로나온책] 비가 시를 고치니 좋아라 外
- 02:00

[이 책] 인간의 짐을 짊어진 동물… 그 노고가 없…
- 01:00

[책세상] 재일제주인 기억을 기록한 작가… 김태…
- 18:14

[책세상] '갱년기'라는 돌부리에 걸린 그들에게…
- 18:11

[책세상] 디카시에 제주어 더하다… 양순진 '할…
- 20:26

[새로나온책] 바람에 발효된 섬의 사유 外
- 01:00

[이 책] ‘같음’을 요구하는 시대, 철학이 묻는 …
- 01:00

[책세상] 비틀린 욕망이 부른 파국… 박해동 '블…















 2026.02.05(목) 20:23
2026.02.05(목)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