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우의 한라칼럼] 꿀벌은 어디 갔을까
- 입력 : 2023. 05.30(화) 00: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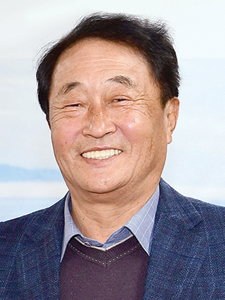
[한라일보] 폭우가 쏟아지거나 폭설이 내릴 때를 제외하면 매일 걸어서 출근한다. 출근길에 돌담 너머 집이나 밭에 심어진 식물들이 눈길을 끈다. 요즘은 장미가 화려하게 꽃을 피웠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감귤나무도 가지마다 꽃을 다닥다닥 매달아 향기를 내뿜으면서 눈과 코를 호강하게 했다. 누가 심었는지 아니면 빗물에 흘러들어 자리 잡았는지 모르지만 낮달맞이꽃과 수염패랭이꽃, 민들레와 자운영도 한창이다. 배추와 무, 유채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식물들은 계절에 맞춰 꽃을 피운다. 꽃을 보며 아름다워하고 향기를 즐긴다. 그러다가 비릿한 냄새를 풍기는 구실잣밤나무와 만나면 민망한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본능에 따라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나무건 풀이건, 크건 작건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식물들의 숙명이기에 벌이나 나비, 벌레와 같은 동물들에게 '어서 나에게로 오세요'하는 신호인 것이다. 눈에 잘 띄는 대칭 모양의 꽃과 고혹적인 향기(매개동물의 입장에서)로 유혹하지만 자기를 찾아오면 반드시 보상을 한다. 수분과 당분이 녹아있는 달콤한 꿀이다. 식물의 입장에서 꽃은 생식과 관련된 것이고 생식의 결과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다. 자신과 같은 생명체를 멸종시키지 않으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수행하는 만큼 절박함이 그대로 담겨있다. 벌들에게도 꿀과 꽃가루가 자신들의 새끼를 키우는 유일한 식량이기에 서로는 서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또한 숙명이다. 공짜가 없다. 자연계에도 아담 스미스의 시장 경제법칙과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이 섞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생식능력을 상실한 암벌들, 즉 일벌들은 새로운 꿀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그 맛은 어떤지에 대해 '춤의 언어'로 서로 이야기한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춤으로 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그런데 꽃은 화려하게 피었는데 벌들이 보이지 않는다. 벌들이 어디 갔을까. 몇 년이 지난 언젠가 꽃이 핀 감귤밭을 지날 때 벌들이 잉잉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도 많았다. 왕벚나무꽃에도 벌들이 떼로 달려든 것도 보았다. 머리와 다리에 노란 꽃가루를 뒤집어쓰고 비틀거리는 벌들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는데 그런 벌들이 보이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일까. 이는 내가 걷는 도심만의 문제가 아닐 듯싶다. 산과 들에도 마찬가지다. 그 많던 벌들이 어디로 간 것일까. 꿀벌은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최근 심상치 않은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100대 작물 가운데 71%는 꿀벌을 매개로 수분한다. 모든 것이 그렇듯 꿀벌과 공존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도 밝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오름 자락이 파헤쳐지고, 곶자왈이 사라지고, 멀쩡한 농경지에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니 큰일이다. 꿀벌이 사라지는 게 작은 일일까.<송창우 제주교통방송 사장>
대부분의 식물들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본능에 따라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나무건 풀이건, 크건 작건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식물들의 숙명이기에 벌이나 나비, 벌레와 같은 동물들에게 '어서 나에게로 오세요'하는 신호인 것이다. 눈에 잘 띄는 대칭 모양의 꽃과 고혹적인 향기(매개동물의 입장에서)로 유혹하지만 자기를 찾아오면 반드시 보상을 한다. 수분과 당분이 녹아있는 달콤한 꿀이다. 식물의 입장에서 꽃은 생식과 관련된 것이고 생식의 결과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다. 자신과 같은 생명체를 멸종시키지 않으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수행하는 만큼 절박함이 그대로 담겨있다. 벌들에게도 꿀과 꽃가루가 자신들의 새끼를 키우는 유일한 식량이기에 서로는 서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또한 숙명이다. 공짜가 없다. 자연계에도 아담 스미스의 시장 경제법칙과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이 섞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생식능력을 상실한 암벌들, 즉 일벌들은 새로운 꿀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그 맛은 어떤지에 대해 '춤의 언어'로 서로 이야기한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춤으로 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그런데 꽃은 화려하게 피었는데 벌들이 보이지 않는다. 벌들이 어디 갔을까. 몇 년이 지난 언젠가 꽃이 핀 감귤밭을 지날 때 벌들이 잉잉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도 많았다. 왕벚나무꽃에도 벌들이 떼로 달려든 것도 보았다. 머리와 다리에 노란 꽃가루를 뒤집어쓰고 비틀거리는 벌들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는데 그런 벌들이 보이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일까. 이는 내가 걷는 도심만의 문제가 아닐 듯싶다. 산과 들에도 마찬가지다. 그 많던 벌들이 어디로 간 것일까. 꿀벌은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최근 심상치 않은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100대 작물 가운데 71%는 꿀벌을 매개로 수분한다. 모든 것이 그렇듯 꿀벌과 공존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도 밝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오름 자락이 파헤쳐지고, 곶자왈이 사라지고, 멀쩡한 농경지에 대규모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니 큰일이다. 꿀벌이 사라지는 게 작은 일일까.<송창우 제주교통방송 사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역대 최대 넘어선 대만 관광객… "겨울에도 제주로"
- 2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 '꿔다놓은 보릿자루' 전락
- 3

"서귀포 요양병원 짓기만 하면 그만? 부지 재검토해야"
- 4

교통약자 이동 돕는 차량인데… '미터기 조작' 의혹 파장
- 5

"제주도 경제 활력 예산 10% 증액 '눈 가리고 아웅'"
- 6

이경선·김경희·하민철·고용천 신임 제주도감사위원에 선…
- 7

"조례 하나 만들고 끝?"… 도의회 '특위' 운영 보여주기 비판
- 8

"나이 들어 아이 돌보면 안되나" 돌보미 정년제 도입 '논란'
- 9

제주4·3 희생자·유족 981명 추가 결정.. 수형인 19명 포함
- 10

추워진 날씨에 '콜록콜록'… 제주 독감·백일해 주의















 2024.11.24(일) 22:53
2024.11.24(일)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