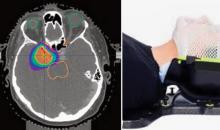[4·3문학의 현장](18)고정국의 '지만 울단 장쿨래기'
큰 누이 나 업엉 벌러니에 곱으레 갔주
- 입력 : 2008. 06.06(금) 00:00
- 진선희 기자 jin@hallailbo.co.kr

▲소년을 키운 위미 앞바다의 벌러니는 고정국 시인이 첫돌을 넘기던 때 아홉살 위인 누나 등에 업혀 엉엉울며 피신했던 곳이다. /사진=이승철기자
무엇이든 공짜로 내주던 위미 동카름
왕대타는 소리가 총격전인 줄 화들짝
동백나무 무성한 가지에 몸을 숨기다
바다는 생색내는 법이 없다. 조건없이 베푼다. 삐죽빼죽 솟은 바위는 숲처럼 보였다. 그 숲을 헤치며 해산물을 캐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때, 해군기지 후보지였던 위미항 서쪽 벌러니의 그림같은 바위들은 4·3때 숨을 곳을 내줬다.
'큰 누이/나 업어네/ 벌러니에/ 곱으레 가난// 엉덕 아래/ 고망고망/ 사름들/ 곱아두서//"엉허당/ 다 죽나죽어"/ 우는 아일/ 쫓아렌 마씀."('엉덕마다 사름덜 곱안')
세월은 매정했다. 우는 아이가 은신처에 찾아든 게 반갑지 않았다. 자칫하면 발각된다. 고정국 시인(62)은 그때 첫돌을 넘긴 아기였고, 그의 누님은 아홉살이었다. 보리파종 시기였다고 한다. 부모님이 보리밭에 씨를 뿌리러 간 사이 산사람들이 들이닥쳤다. 누님은 갓난 동생을 업어 벌러니로 달려갔다.
지금의 위미2리인 동카름 대밭의 대나무가 와직와직 타던 소리에도 놀라던 때였다. 경찰과 무장대가 치열한 총격전을 벌이는 것처럼 들렸으니까. 진짜 이곳저곳에서 '팡팡'소리가 나자 동네 사람들은 '화릉화릉'(여성들이 숨가쁘게 뛰는 모습)했다. 산으로 피할까, 바다로 피할까.'곱으라, 아이덜을 곱지라!' 산사람들의 습격에 마을은 전쟁터로 변한다.
2004년에 나온 고정국 시인의 시조집 '지만 울단 장쿨래기'는 사투리로 4월을 증언한다. 시조집 첫머리의 20수가 4·3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이지만 나머지 2백80수도 60년전의 기억에서 떨어져있지 않다.
입말로 쓰여진 그의 시조는 마치 4월의 어느날로 돌아가 동네 '삼춘'이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해놓은 것처럼 읽힌다. 시인은 어릴적부터 4·3 이야기를 줄곧 듣고 자랐고, 유년의 어느 시절부터는 당시의 기억이 남아있다. 시조집은 그것들이 서로 여여하게 만나 '네박자 노래'처럼 귀에 감기는 운율로 사건을 그려낸다.
'밭갈단/ 잠대 클렁/ 밭갈쉐도/ 풀어두네// 어멍아방/ 밭에염이/ 돔방낭 소굽에/ 곱아두서// 아이덜/ 어떵행심구/ 몸을 박박 /털었젠마씀.'('아이덜 어떵행심구')
위미리엔 제주도기념물로 지정된 1백50년된 동백나무 숲을 비롯해 '돔방낭'이 많다. 시인의 부모는 동백나무 덕에 목숨을 건졌다. 밭 둘레에 심어져있는 동백나무의 무성한 가지가 몸을 숨겨줬다.
 모두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스무밧디 창을 맞안'이란 시조에 그런 사연을 적었다. '공비'들이 총질·창질로 사람을 죽이는 걸 보다못한 시인의 고모부는 맨손으로 덤벼들다 스무군데 총질을 당했다. 손가락, 발가락까지 잘라버렸다. '하늘 더레만 바러렌 마씀', '피난 족족 나시크냐'처럼 뒤이은 시조들은 끔찍한 죽음의 정황을 전한다.
모두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스무밧디 창을 맞안'이란 시조에 그런 사연을 적었다. '공비'들이 총질·창질로 사람을 죽이는 걸 보다못한 시인의 고모부는 맨손으로 덤벼들다 스무군데 총질을 당했다. 손가락, 발가락까지 잘라버렸다. '하늘 더레만 바러렌 마씀', '피난 족족 나시크냐'처럼 뒤이은 시조들은 끔찍한 죽음의 정황을 전한다.
'밤질 가단/ 지서 앞이서/담배 혼대/ 피와보잰//심쌍허게/화곽살 내단/ 그 무신/ 암호카부덴// '팡'허멍/ 불 '팬찍'행게/ 낭 지듯이/ 누어렌마씀.'(''팡'허멍 불 '팬찍'행게')
마을의 중심에 있던 지서앞에서 생긴 일이다. 밤길 가던 사람이 지서 앞에서 담배 한대 피우려다 그게 산사람에게 보내는 신호인 줄 알고 총에 맞아 죽었다. 돼지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내장이 다 터져나오도록 총격을 받은 일도 있다. '도체비 방 노래난 사람은 굴메에두 잘락'(도깨비보고 놀란 사람은 그림자에도 철렁)한다고 했던가. 위미지서에 매달렸던 종이 '강강강강'소리를 내면 위미리 사람들은 무슨 난리가 났나 싶어 애가 탔다. 지서가 있던 자리엔 남원파출소 위미분소가 들어섰다. 파출소 지붕을 뒤덮고 있는 1백30년된 높이 10m의 후박나무만이 그 시절 그대로다.
제주도심에서 남원으로 향하는 남조로엔 안개가 잔뜩 끼었고, 위미리에서 늘상 눈에 걸리는 한라산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동카름은 이웃하며 형·동생하던 사람들이 등돌리고 살았던 4·3의 기억을 품고 있다. 가슴에 남은, 어쩌지 못하는 흉터가 있을 것이다. 동네 할머니들은 바다에서 남편이나 아들을 잃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위로했다. '저 바당 바리멍 살라. 하늘더레 바리멍 살라.' 멀찍이 한라산은 우리 사는 걸 내다보며 '웃엄신가 울엄신가 욕햄신가 달램신가' 모른다. 산은 진실을 알지만 끝까지 기다린다.
구신덜 멩질밥도 굶어…위미리 무장대 습격 피해 커
'또시라/ 멩질 아시날/ 폭도들이/ 놀펴들언//이레 화륵/ 저레 화륵/ 들라일라/ 돋지 못헨// 호래기/ 죽은 구신덜/ 멩질밥두/ 굶언마씀.'('졸바루 눈두 못곰안')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는 두 차례에 걸쳐 무장대의 습격을 받는다. '물자공급작전'에 따라 1948년 11월 28일 1차 습격에 이어 한달여만인 12월 31일 다시 위미리도 들이닥쳤다. 2차 때는 설 전날이었다. 무장대는 명절 준비해둔 음식을 모두 가져가버렸다.
위미리 사람들에게 4·3은 산부대의 습격으로 기억된다. 1991년 위미신용협동조합에서 펴낸 '위미리지'에는 7쪽에 걸쳐 '4·3사건'을 다뤘다. '고향 사람들끼리도 등을 돌리고 살았던 배신과 증오의 긴 밤이 다시는 오지 않도록 …지금은 용서와 화합해야 할 시간'이라며 사건을 정리해놓았다.
이에따르면 '폭도'에 희생된 사람은 29명. 나이 열한살에서 예순여섯의 희생자까지 있다. '위미리지'는 '폭도'들이 '목불인견의 만행'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4·3을 전후해 위미리에 들어온 일부 서북청년의 횡포도 적어놓았다. 위미지서에 근무하며 산사람의 위협을 막아줬지만 주민들을 폭도로 몰아 괴롭히는 등 못살게 굴었다고 한다.
"위미리의 '4·3사건'은 다른 마을과 달리 좌·우익의 표면적인 충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좌익계열'의 마을 사람들도, 위미리 습격에 동참했거나 직접적으로 마을 사람들 간에 횡포를 부렸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미리는 '4·3사건'이 준 엄청난 시련과 참혹상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가 원통한 피해자였다."('위미리지')
2003년 정부가 내놓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신고된 희생자중 가해별 통계가 나와있다. 토벌대에 의한 희생이 78.1%(1만9백55명)로 다수를 차지하고 무장대가 12.6%(1천7백64명), 가해 표시를 하지 않은 공란이 9%(1천2백66명)였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뤄지고 있습니다.
왕대타는 소리가 총격전인 줄 화들짝
동백나무 무성한 가지에 몸을 숨기다
바다는 생색내는 법이 없다. 조건없이 베푼다. 삐죽빼죽 솟은 바위는 숲처럼 보였다. 그 숲을 헤치며 해산물을 캐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때, 해군기지 후보지였던 위미항 서쪽 벌러니의 그림같은 바위들은 4·3때 숨을 곳을 내줬다.
'큰 누이/나 업어네/ 벌러니에/ 곱으레 가난// 엉덕 아래/ 고망고망/ 사름들/ 곱아두서//"엉허당/ 다 죽나죽어"/ 우는 아일/ 쫓아렌 마씀."('엉덕마다 사름덜 곱안')
세월은 매정했다. 우는 아이가 은신처에 찾아든 게 반갑지 않았다. 자칫하면 발각된다. 고정국 시인(62)은 그때 첫돌을 넘긴 아기였고, 그의 누님은 아홉살이었다. 보리파종 시기였다고 한다. 부모님이 보리밭에 씨를 뿌리러 간 사이 산사람들이 들이닥쳤다. 누님은 갓난 동생을 업어 벌러니로 달려갔다.
지금의 위미2리인 동카름 대밭의 대나무가 와직와직 타던 소리에도 놀라던 때였다. 경찰과 무장대가 치열한 총격전을 벌이는 것처럼 들렸으니까. 진짜 이곳저곳에서 '팡팡'소리가 나자 동네 사람들은 '화릉화릉'(여성들이 숨가쁘게 뛰는 모습)했다. 산으로 피할까, 바다로 피할까.'곱으라, 아이덜을 곱지라!' 산사람들의 습격에 마을은 전쟁터로 변한다.
2004년에 나온 고정국 시인의 시조집 '지만 울단 장쿨래기'는 사투리로 4월을 증언한다. 시조집 첫머리의 20수가 4·3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이지만 나머지 2백80수도 60년전의 기억에서 떨어져있지 않다.
입말로 쓰여진 그의 시조는 마치 4월의 어느날로 돌아가 동네 '삼춘'이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해놓은 것처럼 읽힌다. 시인은 어릴적부터 4·3 이야기를 줄곧 듣고 자랐고, 유년의 어느 시절부터는 당시의 기억이 남아있다. 시조집은 그것들이 서로 여여하게 만나 '네박자 노래'처럼 귀에 감기는 운율로 사건을 그려낸다.
'밭갈단/ 잠대 클렁/ 밭갈쉐도/ 풀어두네// 어멍아방/ 밭에염이/ 돔방낭 소굽에/ 곱아두서// 아이덜/ 어떵행심구/ 몸을 박박 /털었젠마씀.'('아이덜 어떵행심구')
위미리엔 제주도기념물로 지정된 1백50년된 동백나무 숲을 비롯해 '돔방낭'이 많다. 시인의 부모는 동백나무 덕에 목숨을 건졌다. 밭 둘레에 심어져있는 동백나무의 무성한 가지가 몸을 숨겨줬다.

▲위미지서(지금의 남원파출소 위미분소) 지붕을 덮고 있는 1백30년된 후박나무. '모두가 원통한 희생자'였던 4·3 당시의 지서 앞에서는 기막힌 일들이 많았다.
'밤질 가단/ 지서 앞이서/담배 혼대/ 피와보잰//심쌍허게/화곽살 내단/ 그 무신/ 암호카부덴// '팡'허멍/ 불 '팬찍'행게/ 낭 지듯이/ 누어렌마씀.'(''팡'허멍 불 '팬찍'행게')
마을의 중심에 있던 지서앞에서 생긴 일이다. 밤길 가던 사람이 지서 앞에서 담배 한대 피우려다 그게 산사람에게 보내는 신호인 줄 알고 총에 맞아 죽었다. 돼지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내장이 다 터져나오도록 총격을 받은 일도 있다. '도체비 방 노래난 사람은 굴메에두 잘락'(도깨비보고 놀란 사람은 그림자에도 철렁)한다고 했던가. 위미지서에 매달렸던 종이 '강강강강'소리를 내면 위미리 사람들은 무슨 난리가 났나 싶어 애가 탔다. 지서가 있던 자리엔 남원파출소 위미분소가 들어섰다. 파출소 지붕을 뒤덮고 있는 1백30년된 높이 10m의 후박나무만이 그 시절 그대로다.
제주도심에서 남원으로 향하는 남조로엔 안개가 잔뜩 끼었고, 위미리에서 늘상 눈에 걸리는 한라산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동카름은 이웃하며 형·동생하던 사람들이 등돌리고 살았던 4·3의 기억을 품고 있다. 가슴에 남은, 어쩌지 못하는 흉터가 있을 것이다. 동네 할머니들은 바다에서 남편이나 아들을 잃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위로했다. '저 바당 바리멍 살라. 하늘더레 바리멍 살라.' 멀찍이 한라산은 우리 사는 걸 내다보며 '웃엄신가 울엄신가 욕햄신가 달램신가' 모른다. 산은 진실을 알지만 끝까지 기다린다.
구신덜 멩질밥도 굶어…위미리 무장대 습격 피해 커
'또시라/ 멩질 아시날/ 폭도들이/ 놀펴들언//이레 화륵/ 저레 화륵/ 들라일라/ 돋지 못헨// 호래기/ 죽은 구신덜/ 멩질밥두/ 굶언마씀.'('졸바루 눈두 못곰안')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는 두 차례에 걸쳐 무장대의 습격을 받는다. '물자공급작전'에 따라 1948년 11월 28일 1차 습격에 이어 한달여만인 12월 31일 다시 위미리도 들이닥쳤다. 2차 때는 설 전날이었다. 무장대는 명절 준비해둔 음식을 모두 가져가버렸다.
위미리 사람들에게 4·3은 산부대의 습격으로 기억된다. 1991년 위미신용협동조합에서 펴낸 '위미리지'에는 7쪽에 걸쳐 '4·3사건'을 다뤘다. '고향 사람들끼리도 등을 돌리고 살았던 배신과 증오의 긴 밤이 다시는 오지 않도록 …지금은 용서와 화합해야 할 시간'이라며 사건을 정리해놓았다.
이에따르면 '폭도'에 희생된 사람은 29명. 나이 열한살에서 예순여섯의 희생자까지 있다. '위미리지'는 '폭도'들이 '목불인견의 만행'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4·3을 전후해 위미리에 들어온 일부 서북청년의 횡포도 적어놓았다. 위미지서에 근무하며 산사람의 위협을 막아줬지만 주민들을 폭도로 몰아 괴롭히는 등 못살게 굴었다고 한다.
"위미리의 '4·3사건'은 다른 마을과 달리 좌·우익의 표면적인 충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좌익계열'의 마을 사람들도, 위미리 습격에 동참했거나 직접적으로 마을 사람들 간에 횡포를 부렸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미리는 '4·3사건'이 준 엄청난 시련과 참혹상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가 원통한 피해자였다."('위미리지')
2003년 정부가 내놓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신고된 희생자중 가해별 통계가 나와있다. 토벌대에 의한 희생이 78.1%(1만9백55명)로 다수를 차지하고 무장대가 12.6%(1천7백64명), 가해 표시를 하지 않은 공란이 9%(1천2백66명)였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00:00

[4·3문학의 현장](32)연재를 마치며
- 00:00

[4·3문학의 현장](31)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2
- 00:00

[4·3문학의 현장](30)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1
- 00:00

[4·3문학의 현장](29)김길호의 '이쿠노 아리랑'
- 00:00

[4·3문학의 현장](28)김시종의 '이카이노 시집'
- 00:00

[4·3문학의 현장](27)한림화의 '한라산의 노을'-2
- 00:00

[4·3문학의 현장](26)한림화의 '한라산의 노을'-1
- 00:00

[4·3문학의 현장](25)허영선의 '무명천 할머니'
- 00:00

[4·3문학의 현장](24)고시홍의 '도마칼'
- 00:00

[4·3문학의 현장](23)김석교의 '숨부기꽃'















 2026.02.05(목) 20:23
2026.02.05(목)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