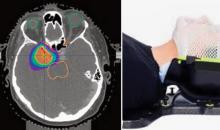[양기훈의 제주마을 백리백경.. 가름 따라, 풍광 따라] (106)애월읍 신엄리
장엄한 기상으로 애향 전통 가득한 마을
- 입력 : 2026. 02.06(금) 02:0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한라일보] 옛 이름 엄장리(嚴莊里)의 명칭만 앞뒤를 바꿔서 읽으면 장엄(莊嚴)이다. 마을의 역사와 환경, 정통적 기질 등을 종합해 바라보면 신엄리는 이름값을 그대로 하고 있는 마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정조임금 시절 1780년에 간행된 '제주읍지'에 신엄장리, 구엄장리, 중엄장리로 이미 나뉘어 있었다. 세 마을의 인구를 합해보면 세 마을로 나뉘기 전 인구가 127가호에 710명으로 상대적으로 대촌이었음을 알 수 있다. 토질 좋은 풍부한 농경지와 바다 자원, 정이 가득한 마을 인심이 사람이 많이 모여 살 수 있는 배경이 됐을 것이다. 신엄리에 포함된 자연 마을들을 작은 단위로 살펴보면 지명 자체에서 향토적 정감이 우러난다. 윤남동, 안골, 베룻골(배렛골·벼룩골), 가운메기(과원목이), 동삭거리, 창남거리(너븐팡거리 포함), 시(세)커리, 큰동네, 답단이, 당거리, 섯동네 등으로 구분해 부르고 있다.
 자연환경적 독특함을 파악하기 위해 아주 오랜 옛날, 노략질을 일삼던 해적이나 왜구의 시선으로 바다에서 바라보면, 분명 육지에 불이 피어오르고 해안가에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마을이 있는 것이 분명하거늘 20m 넘는 해안가 절벽들이 성처럼 버티고 있어서 침공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러한 안전지대 입지여건을 마을 조상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주공간과 마을길, 농경지 대부분이 해발고도 20~50m에 이른다. 애월읍 해안가 마을들이 해발고도가 보통 5~10m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환경적 특이점이 상대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런 지리적 특징이 현대적인 주거시설들이 경관을 장점으로 살리고자 모여드는 등 가치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자연환경적 독특함을 파악하기 위해 아주 오랜 옛날, 노략질을 일삼던 해적이나 왜구의 시선으로 바다에서 바라보면, 분명 육지에 불이 피어오르고 해안가에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마을이 있는 것이 분명하거늘 20m 넘는 해안가 절벽들이 성처럼 버티고 있어서 침공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러한 안전지대 입지여건을 마을 조상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주공간과 마을길, 농경지 대부분이 해발고도 20~50m에 이른다. 애월읍 해안가 마을들이 해발고도가 보통 5~10m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환경적 특이점이 상대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런 지리적 특징이 현대적인 주거시설들이 경관을 장점으로 살리고자 모여드는 등 가치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신엄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표지석이 마을회관 마당에 비석 형태로 서있다. 명칭이 '신우면사무소 옛터'라고 써진 표지석의 핵심 내용은 1906년부터 1914년까지 신우면 사무소가 있던 자리였다는 내용. 조선말 엽과 대한제국시기에 신엄리의 위상이 주변 지역의 중심지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역사적 사실을 밝혀준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일까. 리 단위 명칭을 가진 신엄중학교를 1970년대 초반에 설립해 전통적인 교육열을 유감없이 발휘해오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정도는 우리 마을에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을공동체 내부에서 공론화되고 실행에 옮겨지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주민 결속력에 대해 다른 이유를 들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성엽 이장에게 신엄리가 보유한 가장 큰 자긍심을 묻자, 단박에 한 단어로 대답했다. "열정." 마을 일에 한 번 시동이 걸리면 그 저돌적인 추진력은 외부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한다. 조상들이 대촌을 형성해 상부상조하던 전통이 유전자처럼 몸과 마음에 그대로 계승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마을공동체가 그 고귀한 열정을 바치는 대표적인 사업이 있다. 정주공간 인근 자연녹지 지역에 공원지구를 마련해 '기후 대응 숲 조성사업'을 차곡차곡 준비해 설계용역을 마치고 시설공사 전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다. 슬로건도 감칠맛 나게 '느랏놀멍 공원'을 표방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심신건강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다. 도·농복합지역화를 현실적 사회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너무도 필요한 시설임은 분명하다. 행정적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다른 지역의 공원들을 벤치마킹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모방과 답습'이라는 딜레마에 빠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엄존한다. 누군가에게는 공원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일이지만 결국 신엄지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명소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변 지역에 펼쳐진 숙박시설들은 관광객 인프라가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린 공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마을공동체 구성원들과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의 신엄리 랜드마크가 되기 위한 독창적 자원화가 절실한 것이다. <시각예술가>
밭과 바다 사이에
<수채화 79cm×35cm>
 두 개의 현실적 상황이 대립해 서로를 이기려 하고 있다. 명암법과 색채대비의 싸움. 밭에서 펼쳐지는 명암은 늦은 오후 눈부신 햇살을 엄청난 광선 강도로 드러내면서 기선을 잡으려 하지만 짙은 파란색 바다는 너무도 잔잔하고 여유롭게 앞에 하얀 집 하나를 품어 명암법을 이겨버리고 만다. 회화적 입장에서 이런 구도와 상황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다. 수평선이 소실점이라고 한다면 3층 이상 되는 건물이 밭 아래 보이는 경우 바다와 밭 흙 사이에 건물이 끼어 있게 된다. 신엄리의 자연환경의 시각적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너무도 명쾌한 지점을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렸다. 분명 바닷가와 인접한 곳에 서있는 하얀 건물이다. 저기 밭담을 넘더라도 경사면이 급하게 바다로 향할 것임을 직감할 수 있다. 짙푸른 바다를 이토록 넓게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관광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밭에 단층집을 지어도 바다를 바라보는 경관은 최소 5층은 공짜로 차지하는 것이 된다. 신엄리 사람들이 묘하게 부러워서 그린 것이다. 밭담 앞과 곳곳에 겨울 배추를 수확하다 남은 잎사귀들이 뒹굴고 있다. 입춘도 지나고 겨울 배추도 떠나버린 밭. 저 바다와 함께 성급하게 봄을 노래하고 있다.
두 개의 현실적 상황이 대립해 서로를 이기려 하고 있다. 명암법과 색채대비의 싸움. 밭에서 펼쳐지는 명암은 늦은 오후 눈부신 햇살을 엄청난 광선 강도로 드러내면서 기선을 잡으려 하지만 짙은 파란색 바다는 너무도 잔잔하고 여유롭게 앞에 하얀 집 하나를 품어 명암법을 이겨버리고 만다. 회화적 입장에서 이런 구도와 상황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다. 수평선이 소실점이라고 한다면 3층 이상 되는 건물이 밭 아래 보이는 경우 바다와 밭 흙 사이에 건물이 끼어 있게 된다. 신엄리의 자연환경의 시각적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너무도 명쾌한 지점을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렸다. 분명 바닷가와 인접한 곳에 서있는 하얀 건물이다. 저기 밭담을 넘더라도 경사면이 급하게 바다로 향할 것임을 직감할 수 있다. 짙푸른 바다를 이토록 넓게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관광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밭에 단층집을 지어도 바다를 바라보는 경관은 최소 5층은 공짜로 차지하는 것이 된다. 신엄리 사람들이 묘하게 부러워서 그린 것이다. 밭담 앞과 곳곳에 겨울 배추를 수확하다 남은 잎사귀들이 뒹굴고 있다. 입춘도 지나고 겨울 배추도 떠나버린 밭. 저 바다와 함께 성급하게 봄을 노래하고 있다.
극명한 대비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위치적 강점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회화적 예술성보다 지역적 아름다움을 더 탐닉하게 된다. 어떤 놀라운 풍경보다 평범한 일상과도 같은 자산을 통해 새로운 시각적 사유를 선물 받게 되는 곳.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
<수채화 79㎝×35㎝>
 항우가 떠오르는 언덕동산이다. 스스로의 능력을 표현함에 있어 '산을 뽑고 세상을 덮는다'고 했으니, 뽑으면 뭐하나? 저렇게 산을 들어 올려야지! 기울어진 태양이 측면 광선을 제공하고 옹골찬 기운을 가진 저 동산의 용력은 흐름 자체로 한라산을 번쩍 들었다. 악보의 형상으로 판단해도 높은음 자리 흐름을 낮은음 자리 악보가 들어 올리는 형국이다. 어찌하여 이 경관을 보자마자 무릎을 치며 탄성을 지르게 됐는가? 내가 봤으면 옛 이름 엄장리를 설촌한 조상들도 봤을 것이다. 산이라도 들어 올릴 항우의 기백이 느껴지는 여기다. 동산의 능선은 사실적인 표현을 했지만 하단으로 갈수록 표현주의적 요소를 감행해 들어올리기 위한 기운생동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너무도 단순한 두 개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목적을 향해 돌진하는 메시지려니. 한라산과 하늘이 만나는 멜로디와 저 동산의 윗선 흐름은 너무도 화음이 잘 맞아떨어진다. 닮은 듯 다른 변화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연주하는 재즈 음악을 연상시키는 놀라운 선율.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다 간 숱한 사람들이 구체적인 생각에 접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풍경이 주는 한라산과의 교감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봤을 것이라는 황당한 추론 속에서 그려나갔다. 다시 한라산을 들어 올릴 방법을 찾으라면 신엄리에 가서 확인하라고 할 것이다. 관점의 차이가 시점의 차이를 부른다는 언표를 존중하게 한다. 땅이 보유한 기백이 마을 공동체에 가득하여라.
항우가 떠오르는 언덕동산이다. 스스로의 능력을 표현함에 있어 '산을 뽑고 세상을 덮는다'고 했으니, 뽑으면 뭐하나? 저렇게 산을 들어 올려야지! 기울어진 태양이 측면 광선을 제공하고 옹골찬 기운을 가진 저 동산의 용력은 흐름 자체로 한라산을 번쩍 들었다. 악보의 형상으로 판단해도 높은음 자리 흐름을 낮은음 자리 악보가 들어 올리는 형국이다. 어찌하여 이 경관을 보자마자 무릎을 치며 탄성을 지르게 됐는가? 내가 봤으면 옛 이름 엄장리를 설촌한 조상들도 봤을 것이다. 산이라도 들어 올릴 항우의 기백이 느껴지는 여기다. 동산의 능선은 사실적인 표현을 했지만 하단으로 갈수록 표현주의적 요소를 감행해 들어올리기 위한 기운생동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너무도 단순한 두 개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목적을 향해 돌진하는 메시지려니. 한라산과 하늘이 만나는 멜로디와 저 동산의 윗선 흐름은 너무도 화음이 잘 맞아떨어진다. 닮은 듯 다른 변화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연주하는 재즈 음악을 연상시키는 놀라운 선율.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다 간 숱한 사람들이 구체적인 생각에 접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풍경이 주는 한라산과의 교감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봤을 것이라는 황당한 추론 속에서 그려나갔다. 다시 한라산을 들어 올릴 방법을 찾으라면 신엄리에 가서 확인하라고 할 것이다. 관점의 차이가 시점의 차이를 부른다는 언표를 존중하게 한다. 땅이 보유한 기백이 마을 공동체에 가득하여라.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신엄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표지석이 마을회관 마당에 비석 형태로 서있다. 명칭이 '신우면사무소 옛터'라고 써진 표지석의 핵심 내용은 1906년부터 1914년까지 신우면 사무소가 있던 자리였다는 내용. 조선말 엽과 대한제국시기에 신엄리의 위상이 주변 지역의 중심지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역사적 사실을 밝혀준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일까. 리 단위 명칭을 가진 신엄중학교를 1970년대 초반에 설립해 전통적인 교육열을 유감없이 발휘해오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정도는 우리 마을에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을공동체 내부에서 공론화되고 실행에 옮겨지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주민 결속력에 대해 다른 이유를 들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성엽 이장에게 신엄리가 보유한 가장 큰 자긍심을 묻자, 단박에 한 단어로 대답했다. "열정." 마을 일에 한 번 시동이 걸리면 그 저돌적인 추진력은 외부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한다. 조상들이 대촌을 형성해 상부상조하던 전통이 유전자처럼 몸과 마음에 그대로 계승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마을공동체가 그 고귀한 열정을 바치는 대표적인 사업이 있다. 정주공간 인근 자연녹지 지역에 공원지구를 마련해 '기후 대응 숲 조성사업'을 차곡차곡 준비해 설계용역을 마치고 시설공사 전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다. 슬로건도 감칠맛 나게 '느랏놀멍 공원'을 표방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심신건강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다. 도·농복합지역화를 현실적 사회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너무도 필요한 시설임은 분명하다. 행정적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다른 지역의 공원들을 벤치마킹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모방과 답습'이라는 딜레마에 빠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엄존한다. 누군가에게는 공원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일이지만 결국 신엄지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명소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변 지역에 펼쳐진 숙박시설들은 관광객 인프라가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린 공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마을공동체 구성원들과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의 신엄리 랜드마크가 되기 위한 독창적 자원화가 절실한 것이다. <시각예술가>
밭과 바다 사이에
<수채화 79cm×35cm>

극명한 대비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위치적 강점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회화적 예술성보다 지역적 아름다움을 더 탐닉하게 된다. 어떤 놀라운 풍경보다 평범한 일상과도 같은 자산을 통해 새로운 시각적 사유를 선물 받게 되는 곳.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
<수채화 79㎝×35㎝>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02:00

[양기훈의 제주마을 백리백경.. 가름 따라, 풍광 …
- 02:00

[양기훈의 제주마을 백리백경.. 가름 따라, 풍광 …
- 02:00

[양기훈의 제주마을 백리백경.. 가름 따라, 풍광 …
- 02:00

[양기훈의 제주마을 백리백경.. 가름 따라, 풍광 …
- 02:00

[양기훈의 제주마을 백리백경.. 가름 따라, 풍광 …
- 03:00

[양기훈의 제주마을 백리백경.. 가름 따라, 풍광 …
- 03:00

[양기훈의 제주마을 백리백경.. 가름 따라, 풍광 …
- 02:00

[양기훈의 제주마을 백리백경.. 가름 따라, 풍광 …
- 02:00

[양기훈의 제주마을 백리백경.. 가름 따라, 풍광 …
- 03:00

[양기훈의 제주마을 백리백경.. 가름 따라, 풍광 …















 2026.02.05(목) 20:23
2026.02.05(목)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