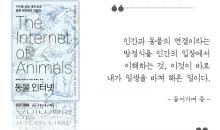[진선희기자의 문화현장]제주섬 예술가를 기리는 뜻
- 입력 : 2008. 08.12(화) 00:00
- 진선희 기자 jin@hallailbo.co.kr
어느 시인의 기념관 건립…수천점 자료만 놓고 막막
당장 유품 보관문제 걱정
김동리는 이런 글을 썼다. "고향은 작가의 마음밭이다. 나는 어린시절부터 에밀레 종소리를 듣고 자랐다. 종소리는 신라와 나를 잇는 소리의 무지개였다."
박목월은 이런 시를 읊었다.'참말로 경상도 사투리에는/ 약간 풀냄새가 난다/ 약간 이슬냄새가 난다/ 그리고 입안이 마르는/ 황토흙 타는 냄새가 난다'('사투리'에서)고.
지난 휴갓길, 경주 석굴암에서 내려오다 만난 동리·목월문학관 귀퉁이에서 마주친 글귀다. 두 문인이 어찌 한곳에 깃들었나 싶었는데, 경주 출신이란 인연이 있었다.
문학관은 2006년 개관했다. 건물 외양만 놓고 보면 그닥 할 말이 없지만 지역 예술가를 기리는 문화공간 하나 갖지 못한 제주사람 처지에선 물리칠 수 없는 여정이었다. 오랜 시간 문학관을 거닐었다.
김동리와 박목월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을 세우자며 10여명으로 건립추진위원회가 꾸려진 게 2000년. 그 이듬해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 전국에서 모여든 3백여명의 문인이 기념사업회를 발족시켰다. 이들 기념사업회는 경주시와 공동으로 문학관 건립을 위한 예산 40억원을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탰다.
문학관은 두 작가의 저서는 물론이고 7천여종의 장서, 육필원고, 문학자료 1천5백여점, 생활유품 2백50여점 등을 갖추고 관람객을 맞고 있다. 방명록엔 '교과서에 실린 작가를 여기서 본다'며 감격어린 소감을 적어놓은 방문객들의 이름이 보였다.
제주섬에도 수많은 예술가들이 뜨고 졌지만 문학관 같은 공간이 없다. 10월 개관을 앞둔 서귀포시 소암현중화기념관이 유일하다.
이런 중에 서귀포시 안덕면 카멜리아힐에 '떠나가는 배'의 양중해 시인을 기리는 공간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린다. 동백나무 우거진 카멜리아힐에 쏟은 고인의 각별한 애정에다 해당 업체 대표를 아들처럼 여기며 지내온 게 계기가 됐다.
지난해 별세한 고인의 자료가 그곳에 어느 정도 있는지 유족들도 헤아리기 어렵다. 제주 문화계, 교육계에 몸담으며 꼼꼼히 챙긴 온갖 자료는 물론이고 수석, 시서화 소장품 등 수천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장서만 5천권이 된다고 하니 말이다. 기업가 개인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규모다. 이 때문에 건립 사업이 잠시 주춤해있다. 당장 유품 보관 문제가 걱정이다. 기념관 건립을 두고 말을 아끼던 유족은 끝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건물을 짓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사람이 찾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하면 더 큰일이다. 급하게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지혜를 짜내고 있다"고 했다.
제주 예술가의 이름을 단 문화공간이 생기는 일, 그저 멀리서 지켜봐야만 하나. 한 예술가의 생애는 제주의 역사인데 말이다.
당장 유품 보관문제 걱정
김동리는 이런 글을 썼다. "고향은 작가의 마음밭이다. 나는 어린시절부터 에밀레 종소리를 듣고 자랐다. 종소리는 신라와 나를 잇는 소리의 무지개였다."
박목월은 이런 시를 읊었다.'참말로 경상도 사투리에는/ 약간 풀냄새가 난다/ 약간 이슬냄새가 난다/ 그리고 입안이 마르는/ 황토흙 타는 냄새가 난다'('사투리'에서)고.
지난 휴갓길, 경주 석굴암에서 내려오다 만난 동리·목월문학관 귀퉁이에서 마주친 글귀다. 두 문인이 어찌 한곳에 깃들었나 싶었는데, 경주 출신이란 인연이 있었다.
문학관은 2006년 개관했다. 건물 외양만 놓고 보면 그닥 할 말이 없지만 지역 예술가를 기리는 문화공간 하나 갖지 못한 제주사람 처지에선 물리칠 수 없는 여정이었다. 오랜 시간 문학관을 거닐었다.
김동리와 박목월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을 세우자며 10여명으로 건립추진위원회가 꾸려진 게 2000년. 그 이듬해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 전국에서 모여든 3백여명의 문인이 기념사업회를 발족시켰다. 이들 기념사업회는 경주시와 공동으로 문학관 건립을 위한 예산 40억원을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탰다.
문학관은 두 작가의 저서는 물론이고 7천여종의 장서, 육필원고, 문학자료 1천5백여점, 생활유품 2백50여점 등을 갖추고 관람객을 맞고 있다. 방명록엔 '교과서에 실린 작가를 여기서 본다'며 감격어린 소감을 적어놓은 방문객들의 이름이 보였다.
제주섬에도 수많은 예술가들이 뜨고 졌지만 문학관 같은 공간이 없다. 10월 개관을 앞둔 서귀포시 소암현중화기념관이 유일하다.
이런 중에 서귀포시 안덕면 카멜리아힐에 '떠나가는 배'의 양중해 시인을 기리는 공간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린다. 동백나무 우거진 카멜리아힐에 쏟은 고인의 각별한 애정에다 해당 업체 대표를 아들처럼 여기며 지내온 게 계기가 됐다.
지난해 별세한 고인의 자료가 그곳에 어느 정도 있는지 유족들도 헤아리기 어렵다. 제주 문화계, 교육계에 몸담으며 꼼꼼히 챙긴 온갖 자료는 물론이고 수석, 시서화 소장품 등 수천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장서만 5천권이 된다고 하니 말이다. 기업가 개인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규모다. 이 때문에 건립 사업이 잠시 주춤해있다. 당장 유품 보관 문제가 걱정이다. 기념관 건립을 두고 말을 아끼던 유족은 끝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건물을 짓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사람이 찾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하면 더 큰일이다. 급하게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지혜를 짜내고 있다"고 했다.
제주 예술가의 이름을 단 문화공간이 생기는 일, 그저 멀리서 지켜봐야만 하나. 한 예술가의 생애는 제주의 역사인데 말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제주영어교육도시 FSAA 국제학교 건축 허가 승인
- 2

다음달 토트넘 합류하는 양민혁 제주 외가 찾는다
- 3

'비공개 오찬' 오영훈 지사 음식값 1인당 3만원 초과
- 4

읍면동 예산 최대 40% '싹둑'… "이래 놓고 '민생 예산'?"
- 5

제주행 항공기 탑승 50대 착륙 후 의식 잃고 쓰러져 사망
- 6

"인구 더 많은데 예산은?"… 행정시 예산 놓고 의원 '설전'
- 7

제주시 아라2동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들어선다
- 8

'매각 무산' 927억 제주 주상복합용지 매매가 재산정 논란
- 9

제주도청 주변 삼다공원·녹지공간 묶어 '도민의 숲' 조성
- 10

'아우성'에도 제주 차고지증명제 폐지-유지 입장차 '팽팽'
- 00:00

[진선희기자의 문화현장]담담하고 끔찍하게 그…
- 00:00

[진선희기자의 문화현장]제주영상위원회, 너무 …
- 00:00

[진선희기자의 문화현장]"도미술대전 사유화 안…
- 00:00

[진선희기자의 문화현장]대중성과 전문성 '아슬…
- 00:00

[진선희기자의 문화현장]'제주도 축소판'이란 그…
- 00:00

[진선희기자의 문화현장]손발 안맞는 '자부담' …
- 00:00

[진선희기자의 문화현장]김만덕의 '할매'같은 멘…
- 00:00

[진선희기자의 문화현장]4·3미술제의 궁색한 탈…
- 00:00

[진선희기자의 문화현장]비상임 지휘자, 이젠 돌…
- 00:00

[진선희기자의 문화현장]평화로의 제주어 홍보…















 2024.11.30(토) 11:32
2024.11.30(토)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