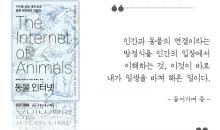[代를잇는사람들](27)감물염색 오운자씨 가족
"갈옷은 자연에서 얻은 지혜"
- 입력 : 2008. 08.23(토) 00:00
- 문미숙 기자 msmoon@hallailbo.co.kr

▲오대홍·이인선씨 부부와 감물염색 기술을 이어받은 큰 딸 오운자씨가 감물 염색장에서 갈천을 살펴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강희만기자
취미로 시작한 감물염색이 이젠 사업으로
'감수광' 브랜드 개발… 서울 등지에 공급
"질길 뿐만아니라 시원해 여름옷으론 최고"
제주의 여름, 볕좋은 날이면 농촌에선 토종 풋감에서 나온 즙을 가득 머금은 천들이 일광욕하느라 바쁘다. 몇 날 며칠을 자외선을 쬐면서 흰색에서 서서히 때깔좋은 갈색으로 변신한 천은 다시 제주의 전통 노동복인 '갈옷'이나 일상복으로 거듭난다
불볕더위가 막바지 기세를 부리던 날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감물염색 작업장. 군데군데 갈색 감물이 튄 흰색 상의를 입은 이들이 감즙이 잘 스며든 흰색 광목천 널기에 한창이었다. 옛 바나나 하우스 지붕은 훌륭한 천 건조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오대흥(74)·이인선씨(78) 부부와 큰 딸 오운자씨(54)가 분주히 움직이는 감물 천연염색장의 풍경이 그랬다.
"감물염색을 위해 마을은 물론 도내 곳곳에서 풋감을 구입해요. 어머니가 염색할 시절엔 감즙을 내기 위해 일일이 '덩두렁 마께'(방망이)로 빻았지만 지금은 기계로 감을 통째로 갈아서 사용합니다. 감즙에 천을 충분히 적신후 물기를 짜서 햇볕에 여러날 말리면 본연의 색이 점점 나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나 할까요." 오운자씨의 설명이다.
감물 본연의 색감이 나오기까지 물에 적셨다가 다시 말리기를 반복하는 바래기 작업을 거치는 동안 흰색 천은 주홍빛에서 짙은 갈색으로 여러차례의 변신을 거듭한다.
"더러 물을 적시는 과정을 생략하기도 하지만 물을 적셔야 천에 색깔이 곱게 드는 것 같아." 오대흥 할아버지도 부인과 딸 옆에서 감물염색작업을 일일이 거들다 보니 반 전문가가 됐다.
오운자씨가 처음으로 감물염색에 눈을 돌린 건 천연염색에 대한 관심이 막 고조될 무렵인 1990년이었다. 그녀의 스승은 친정 어머니인 이인선 할머니였다. 여름이면 해마다 감물을 들여 밭일을 나갈 때나 물론 평상복으로 입곤했던 이 할머니는 그녀에게 훌륭한 스승이 돼 주었다.
"그렇게 곱게 감물을 들인 천으로 소품을 만들어 주변의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행복감이 만만치 않았죠. 제주의 전통 자연색깔이 아름다웠음은 말할 것도 없구요."
오운자씨가 그렇게 취미삼아 시작한 감물염색은 2000년부터 본격화됐다. 광목, 무명, 마, 인견 등의 천연소재와 자연색깔인 감물의 환상적 만남은 전통의 미와 현대적 패션감각이 어우러지며 멋스런 의상과 모자, 가방 등 패션상품과 고급의상으로 연결되며 대중화가 한창이었다.
그녀의 전통생활기술의 전승노력을 인정받아 2001년엔 노동부 지정 감물염 기능전승자의 집으로 지정받았고, 3년 전쯤엔 제주방언인 '감수광'이란 브랜드도 탄생시켰다. 직접 염색한 갈천으로 제작한 의류, 모자, 가방 등이 감수광 브랜드를 달고 돌하르방공원에 납품되고 있다. 또 서울 소재 의류제작업체에도 감수광 브랜드로 염색한 천을 판매한다.
제주에서 난 풋감, 바람, 햇살에다 작업하는 이의 정성이 녹아든 자연의 색이 눈도 마음도 편안하게 해서일까? 근래엔 감물염색한 천이 이불, 베개 등의 침구커버로도 인기를 모으며 제주의 전통색깔을 알려나가고 있다.
"감물 들인 갈옷은 흙색깔과 비슷해 더러움도 덜 타고, 땀이 나도 옷이 몸에 달라붙지 않아서 시원해. 여름철 옷으론 최고지." 이 할머니의 갈옷 예찬은 제주 전통색깔의 아름답고 편안함을 말함이었다.
'감수광' 브랜드 개발… 서울 등지에 공급
"질길 뿐만아니라 시원해 여름옷으론 최고"
제주의 여름, 볕좋은 날이면 농촌에선 토종 풋감에서 나온 즙을 가득 머금은 천들이 일광욕하느라 바쁘다. 몇 날 며칠을 자외선을 쬐면서 흰색에서 서서히 때깔좋은 갈색으로 변신한 천은 다시 제주의 전통 노동복인 '갈옷'이나 일상복으로 거듭난다
불볕더위가 막바지 기세를 부리던 날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감물염색 작업장. 군데군데 갈색 감물이 튄 흰색 상의를 입은 이들이 감즙이 잘 스며든 흰색 광목천 널기에 한창이었다. 옛 바나나 하우스 지붕은 훌륭한 천 건조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오대흥(74)·이인선씨(78) 부부와 큰 딸 오운자씨(54)가 분주히 움직이는 감물 천연염색장의 풍경이 그랬다.
"감물염색을 위해 마을은 물론 도내 곳곳에서 풋감을 구입해요. 어머니가 염색할 시절엔 감즙을 내기 위해 일일이 '덩두렁 마께'(방망이)로 빻았지만 지금은 기계로 감을 통째로 갈아서 사용합니다. 감즙에 천을 충분히 적신후 물기를 짜서 햇볕에 여러날 말리면 본연의 색이 점점 나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나 할까요." 오운자씨의 설명이다.
감물 본연의 색감이 나오기까지 물에 적셨다가 다시 말리기를 반복하는 바래기 작업을 거치는 동안 흰색 천은 주홍빛에서 짙은 갈색으로 여러차례의 변신을 거듭한다.
"더러 물을 적시는 과정을 생략하기도 하지만 물을 적셔야 천에 색깔이 곱게 드는 것 같아." 오대흥 할아버지도 부인과 딸 옆에서 감물염색작업을 일일이 거들다 보니 반 전문가가 됐다.
오운자씨가 처음으로 감물염색에 눈을 돌린 건 천연염색에 대한 관심이 막 고조될 무렵인 1990년이었다. 그녀의 스승은 친정 어머니인 이인선 할머니였다. 여름이면 해마다 감물을 들여 밭일을 나갈 때나 물론 평상복으로 입곤했던 이 할머니는 그녀에게 훌륭한 스승이 돼 주었다.
"그렇게 곱게 감물을 들인 천으로 소품을 만들어 주변의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행복감이 만만치 않았죠. 제주의 전통 자연색깔이 아름다웠음은 말할 것도 없구요."
오운자씨가 그렇게 취미삼아 시작한 감물염색은 2000년부터 본격화됐다. 광목, 무명, 마, 인견 등의 천연소재와 자연색깔인 감물의 환상적 만남은 전통의 미와 현대적 패션감각이 어우러지며 멋스런 의상과 모자, 가방 등 패션상품과 고급의상으로 연결되며 대중화가 한창이었다.
그녀의 전통생활기술의 전승노력을 인정받아 2001년엔 노동부 지정 감물염 기능전승자의 집으로 지정받았고, 3년 전쯤엔 제주방언인 '감수광'이란 브랜드도 탄생시켰다. 직접 염색한 갈천으로 제작한 의류, 모자, 가방 등이 감수광 브랜드를 달고 돌하르방공원에 납품되고 있다. 또 서울 소재 의류제작업체에도 감수광 브랜드로 염색한 천을 판매한다.
제주에서 난 풋감, 바람, 햇살에다 작업하는 이의 정성이 녹아든 자연의 색이 눈도 마음도 편안하게 해서일까? 근래엔 감물염색한 천이 이불, 베개 등의 침구커버로도 인기를 모으며 제주의 전통색깔을 알려나가고 있다.
"감물 들인 갈옷은 흙색깔과 비슷해 더러움도 덜 타고, 땀이 나도 옷이 몸에 달라붙지 않아서 시원해. 여름철 옷으론 최고지." 이 할머니의 갈옷 예찬은 제주 전통색깔의 아름답고 편안함을 말함이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제주영어교육도시 FSAA 국제학교 건축 허가 승인
- 2

다음달 토트넘 합류하는 양민혁 제주 외가 찾는다
- 3

'비공개 오찬' 오영훈 지사 음식값 1인당 3만원 초과
- 4

제주행 항공기 탑승 50대 착륙 후 의식 잃고 쓰러져 사망
- 5

읍면동 예산 최대 40% '싹둑'… "이래 놓고 '민생 예산'?"
- 6

찬 바람 매서운 제주지방 산지 최고 15㎝ 폭설 쏟아진다
- 7

"인구 더 많은데 예산은?"… 행정시 예산 놓고 의원 '설전'
- 8

제주시 아라2동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들어선다
- 9

'매각 무산' 927억 제주 주상복합용지 매매가 재산정 논란
- 10

제주도청 주변 삼다공원·녹지공간 묶어 '도민의 숲' 조성
- 00:00

[代를잇는사람들](42)에필로그
- 00:00
[代를잇는사람들](41)세탁소 운영하는 고대업씨 …
- 00:00
[代를잇는사람들](40)인천문화당 이삼성 씨 가족
- 00:00

[代를잇는사람들](39)탐라차문화원 이순옥·이연…
- 00:00

[代를잇는사람들](38)푸른콩 된장 만드는 양정옥…
- 00:00
[代를잇는사람들](37)해운대가든 김기년·강봉호…
- 00:00
[代를잇는사람들](36)전문건설업체 문일환씨 가…
- 00:00
[代를잇는사람들](35)대진횟집 곽동영·정유은씨 …
- 00:00
[代를잇는사람들](34)한림공원 송봉규·상훈 부자
- 00:00
[代를잇는사람들](33)개인택시 기사 부재혁씨















 2024.11.30(토) 00:29
2024.11.30(토) 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