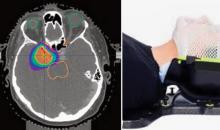[4·3문학의 현장](28)김시종의 '이카이노 시집'
뜨거운 그 기억은 좀처럼 식지 않았다
- 입력 : 2008. 09.05(금) 00:00
- /오사카=진선희 기자 jin@hallailbo.co.kr

▲김시종 시인이 오사카 쓰루하시 거리를 걷고 있다. 제주에서 4·3을 온 몸으로 겪은 시인이지만 당시의 참혹한 기억은 오히려 4·3에 대해 침묵하게 만들었다. 2000년쯤 공개적으로 4·3체험을 밝혔던 시인은 최근들어 4·3 연작시 3편을 잇달아 내놓았다. /사진=김명선기자 mskim@hallailbo.co.kr
남로당 예비당원이던 49년 신변위협 느껴 日 밀항
"참혹한 시기에 도망쳐온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나"
2000년에야 체험 공개…최근 학술지에 4·3 연작시
"어제까지 죽으로 끼니를 대신했다"는 시인은 한국 소주에 뜨거운 물을 타서 몇모금 들이킬 뿐 젓가락을 거의 들지 않았다. 시인은 지난 봄을 병실에서 보냈다. 지난달 26일 일본 오사카 쓰루하시에서 만난 김시종(79) 시인. 남로당 예비당원이었던 그는 1949년 4·3의 와중에 일본으로 몸을 피했다. 내년이면 일본 생활 60년째. 한국 나이로 스무살이던 시인은 어느덧 여든을 바라보고 있다.
'고국과 일본/ 나 사이에 얽힌/ 거리는 서로 똑같다면 좋겠지// 사모와 견딤/ 사랑이 똑같다면/ 견뎌야만 하는 나라 또한/ 똑같은 거리에 있겠지// 어제의 오늘이 지금이며/ 지금이 고스란히 내일이라면/ 미래도 과거도 지금 이 순간 살아 있다 말할 수 있겠지'('똑같다면')
 함경도 원산 태생인 시인은 어릴적 아버지를 따라 제주도에 왔다. 광주에 있는 교원양성 중학교로 진학했던 그는 졸업을 반년 남기고 제주로 돌아온다. 제주도인민위원회 등에서 일하며 4·3을 체험했다.
함경도 원산 태생인 시인은 어릴적 아버지를 따라 제주도에 왔다. 광주에 있는 교원양성 중학교로 진학했던 그는 졸업을 반년 남기고 제주로 돌아온다. 제주도인민위원회 등에서 일하며 4·3을 체험했다.
하지만 시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4·3을 말한 것은 2000년의 일이다. 그가 지금까지 내놓은 시집 '지평선', 일본풍토기', '니카타', '이카이노 시집', '광주시편', '화석의 여름'등에도 4·3이 그려진 것은 손에 꼽힌다. '니카타'라는 시집에 실린 'Ⅰ바다 울림 속에서'를 통해 제주섬 자갈 해변에 철사로 손목이 묶여 바다에 던져진 희생자의 시체가 밀려온다는 내용을 쓴 것 정도다. 시인은 그동안 왜 4·3을 쓰지 않았을까.
"낯을 들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서는 게 괴롭다. 참혹한 시기에 도망쳐왔으니까. 끔찍한 죽음을 목격했던 그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잠못 이룬 해가 몇년이나 이어졌는지 모른다."
4·3을 생생히 겪은 이들은 고통을 입밖으로 꺼내길 두려워한다. 발화하는 순간 그 기억은 현재가 된다. 제주출신 재일동포들이 몰려사는 이쿠노구의 공원에서 만난 어느 할머니가 4·3 이야기를 꺼내자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말이다.
 시인은 섬을 떠나온지 50년만인 1999년에야 제주땅을 밟았다. 아내와 동행할까 하다가 그만 뒀다. 빨갱이 도망자 가족이 겪었을 고통때문에 친척들이 자신을 원망할 거라 생각해서다. 긴장된 마음으로 제주국제공항 대합실로 들어서는데 외조카가 나와있었다. 욕이나 듣지 않을까 했는데 첫마디가 "잘 왔수다"였다. 조카들은 일찍이 세상을 뜬 시인의 부모 산소까지 돌봤다. 하지만 4·3이 드리운 그늘은 있었다. 행여 피해를 당할까 싶어 조카들은 시인의 사진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시인은 이 대목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
시인은 섬을 떠나온지 50년만인 1999년에야 제주땅을 밟았다. 아내와 동행할까 하다가 그만 뒀다. 빨갱이 도망자 가족이 겪었을 고통때문에 친척들이 자신을 원망할 거라 생각해서다. 긴장된 마음으로 제주국제공항 대합실로 들어서는데 외조카가 나와있었다. 욕이나 듣지 않을까 했는데 첫마디가 "잘 왔수다"였다. 조카들은 일찍이 세상을 뜬 시인의 부모 산소까지 돌봤다. 하지만 4·3이 드리운 그늘은 있었다. 행여 피해를 당할까 싶어 조카들은 시인의 사진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시인은 이 대목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
제 나라에서 조선어 선생을 멸시하며 한글로 '아'자 하나 못썼던 시인은 충격속에 해방을 맞는다. 그로부터 4년뒤 일본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는 식민지 시절의 일본어와 결별하리라 다짐한다. 일본어로 쓰여진 그의 시에 등장하는 시어가 독특한 것은 그같은 싸움의 결과다. 지난 5월 한국에서 처음 출판된 김시종 시선집 '경계의 시' 번역자는 그런 언어를 두고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낯선 어휘와 표현'들이라고 했다.
'아름다운 문장'과는 거리가 먼 이질적인 일본어로 시를 쓰는 일처럼 시인은 자신을 응시하고 성찰하는 일에 물러섬이 없다. 자기 내부를 들여다보는 일은 곧 재일한국인의 삶을 냉정하게 바라본다는 의미다. 시인이 남한에는 반한주의자로, 북에는 변절주의자로 불리며 양쪽에서 기피인물이 된 것은 시인의 엄정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시인은 4·3 60주년에 즈음해 일본의 계간 학술지 '캉(環)'에 권두시로 4·3 연작시를 발표했다. 지난해 겨울호부터 올 여름호까지 실린 '새가 말을 하는 가을(鳥語の秋)', '4월이여, 먼 날이여'(四月よ, 遠い日よ), '여정(旅)'등 3편이다. 그의 시에서 4월은 여전히 잔혹한 달이었다.
'옛날 사랑이 피를 떨어트렸던/ 저 네거리, 저 모퉁이/ 저 웅덩이/ 거기에 있었던 나는 넘칠 정도로 나이를 먹고/ 개나리도 살구도 함께 만발하게 피는 일본에서/ 고집스럽게 살아서,/ 화창한 날은 빛나서/ 4월은 또다시 시계(視界)를 물들이고 돌아간다.'('4월이여, 먼 날이여')


 같은 날 제사많던 이카이노 在日의 존재를 물어온 공간
같은 날 제사많던 이카이노 在日의 존재를 물어온 공간
코리아국제학원장 맡은 김시종씨
'거기엔 늘 무언가 넘쳐나/ 넘치지 않으면 시들고 마는/ 일 벌이기 좋아하는 조선 동네./한번 시작했다 하면/ 사흘 낮밤./ 징소리 북소리 요란한 동네./지금도 무당이 날뛰는/ 원색의 동네.'
김시종 시인이 1978년에 낸 '이카이노(猪飼野) 시집'에 실린 '보이지 않는 동네'중 일부다. 옛적 '돼지를 기르는 들판'(이카이노)으로 불렸던 이쿠노(生野)구는 제주출신 재일동포 밀집지다.
시인이 1949년에 무인도인 '관탈섬'에 숨어있다가 밀항선을 타고 일본에 도착한 다음날 찾아간 곳이 이쿠노구 쓰루하시였다. 그곳에 가면 동포가 많다는 얘길 들어서다. 이쿠노에서는 다정한 추억보다 쓰라린 기억이 많다.
"봄철이 되면 동포들이 사는 이곳저곳에서 식게(제사)가 벌어졌다. 평소 웃고 떠들며 지냈던 제주 사람들이지만 그 무렵이 가까워오면 공기가 냉랭해진다. '저 사람 때문에 가족이 죽었져'라며 서로를 원망하기 때문이다. 50~60년대 이카이노에선 종종 그런 풍경을 만났다."
 이카이노에서 시작된 그의 일본 생활은 '재일(在日)'이란 존재를 끊임없이 묻는 과정이었다. 일본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조선어를 가르치는 교사였던 시인은 이즈막에 민족의 정체성을 외면하지 않는 국제인을 양성하기 위한 일에 나섰다. 병중에도 코리아국제학원장 겸 이사장을 맡았다.
이카이노에서 시작된 그의 일본 생활은 '재일(在日)'이란 존재를 끊임없이 묻는 과정이었다. 일본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조선어를 가르치는 교사였던 시인은 이즈막에 민족의 정체성을 외면하지 않는 국제인을 양성하기 위한 일에 나섰다. 병중에도 코리아국제학원장 겸 이사장을 맡았다.
코리아국제학원은 총련과 민단이 각각 운영해온 민족학교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뜻에서 시작됐다. 지난 4월 1일 임시 건물을 빌려 개교했고 8월 30일에는 오사카에 교사를 짓고 준공식을 가졌다.
"재일동포들은 한국적이나 조선적 등으로 나뉘면서도 한 곳에서 같이 살아간다. 차이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알아가고 있다. 이때문에 재일동포들은 통일을 선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재일'의 전망이 있고 한반도의 미래가 있다. 코리아국제학원에서는 북이니 남이니 따지지 않고 동아시아적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교육하게 될 것이다. 경계를 넘어 세계와 만나는 월경인(越境人)이 필요한 시대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혹한 시기에 도망쳐온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나"
2000년에야 체험 공개…최근 학술지에 4·3 연작시
"어제까지 죽으로 끼니를 대신했다"는 시인은 한국 소주에 뜨거운 물을 타서 몇모금 들이킬 뿐 젓가락을 거의 들지 않았다. 시인은 지난 봄을 병실에서 보냈다. 지난달 26일 일본 오사카 쓰루하시에서 만난 김시종(79) 시인. 남로당 예비당원이었던 그는 1949년 4·3의 와중에 일본으로 몸을 피했다. 내년이면 일본 생활 60년째. 한국 나이로 스무살이던 시인은 어느덧 여든을 바라보고 있다.
'고국과 일본/ 나 사이에 얽힌/ 거리는 서로 똑같다면 좋겠지// 사모와 견딤/ 사랑이 똑같다면/ 견뎌야만 하는 나라 또한/ 똑같은 거리에 있겠지// 어제의 오늘이 지금이며/ 지금이 고스란히 내일이라면/ 미래도 과거도 지금 이 순간 살아 있다 말할 수 있겠지'('똑같다면')

▲집으로 향하는 김시종시인의 어깨위에 무거운 삶의 짐이 얹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4·3을 말한 것은 2000년의 일이다. 그가 지금까지 내놓은 시집 '지평선', 일본풍토기', '니카타', '이카이노 시집', '광주시편', '화석의 여름'등에도 4·3이 그려진 것은 손에 꼽힌다. '니카타'라는 시집에 실린 'Ⅰ바다 울림 속에서'를 통해 제주섬 자갈 해변에 철사로 손목이 묶여 바다에 던져진 희생자의 시체가 밀려온다는 내용을 쓴 것 정도다. 시인은 그동안 왜 4·3을 쓰지 않았을까.
"낯을 들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서는 게 괴롭다. 참혹한 시기에 도망쳐왔으니까. 끔찍한 죽음을 목격했던 그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잠못 이룬 해가 몇년이나 이어졌는지 모른다."
4·3을 생생히 겪은 이들은 고통을 입밖으로 꺼내길 두려워한다. 발화하는 순간 그 기억은 현재가 된다. 제주출신 재일동포들이 몰려사는 이쿠노구의 공원에서 만난 어느 할머니가 4·3 이야기를 꺼내자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말이다.

▲인터뷰 동안 시인은 다양한 감정을 드러내며 말을 이어갔다.
제 나라에서 조선어 선생을 멸시하며 한글로 '아'자 하나 못썼던 시인은 충격속에 해방을 맞는다. 그로부터 4년뒤 일본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는 식민지 시절의 일본어와 결별하리라 다짐한다. 일본어로 쓰여진 그의 시에 등장하는 시어가 독특한 것은 그같은 싸움의 결과다. 지난 5월 한국에서 처음 출판된 김시종 시선집 '경계의 시' 번역자는 그런 언어를 두고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낯선 어휘와 표현'들이라고 했다.
'아름다운 문장'과는 거리가 먼 이질적인 일본어로 시를 쓰는 일처럼 시인은 자신을 응시하고 성찰하는 일에 물러섬이 없다. 자기 내부를 들여다보는 일은 곧 재일한국인의 삶을 냉정하게 바라본다는 의미다. 시인이 남한에는 반한주의자로, 북에는 변절주의자로 불리며 양쪽에서 기피인물이 된 것은 시인의 엄정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시인은 4·3 60주년에 즈음해 일본의 계간 학술지 '캉(環)'에 권두시로 4·3 연작시를 발표했다. 지난해 겨울호부터 올 여름호까지 실린 '새가 말을 하는 가을(鳥語の秋)', '4월이여, 먼 날이여'(四月よ, 遠い日よ), '여정(旅)'등 3편이다. 그의 시에서 4월은 여전히 잔혹한 달이었다.
'옛날 사랑이 피를 떨어트렸던/ 저 네거리, 저 모퉁이/ 저 웅덩이/ 거기에 있었던 나는 넘칠 정도로 나이를 먹고/ 개나리도 살구도 함께 만발하게 피는 일본에서/ 고집스럽게 살아서,/ 화창한 날은 빛나서/ 4월은 또다시 시계(視界)를 물들이고 돌아간다.'('4월이여, 먼 날이여')

▲김시종시인의 부인이 25년간 운영했던 일본식 선술집. 오사카 문인들의 사랑방이다.

▲시인이 오랫만에 선술집을 찾았다.

▲얼마전 병원생활이후 죽으로 끼니를 때웠던 작가는 뜨거운 물을 탄 한국소주 몇 모금을 들이킬 뿐이었다.
코리아국제학원장 맡은 김시종씨
'거기엔 늘 무언가 넘쳐나/ 넘치지 않으면 시들고 마는/ 일 벌이기 좋아하는 조선 동네./한번 시작했다 하면/ 사흘 낮밤./ 징소리 북소리 요란한 동네./지금도 무당이 날뛰는/ 원색의 동네.'
김시종 시인이 1978년에 낸 '이카이노(猪飼野) 시집'에 실린 '보이지 않는 동네'중 일부다. 옛적 '돼지를 기르는 들판'(이카이노)으로 불렸던 이쿠노(生野)구는 제주출신 재일동포 밀집지다.
시인이 1949년에 무인도인 '관탈섬'에 숨어있다가 밀항선을 타고 일본에 도착한 다음날 찾아간 곳이 이쿠노구 쓰루하시였다. 그곳에 가면 동포가 많다는 얘길 들어서다. 이쿠노에서는 다정한 추억보다 쓰라린 기억이 많다.
"봄철이 되면 동포들이 사는 이곳저곳에서 식게(제사)가 벌어졌다. 평소 웃고 떠들며 지냈던 제주 사람들이지만 그 무렵이 가까워오면 공기가 냉랭해진다. '저 사람 때문에 가족이 죽었져'라며 서로를 원망하기 때문이다. 50~60년대 이카이노에선 종종 그런 풍경을 만났다."

▲이카이노로 불렸던 오사카 이쿠노구에 들어선 시장. 제주출신 재일동포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돌하르방이 세워져있다. /사진=김명선 기자
코리아국제학원은 총련과 민단이 각각 운영해온 민족학교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뜻에서 시작됐다. 지난 4월 1일 임시 건물을 빌려 개교했고 8월 30일에는 오사카에 교사를 짓고 준공식을 가졌다.
"재일동포들은 한국적이나 조선적 등으로 나뉘면서도 한 곳에서 같이 살아간다. 차이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알아가고 있다. 이때문에 재일동포들은 통일을 선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재일'의 전망이 있고 한반도의 미래가 있다. 코리아국제학원에서는 북이니 남이니 따지지 않고 동아시아적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교육하게 될 것이다. 경계를 넘어 세계와 만나는 월경인(越境人)이 필요한 시대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00:00

[4·3문학의 현장](32)연재를 마치며
- 00:00

[4·3문학의 현장](31)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2
- 00:00

[4·3문학의 현장](30)김석범의 '까마귀의 죽음'-1
- 00:00

[4·3문학의 현장](29)김길호의 '이쿠노 아리랑'
- 00:00

[4·3문학의 현장](28)김시종의 '이카이노 시집'
- 00:00

[4·3문학의 현장](27)한림화의 '한라산의 노을'-2
- 00:00

[4·3문학의 현장](26)한림화의 '한라산의 노을'-1
- 00:00

[4·3문학의 현장](25)허영선의 '무명천 할머니'
- 00:00

[4·3문학의 현장](24)고시홍의 '도마칼'
- 00:00

[4·3문학의 현장](23)김석교의 '숨부기꽃'















 2026.02.07(토) 05:51
2026.02.07(토) 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