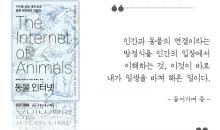[제주섬 박물관 순례Ⅱ](12)이중섭미술관
피난지에서 서귀포의 환상을 빚다
- 입력 : 2009. 06.11(목) 00:00
- 진선희 기자 jin@hallailbo.co.kr

▲1950년대 서귀포를 거쳐간 화가 이중섭이 살던 초가 너머로 이중섭미술관이 보인다. 지난해 7만여명이 미술관을 찾았다. /사진=김명선기자
1951년 제주로 피난 1년 가량 머물렀던 화가 이중섭
짧은 인연이 낳은 미술관… 문화도시 서귀포의 자산
 1950년. 그의 나이 서른다섯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전 가장인 형이 행방불명된다. 원산에 살던 그는 12월초 부인과 두 아들, 조카를 데리고 전쟁을 피해 부산에 다다른다. 범일동의 창고에 수용되었던 그는 부두에서 짐을 부리는 일에 종사하기도 했다.
1950년. 그의 나이 서른다섯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전 가장인 형이 행방불명된다. 원산에 살던 그는 12월초 부인과 두 아들, 조카를 데리고 전쟁을 피해 부산에 다다른다. 범일동의 창고에 수용되었던 그는 부두에서 짐을 부리는 일에 종사하기도 했다.
이듬해 1월초 그는 가족과 수용소에서 나와 제주도로 향한다. 부산에서 제주까지 배편을 제공해준 선주가 사는 곳이 서귀포였다. 선주의 집에서 두 달간 살았던 그는 서귀포에서 만난 또다른 이웃의 집으로 옮긴다. 피난민에게 주는 배급과 고구마로 허기를 때웠고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게를 잡아 반찬으로 먹었다. '서귀포의 환상', '섶섬이 보이는 풍경'은 이때 그린 것으로 알려져있다. 12월, 그는 서귀포를 떠나 다시 부산으로 간다.
누구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이중섭이다. 이즈음 '가짜 그림'으로 그의 이름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이중섭은 한국사람들이 사랑하는 화가로 손에 꼽힌다.
 서귀포에 그가 머문 것은 1년 안팎. 짧으면 짧은 기간이지만 어느 평자는 이중섭이 이 무렵 서귀포에서 유토피아를 품었다고 했다. 아마 그럴 것이다. 불우한 생을 이어가다 마흔하나의 나이로 세상을 뜬 그다. 곤궁한 삶은 여전했지만 피난지 서귀포엔 가족이 곁에 있었다.
서귀포에 그가 머문 것은 1년 안팎. 짧으면 짧은 기간이지만 어느 평자는 이중섭이 이 무렵 서귀포에서 유토피아를 품었다고 했다. 아마 그럴 것이다. 불우한 생을 이어가다 마흔하나의 나이로 세상을 뜬 그다. 곤궁한 삶은 여전했지만 피난지 서귀포엔 가족이 곁에 있었다.
제주와 그의 인연은 서귀포시 서귀동에 이중섭미술관을 낳았다. 1996년 3월 이중섭거리를 명명한 게 먼저였다. 1997년 이중섭이 살던 납작한 초가가 복원됐다. 1998년부터는 이중섭예술제가 막을 올렸다.
2002년 개관한 이중섭전시관은 이듬해 미술관으로 등록한다. 지난 한해 7만여명이 미술관을 다녀갔다.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관람객의 80% 가량은 다른 지역에서 온다. 키가 180㎝가 넘었다는 이중섭이 한평 남짓한 방에 살면서도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때를 보낸 나날을 떠올리며 관람객들은 상념에 빠진다. 손바닥만한 은박지 그림을 오래도록 눈에 담고 간다. 이중섭이라는 '브랜드'를 일찍이 선점한 서귀포는 미술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이중섭 거주지를 끼고 있는 미술관은 지금 서귀포 문화의 거점이 되고 있다. 이중섭미술관처럼 공립으로 운영되는 소암기념관, 기당미술관이 인근에 있는데다 이중섭거리엔 창작스튜디오가 만들어졌다. 갤러리카페 미루나무 같은 사설 문화공간이 들어섰고, 갤러리 하루는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에 이중섭미술관 야외전시장에서 서귀포예술벼룩시장을 연다. 섶섬, 문섬, 새섬이 눈에 걸리는 미술관은 이중섭의 그림처럼 문화도시 서귀포의 환상을 그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 문화자원을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달렸다.
이중섭 거주지를 끼고 있는 미술관은 지금 서귀포 문화의 거점이 되고 있다. 이중섭미술관처럼 공립으로 운영되는 소암기념관, 기당미술관이 인근에 있는데다 이중섭거리엔 창작스튜디오가 만들어졌다. 갤러리카페 미루나무 같은 사설 문화공간이 들어섰고, 갤러리 하루는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에 이중섭미술관 야외전시장에서 서귀포예술벼룩시장을 연다. 섶섬, 문섬, 새섬이 눈에 걸리는 미술관은 이중섭의 그림처럼 문화도시 서귀포의 환상을 그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 문화자원을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달렸다.
하지만 소장자료 130여점 중에서 이중섭 원화는 '파란 게와 어린이', '파도와 물고기', '가족'등 9점에 그친다. 개관 무렵부터 이중섭 그림이 없어 애를 태웠던 미술관은 지금도 소장품 확보가 과제다. 특정 화랑에만 기댈 게 아니라 서귀포 사람들의 힘으로 미술관의 청사진을 그려가야 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www.seogwipo.go.kr/JSLee. 733-3555.


짧은 인연이 낳은 미술관… 문화도시 서귀포의 자산

이듬해 1월초 그는 가족과 수용소에서 나와 제주도로 향한다. 부산에서 제주까지 배편을 제공해준 선주가 사는 곳이 서귀포였다. 선주의 집에서 두 달간 살았던 그는 서귀포에서 만난 또다른 이웃의 집으로 옮긴다. 피난민에게 주는 배급과 고구마로 허기를 때웠고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게를 잡아 반찬으로 먹었다. '서귀포의 환상', '섶섬이 보이는 풍경'은 이때 그린 것으로 알려져있다. 12월, 그는 서귀포를 떠나 다시 부산으로 간다.
누구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이중섭이다. 이즈음 '가짜 그림'으로 그의 이름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이중섭은 한국사람들이 사랑하는 화가로 손에 꼽힌다.

제주와 그의 인연은 서귀포시 서귀동에 이중섭미술관을 낳았다. 1996년 3월 이중섭거리를 명명한 게 먼저였다. 1997년 이중섭이 살던 납작한 초가가 복원됐다. 1998년부터는 이중섭예술제가 막을 올렸다.
2002년 개관한 이중섭전시관은 이듬해 미술관으로 등록한다. 지난 한해 7만여명이 미술관을 다녀갔다.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관람객의 80% 가량은 다른 지역에서 온다. 키가 180㎝가 넘었다는 이중섭이 한평 남짓한 방에 살면서도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때를 보낸 나날을 떠올리며 관람객들은 상념에 빠진다. 손바닥만한 은박지 그림을 오래도록 눈에 담고 간다. 이중섭이라는 '브랜드'를 일찍이 선점한 서귀포는 미술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소장자료 130여점 중에서 이중섭 원화는 '파란 게와 어린이', '파도와 물고기', '가족'등 9점에 그친다. 개관 무렵부터 이중섭 그림이 없어 애를 태웠던 미술관은 지금도 소장품 확보가 과제다. 특정 화랑에만 기댈 게 아니라 서귀포 사람들의 힘으로 미술관의 청사진을 그려가야 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www.seogwipo.go.kr/JSLee. 733-3555.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제주영어교육도시 FSAA 국제학교 건축 허가 승인
- 2

'비공개 오찬' 오영훈 지사 음식값 1인당 3만원 초과
- 3

제주행 항공기 탑승 50대 착륙 후 의식 잃고 쓰러져 사망
- 4

찬 바람 매서운 제주지방 산지 최고 15㎝ 폭설 쏟아진다
- 5

읍면동 예산 최대 40% '싹둑'… "이래 놓고 '민생 예산'?"
- 6

다음달 토트넘 합류하는 양민혁 제주 외가 찾는다
- 7

제주시 아라2동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들어선다
- 8

제주도청 주변 삼다공원·녹지공간 묶어 '도민의 숲' 조성
- 9

"인구 더 많은데 예산은?"… 행정시 예산 놓고 의원 '설전'
- 10

'아우성'에도 제주 차고지증명제 폐지-유지 입장차 '팽팽'















 2024.11.28(목) 20:36
2024.11.28(목)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