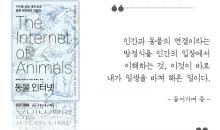[하루를 시작하며] 선무당 생사람 잡듯
- 입력 : 2015. 06.10(수) 00:00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지지난해 이맘때 쯤, 다리 좀 다친 걸 심상케 여겼다가 독이 번진 것이다.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갔더니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진단이었다. 청천병력이었지만 잘라내야 살 수 있다는데, 어쩔 것인가?
다음날 아침 9시 절단 수술키로 하고, 입원실로 돌아와 온갖 생각에 뒤척일 때 마침 소식을 듣고 달려 온 막내 동생이 "형님! 절대 자르지 맙서!" 강력한 만류와 함께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정형·혈관·신경 3인의 젊은 교수가 함께 정밀진단하고 신속히 진료에 들어갔다. 걱정이 돼서 절단여부를 물었더니 "이 다리를 왜 잘라요?"하였다.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몇 개월 입원치료 끝에 기어이 내 다리로 걸어서 그 병원 문을 당당히 나섰던 것이다. 실로 숨 가쁜 순간이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다리를 잘라야 살 수 있어요." 근엄하게 선언하던 그 의사를 떠올리면, 오싹 소름이 돋는다. 그동안 그 의사의 속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다리가 잘려나갔을까? 한 번 잘리면 영영 끝장인 그 다리를, 도새기 아강발 자르듯 댕강댕강 잘라내서 대체 어쩌자는 건가. 평생 앉은뱅이, 그 원통한 세월을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아직도 의삽네 하고 버텨 앉아, 오는 족족 잘라내고 있을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전율이다. 히포크라테스를 들먹일 것도 없이, 의사는 병신 만드는 면허가 아니지 않은가.
모르면 솔직히 잘 모른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나. 큰 병원에 가보라고 당연히 말해줘야 되지 않겠나. 한 생의 운명 앞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이다.
선무당 생사람 잡듯, 그는 그의 자식, 부모, 형제들에게도 차마 그런 식의 처방을 내고 있을까? 마구잡이 그 눈 먼 칼을 여전히 눈 딱 감고 마구 휘둘러대고 있을까? "저것덜 다 돌팔이우다. 아무것도 몰라마씀." 그때 막내 동생과 같이 왔던 그 친구의 말이 생생하다.
O형, 4월 중순부터 시작한 귤나무 접목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10여명의 남자 접사와 20여명의 여자 기능사가 동원되는 이 일은 육묘사업의 핵심입니다. 혹, 품종이 섞일까봐, 보관 중인 접수 중 상한 것이 나올까봐, 한시도 자리를 뜨지 못 하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품종이 섞이면, 없는 것만 못하고, 불량접수의 접목은 안 함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묘목굴채와 겹치는 날이 많아 매우 힘들지만, 결코 힘들다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지요.
내내 계속되는 경황없는 날들…. 그래도, 눈 오는 날 석파시선암(石播詩禪庵)에 심은 나무의 왕벚꽃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 오면, 새섬과 삼매봉의 새벽바다도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렴요, 그때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를 생각하면, 이게 어딥니까. 그 암울했던 날들, 허구헌 날 침대에 드러누워 실픈 잠을 자고 또 자고, 봤던 TV를 보고 또 보며 온갖 상념에 몸부림치던 그 날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훨훨 나는 기분입니다. 이쯤사 못 견디랴 싶은 거지요. 아무리 지쳐도 잠들기 전 섀도복싱(혼자 하는 복싱연습) 3라운드는 거르지 않습니다. 마음은, 언제라도 다시 링에 오를 채비를 합니다. 건강의 중요성에 입술 깨무는 것이지요.
O형,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각종 모임이나 경조사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O형, 세월에 핑계가 하도 많아, 미안하고 미안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강문신 시인>
다음날 아침 9시 절단 수술키로 하고, 입원실로 돌아와 온갖 생각에 뒤척일 때 마침 소식을 듣고 달려 온 막내 동생이 "형님! 절대 자르지 맙서!" 강력한 만류와 함께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정형·혈관·신경 3인의 젊은 교수가 함께 정밀진단하고 신속히 진료에 들어갔다. 걱정이 돼서 절단여부를 물었더니 "이 다리를 왜 잘라요?"하였다.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몇 개월 입원치료 끝에 기어이 내 다리로 걸어서 그 병원 문을 당당히 나섰던 것이다. 실로 숨 가쁜 순간이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다리를 잘라야 살 수 있어요." 근엄하게 선언하던 그 의사를 떠올리면, 오싹 소름이 돋는다. 그동안 그 의사의 속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다리가 잘려나갔을까? 한 번 잘리면 영영 끝장인 그 다리를, 도새기 아강발 자르듯 댕강댕강 잘라내서 대체 어쩌자는 건가. 평생 앉은뱅이, 그 원통한 세월을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아직도 의삽네 하고 버텨 앉아, 오는 족족 잘라내고 있을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전율이다. 히포크라테스를 들먹일 것도 없이, 의사는 병신 만드는 면허가 아니지 않은가.
모르면 솔직히 잘 모른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나. 큰 병원에 가보라고 당연히 말해줘야 되지 않겠나. 한 생의 운명 앞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이다.
선무당 생사람 잡듯, 그는 그의 자식, 부모, 형제들에게도 차마 그런 식의 처방을 내고 있을까? 마구잡이 그 눈 먼 칼을 여전히 눈 딱 감고 마구 휘둘러대고 있을까? "저것덜 다 돌팔이우다. 아무것도 몰라마씀." 그때 막내 동생과 같이 왔던 그 친구의 말이 생생하다.
O형, 4월 중순부터 시작한 귤나무 접목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10여명의 남자 접사와 20여명의 여자 기능사가 동원되는 이 일은 육묘사업의 핵심입니다. 혹, 품종이 섞일까봐, 보관 중인 접수 중 상한 것이 나올까봐, 한시도 자리를 뜨지 못 하는 긴장의 연속입니다. 품종이 섞이면, 없는 것만 못하고, 불량접수의 접목은 안 함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묘목굴채와 겹치는 날이 많아 매우 힘들지만, 결코 힘들다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지요.
내내 계속되는 경황없는 날들…. 그래도, 눈 오는 날 석파시선암(石播詩禪庵)에 심은 나무의 왕벚꽃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 오면, 새섬과 삼매봉의 새벽바다도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렴요, 그때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를 생각하면, 이게 어딥니까. 그 암울했던 날들, 허구헌 날 침대에 드러누워 실픈 잠을 자고 또 자고, 봤던 TV를 보고 또 보며 온갖 상념에 몸부림치던 그 날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훨훨 나는 기분입니다. 이쯤사 못 견디랴 싶은 거지요. 아무리 지쳐도 잠들기 전 섀도복싱(혼자 하는 복싱연습) 3라운드는 거르지 않습니다. 마음은, 언제라도 다시 링에 오를 채비를 합니다. 건강의 중요성에 입술 깨무는 것이지요.
O형,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각종 모임이나 경조사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O형, 세월에 핑계가 하도 많아, 미안하고 미안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강문신 시인>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제주영어교육도시 FSAA 국제학교 건축 허가 승인
- 2

'비공개 오찬' 오영훈 지사 음식값 1인당 3만원 초과
- 3

다음달 토트넘 합류하는 양민혁 제주 외가 찾는다
- 4

제주행 항공기 탑승 50대 착륙 후 의식 잃고 쓰러져 사망
- 5

읍면동 예산 최대 40% '싹둑'… "이래 놓고 '민생 예산'?"
- 6

찬 바람 매서운 제주지방 산지 최고 15㎝ 폭설 쏟아진다
- 7

제주시 아라2동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들어선다
- 8

제주도청 주변 삼다공원·녹지공간 묶어 '도민의 숲' 조성
- 9

"인구 더 많은데 예산은?"… 행정시 예산 놓고 의원 '설전'
- 10

'매각 무산' 927억 제주 주상복합용지 매매가 재산정 논란















 2024.11.29(금) 13:13
2024.11.29(금)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