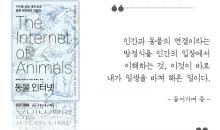[한국 해녀를 말하다](12)일본 오사카 출향제주해녀들
외롭고 원통한 세월 이겨내며 살아온 역사의 증인
- 입력 : 2017. 10.25(수) 2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왼쪽부터 원순덕·김순녀·안춘하·양애순·이순덕·문태현씨. 강경민기자
마지막 머구리 원순덕씨 죽을 고비만 10번 넘겨
밀항 적발 관리청에 잡혀 우여곡절 끝 대마도행
고향 그리며 이국땅에서 망향가로 외로움 달래
일본 오사카. 한국전쟁 직후에 일본으로 건너온 많은 제주 출향해녀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가 고향인 원순덕(79) 할머니. 20살에 고향을 떠나 일본 대마도로 건너와 잠수기(머구리)일을 하면서 한평생을 보냈다. 조천리에 있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7살 때부터 물질을 하다가 20살이 되던 해인 1958년 어머니가 살고 있는 대마도로 왔다.
그녀가 대마도에 도착한 당시에는 제주해녀 100여명이 대마도에 살면서 물질을 했다고 기억했다. "옛날부터 대마도는 가까운 거리였다. 한국에서 대마도까지 노를 저어서 왔다. 제주사람들이 대마도로 밀항을 온 후 동경과 오사카, 고베로 갔다"고 했다.
그녀도 밀항했다. 밀항이 적발돼 오랫동안 관리청에 잡혀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 등의 도움으로 어머니를 만나 대마도로 갔다.
"그때는 밀항을 신고하면 한사람당 3000원씩을 주었다. 누가 우리를 신고하는 바람에 일본 순사에 잡혔다. 이후 관리청에 잡혀 있는데 어느날 민단에서 얼굴도 모르는 남자어른이 찾아와 나를 데리고 나와서 생전 모르는 사람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 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여기서 같이 살면서 밥을 해달라고 했다. 나는 어머니를 만나러 일본에 온 것이지 밥을 해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다. 갈곳이 없어 며칠간 그 집에서 살다가 몰래 빠져 나와 민단을 찾아가 어머니에게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후 여관에서 살다가 우연히 어머니를 아는 제주사람을 만나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고 대마도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그녀는 어머니와 같이 대마도에서 물질하다가 남편을 만나 24살에 결혼을 했다. 그녀는 테왁을 이용하는 물질이 아닌 머구리일을 했다. 머구리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에어콤프레샤에서 호스로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전복 등 해산물을 채취했다.
 당시 일본 해녀들은 아랫도리에 훈도시 하나만 걸치고 테왁도 없이 물질을 했다고 했다. 일본 해녀들은 한번 물에 들어가서 나오면 배를 잡고 올라와서 불을 쬐고 서너번 물속을 들락날락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고 기억했다.
당시 일본 해녀들은 아랫도리에 훈도시 하나만 걸치고 테왁도 없이 물질을 했다고 했다. 일본 해녀들은 한번 물에 들어가서 나오면 배를 잡고 올라와서 불을 쬐고 서너번 물속을 들락날락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고 기억했다.
머구리 잠수는 두 사람이 교대로 했지만 힘들고 위험한 작업에 비해 소득은 그다지 신통치 않았다. "초창기에는 1년에 10만원 정도 벌었다. 당시 날전복은 1관(3.75㎏) 700원, 고등어는 1관 30원했다"고 했다. 그 시절 그녀는 "보리밥에 다른사람 밭에 있는 감자잎과 콩잎, 내가 잡은 북바리 등 고기를 반찬으로 해서 먹었다. 선주가 주는 돼지고기는 소금에 절여 두었다 먹었다"고 회고했다.
대마도 머구리 작업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만 했다. 현재처럼 잠수복을 입고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소중이와 적삼만을 입고 작업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추워서 작업이 불가능했다. "겨울에는 아무일도 안하고 놀았다. 이곳에 온 제주해녀들은 겨울에도 가끔씩 테왁을 이용해 물질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대마도에서 48세까지 머구리일을 하다가 오사카로 나와 집을 사고 잠시 장사를 하다가 다시 대마도로 돌아가 6년 동안 남편과 함께 머구리일을 했다. 이후 대마도에서 나와 미에현에 가서 머구리 작업을 하는 등 62세까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머구리일만 했다.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밖으로 나올때는 감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나와야 하는데 감압을 못해서 대마도에서만 4명이 죽었다"며 "나도 공기호스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열번도 넘게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회상했다.
대마도 마지막 머구리 잠수부인 그녀는 일본 사람과 공동투자해 미에현에 있는 바다를 샀지만 해산물이 없어 돈만 날리기도 했다.
"대마도 바다에는 전복이 널려 있었는데 150만원을 투자해서 산 미에현 바다는 깊은데 갈수록 물건(해산물)이 없는 바다였다. 생복이 하나 없는 그런 바다는 처음 보았다. 한 두해 논 바다라고 해서 기대를 해서 샀는데 결국 돈만 날렸다"고 했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평생물질을 해 온 인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물질을 안 배웠으면 여기 오사카에 살면서 좋은 세상도 봤을 거고 나쁜 일도 경험을 했을 것이다. 여기와서 물질을 배운 것이 참으로 외롭고 원통하다"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오사카 코리아타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표선리 출신인 출향해녀 이순덕(63)씨는 지난 2002년 일본에 물질을 왔다가 오사카에 정착했다. 이씨는 "오사카에서 미에현을 왔다갔다 하면서 물질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 남편이 아파서 돈도 벌고 간호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물질을 더 이상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 역시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다. "당시 비자가 15일인데 일본에 오면 하루종일 물질만 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울며 물질을 했다"고 회상했다.
"비자기간을 넘긴 사람은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불법 체류를 했다. 당시 한달에 한국돈으로 200만원을 벌었다. 14일 물질을 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1000만원도 벌기도 했다"고 했다.
오사카에 거주하는 문태현(75) 할아버지는 제주해녀 1세대를 이렇게 기억했다. "해녀 1세대 어르신들은 고생을 많이 했다. 미에현 등에 가서 반년을 물질하고 돌아와서 오사카에 살다가 다시 가서 물질을 했다. 여기에 온 제주출향해녀들은 김치와 멸치만 먹으면서 어렵게 생활을 했다. 당시에 일본 해녀도 있었지만 제주도 해녀처럼 잘하지 못했다"고 했다.
오사카에서 한국 식당(먹자)을 운영하는 출향해녀 김순녀씨는 지금도 고향 제주를 생각하면서 양애순(62·대평리)·안춘하(83·김녕리)씨와 같이 와카야마 등에 가서 운동삼아 소라와 전복을 따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 살고 있는 제주 출향해녀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 물질을 그만두고 망향가를 부르고 있다. 일본 제주해녀의 역사는 굴곡 많은 암울한 시대의 거친 파도를 헤치며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살아온 아픈 역사이다. 우리 후손들이 이들을 소중하게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특별취재팀=고대로 부장, 강경민 차장, 김희동천·강동민 기자
밀항 적발 관리청에 잡혀 우여곡절 끝 대마도행
고향 그리며 이국땅에서 망향가로 외로움 달래
일본 오사카. 한국전쟁 직후에 일본으로 건너온 많은 제주 출향해녀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가 고향인 원순덕(79) 할머니. 20살에 고향을 떠나 일본 대마도로 건너와 잠수기(머구리)일을 하면서 한평생을 보냈다. 조천리에 있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7살 때부터 물질을 하다가 20살이 되던 해인 1958년 어머니가 살고 있는 대마도로 왔다.
그녀가 대마도에 도착한 당시에는 제주해녀 100여명이 대마도에 살면서 물질을 했다고 기억했다. "옛날부터 대마도는 가까운 거리였다. 한국에서 대마도까지 노를 저어서 왔다. 제주사람들이 대마도로 밀항을 온 후 동경과 오사카, 고베로 갔다"고 했다.
그녀도 밀항했다. 밀항이 적발돼 오랫동안 관리청에 잡혀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 등의 도움으로 어머니를 만나 대마도로 갔다.
"그때는 밀항을 신고하면 한사람당 3000원씩을 주었다. 누가 우리를 신고하는 바람에 일본 순사에 잡혔다. 이후 관리청에 잡혀 있는데 어느날 민단에서 얼굴도 모르는 남자어른이 찾아와 나를 데리고 나와서 생전 모르는 사람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 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여기서 같이 살면서 밥을 해달라고 했다. 나는 어머니를 만나러 일본에 온 것이지 밥을 해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다. 갈곳이 없어 며칠간 그 집에서 살다가 몰래 빠져 나와 민단을 찾아가 어머니에게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후 여관에서 살다가 우연히 어머니를 아는 제주사람을 만나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고 대마도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그녀는 어머니와 같이 대마도에서 물질하다가 남편을 만나 24살에 결혼을 했다. 그녀는 테왁을 이용하는 물질이 아닌 머구리일을 했다. 머구리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에어콤프레샤에서 호스로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전복 등 해산물을 채취했다.

일본 오사카 코리아타운.
머구리 잠수는 두 사람이 교대로 했지만 힘들고 위험한 작업에 비해 소득은 그다지 신통치 않았다. "초창기에는 1년에 10만원 정도 벌었다. 당시 날전복은 1관(3.75㎏) 700원, 고등어는 1관 30원했다"고 했다. 그 시절 그녀는 "보리밥에 다른사람 밭에 있는 감자잎과 콩잎, 내가 잡은 북바리 등 고기를 반찬으로 해서 먹었다. 선주가 주는 돼지고기는 소금에 절여 두었다 먹었다"고 회고했다.
대마도 머구리 작업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만 했다. 현재처럼 잠수복을 입고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소중이와 적삼만을 입고 작업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추워서 작업이 불가능했다. "겨울에는 아무일도 안하고 놀았다. 이곳에 온 제주해녀들은 겨울에도 가끔씩 테왁을 이용해 물질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대마도에서 48세까지 머구리일을 하다가 오사카로 나와 집을 사고 잠시 장사를 하다가 다시 대마도로 돌아가 6년 동안 남편과 함께 머구리일을 했다. 이후 대마도에서 나와 미에현에 가서 머구리 작업을 하는 등 62세까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머구리일만 했다.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밖으로 나올때는 감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나와야 하는데 감압을 못해서 대마도에서만 4명이 죽었다"며 "나도 공기호스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열번도 넘게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회상했다.
대마도 마지막 머구리 잠수부인 그녀는 일본 사람과 공동투자해 미에현에 있는 바다를 샀지만 해산물이 없어 돈만 날리기도 했다.
"대마도 바다에는 전복이 널려 있었는데 150만원을 투자해서 산 미에현 바다는 깊은데 갈수록 물건(해산물)이 없는 바다였다. 생복이 하나 없는 그런 바다는 처음 보았다. 한 두해 논 바다라고 해서 기대를 해서 샀는데 결국 돈만 날렸다"고 했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평생물질을 해 온 인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물질을 안 배웠으면 여기 오사카에 살면서 좋은 세상도 봤을 거고 나쁜 일도 경험을 했을 것이다. 여기와서 물질을 배운 것이 참으로 외롭고 원통하다"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오사카 코리아타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표선리 출신인 출향해녀 이순덕(63)씨는 지난 2002년 일본에 물질을 왔다가 오사카에 정착했다. 이씨는 "오사카에서 미에현을 왔다갔다 하면서 물질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 남편이 아파서 돈도 벌고 간호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물질을 더 이상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 역시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다. "당시 비자가 15일인데 일본에 오면 하루종일 물질만 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울며 물질을 했다"고 회상했다.
"비자기간을 넘긴 사람은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불법 체류를 했다. 당시 한달에 한국돈으로 200만원을 벌었다. 14일 물질을 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1000만원도 벌기도 했다"고 했다.
오사카에 거주하는 문태현(75) 할아버지는 제주해녀 1세대를 이렇게 기억했다. "해녀 1세대 어르신들은 고생을 많이 했다. 미에현 등에 가서 반년을 물질하고 돌아와서 오사카에 살다가 다시 가서 물질을 했다. 여기에 온 제주출향해녀들은 김치와 멸치만 먹으면서 어렵게 생활을 했다. 당시에 일본 해녀도 있었지만 제주도 해녀처럼 잘하지 못했다"고 했다.
오사카에서 한국 식당(먹자)을 운영하는 출향해녀 김순녀씨는 지금도 고향 제주를 생각하면서 양애순(62·대평리)·안춘하(83·김녕리)씨와 같이 와카야마 등에 가서 운동삼아 소라와 전복을 따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 살고 있는 제주 출향해녀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 물질을 그만두고 망향가를 부르고 있다. 일본 제주해녀의 역사는 굴곡 많은 암울한 시대의 거친 파도를 헤치며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살아온 아픈 역사이다. 우리 후손들이 이들을 소중하게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특별취재팀=고대로 부장, 강경민 차장, 김희동천·강동민 기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제주영어교육도시 FSAA 국제학교 건축 허가 승인
- 2

다음달 토트넘 합류하는 양민혁 제주 외가 찾는다
- 3

'비공개 오찬' 오영훈 지사 음식값 1인당 3만원 초과
- 4

읍면동 예산 최대 40% '싹둑'… "이래 놓고 '민생 예산'?"
- 5

제주행 항공기 탑승 50대 착륙 후 의식 잃고 쓰러져 사망
- 6

"인구 더 많은데 예산은?"… 행정시 예산 놓고 의원 '설전'
- 7

제주시 아라2동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들어선다
- 8

'매각 무산' 927억 제주 주상복합용지 매매가 재산정 논란
- 9

제주도청 주변 삼다공원·녹지공간 묶어 '도민의 숲' 조성
- 10

'아우성'에도 제주 차고지증명제 폐지-유지 입장차 '팽팽'
- 04:00

[2024 독도 제주 출향해녀 세미나] "독도 출향 해…
- 04:00

"독도 수호 제주해녀들 공로 국가차원 인정받기 …
- 00:00

[독도 출항해녀/기억의 기록] (10)에필로그
- 00:00

[독도 출항해녀/기억의 기록] (9)일본 오키섬으로…
- 00:00

[독도 출항해녀/기억의 기록] (8)일본 시마네현 …
- 00:00

[독도 출항해녀/기억의 기록] (7)독도 어장
- 00:00

[독도 출항해녀/ 기억의 기록] (6)울릉도 마지막 …
- 00:00

[독도 출향해녀/ 기억의 기록] (5)제주 해녀 삶 이…
- 00:00

[독도 출향해녀/ 기억의 기록] (4)다시 찾은 울릉…
- 00:00

[독도 출향해녀/ 기억의 기록] (3)독도 수호 '주체…















 2024.11.30(토) 09:47
2024.11.30(토)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