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세상] 구순 나이로 바라본 일상, 詩로 말하다
'섬 시인' 이생진의 시집 '무연고'
- 입력 : 2018. 11.23(금) 00:00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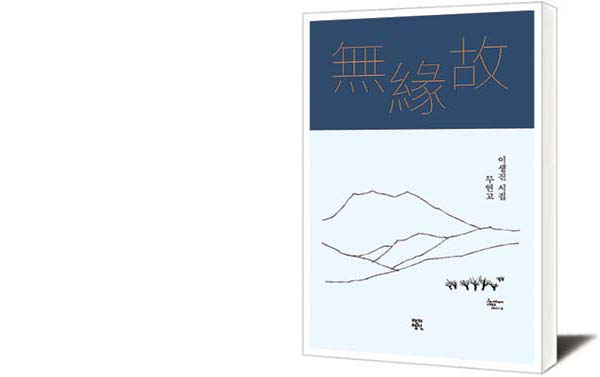
38번째 시집 왕성한 집필
자신의 삶 일기로 풀어내
자서전 같은 '시와 살다'
"젊어서 섬으로 돌아다닌 탓에/팔과 얼굴이 검버섯 숲이다."('병과 나'에서)
바다를 빼면 말할 수 없는 시인, 이생진. 시집 '그리운 바다 성산포'와 '먼 섬에 가고 싶다' 등으로 알려진 '섬 시인' 이생진(89)이 시집 '무연고'를 냈다. 지난해 10월 '맹골도' 이후 1년 만에 낸 신작으로, 첫 시집 '산토끼'를 시작으로 통산 38번째다.
우리나라 섬 3000여 개 가운데 1000곳 이상을 발품팔아 다닌 시인이다. 때문에 그동안 그의 시는 주로 섬과 바다로 가득찼다. 이번엔 조금 다르다. 신작 '무연고'는 구순을 맞아 자신의 삶과 일상을 기록한 일기에 가깝다. 지난해 아내를 보낸 외로움과 노쇠한 몸으로 겪는 어려움, 그리고 슬픔을 담담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그의 시는 바다 위에 홀로 남겨진 섬처럼 쓸쓸하다. 때로는 황금찬(1918∼2018) 등 먼저 떠난 선배나 동료 시인들을 그리워하거나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보며 동병상련을 느끼는 시구도 여럿 있다. 그러면서도 시인은 섬처럼 꼿꼿하게 바다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시를 쓰고 생(生)의 의지를 다잡는다.
90이 되어 "인생 풀코스를 뛴 기분"이라는 시인은 신문을 읽고, 산책하고, 세끼 밥을 먹고, 서점을 가고, 시를 쓴다. 그것이 곧 일상이다. 그는 '가다가'의 작품에서 "하늘은 맑고/구름은 가볍고/바위는 무겁고/소나무는 푸르고/나는 늙었지만 심장은 따뜻해서/아직도 내게 안기는 시가 따뜻하다"고 말한다.
시인은 그동안 펴낸 시집과 시선집, 산문집 등의 서문을 모은 서문집 '시와 살다'를 함께 내놨다. 앞서 1997년 출간한 첫 산문집 '아무도 섬에 오라고 하지 않았다'를 다듬고 그동안 책으로 묶이지 않은 산문 원고를 더해 개정증보판도 새로 썼다.
섬을 떠돌며 시를 써온 시인은 서문집에서 자신의 시를 '발로 쓴 시'라고 말한다. 책상머리에 앉아 쓰는 시보다는 걸어 다니며 쓰는 시가 더 시답다는 것이다. 그래서 '발로 쓴 시'는 지금 읽어 보아도 그 실감이 난다고 한다. 평생 쓴 일기와 화첩, 메모지를 빠짐없이 간직하고 있을 만큼 시인은 기록하는 습관은 뇌신경을 깨우는 값진 보물이라고 한다. '시와 살다'는 자서전과 같은 작품이다.
6·25 전쟁 당시 제주도 육군 제1훈련소에서 3년간 복무하며 시작된 제주와의 인연. 시인은 그 인연을 여덟 번째 시집 '그리운 바다 성산포'로 노래했고, 성산포 오정개 해안에 '그리운 바다 성산포' 시비공원 건립으로 이어졌다. 제주를 자신의 고향이라 말하는 이생진. 시인은 제주도라는 섬에 와서, 매일 해가 뜨는 성산포라는 곳에서 섬사람들과 부대끼며 시의 열정을 지펴왔다. 작가정신. '무연고' 1만1000원, '시와 살다' 1만6000원, '아무도 섬에 오라고 하지 않았다' 1만3000원.
자신의 삶 일기로 풀어내
자서전 같은 '시와 살다'
"젊어서 섬으로 돌아다닌 탓에/팔과 얼굴이 검버섯 숲이다."('병과 나'에서)
바다를 빼면 말할 수 없는 시인, 이생진. 시집 '그리운 바다 성산포'와 '먼 섬에 가고 싶다' 등으로 알려진 '섬 시인' 이생진(89)이 시집 '무연고'를 냈다. 지난해 10월 '맹골도' 이후 1년 만에 낸 신작으로, 첫 시집 '산토끼'를 시작으로 통산 38번째다.
우리나라 섬 3000여 개 가운데 1000곳 이상을 발품팔아 다닌 시인이다. 때문에 그동안 그의 시는 주로 섬과 바다로 가득찼다. 이번엔 조금 다르다. 신작 '무연고'는 구순을 맞아 자신의 삶과 일상을 기록한 일기에 가깝다. 지난해 아내를 보낸 외로움과 노쇠한 몸으로 겪는 어려움, 그리고 슬픔을 담담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그의 시는 바다 위에 홀로 남겨진 섬처럼 쓸쓸하다. 때로는 황금찬(1918∼2018) 등 먼저 떠난 선배나 동료 시인들을 그리워하거나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보며 동병상련을 느끼는 시구도 여럿 있다. 그러면서도 시인은 섬처럼 꼿꼿하게 바다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시를 쓰고 생(生)의 의지를 다잡는다.
90이 되어 "인생 풀코스를 뛴 기분"이라는 시인은 신문을 읽고, 산책하고, 세끼 밥을 먹고, 서점을 가고, 시를 쓴다. 그것이 곧 일상이다. 그는 '가다가'의 작품에서 "하늘은 맑고/구름은 가볍고/바위는 무겁고/소나무는 푸르고/나는 늙었지만 심장은 따뜻해서/아직도 내게 안기는 시가 따뜻하다"고 말한다.
시인은 그동안 펴낸 시집과 시선집, 산문집 등의 서문을 모은 서문집 '시와 살다'를 함께 내놨다. 앞서 1997년 출간한 첫 산문집 '아무도 섬에 오라고 하지 않았다'를 다듬고 그동안 책으로 묶이지 않은 산문 원고를 더해 개정증보판도 새로 썼다.
섬을 떠돌며 시를 써온 시인은 서문집에서 자신의 시를 '발로 쓴 시'라고 말한다. 책상머리에 앉아 쓰는 시보다는 걸어 다니며 쓰는 시가 더 시답다는 것이다. 그래서 '발로 쓴 시'는 지금 읽어 보아도 그 실감이 난다고 한다. 평생 쓴 일기와 화첩, 메모지를 빠짐없이 간직하고 있을 만큼 시인은 기록하는 습관은 뇌신경을 깨우는 값진 보물이라고 한다. '시와 살다'는 자서전과 같은 작품이다.
6·25 전쟁 당시 제주도 육군 제1훈련소에서 3년간 복무하며 시작된 제주와의 인연. 시인은 그 인연을 여덟 번째 시집 '그리운 바다 성산포'로 노래했고, 성산포 오정개 해안에 '그리운 바다 성산포' 시비공원 건립으로 이어졌다. 제주를 자신의 고향이라 말하는 이생진. 시인은 제주도라는 섬에 와서, 매일 해가 뜨는 성산포라는 곳에서 섬사람들과 부대끼며 시의 열정을 지펴왔다. 작가정신. '무연고' 1만1000원, '시와 살다' 1만6000원, '아무도 섬에 오라고 하지 않았다' 1만3000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5:49

[책세상] 예술의 길 걸어온 7인… 예담길 '일곱 …
- 03:30

[새로나온책] 학교에서 만나는 인공지능 이야기 …
- 02:00

[이 책] 무명 청년 시인이 그려낸 ‘밤의 낭만과 …
- 02:00

[책세상] 제주어로 쓴 제주전통음식 이야기… 지…
- 01:00

[새로나온책] 물은 끓고, 영원에 가까워진다 外
- 02:30

[책세상] 시인이 노래한 ‘파리’… 다시 꺼낸 …
- 21:00

[이 책] 전쟁의 상흔 속 살아가게 한 힘… '사랑'…
- 02:00

[새로나온책] 0시의 새 外
- 20:06

[이 책] 38인의 친필편지… 글자마다 '그리운 안…
- 02:00

[책세상] 30여년 낯선 타국서 빚어낸 여정















 2025.12.25(목) 03:28
2025.12.25(목) 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