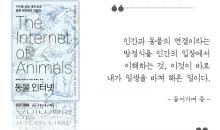[황학주의 제주살이] (65)제주에 종일 내리는 눈
- 입력 : 2022. 12.20(화)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한라일보] 거의 하루 내내 눈이 왔다. 그리고 나는 창가에 앉아 종일 밀린 원고를 썼다. 눈은 이미 간밤에 쌓일 만큼 쌓여 있어서 아침에 눈을 뜨자 마당에 가득했다. 이럴 때 핸드폰을 들고 마당에 나가 눈 사진을 찍는 일은 피할 수 없다. 오른쪽으로 이웃한 말 목장에 말들이 나와 있다. 눈밭을 밟고 큰 움직임 없이 뭉그적거리며 서 있는 말들 위로 눈이 내리고, 나는 연필을 입에 문 채 흰 종이 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시 몇 편을 두고 뭉그적댄다. 나는 수정된 시를 종이에 다시 옮겨 쓴 다음 가능한 시가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씨름하고 있다.
눈은 잠시 멎는 듯 했지만 갑자기 사위(四圍)가 어두워지며 눈보라로 몰아친다. 멀리 보이는 바다 풍경마저 지우고 눈은 시야 가득 눈송이를 뿌려대며 남에서 북으로 지나간다. 말들 또한 눈을 피해 어느새 자리를 옮기고 목장은 텅 빈 하얀 웅덩이처럼 가라앉았다. 마치 거친 무늬를 새기는 누군가가 점토판에 흙을 짓이기는 것처럼 공중은 한 장의 화폭이 되고,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나를 아득한 회상 속으로 밀어넣는다. 그 가운데 내 마음은 똬리를 틀고 무언가 풀어내지 못하는 말을 붙들고 앉아 있다. 그 언어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보여주려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눈이 그치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사유는 궤적의 흔적을 이리저리 남기며 쓰였다 지워지고 다시 쓰인다. 구름 사이로 잠시 햇빛이 들어 창밖의 동백나무 울타리를 비추자 그 틈으로 농부의 집 근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인다. 바람이 바뀌어 연기는 북에서 남으로 흩어져 가고 있다. 그 너머 풍력발전기들이 가늘디가는 선으로 나타나고 흐린 바다가 수평선 위에 하얀 색 대기를 띠처럼 두르며 그 위로 회색 하늘은 구름들을 데리고 무겁다. 점심을 먹고 다시 책상에 앉아 있자니 한바탕 싸락눈이 쏟아지며 뒷마당을 구르고 동백나무 잎사귀를 때리며 보석처럼 굴러떨어지는 것이 꼭 딴 세상 같다. 마치 시 같은 것을 끄적거리고 있는 나에게 얼빠진 수작 마라는 듯이.
그래도 나는 흰 종이에 뭔가를 쓰다 지운다. 알 듯 모를 듯 한 세계와 풍경들의 체험인 이 시간에 나는 내가 미처 모르는 '나'와 마주 앉아 있는 셈인데 모호하지만 알 수 있는 것, 불가사의하지만 분명한 것,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 꾸지나무나 닥나무 속껍질을 끓이고 두들기고 말려서 만든 종이처럼 종이 위에서 내 생각은 들뜨고 찢어지고 다시 이어 붙여진다. 강한 바람에 남쪽으로 쏠린 먼나무와 담팔수의 줄기들이 연못을 가릴 만한 몸체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나무들은 새처럼 바람을 타며 공중에 떠 있다. 제주에서 거의 하루 종일 내리는 눈을 보기란 쉽지 않다. 제주는 그 자체로 참 이색적인 주제이다. <시인>
눈은 잠시 멎는 듯 했지만 갑자기 사위(四圍)가 어두워지며 눈보라로 몰아친다. 멀리 보이는 바다 풍경마저 지우고 눈은 시야 가득 눈송이를 뿌려대며 남에서 북으로 지나간다. 말들 또한 눈을 피해 어느새 자리를 옮기고 목장은 텅 빈 하얀 웅덩이처럼 가라앉았다. 마치 거친 무늬를 새기는 누군가가 점토판에 흙을 짓이기는 것처럼 공중은 한 장의 화폭이 되고,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나를 아득한 회상 속으로 밀어넣는다. 그 가운데 내 마음은 똬리를 틀고 무언가 풀어내지 못하는 말을 붙들고 앉아 있다. 그 언어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보여주려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눈이 그치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사유는 궤적의 흔적을 이리저리 남기며 쓰였다 지워지고 다시 쓰인다. 구름 사이로 잠시 햇빛이 들어 창밖의 동백나무 울타리를 비추자 그 틈으로 농부의 집 근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인다. 바람이 바뀌어 연기는 북에서 남으로 흩어져 가고 있다. 그 너머 풍력발전기들이 가늘디가는 선으로 나타나고 흐린 바다가 수평선 위에 하얀 색 대기를 띠처럼 두르며 그 위로 회색 하늘은 구름들을 데리고 무겁다. 점심을 먹고 다시 책상에 앉아 있자니 한바탕 싸락눈이 쏟아지며 뒷마당을 구르고 동백나무 잎사귀를 때리며 보석처럼 굴러떨어지는 것이 꼭 딴 세상 같다. 마치 시 같은 것을 끄적거리고 있는 나에게 얼빠진 수작 마라는 듯이.
그래도 나는 흰 종이에 뭔가를 쓰다 지운다. 알 듯 모를 듯 한 세계와 풍경들의 체험인 이 시간에 나는 내가 미처 모르는 '나'와 마주 앉아 있는 셈인데 모호하지만 알 수 있는 것, 불가사의하지만 분명한 것,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 꾸지나무나 닥나무 속껍질을 끓이고 두들기고 말려서 만든 종이처럼 종이 위에서 내 생각은 들뜨고 찢어지고 다시 이어 붙여진다. 강한 바람에 남쪽으로 쏠린 먼나무와 담팔수의 줄기들이 연못을 가릴 만한 몸체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나무들은 새처럼 바람을 타며 공중에 떠 있다. 제주에서 거의 하루 종일 내리는 눈을 보기란 쉽지 않다. 제주는 그 자체로 참 이색적인 주제이다. <시인>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다음달 토트넘 합류하는 양민혁 제주 외가 찾는다
- 2

'비공개 오찬' 오영훈 지사 음식값 1인당 3만원 초과
- 3

읍면동 예산 최대 40% '싹둑'… "이래 놓고 '민생 예산'?"
- 4

제주행 항공기 탑승 50대 착륙 후 의식 잃고 쓰러져 사망
- 5

'오등봉 위파크 충격' 제주 10월 미분양 주택 물량 급증
- 6

'매각 무산' 927억 제주 주상복합용지 매매가 재산정 논란
- 7

'아우성'에도 제주 차고지증명제 폐지-유지 입장차 '팽팽'
- 8

조국혁신당, 29일 제주도당 창당대회 개최
- 9

제주드림타워 개관 4주년 도민 1600명에 숙박권 등 제공 이벤…
- 10

'신규 마을기업' 모집 1년만에 재개… 현장 혼란은 불가피















 2024.12.01(일) 18:29
2024.12.01(일)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