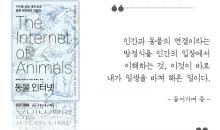[영화觀] 사랑이 하는 말
- 입력 : 2023. 06.09(금) 00:00 수정 : 2023. 06. 12(월) 08:48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영화 '말 없는 소녀'.
[한라일보] 하루가 유독 길다고 느끼는 날이 있다. 해야 할 일도 헤아릴 생각도 많았던 어떤 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쉴 틈 없이 하루의 시간을 채워야 했던 날. 그런 날에는 이상하게 입에서 마른 풀내가 난다. 긴장한 순간마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는지 입가를 문지르면 하루의 흔적처럼 각질이 만져진다. 눈은 침침하고 몸 구석구석이 쑤시는데 마른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누구와 어떤 말도 하고 싶지가 않다. 누군가와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울고 화내며 하루의 피로를 쏟아내 풀던 날들은 이제 지나간 것 같다고 느낀다. 땅으로 꺼질 듯한 자세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편의점에 들른다. 맥주 한 캔을 사고 고개만 꾸벅 숙이고 나오는데 점원이 인사를 건넨다. '좋은 밤 되세요'.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기분이었다. 필요하고 정확한 한 마디 인사가 녹아내릴 것 같던 순간을 미소로 일으켰다.
말이 많은 시대다. 입소문은 물론이고 SNS를 타고 흐르는 손소문까지. 모두가 말을 멈추지 않는다. 좋아하는 것을 또는 싫어하는 것을 널리 퍼트리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설한다. 떠도는 말에서 발생한 열기는 마른 말들 사이에 불을 지핀다. 말들이 활활 탄다. 좋아해도 뜨겁고 싫어하면 더 뜨거워진다. 타오를 것 같은 감정들이 말의 바람을 타고 밤새도록 춤을 춘다. 그렇게 모두가 말을 얹고 말로 서로를 누른다. 침묵하는 이들을 게으르거나 비겁하다고 다짜고짜 몰아세우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천천히 말을 고를 때까지, 차분히 숨을 고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들이 드문 시대다.
아일랜드의 작가 클레어 키건의 소설 '맡겨진 소녀'가 영화 '말 없는 소녀'로 만들어졌다. 두 제목을 이으면 영화의 줄거리가 될 정도로 단순한 이야기다. '말 없는 소녀가 맡겨진다'.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에 사는 소녀 코오트는 자매 많은 가난한 집의 겉도는 아이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유난히 말수가 적은 코오트는 엄마의 출산을 앞두고 여름 방학 동안 먼 친척 부부에게 맡겨진다. 낯선 공간에 홀로 떨어진 소녀는 지금까지 겪었던 여름과는 다른 시간을 보내게 된다. 자주 외로웠고, 양껏 사랑받지 못한 채로 이리저리 부대끼며 살던 소녀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부부의 다정한 눈 맞춤과 사소한 관심들로 인해 말없이 눈을 맞추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렇게 천천히 코오트의 침묵 위로 햇살이 내리쬔다. 고독의 무게를 털어내는 일상의 사소한 빗질들이 말 없는 소녀를 곱게 어루만져 움트게 한다. 웅크리고 주저하는 일이 익숙했던 소녀 코오트는 이제 침묵이 외로움만이 아님을, 말없이도 충만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어떤 영화는 한 장면을 위해 달려간다. '말 없는 소녀'가 그런 영화다. 특별한 사건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던 아일랜드 소읍의 풍광을 침착하고 아름답게 담아내던 조용한 카메라는 엔딩에 이르러 그 존재감을 여실히 입증한다. '말 없는 소녀'의 카메라는 내내 숨죽인 상태로 코오트의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다가 엔딩 장면에 이르러서는 세차게 도약하는 생명체를 목도하는 것처럼 벅차오르는 코오트의 감정을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한다. 물론 많은 말이 필요한 장면이 아니다. 천천히 쌓아 올린 감정의 망울들이 만개하는 데에는 정확한 한 마디를 내뱉는 순간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사랑을 잃고 말을 잃은 이들과 사랑을 잊어 말을 멈춘 소녀 사이에 무언가가 피어난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었을까. 말로는 정확히 호명하기 어려운 어떤 사랑의 개화를 영화는 섬세하게 피워낸다.
어떤 영화는 한 장면을 위해 달려간다. '말 없는 소녀'가 그런 영화다. 특별한 사건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던 아일랜드 소읍의 풍광을 침착하고 아름답게 담아내던 조용한 카메라는 엔딩에 이르러 그 존재감을 여실히 입증한다. '말 없는 소녀'의 카메라는 내내 숨죽인 상태로 코오트의 변화와 성장을 지켜보다가 엔딩 장면에 이르러서는 세차게 도약하는 생명체를 목도하는 것처럼 벅차오르는 코오트의 감정을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한다. 물론 많은 말이 필요한 장면이 아니다. 천천히 쌓아 올린 감정의 망울들이 만개하는 데에는 정확한 한 마디를 내뱉는 순간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사랑을 잃고 말을 잃은 이들과 사랑을 잊어 말을 멈춘 소녀 사이에 무언가가 피어난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었을까. 말로는 정확히 호명하기 어려운 어떤 사랑의 개화를 영화는 섬세하게 피워낸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는 날에도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태어나고 소멸된다. 꺼내지 못한 말들과 꺼낼 수 없는 말들은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이 말이 되어 숨 가쁘게 달리는 순간이 존재한다, 기적처럼. 말의 숙성이 끝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상대의 마음에 도착한다. 그리고 곱게 걸러진 귀한 말들을 기꺼이 속삭인다. 그것은 당연히 사랑이 하는 말이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말이 많은 시대다. 입소문은 물론이고 SNS를 타고 흐르는 손소문까지. 모두가 말을 멈추지 않는다. 좋아하는 것을 또는 싫어하는 것을 널리 퍼트리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설한다. 떠도는 말에서 발생한 열기는 마른 말들 사이에 불을 지핀다. 말들이 활활 탄다. 좋아해도 뜨겁고 싫어하면 더 뜨거워진다. 타오를 것 같은 감정들이 말의 바람을 타고 밤새도록 춤을 춘다. 그렇게 모두가 말을 얹고 말로 서로를 누른다. 침묵하는 이들을 게으르거나 비겁하다고 다짜고짜 몰아세우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천천히 말을 고를 때까지, 차분히 숨을 고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들이 드문 시대다.
아일랜드의 작가 클레어 키건의 소설 '맡겨진 소녀'가 영화 '말 없는 소녀'로 만들어졌다. 두 제목을 이으면 영화의 줄거리가 될 정도로 단순한 이야기다. '말 없는 소녀가 맡겨진다'.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에 사는 소녀 코오트는 자매 많은 가난한 집의 겉도는 아이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유난히 말수가 적은 코오트는 엄마의 출산을 앞두고 여름 방학 동안 먼 친척 부부에게 맡겨진다. 낯선 공간에 홀로 떨어진 소녀는 지금까지 겪었던 여름과는 다른 시간을 보내게 된다. 자주 외로웠고, 양껏 사랑받지 못한 채로 이리저리 부대끼며 살던 소녀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부부의 다정한 눈 맞춤과 사소한 관심들로 인해 말없이 눈을 맞추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렇게 천천히 코오트의 침묵 위로 햇살이 내리쬔다. 고독의 무게를 털어내는 일상의 사소한 빗질들이 말 없는 소녀를 곱게 어루만져 움트게 한다. 웅크리고 주저하는 일이 익숙했던 소녀 코오트는 이제 침묵이 외로움만이 아님을, 말없이도 충만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는 날에도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태어나고 소멸된다. 꺼내지 못한 말들과 꺼낼 수 없는 말들은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이 말이 되어 숨 가쁘게 달리는 순간이 존재한다, 기적처럼. 말의 숙성이 끝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상대의 마음에 도착한다. 그리고 곱게 걸러진 귀한 말들을 기꺼이 속삭인다. 그것은 당연히 사랑이 하는 말이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제주영어교육도시 FSAA 국제학교 건축 허가 승인
- 2

다음달 토트넘 합류하는 양민혁 제주 외가 찾는다
- 3

'비공개 오찬' 오영훈 지사 음식값 1인당 3만원 초과
- 4

읍면동 예산 최대 40% '싹둑'… "이래 놓고 '민생 예산'?"
- 5

제주행 항공기 탑승 50대 착륙 후 의식 잃고 쓰러져 사망
- 6

"인구 더 많은데 예산은?"… 행정시 예산 놓고 의원 '설전'
- 7

제주시 아라2동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들어선다
- 8

'매각 무산' 927억 제주 주상복합용지 매매가 재산정 논란
- 9

제주도청 주변 삼다공원·녹지공간 묶어 '도민의 숲' 조성
- 10

'아우성'에도 제주 차고지증명제 폐지-유지 입장차 '팽팽'















 2024.11.30(토) 11:32
2024.11.30(토)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