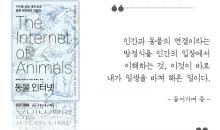[토요일에 만난 사람](63) 손안심 할머니가 사는 법
"애들이 좋아서 키웠지요"
- 입력 : 2007. 10.13(토) 00:00
- 표성준 기자 sjpyo@hallailbo.co.kr

▲베풀기 좋아하는 천성의 손안심 할머니는 피 한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아이들을 데려다 살기를 수십년간 이어오고 있다. /사진=김명선기자 mskim@hallailbo.co.kr
어려운 아이 보면 지나치지 못해
돌보던 4남매 거둬 18년째 한솥밥
손녀 대학 보내려 용돈 몰래 저축
비가 오면 '올래'가 잠기는 일이 반복됐고, 아이들은 젖은 발로 학교에 가야 했다. 할머니는 마른 날을 기다려 시멘트를 사다 나흘 동안 아등바등 겨우 포장했다. 하지만 배합이 잘못됐는지 지금은 곳곳이 패여버려 물에 잠기는 공간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할머니는 그때 일을 하다 척추를 다쳐 다리를 절게 됐다.
손안심 할머니(78)는 피 한방울 안섞인 손자손녀와 살고 있다. 60살 되던 해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낸 그는 서울을 떠나 제주에 둥지를 틀었다. 제주에 사는 동생의 소개로 목재회사를 운영하는 부부의 4남매를 돌보기 시작했다.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 사업이 어려워진 아이들의 부모는 헤어지고 아이들만 남긴 채 떠나버렸다.
그는 얼마 전 아들네가 사는 서울 나들이를 했다. "몇 해 전부터 계속 왔다가라고 해서 갔더니 아들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묻지를 않아요." 그는 아들이 어렸을 때도 남의 아이들을 곧잘 데려다 키웠다. 부모가 있어도 굶는 아이들이 이웃에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부모를 찾아가 설득했다. "애들이 좋아서 키웠지요. 지금도 길가다 아이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아들은 그런 어머니가 싫었다.
서울서 그는 남편을 만난 뒤 함께 복덕방을 운영하면서 제법 행세하며 살았다. 아들이 장가들 때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의붓딸이 시집갈 때는 결혼자금까지 제공했다. 하지만 베푸는 것을 좋아해서인지 말년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4남매 가운데 한 아이는 통장에 있는 8백만원을 써버리고 달아났다. 지인이 어렵다길래 조금씩 빌려준 돈이 1천2백만원에 이르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손가락이 병신되도록 뜨개질하면서 번돈인데…." 그의 오른손 넷째와 새끼 손가락은 구부려지질 않는다.
수입원은 나라에서 주는 생계보조금 20만원과 아들네가 명절 때마다 부쳐오는 돈이 전부. 공과금을 내고 아이들 용돈을 주면 바닥이다. "혼자 아이들 4명을 키울 때 라면 3개를 끓여 이놈 국물 주고 저놈 또 국물 주느라 굶다보니 내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지금은 읍사무소와 적십자에서 쌀을 지원해줘 굶지는 않는다. 여름엔 바느질 겨울엔 뜨개질을 해주고 먹거리를 얻는 것도 다행이다. "남들이 나보고 헛고생한다는데 덕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배고픈 애들 먹여살리면 된 거지요."
그는 문맹이다. 그런데도 물어물어 아이들 학교는 다 보냈다. 지금 남아 있는 두 아이 가운데 생후 20일부터 키운 막내는 고등학교 운동선수. "운동하니까 라면이라도 사먹으라고 가끔 용돈을 쥐어주는데 부족한 것만 같아 마음이 아파요." 셋째는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고생. 한달 수입 40만원 가운데 20만원을 할머니에게 드린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녀 모르게 그 돈을 고스란히 저축하고 있다. 내년이면 대학생이 될 손녀에게 제주시에 방을 얻어주기 위해서다.
얼마 전 서울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십년 전 데려다 키웠던 아이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내가 먹고살 만해서 도와줬는데, 지금 내가 못사는 거 알면 도움주려고 할 거 아녜요. 그럼 걔네들 도와준 공이 없지요."
돌보던 4남매 거둬 18년째 한솥밥
손녀 대학 보내려 용돈 몰래 저축
비가 오면 '올래'가 잠기는 일이 반복됐고, 아이들은 젖은 발로 학교에 가야 했다. 할머니는 마른 날을 기다려 시멘트를 사다 나흘 동안 아등바등 겨우 포장했다. 하지만 배합이 잘못됐는지 지금은 곳곳이 패여버려 물에 잠기는 공간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할머니는 그때 일을 하다 척추를 다쳐 다리를 절게 됐다.
손안심 할머니(78)는 피 한방울 안섞인 손자손녀와 살고 있다. 60살 되던 해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낸 그는 서울을 떠나 제주에 둥지를 틀었다. 제주에 사는 동생의 소개로 목재회사를 운영하는 부부의 4남매를 돌보기 시작했다.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 사업이 어려워진 아이들의 부모는 헤어지고 아이들만 남긴 채 떠나버렸다.
그는 얼마 전 아들네가 사는 서울 나들이를 했다. "몇 해 전부터 계속 왔다가라고 해서 갔더니 아들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묻지를 않아요." 그는 아들이 어렸을 때도 남의 아이들을 곧잘 데려다 키웠다. 부모가 있어도 굶는 아이들이 이웃에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부모를 찾아가 설득했다. "애들이 좋아서 키웠지요. 지금도 길가다 아이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아들은 그런 어머니가 싫었다.
서울서 그는 남편을 만난 뒤 함께 복덕방을 운영하면서 제법 행세하며 살았다. 아들이 장가들 때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의붓딸이 시집갈 때는 결혼자금까지 제공했다. 하지만 베푸는 것을 좋아해서인지 말년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4남매 가운데 한 아이는 통장에 있는 8백만원을 써버리고 달아났다. 지인이 어렵다길래 조금씩 빌려준 돈이 1천2백만원에 이르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손가락이 병신되도록 뜨개질하면서 번돈인데…." 그의 오른손 넷째와 새끼 손가락은 구부려지질 않는다.
수입원은 나라에서 주는 생계보조금 20만원과 아들네가 명절 때마다 부쳐오는 돈이 전부. 공과금을 내고 아이들 용돈을 주면 바닥이다. "혼자 아이들 4명을 키울 때 라면 3개를 끓여 이놈 국물 주고 저놈 또 국물 주느라 굶다보니 내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지금은 읍사무소와 적십자에서 쌀을 지원해줘 굶지는 않는다. 여름엔 바느질 겨울엔 뜨개질을 해주고 먹거리를 얻는 것도 다행이다. "남들이 나보고 헛고생한다는데 덕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배고픈 애들 먹여살리면 된 거지요."
그는 문맹이다. 그런데도 물어물어 아이들 학교는 다 보냈다. 지금 남아 있는 두 아이 가운데 생후 20일부터 키운 막내는 고등학교 운동선수. "운동하니까 라면이라도 사먹으라고 가끔 용돈을 쥐어주는데 부족한 것만 같아 마음이 아파요." 셋째는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고생. 한달 수입 40만원 가운데 20만원을 할머니에게 드린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녀 모르게 그 돈을 고스란히 저축하고 있다. 내년이면 대학생이 될 손녀에게 제주시에 방을 얻어주기 위해서다.
얼마 전 서울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십년 전 데려다 키웠던 아이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내가 먹고살 만해서 도와줬는데, 지금 내가 못사는 거 알면 도움주려고 할 거 아녜요. 그럼 걔네들 도와준 공이 없지요."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다음달 토트넘 합류하는 양민혁 제주 외가 찾는다
- 2

'비공개 오찬' 오영훈 지사 음식값 1인당 3만원 초과
- 3

읍면동 예산 최대 40% '싹둑'… "이래 놓고 '민생 예산'?"
- 4

제주행 항공기 탑승 50대 착륙 후 의식 잃고 쓰러져 사망
- 5

'오등봉 위파크 충격' 제주 10월 미분양 주택 물량 급증
- 6

'매각 무산' 927억 제주 주상복합용지 매매가 재산정 논란
- 7

'아우성'에도 제주 차고지증명제 폐지-유지 입장차 '팽팽'
- 8

조국혁신당, 29일 제주도당 창당대회 개최
- 9

제주드림타워 개관 4주년 도민 1600명에 숙박권 등 제공 이벤…
- 10

'신규 마을기업' 모집 1년만에 재개… 현장 혼란은 불가피
- 00:00
[토요일에 만난 사람]에필로그
- 00:00
[토요일에 만난 사람](70)여성장애인시설 윤기예 …
- 00:00
[토요일에 만난 사람](69)이노 인라인동호회
- 00:00
[토요일에 만난 사람](68) 마라톤 마니아 김성옥…
- 00:00
[토요일에 만난 사람](67) 유덕상 제주자치도 환…
- 00:00
[토요일에 만난 사람](66)제주출신 영화감독 부지…
- 00:00
[토요일에 만난 사람](65)국내 첫 여성활선전기원…
- 00:00
[토요일에 만난 사람](64)딸 넷 키우는 이희현·백…
- 00:00
[토요일에 만난 사람](63) 손안심 할머니가 사는 …
- 00:00
[토요일에 만난 사람](62)제주대 한글배움터 백금…















 2024.12.01(일) 20:20
2024.12.01(일)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