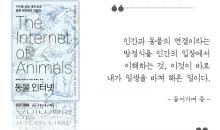[책세상]'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참 신기한 일이야'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살던 그리운 그 풍경
- 입력 : 2017. 08.04(금)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물고기 잡던 시절 통해 오염된 환경 꼬집어
정말 오래전 이야기라고 했다.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라면서.
이야기를 이끄는 주인공은 쉬리다. 동네 사람들은 그 물고기를 가새피리라고 부른다. 꼬리 끝이 가위 같이 생겨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다. 몸은 가늘고 긴데 몸통은 조금 통통하다. 머리도 가늘고 길고 뾰족하다.
쉬리가 살고 있는 섬진강 진메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고기를 잡을까. 봄에서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 다시 봄에 이르는 계절 동안 쏘가리, 메기, 꺽지, 밀어, 다슬기, 참게, 가제 따위를 잡아먹고 살아가는 일상을 만날 수 있다.
'섬진강 시인'으로 불리는 김용택 시인이 글을 쓰고 구서보씨가 그림을 그린 '참 신기한 일이야'. 얼마전 전북 전주 생활을 접고 임실군 덕치면으로 거처를 옮긴 김 시인은 그곳을 배경으로 경이로운 대자연의 생명력을 펼쳐놓는다.
사는 게 다 그만그만했던 시절이 있었다. 가난했던 그 시절 물고기는 중요한 식량이었고 놀잇감이었다. 물고기를 잡아 배고픔을 해결했고 물고기와 놀며 배고픔을 잊었다. 물고기를 잡아먹는 일은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하는 문제가 아니다.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일은 생태계의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시인은 그림책 곳곳에서 쉬리의 입을 빌어 자연스러운 섭리를 참 신기한 일이라고 말한다. "바위 속에 든 친구들이 밤이 되면 바위 밖으로 나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왜 친구들은 밤이 되면 바위 속에서 나가는 걸까." 밤에 강가로 나가 통발 속에 갇힌 물고기를 쏟아내면 왜 그렇게 반짝이며 아름다운지, 사람들은 밤이 되면 바위 속에 있던 고기들이 나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경이롭고 신비하다.
하지만 그같은 신기함은 이제 옛말이다. 자연스러운 강의 사계와 생태는 지금은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또다른 의미의 신기한 일이 되었다. 그것은 절망적인 신기함이고 슬프고도 슬픈 신기함이다.
"섬진강은 아직도 물이 맑아서 사람들이 섬진강은 살아 있다고 해. 하지만 그 말을 다 믿지는 마.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일 뿐이야. 아이들이 강물에서 놀고 사람들이 강물을 먹으며 살 때 일이니까 정말 오래전 일이야."
이름을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던 강은 언젠가부터 녹조라떼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던, 당연하던 풍경들이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자주보라. 1만3000원.
정말 오래전 이야기라고 했다.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라면서.
이야기를 이끄는 주인공은 쉬리다. 동네 사람들은 그 물고기를 가새피리라고 부른다. 꼬리 끝이 가위 같이 생겨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다. 몸은 가늘고 긴데 몸통은 조금 통통하다. 머리도 가늘고 길고 뾰족하다.
쉬리가 살고 있는 섬진강 진메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고기를 잡을까. 봄에서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 다시 봄에 이르는 계절 동안 쏘가리, 메기, 꺽지, 밀어, 다슬기, 참게, 가제 따위를 잡아먹고 살아가는 일상을 만날 수 있다.
'섬진강 시인'으로 불리는 김용택 시인이 글을 쓰고 구서보씨가 그림을 그린 '참 신기한 일이야'. 얼마전 전북 전주 생활을 접고 임실군 덕치면으로 거처를 옮긴 김 시인은 그곳을 배경으로 경이로운 대자연의 생명력을 펼쳐놓는다.
사는 게 다 그만그만했던 시절이 있었다. 가난했던 그 시절 물고기는 중요한 식량이었고 놀잇감이었다. 물고기를 잡아 배고픔을 해결했고 물고기와 놀며 배고픔을 잊었다. 물고기를 잡아먹는 일은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하는 문제가 아니다.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일은 생태계의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시인은 그림책 곳곳에서 쉬리의 입을 빌어 자연스러운 섭리를 참 신기한 일이라고 말한다. "바위 속에 든 친구들이 밤이 되면 바위 밖으로 나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왜 친구들은 밤이 되면 바위 속에서 나가는 걸까." 밤에 강가로 나가 통발 속에 갇힌 물고기를 쏟아내면 왜 그렇게 반짝이며 아름다운지, 사람들은 밤이 되면 바위 속에 있던 고기들이 나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경이롭고 신비하다.
하지만 그같은 신기함은 이제 옛말이다. 자연스러운 강의 사계와 생태는 지금은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또다른 의미의 신기한 일이 되었다. 그것은 절망적인 신기함이고 슬프고도 슬픈 신기함이다.
"섬진강은 아직도 물이 맑아서 사람들이 섬진강은 살아 있다고 해. 하지만 그 말을 다 믿지는 마.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일 뿐이야. 아이들이 강물에서 놀고 사람들이 강물을 먹으며 살 때 일이니까 정말 오래전 일이야."
이름을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던 강은 언젠가부터 녹조라떼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던, 당연하던 풍경들이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자주보라. 1만3000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제주영어교육도시 FSAA 국제학교 건축 허가 승인
- 2

'비공개 오찬' 오영훈 지사 음식값 1인당 3만원 초과
- 3

제주행 항공기 탑승 50대 착륙 후 의식 잃고 쓰러져 사망
- 4

찬 바람 매서운 제주지방 산지 최고 15㎝ 폭설 쏟아진다
- 5

읍면동 예산 최대 40% '싹둑'… "이래 놓고 '민생 예산'?"
- 6

다음달 토트넘 합류하는 양민혁 제주 외가 찾는다
- 7

제주시 아라2동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들어선다
- 8

제주도청 주변 삼다공원·녹지공간 묶어 '도민의 숲' 조성
- 9

"인구 더 많은데 예산은?"… 행정시 예산 놓고 의원 '설전'
- 10

'아우성'에도 제주 차고지증명제 폐지-유지 입장차 '팽팽'
- 03:40
[책세상] 탄성 인간 外
- 02:40

[이책] 지구 위기 극복의 새로운 열쇠 '동물 인터…
- 02:00

[책세상] 감성과 생각의 싹 틔우는 문학의 향기
- 02:30

[책세상] 아름다운 섬, 이면에 깃든 서늘한 이야…
- 01:40

[책세상] 배구 코트의 맛과 멋, 그리고 울림 外
- 01:20

[이책]『제주문학 100집』창작열정으로 걸어온 …
- 01:00

[책세상] 다채로운 빛깔의 시편, 마음 깊이 스미…
- 03:30

[책세상] 김동현 신작 비평집 ‘사랑의 서사는 …
- 02:30

[책세상] 박희순·신기영의 제주어동시 컬러링북…
- 02:00

[책세상] 금리로 혼내주는 선생님 外















 2024.11.28(목) 20:36
2024.11.28(목)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