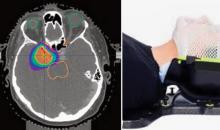[저자와 함께] '지금도 낭낭히' 나기철 시인
"짧고 단단하고 여운있는 시 꿈꾼다"
- 입력 : 2018. 05.24(목) 2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작은시(詩)앗·채송화' 동인으로 활동하는 나기철 시인은 시가 자꾸 수다스러워지는 현실 속에 짧지만 단단한 시로 시의 본령에 다가서려 한다.
10여년 '채송화' 동인 시운동
가슴 뛰는 연애 감정 품은 채
집중·함축 통해 시의 본령에
 어느덧 10년이 됐다. '내 안에 움튼 연둣빛'이란 이름을 달고 첫 동인지를 낸 해가 2008년이었다. 짧은 시 운동을 펼쳐온 '작은시(詩)앗·채송화' 동인을 말한다. 낮은 자세가 흐트러지는 법 없이 다섯장의 꽃잎만으로 온 마당을 은은히 반짝이게 하는 채송화처럼, 시인들은 짧고 야무진 시, 찰지고 단단한 시를 쓰자며 하나둘 모여들었다.
어느덧 10년이 됐다. '내 안에 움튼 연둣빛'이란 이름을 달고 첫 동인지를 낸 해가 2008년이었다. 짧은 시 운동을 펼쳐온 '작은시(詩)앗·채송화' 동인을 말한다. 낮은 자세가 흐트러지는 법 없이 다섯장의 꽃잎만으로 온 마당을 은은히 반짝이게 하는 채송화처럼, 시인들은 짧고 야무진 시, 찰지고 단단한 시를 쓰자며 하나둘 모여들었다.
'작은시앗·채송화' 11호 발간부터 동인 회장을 맡고 있는 제주 나기철 시인 역시 다르지 않았다. 어느 시인이 '설사하듯'이라고 표현했듯 시가 길고, 어렵고, 수다스러워지는 현실에서 집중과 함축을 통해 시의 본령에 다가서려는 작업을 이어왔다. 나 시인의 '지금도 낭낭히'는 그같은 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집이다.
'창밖의 눈이 좋아/ 러시아 민요에서 이미자로/ 넘어간다/ 도리 없이 두 병으로 간다/ 쌓인다'('홍천, 밤 문자' 전문)
오랜 벗이 그에게 보내온 휴대전화 문자가 시가 되었다. 그 동네에서 눈나리는 날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중년의 한때가 러시아 민요를 타고 이미자의 노래에 녹아든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침묵 속에 그대와 나의 마음을 닮은 음악이 흐른다. '저 세상에/ 날 데려가시면/ 다시 못 올/ 이 세상'('명도암 마을')에서 짧은 생을 위로해주는 존재들이 고맙다.
그의 시는 대부분 10행을 넘지 않는다. 상상력보다는 체험에 의존하는 시들이 많다. 하귀 등대, 귀덕 바다, 서부두, 명도암 마을, 평화양로원, 오일장, 연희동, 북촌 등 시인의 눈길과 발길이 닿은 공간이 닦고 또 닦아낸, 고르고 고른 언어를 통해 저마다의 풍경을 그려낸다.
1987년 '시문학'으로 등단한 이래 30여 년간 그가 낸 시집은 이번까지 포함하면 여섯권. 과작(寡作)인 셈이다. 시단에 발디딘 지 30여년 만에 첫 시집을 묶어내 화제가 되었던 어느 시인이 그에게 '시나 한 편 꿔 줄 수 없겠나?'라고 농처럼 한마디 건네자 나 시인은 시의 곳간이 비어 꿔 드릴 시가 없다('텅')고 노래한다. 이즈음 말수를 줄이고 줄이는 시쓰기에 집중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읽힌다.
수 백편의 시를 쏟아내더라도 단 한 편의 시가 던지는 울림을 뛰어넘지 못할 때가 있다. 무언가에 설레는 마음이 없이 독자를 움직일 시를 쓸 수 있을까. 시인은 오늘도 슬몃 가슴 뛰는 연애 감정을 품은 채 그 하나의 시를 기다린다. '눈 피해 눈이 자꾸 갔습니다/ 그 사이 달라진/ 머릿결/ 파동의 남오미자꽃/ 지금도/ 낭낭히 들리는,'('별후(別後)' 전문) . 서정시학 서정시 시리즈로 나왔다. 1만원.
가슴 뛰는 연애 감정 품은 채
집중·함축 통해 시의 본령에

'작은시앗·채송화' 11호 발간부터 동인 회장을 맡고 있는 제주 나기철 시인 역시 다르지 않았다. 어느 시인이 '설사하듯'이라고 표현했듯 시가 길고, 어렵고, 수다스러워지는 현실에서 집중과 함축을 통해 시의 본령에 다가서려는 작업을 이어왔다. 나 시인의 '지금도 낭낭히'는 그같은 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집이다.
'창밖의 눈이 좋아/ 러시아 민요에서 이미자로/ 넘어간다/ 도리 없이 두 병으로 간다/ 쌓인다'('홍천, 밤 문자' 전문)
오랜 벗이 그에게 보내온 휴대전화 문자가 시가 되었다. 그 동네에서 눈나리는 날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중년의 한때가 러시아 민요를 타고 이미자의 노래에 녹아든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침묵 속에 그대와 나의 마음을 닮은 음악이 흐른다. '저 세상에/ 날 데려가시면/ 다시 못 올/ 이 세상'('명도암 마을')에서 짧은 생을 위로해주는 존재들이 고맙다.
그의 시는 대부분 10행을 넘지 않는다. 상상력보다는 체험에 의존하는 시들이 많다. 하귀 등대, 귀덕 바다, 서부두, 명도암 마을, 평화양로원, 오일장, 연희동, 북촌 등 시인의 눈길과 발길이 닿은 공간이 닦고 또 닦아낸, 고르고 고른 언어를 통해 저마다의 풍경을 그려낸다.
1987년 '시문학'으로 등단한 이래 30여 년간 그가 낸 시집은 이번까지 포함하면 여섯권. 과작(寡作)인 셈이다. 시단에 발디딘 지 30여년 만에 첫 시집을 묶어내 화제가 되었던 어느 시인이 그에게 '시나 한 편 꿔 줄 수 없겠나?'라고 농처럼 한마디 건네자 나 시인은 시의 곳간이 비어 꿔 드릴 시가 없다('텅')고 노래한다. 이즈음 말수를 줄이고 줄이는 시쓰기에 집중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읽힌다.
수 백편의 시를 쏟아내더라도 단 한 편의 시가 던지는 울림을 뛰어넘지 못할 때가 있다. 무언가에 설레는 마음이 없이 독자를 움직일 시를 쓸 수 있을까. 시인은 오늘도 슬몃 가슴 뛰는 연애 감정을 품은 채 그 하나의 시를 기다린다. '눈 피해 눈이 자꾸 갔습니다/ 그 사이 달라진/ 머릿결/ 파동의 남오미자꽃/ 지금도/ 낭낭히 들리는,'('별후(別後)' 전문) . 서정시학 서정시 시리즈로 나왔다. 1만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2026.02.06(금) 14:06
2026.02.06(금)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