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 황폐해진 제주섬의 원천… 도민들의 저항
권무일의 『제주 바다의 슬픈 역사』
- 입력 : 2025. 04.18(금) 01:45 수정 : 2025. 04. 18(금) 14:25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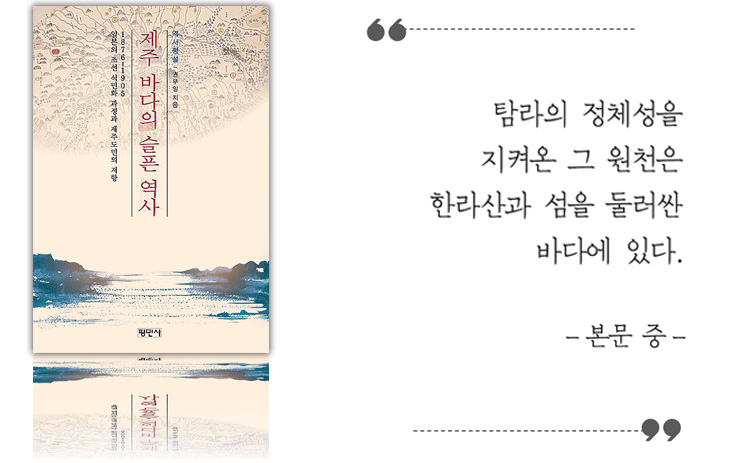
[한라일보] 한반도 남쪽에 오롯이 자리한 섬인 제주도는 수천년 탐라 고유의 정체성을 지켜온 보물섬이다. 그 원천은 중앙에 높이 솟은 한라산과 섬을 둘러싼 바다에 있다. 한라산 산록에는 수천마리 마소가 뛰어놀고, 제주 바다에는 가까이에 전복, 해삼, 멸치, 해초들이 지천이고 수평선으로 나아가면 방어, 갯방어, 도미가 무진장인 황금어장이다. 제주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제주 바다를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자신들의 바다로 여기며 살았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로 개항한 뒤 일본 어민들이 조선의 바다로 고기잡이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황금어장인 제주 바다로 수백대가 몰려왔다. 제주 바다는 황폐해지고 제주 해녀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어장을 잃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장편 역사소설 '의녀 김만덕', '말, 헌신공신 김만일과 말 이야기', 평설 '이방익 표류기' 등 제주 인물을 소재로 글을 써 온 권무일(84) 작가가 이번엔 '제주 바다'에 주목한다. 최근 펴낸 역사평설 '제주 바다의 슬픈 역사'다. 작가는 경기도 태생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다 2004년 제주에 정착해 제주 역사와 관련된 글을 써오고 있다.
이 책은 1987년 개항 이후 1905년 을사늑약까지의 조선의 식민화 과정을 담으며 30여년간 일본이 제주 바다를 침탈해 황폐화하고 도민들에 횡포를 저지른 일을 다룬다. 작가는 "이 30여년간의 역사는 후대인들의 뇌리에서 사라진 역사, 아니 잊어버리고 싶은 치욕의 역사였다"며 "그러나 조선이 사면의 바다를 일본에게 내주고 이로 인해 일본 어업이 조선의 사해 특히 제주 바다를 싹쓸이한 역사적 사실이 한국 사학계의 정사(正史)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고, 제주에서도 단편적인 것 이외에는 거의 기록을 찾을수 없었다"고 제주 바다의 아픈 역사에 주목하게 된 이유를 전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주도민들의 저항 모습도 담아냈다. "제주도민들이 일본 어민들에게 강경 대처하는 한편 상경 투쟁을 벌이자 중앙 정부는 그제서야 조약을 들춰봤다. 배령리 양종신 살해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민중의 저항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도로 확산됐다. 이 저항 사건은 일본을 긴장시켰고 고종과 일본측도 도민의 참혹한 실상을 알게됐다."
권 작가는 "제주도민이 슬픈 역사와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빛나는 미래를 지향해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마음으로 썼다"며 "아마추어 역사평론가로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재해석한 소설같은 역사 이야기"라고 전한다. 평민사. 1만8000원.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로 개항한 뒤 일본 어민들이 조선의 바다로 고기잡이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황금어장인 제주 바다로 수백대가 몰려왔다. 제주 바다는 황폐해지고 제주 해녀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어장을 잃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장편 역사소설 '의녀 김만덕', '말, 헌신공신 김만일과 말 이야기', 평설 '이방익 표류기' 등 제주 인물을 소재로 글을 써 온 권무일(84) 작가가 이번엔 '제주 바다'에 주목한다. 최근 펴낸 역사평설 '제주 바다의 슬픈 역사'다. 작가는 경기도 태생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다 2004년 제주에 정착해 제주 역사와 관련된 글을 써오고 있다.
이 책은 1987년 개항 이후 1905년 을사늑약까지의 조선의 식민화 과정을 담으며 30여년간 일본이 제주 바다를 침탈해 황폐화하고 도민들에 횡포를 저지른 일을 다룬다. 작가는 "이 30여년간의 역사는 후대인들의 뇌리에서 사라진 역사, 아니 잊어버리고 싶은 치욕의 역사였다"며 "그러나 조선이 사면의 바다를 일본에게 내주고 이로 인해 일본 어업이 조선의 사해 특히 제주 바다를 싹쓸이한 역사적 사실이 한국 사학계의 정사(正史)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고, 제주에서도 단편적인 것 이외에는 거의 기록을 찾을수 없었다"고 제주 바다의 아픈 역사에 주목하게 된 이유를 전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주도민들의 저항 모습도 담아냈다. "제주도민들이 일본 어민들에게 강경 대처하는 한편 상경 투쟁을 벌이자 중앙 정부는 그제서야 조약을 들춰봤다. 배령리 양종신 살해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민중의 저항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도로 확산됐다. 이 저항 사건은 일본을 긴장시켰고 고종과 일본측도 도민의 참혹한 실상을 알게됐다."
권 작가는 "제주도민이 슬픈 역사와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빛나는 미래를 지향해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마음으로 썼다"며 "아마추어 역사평론가로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재해석한 소설같은 역사 이야기"라고 전한다. 평민사. 1만8000원.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02:00

[책세상] 어린이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림책
- 03:00

[새로나온책]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外
- 02:30

[이 책] “강인함 그대로”… 미 해병의 전설이 …
- 02:00

[책세상] 돌담·신화에 4·3까지 다룬 제주 문학지
- 01:30

[새로나온책] 불온한 영화를 위하여 外
- 01:45

[이 책] 황폐해진 제주섬의 원천… 도민들의 저…
- 01:20

[책세상] 상실의 경험마저 아릿한 아름다움으로
- 01:00

[책세상] 제주라는 공간서 마주한 '삶의 자국'들
- 08:32

[책세상] '인생 100세' 삶의 질 높이고, 젊음 유지…
- 07:00

[이 책] 시골 청년들과 낭만 찾기 속 ‘작은 일렁…















 2025.05.04(일) 14:56
2025.05.04(일) 1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