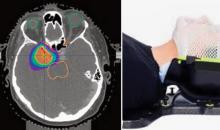[책세상] 소소한 풍경에 외면 못하는 이 땅의 현실
제주 홍성운 신작 시조집 '버릴까'
- 입력 : 2019. 01.18(금)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그가 써놓은 시처럼, '사람은 시 한 구절에 눈물 괼 때' 있다. 수다하지 않아도 몇 줄의 그 문장에 얼어붙은 심장이 움직인다. 그의 이번 시 작업은 번다한 사람 살이에 무슨 시냐고 묻는 이들에게 답하는 여정 같다. 제주 홍성운 시인의 새 시조집 '버릴까'이다. 고요하고 맑은 풍경을 현대시조로 노래하되 이 땅의 현실에 발딛고 있는 시편들이 펼쳐진다.
'가끔은 적시고픈 목마른 땅이 있다// 가끔은 뇌성으로 깨우고픈 사람이 있다// 가끔은 번개를 놓아 밝히고픈 하늘이 있다'('장마' 전문).
시인이 꿈꾸는 시는 그런 건지 모른다. 목마름을 해소하고 표정없는 나날에 무늬를 그려넣는 한 편의 시 말이다. '한두 잔 들이키면 그냥 포만하고/적당히 취기가 올라/ 갈증을 풀어주는' 막걸리 같은 시, '간 밤의 쓰린 속을 시원히 달래주고/ 매콤한 그 맛 하나로/ 다시 또 찾게 되는' 콩나물 해장국 같은 시('그런 시 어디 없을까')라고 해도 된다.
그같은 시를 간구하는 길에 '깨어있자' 다짐하며 흩어졌던 이들이 있다. '다 삭은 줄 알았던 오래된 불씨 하나'가 촛불이 되어 광장에 타오를 때 '한계령에서 온 편지'의 화자도 가만히 촛불을 켠다. 음력 2월 칠머리당 영등굿으로 간신히 달랜 제주 바람은 '빚진 일 없이 모두 죄인'이 되는 '물 강정 너럭바위에 구럼비낭으로'('광대야 줄광대야!) 운다. 한라산 관음사 등산로에 있는 얕은 수직동굴인 썩은 굴은 제주4·3의 그 4월('숲 속의 동굴')을 일깨우고 '4월 안개'는 노란 리본을 적시며 세월호의 사연을 불러낸다. 시인에게 4월의 제주 봄날은 서성일 수 밖에 없는 계절이다.
그래서 시는 계속되어야 하리라. 시는 마치 병문천이 복개되며 간데없는 대장간('망치 소리')의 처지 같고 상주도 조문객도 없는 폐차장의 마지막('폐차의 장례')인 듯 하지만 '겨울 한때' 용케 살아나는 작은 동백나무와도 같다. '수십 년 내 품에서 심박동에 공명했던/ 버팔로 가죽지갑을 오늘은 버릴까'('버릴까') 싶어 오래된 명함 따위를 하나둘 꺼내놓다 끝내 '깊숙이 앉은 울 엄니 부적 한 점'과 마주하는 순간처럼 시는 때때로 벼랑에 선 마음을 부적처럼 끌어안는다. 시집을 열며 시인은 노래하듯 말한다. "한 편의 시가 광장의 불빛만 하다면, 저 사막 카라반의 물병만 하다면 시는 아직 유효하다". 푸른사상. 9000원.
'가끔은 적시고픈 목마른 땅이 있다// 가끔은 뇌성으로 깨우고픈 사람이 있다// 가끔은 번개를 놓아 밝히고픈 하늘이 있다'('장마' 전문).
시인이 꿈꾸는 시는 그런 건지 모른다. 목마름을 해소하고 표정없는 나날에 무늬를 그려넣는 한 편의 시 말이다. '한두 잔 들이키면 그냥 포만하고/적당히 취기가 올라/ 갈증을 풀어주는' 막걸리 같은 시, '간 밤의 쓰린 속을 시원히 달래주고/ 매콤한 그 맛 하나로/ 다시 또 찾게 되는' 콩나물 해장국 같은 시('그런 시 어디 없을까')라고 해도 된다.
그같은 시를 간구하는 길에 '깨어있자' 다짐하며 흩어졌던 이들이 있다. '다 삭은 줄 알았던 오래된 불씨 하나'가 촛불이 되어 광장에 타오를 때 '한계령에서 온 편지'의 화자도 가만히 촛불을 켠다. 음력 2월 칠머리당 영등굿으로 간신히 달랜 제주 바람은 '빚진 일 없이 모두 죄인'이 되는 '물 강정 너럭바위에 구럼비낭으로'('광대야 줄광대야!) 운다. 한라산 관음사 등산로에 있는 얕은 수직동굴인 썩은 굴은 제주4·3의 그 4월('숲 속의 동굴')을 일깨우고 '4월 안개'는 노란 리본을 적시며 세월호의 사연을 불러낸다. 시인에게 4월의 제주 봄날은 서성일 수 밖에 없는 계절이다.
그래서 시는 계속되어야 하리라. 시는 마치 병문천이 복개되며 간데없는 대장간('망치 소리')의 처지 같고 상주도 조문객도 없는 폐차장의 마지막('폐차의 장례')인 듯 하지만 '겨울 한때' 용케 살아나는 작은 동백나무와도 같다. '수십 년 내 품에서 심박동에 공명했던/ 버팔로 가죽지갑을 오늘은 버릴까'('버릴까') 싶어 오래된 명함 따위를 하나둘 꺼내놓다 끝내 '깊숙이 앉은 울 엄니 부적 한 점'과 마주하는 순간처럼 시는 때때로 벼랑에 선 마음을 부적처럼 끌어안는다. 시집을 열며 시인은 노래하듯 말한다. "한 편의 시가 광장의 불빛만 하다면, 저 사막 카라반의 물병만 하다면 시는 아직 유효하다". 푸른사상. 9000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03:00

[새로나온책] 허즈번즈 外
- 02:30

[책세상] 탄자니아로 간 시인… 허망함에서 찾은…
- 03:00

[새로나온책] 비가 시를 고치니 좋아라 外
- 02:00

[이 책] 인간의 짐을 짊어진 동물… 그 노고가 없…
- 01:00

[책세상] 재일제주인 기억을 기록한 작가… 김태…
- 18:14

[책세상] '갱년기'라는 돌부리에 걸린 그들에게…
- 18:11

[책세상] 디카시에 제주어 더하다… 양순진 '할…
- 20:26

[새로나온책] 바람에 발효된 섬의 사유 外
- 01:00

[이 책] ‘같음’을 요구하는 시대, 철학이 묻는 …
- 01:00

[책세상] 비틀린 욕망이 부른 파국… 박해동 '블…















 2026.02.05(목) 20:23
2026.02.05(목)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