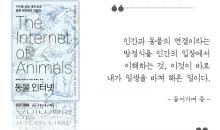[김정호의 문화광장] 일상에서의 공포 생태학
- 입력 : 2022. 12.06(화)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한라일보] 뉴스와 영화에서 사건 사고를 너무 접하다 보면 갖게 되는 부작용이 일상에서의 공포 생태학이다. 할리우드 영화 내러티브의 공식은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영화가 시작해 그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적대자. 그것은 악당일 수도 있고 외계인, 지진 등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 사회 제도일 수도 있다. 주인공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인간에 대한 믿음이 싹트는 새로운 평화의 균형 잡힌 세계를 이루려 노력한다. 봉준호 감독의 '괴물'(2006)은 그런 할리우드 장르 영화 공식을 잘 보여주는데 살짝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부분은 무능하고 관료적인 정부를 대신해 해결사로 한강 변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별 볼 일 없는 소시민 송강호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미국영화에서처럼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괴물이나 외계인,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경우보다는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평범한 시민이 보여주는 영웅적 행위가 많이 등장한다.
너무나 영화 같아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임에도 믿을 수 없는 것은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미국의 911 테러와 세월호 침몰을 텔레비전 실시간 중계로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세월호를 보면서 '괴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우리 가족은 내가 지키고 살아야지. 나라가 지켜주지 않는다. 어린 시절, 4·3을 지내온 노모는 항상 속옷을 깨끗이 입어라, 비행기나 배에 일가족이 함께 타지 말고 서로 다른 편을 이용하라고 하셨다. 교통사고나 만일의 경우에 누가 나의 바지를 벗겼을 때 속옷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은 길거리에 버려진 시신을 지나치면서라도 목격하던가 혹은 그런 사례를 들어서 아는 조언일 것이다.
사람이 사람에게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간격은 대략 1m라고 한다. 그래서 서양 문화에서는 가족이나 애인, 친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범위 내에 들어오면 위험하다고 받아들이고 타인의 신체 접촉을 꺼린다. 문화가 다르고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이런 프라이버시 공간은 사치이며 출퇴근 시간에 매일같이 핼러윈의 이태원에 근접하는 밀고 당김을 경험하면서 개인적 안전 공간이라는 개념에 무감각해졌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m로 시행하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아 바닥에 거리를 표시하여 서게 하지 않았나.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뮤지컬 장르가 인기가 있듯이 어린 시절 어린이집, 영어 유치원, 학원 등에서 핼러윈을 접한 젊은 사람들에게 핼러윈은 추석이나 설날처럼 어른들이 강요한 행사가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행사이고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대학, 직업 등에 따른 서열화에 익숙한 세상에서 잠시나마 나를 얽매이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해방구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국화돼 있다. 어머니의 충고가 더 늘 것 같다. 사람이 지옥이다.
<김정호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너무나 영화 같아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임에도 믿을 수 없는 것은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미국의 911 테러와 세월호 침몰을 텔레비전 실시간 중계로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세월호를 보면서 '괴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우리 가족은 내가 지키고 살아야지. 나라가 지켜주지 않는다. 어린 시절, 4·3을 지내온 노모는 항상 속옷을 깨끗이 입어라, 비행기나 배에 일가족이 함께 타지 말고 서로 다른 편을 이용하라고 하셨다. 교통사고나 만일의 경우에 누가 나의 바지를 벗겼을 때 속옷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은 길거리에 버려진 시신을 지나치면서라도 목격하던가 혹은 그런 사례를 들어서 아는 조언일 것이다.
사람이 사람에게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간격은 대략 1m라고 한다. 그래서 서양 문화에서는 가족이나 애인, 친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범위 내에 들어오면 위험하다고 받아들이고 타인의 신체 접촉을 꺼린다. 문화가 다르고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이런 프라이버시 공간은 사치이며 출퇴근 시간에 매일같이 핼러윈의 이태원에 근접하는 밀고 당김을 경험하면서 개인적 안전 공간이라는 개념에 무감각해졌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m로 시행하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아 바닥에 거리를 표시하여 서게 하지 않았나.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뮤지컬 장르가 인기가 있듯이 어린 시절 어린이집, 영어 유치원, 학원 등에서 핼러윈을 접한 젊은 사람들에게 핼러윈은 추석이나 설날처럼 어른들이 강요한 행사가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행사이고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대학, 직업 등에 따른 서열화에 익숙한 세상에서 잠시나마 나를 얽매이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해방구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국화돼 있다. 어머니의 충고가 더 늘 것 같다. 사람이 지옥이다.
<김정호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제주영어교육도시 FSAA 국제학교 건축 허가 승인
- 2

다음달 토트넘 합류하는 양민혁 제주 외가 찾는다
- 3

'비공개 오찬' 오영훈 지사 음식값 1인당 3만원 초과
- 4

제주행 항공기 탑승 50대 착륙 후 의식 잃고 쓰러져 사망
- 5

읍면동 예산 최대 40% '싹둑'… "이래 놓고 '민생 예산'?"
- 6

찬 바람 매서운 제주지방 산지 최고 15㎝ 폭설 쏟아진다
- 7

제주시 아라2동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들어선다
- 8

"인구 더 많은데 예산은?"… 행정시 예산 놓고 의원 '설전'
- 9

'매각 무산' 927억 제주 주상복합용지 매매가 재산정 논란
- 10

제주도청 주변 삼다공원·녹지공간 묶어 '도민의 숲' 조성















 2024.11.30(토) 00:29
2024.11.30(토) 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