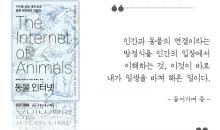[책세상] 표준어든, 사투리든 '방언 사용권' 존중을
표준어·방언 대결 구도 추적 정승철의 '방언의 발견'
- 입력 : 2018. 04.27(금)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1933년 조선어학회는 전문가 등 각계 인사 73명으로 '표준어 사정위원회'를 꾸린다. 지역이나 계층별로 다르게 쓰이는 말 중에 어느 하나를 가려 표준으로 정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중 과반수 위원인 37명이 서울·경기도 출신이었고 나머지 36명은 어느 정도 널리 쓰이는 '시골말'을 판별할 목적으로 각 도별 인구수에 비례해 선출했다. 표준어 사정위원회는 표준 단어를 결정하기 위해 세 차례 독회를 열었는데 서울·경기 출신의 위원에게만 최종 결정권을 부여하고 다른 지방 출신 위원들에겐 재심을 청구할 권리만 줬다. 서울말을 중심으로 표준어를 구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일이었다.
정승철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쓴 '방언의 발견'은 이처럼 최초의 표준어를 누가, 어떻게 정했을까를 시작으로 표준어 형성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복원해낸다. 더불어 표준어와 방언의 대결 구도를 사회문화사적으로 추적하며 획일화된 가치를 강요해온 우리 사회를 되돌아본다.
20세기초 도쿄말을 중심으로 성립된 일본의 표준어는 제국주의 시대의 자국민과 피식민지인에 대한 교육 언어, 나아가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쓰였다. 사투리를 추방하고 표준어를 보급하기 위해 도입했던 방언 패찰 제도가 그 점을 보여준다. 오키나와에서는 1960년대까지 방언 패찰이 존재했다. 학교에서 원주민들의 언어인 류큐어를 사용하면 그 학생이 벌칙으로 목에 방언 패찰을 걸어야 하는 인권 침해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방언 패찰과 같은 눈에 보이는 차별은 없었지만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하면서 서울말과 지방어 사이에 위계가 생겨났고 방언은 고쳐야 할 말, 공식적이지 못한 언어로 억압받아왔다. 산업화를 거치는 동안엔 국가 구성원 모두가 표준어 하나로 소통해야 근대화를 빨리 이룩할 수 있다고 여겼다.
저자는 국민 전체의 소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표준어를 쓰자는 논리는 국제화 시대 세계화를 위해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저 원하는 사람이 영어를 배워 쓰듯이 표준어도 그렇게 쓰면 된다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말을 두고 표준어는 맞고, 사투리는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동안 사투리 쓴다고 수난을 당한 사람들의 상처 치유는 차치하더라도,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표준어든 사투리든 자신이 원하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곧 '방언 사용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지금이라도 만들어져야 한다." 창비. 1만6000원.
정승철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쓴 '방언의 발견'은 이처럼 최초의 표준어를 누가, 어떻게 정했을까를 시작으로 표준어 형성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복원해낸다. 더불어 표준어와 방언의 대결 구도를 사회문화사적으로 추적하며 획일화된 가치를 강요해온 우리 사회를 되돌아본다.
20세기초 도쿄말을 중심으로 성립된 일본의 표준어는 제국주의 시대의 자국민과 피식민지인에 대한 교육 언어, 나아가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쓰였다. 사투리를 추방하고 표준어를 보급하기 위해 도입했던 방언 패찰 제도가 그 점을 보여준다. 오키나와에서는 1960년대까지 방언 패찰이 존재했다. 학교에서 원주민들의 언어인 류큐어를 사용하면 그 학생이 벌칙으로 목에 방언 패찰을 걸어야 하는 인권 침해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방언 패찰과 같은 눈에 보이는 차별은 없었지만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서울말을 표준어로 정하면서 서울말과 지방어 사이에 위계가 생겨났고 방언은 고쳐야 할 말, 공식적이지 못한 언어로 억압받아왔다. 산업화를 거치는 동안엔 국가 구성원 모두가 표준어 하나로 소통해야 근대화를 빨리 이룩할 수 있다고 여겼다.
저자는 국민 전체의 소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표준어를 쓰자는 논리는 국제화 시대 세계화를 위해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저 원하는 사람이 영어를 배워 쓰듯이 표준어도 그렇게 쓰면 된다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말을 두고 표준어는 맞고, 사투리는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동안 사투리 쓴다고 수난을 당한 사람들의 상처 치유는 차치하더라도,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표준어든 사투리든 자신이 원하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곧 '방언 사용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지금이라도 만들어져야 한다." 창비. 1만6000원.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제주영어교육도시 FSAA 국제학교 건축 허가 승인
- 2

다음달 토트넘 합류하는 양민혁 제주 외가 찾는다
- 3

'비공개 오찬' 오영훈 지사 음식값 1인당 3만원 초과
- 4

제주행 항공기 탑승 50대 착륙 후 의식 잃고 쓰러져 사망
- 5

읍면동 예산 최대 40% '싹둑'… "이래 놓고 '민생 예산'?"
- 6

찬 바람 매서운 제주지방 산지 최고 15㎝ 폭설 쏟아진다
- 7

제주시 아라2동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들어선다
- 8

"인구 더 많은데 예산은?"… 행정시 예산 놓고 의원 '설전'
- 9

제주도청 주변 삼다공원·녹지공간 묶어 '도민의 숲' 조성
- 10

'매각 무산' 927억 제주 주상복합용지 매매가 재산정 논란
- 03:40

[책세상] 탄성 인간 外
- 02:40

[이책] 지구 위기 극복의 새로운 열쇠 '동물 인터…
- 02:00

[책세상] 감성과 생각의 싹 틔우는 문학의 향기
- 02:30

[책세상] '고딕x호러x제주'... 아름다운 섬, 이면…
- 01:40

[책세상] 배구 코트의 맛과 멋, 그리고 울림 外
- 01:20

[이책]『제주문학 100집』창작열정으로 걸어온 …
- 01:00

[책세상] 다채로운 빛깔의 시편, 마음 깊이 스미…
- 03:30

[책세상] 김동현 신작 비평집 ‘사랑의 서사는 …
- 02:30

[책세상] 박희순·신기영의 제주어동시 컬러링북…
- 02:00

[책세상] 금리로 혼내주는 선생님 外















 2024.11.29(금) 19:51
2024.11.29(금)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