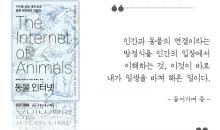[영화觀] 파도가 지나간 자리
살아가는 순간의 질감이 생생
- 입력 : 2020. 11.06(금)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영화 '도망친 여자'의 한 장면.
영화 '도망친 여자'를 보았다. 홍상수 감독의 24번째 장편영화이자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 감독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1996년 첫 작품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이후, 홍상수 감독은 매년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며 자신의 세계를 조금씩 넓혀나가고 있다. 마치 텃밭을 일구는 농부의 수확처럼 그의 작품 세계는 닮은 듯 또 다른 결과물들을 해마다 관객들에게 안긴다. 언제나 그렇듯 아무렇지 않게 시작한 그의 산책은 길에서 만난 무수한 풍경과 감정들을 보는 이들에게 전해준다.
무심하게 스쳐간 것들의 의미는 그것을 다시,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주인공 감희가 겪는 세 번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지나간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도망친 여자'는 스무고개의 등성이를 넘어가며 여러 번 보는 이를 멈칫하게 만드는 영화다. '우정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언제나처럼, 바다 수면 위와 아래로 여러 물결들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작품에 대한 설명처럼 영화는 복잡한 이면과 선연한 정면을 조립해 관계의 모양들을 입체적으로 만들어낸다.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대화를 나눈다는 영화의 구조는 단순하다. 그런데 그 만남과 대화는 같지만 다르다. 두 번은 계획적이고 한 번은 우연히 이루어진다. 세 차례, 별 것 없게 들리는 대화의 바깥에는 추측과 단정, 의심과 푸념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한다. 화면 속 등장 인물은 두 명 뿐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대화의 꼬리가 서로를 무는 순간 영화는 흥미로운 긴장감으로 가득해진다. 순간의 일이다. 단출한 차림인데 풍성한 미감을 갖게 만드는 홍상수 영화의 특별한 개성이 '도망친 여자'에도 여전하다.
 '도망친 여자'는 또한 여자들의 영화이기도 하다. 이 영화 속 남자들은 얼굴을 가늠하기 힘들다. 그 남자들은 뒷모습으로 변명하고 뒷모습으로 불만을 이야기한다. 얼굴이 보이는 남자는 여자에 의해 내쫓김을 당한다. 거나한 술자리에서의 분노도 찾아보기 힘들다. 떠들썩하던 유머는 작고 경쾌하게 변했고 불 같던 분노는 감정 이후의 사과와 수락으로 평온을 찾았다. 현명한 여자들 덕에 홍상수의 세계는 고요해졌다.
'도망친 여자'는 또한 여자들의 영화이기도 하다. 이 영화 속 남자들은 얼굴을 가늠하기 힘들다. 그 남자들은 뒷모습으로 변명하고 뒷모습으로 불만을 이야기한다. 얼굴이 보이는 남자는 여자에 의해 내쫓김을 당한다. 거나한 술자리에서의 분노도 찾아보기 힘들다. 떠들썩하던 유머는 작고 경쾌하게 변했고 불 같던 분노는 감정 이후의 사과와 수락으로 평온을 찾았다. 현명한 여자들 덕에 홍상수의 세계는 고요해졌다.
'도망친 여자'의 전작인 세 편의 흑백영화 '그 후', '풀잎들' 그리고 '강변호텔'은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작품들이었다. 흑백의 세계 속 요동치는 인물의 감정들은 진하고 무겁고 때로는 신비롭기까지 했다. 반면 '도망친 여자'는 사소한 삶의 궁금증들로 가득한 영화다. 살아가는 순간의 질감을 만질 수 있게 만들어졌다. 맛있는 고기와 아기같은 길고양이들, 상대에게 더 잘 어울리는 옷, 사과를 깎는 솜씨와 인연을 끝내는 쾌감같은 생생한 감정들로 충만하다.
세차게 몰아치던 파도가 끝난 자리에는 또 다시 작은 파도들이 밀려온다. 홍상수 감독의 바다는 늘 그렇게 다른 모양으로 관객들을 불러 모은다. 나는 그의 해변에 앉을 때마다 외롭고 기쁘다.
<진명현·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1996년 첫 작품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이후, 홍상수 감독은 매년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며 자신의 세계를 조금씩 넓혀나가고 있다. 마치 텃밭을 일구는 농부의 수확처럼 그의 작품 세계는 닮은 듯 또 다른 결과물들을 해마다 관객들에게 안긴다. 언제나 그렇듯 아무렇지 않게 시작한 그의 산책은 길에서 만난 무수한 풍경과 감정들을 보는 이들에게 전해준다.
무심하게 스쳐간 것들의 의미는 그것을 다시,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주인공 감희가 겪는 세 번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지나간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도망친 여자'는 스무고개의 등성이를 넘어가며 여러 번 보는 이를 멈칫하게 만드는 영화다. '우정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언제나처럼, 바다 수면 위와 아래로 여러 물결들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작품에 대한 설명처럼 영화는 복잡한 이면과 선연한 정면을 조립해 관계의 모양들을 입체적으로 만들어낸다.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대화를 나눈다는 영화의 구조는 단순하다. 그런데 그 만남과 대화는 같지만 다르다. 두 번은 계획적이고 한 번은 우연히 이루어진다. 세 차례, 별 것 없게 들리는 대화의 바깥에는 추측과 단정, 의심과 푸념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한다. 화면 속 등장 인물은 두 명 뿐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대화의 꼬리가 서로를 무는 순간 영화는 흥미로운 긴장감으로 가득해진다. 순간의 일이다. 단출한 차림인데 풍성한 미감을 갖게 만드는 홍상수 영화의 특별한 개성이 '도망친 여자'에도 여전하다.

'도망친 여자'의 전작인 세 편의 흑백영화 '그 후', '풀잎들' 그리고 '강변호텔'은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작품들이었다. 흑백의 세계 속 요동치는 인물의 감정들은 진하고 무겁고 때로는 신비롭기까지 했다. 반면 '도망친 여자'는 사소한 삶의 궁금증들로 가득한 영화다. 살아가는 순간의 질감을 만질 수 있게 만들어졌다. 맛있는 고기와 아기같은 길고양이들, 상대에게 더 잘 어울리는 옷, 사과를 깎는 솜씨와 인연을 끝내는 쾌감같은 생생한 감정들로 충만하다.
세차게 몰아치던 파도가 끝난 자리에는 또 다시 작은 파도들이 밀려온다. 홍상수 감독의 바다는 늘 그렇게 다른 모양으로 관객들을 불러 모은다. 나는 그의 해변에 앉을 때마다 외롭고 기쁘다.
<진명현·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제주영어교육도시 FSAA 국제학교 건축 허가 승인
- 2

다음달 토트넘 합류하는 양민혁 제주 외가 찾는다
- 3

'비공개 오찬' 오영훈 지사 음식값 1인당 3만원 초과
- 4

읍면동 예산 최대 40% '싹둑'… "이래 놓고 '민생 예산'?"
- 5

제주행 항공기 탑승 50대 착륙 후 의식 잃고 쓰러져 사망
- 6

"인구 더 많은데 예산은?"… 행정시 예산 놓고 의원 '설전'
- 7

제주시 아라2동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들어선다
- 8

'매각 무산' 927억 제주 주상복합용지 매매가 재산정 논란
- 9

제주도청 주변 삼다공원·녹지공간 묶어 '도민의 숲' 조성
- 10

'아우성'에도 제주 차고지증명제 폐지-유지 입장차 '팽팽'















 2024.11.30(토) 11:32
2024.11.30(토)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