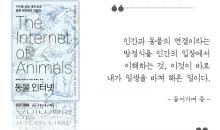[영화觀] 시와 산책
- 입력 : 2021. 05.07(금)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영화 '패터슨'.
얼마 전 아름다운 책을 읽었다. 한정원 작가의 '시와 산책'이라는 산문집이었는데 글들이 맑고 단정해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누군가가 이른 아침의 수고로 떠온 달고 찬 물을 마시는 것 같은 상쾌한 기분이 드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시와 산책'은 출판사 '시간의 흐름에'서 펴낸 '말들의 흐름'시리즈 중 한 권으로 마치 끝말잇기처럼 전작의 끝말 키워드를 하나 이어받고 자신의 단어 한 가지를 추가해 써 내려간 글들로 묶인 책이다. 시 그리고 산책. 어쩌면 현대인의 일상에서 이 두 가지는 일상의 필수 목록 중에서는 조금 멀리 위치한 말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시는 문학 중에서도 소수의 독자층을 가지고 있어 쉬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 어렵고 산책은 그 시간의 틈을 내기도 어려운 데다 마땅히 여유를 가지고 걸을 길을 찾기가 어려워 수월 하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산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니 알고 있다기보다는 믿고 있다고 쓰는 쪽이 맞는 것 같다. 수많은 말들의 전장 속에서 다소곳이 물러나 스스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감정의 정수인 시의 언어는 우리의 삶을 잠시나마 멈추게 만든다. 그리고 그 멈춘 지점에서 시는 유용하다고 믿던 것들을 일순간 무용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금세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들의 조합을 다시 읽어내고 나의 감정과 마주하게 하는 일은 오직 시의 언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멈춰서 흘러가지 않는 시의 시간들 덕에 우리는 이따금 차오르는 감정들을 기어코 호명할 수 있게 된다. 언어를 만든 이가 여전히 궁금해하는 진화의 형태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시가 아닐까 한다.
영화 '패터슨'은 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패터슨이라는 소도시의 버스 운전사 패터슨은 출퇴근, 도시락, 아내, 가정, 퇴근 후 맥주 한 잔, 개와의 산책 등으로 이루어진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의 일상은 특별한 사건도 끔찍한 사고도 없이 낙수처럼 자연스럽고 호수처럼 고요하다. 그런 그에게 시가 있다. 그는 패터슨에 살았던 시인의 존경해 그의 시집을 보석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매일 자신의 시를 쓴다. 패터슨에게는 그 행위가 몸에 익고 생활에 녹아들어 '시를 쓴다'는 말이 주는 다소의 난이도가 '물을 마신다, 하늘을 본다'는 말처럼 익숙하기만 하다. 덕분에 영화는 자주 관객을 멈추게 만든다. 시를 쓰는 사람이 멈추어 무언가를 바라볼 때 관객 역시 스크린 속 인물과 같은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관찰은 아마도 시의 언어를 골라낼 때 맨 처음이 되는 행위일 것이다. 자연을 노래한 시인이자 산문가 메리 올리버가 지켜본 것처럼 자연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는 동시에 알수록 새로운 것이라 시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꺼내 자연 앞에 둘 때 그리고 마음과 풍경이 만나 대화가 시작될 때 그 순간들이 우리 앞에 서정시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닐까. 영화 속 패터슨이 동네 벤치 앞에 앉아 그 자연을 바라볼 때 어떤 일본인 시인이 그의 옆에 앉게 된다. 그리고 그는 '시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라는 패터슨의 물음에 자신은 '시로 숨을 쉰다'라고 말한다. 그 둘은 그 벤치에 앉아 한 곳을 바라보며 길지 않은 말들로 풍성한 대화를 이어간다. 이 범상하고 우연한 만남은 이 영화 속에서도 밖에서도 러닝타임 이상으로 머무른다.
장건재 감독의 영화 '한여름의 판타지아'는 산책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다. 일본의 고조시 작은 마을에서 촬영된 이 영화는 흑백의 1부와 컬러의 2부로 나뉜 작품으로 우연히 낯선 곳을 찾은 이들의 여정으로 이루어지는 영화다. 또한 이 영화 속 여름의 풍광을 온전히 담아낸 아름다운 장면들은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다리를 동동 거리게 만들기도 한다. '걷고 싶다'는 욕망을 이토록 청정하게 차오르게 한 영화는 이 영화가 처음이었다. 영화 속의 마을은 특별한 것이 없다. 그저 여름이라는 계절에 들어선 소란스럽지 않은 마을의 풍광이 펼쳐진다. 작은 가게들이 있고 거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의 소리와 길의 온도가 느껴지는 공간이다. 이 곳을 찾은 이들은 낯설지만 어렵지 않은 새로운 길들을 걷는다. 혼자 걸을 때도 있고 우연히 만난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도 있다. 특히 컬러로 촬영된 2부는 걷고 멈추고 바라보는 두 인물의 모든 것에 집중하는 영화다.
 한국에서 혼자 여행을 혼 혜정과 그곳에서 감을 재배하며 사는 유스케는 아는 길과 모르는 마음 사이를 함께 걷는다. 해가 뜨거운 낮을 지나, 바람이 해를 달래는 오후를 지나 그리고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는 작은 시간의 틈들을 그들을 함께 바라보며 걷는다. 한나절이 얼마나 짧고도 긴 시간인지를 영화의 마지막에서야 알았다. 나는 그 둘이 함께하는 한나절의 산책이 너무 좋아서 백일을 걷는 대도 따라 걸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카메라가 꺼지고 한없이 걸을 수 있을 것 같던 영화를 품은 나는 극장 문을 나서서 천천히 걸었다. 지하철이 끊기면 택시를 타고 택시가 당장 타고 싶지 않으면 좀 더 걷자 갈 수 있을 때까지 걸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한국에서 혼자 여행을 혼 혜정과 그곳에서 감을 재배하며 사는 유스케는 아는 길과 모르는 마음 사이를 함께 걷는다. 해가 뜨거운 낮을 지나, 바람이 해를 달래는 오후를 지나 그리고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는 작은 시간의 틈들을 그들을 함께 바라보며 걷는다. 한나절이 얼마나 짧고도 긴 시간인지를 영화의 마지막에서야 알았다. 나는 그 둘이 함께하는 한나절의 산책이 너무 좋아서 백일을 걷는 대도 따라 걸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카메라가 꺼지고 한없이 걸을 수 있을 것 같던 영화를 품은 나는 극장 문을 나서서 천천히 걸었다. 지하철이 끊기면 택시를 타고 택시가 당장 타고 싶지 않으면 좀 더 걷자 갈 수 있을 때까지 걸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영화를 본다는 일 또한 유용보다는 무용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시의 언어를 만드는 것처럼 영화를 천천히 되새기고, 산책을 하는 자의 그것처럼 앞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주며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행복하다'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날이 과연 그리 많을까. 분에 넘치게 유용한 날들이었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산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니 알고 있다기보다는 믿고 있다고 쓰는 쪽이 맞는 것 같다. 수많은 말들의 전장 속에서 다소곳이 물러나 스스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감정의 정수인 시의 언어는 우리의 삶을 잠시나마 멈추게 만든다. 그리고 그 멈춘 지점에서 시는 유용하다고 믿던 것들을 일순간 무용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금세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들의 조합을 다시 읽어내고 나의 감정과 마주하게 하는 일은 오직 시의 언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멈춰서 흘러가지 않는 시의 시간들 덕에 우리는 이따금 차오르는 감정들을 기어코 호명할 수 있게 된다. 언어를 만든 이가 여전히 궁금해하는 진화의 형태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시가 아닐까 한다.
영화 '패터슨'은 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패터슨이라는 소도시의 버스 운전사 패터슨은 출퇴근, 도시락, 아내, 가정, 퇴근 후 맥주 한 잔, 개와의 산책 등으로 이루어진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의 일상은 특별한 사건도 끔찍한 사고도 없이 낙수처럼 자연스럽고 호수처럼 고요하다. 그런 그에게 시가 있다. 그는 패터슨에 살았던 시인의 존경해 그의 시집을 보석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매일 자신의 시를 쓴다. 패터슨에게는 그 행위가 몸에 익고 생활에 녹아들어 '시를 쓴다'는 말이 주는 다소의 난이도가 '물을 마신다, 하늘을 본다'는 말처럼 익숙하기만 하다. 덕분에 영화는 자주 관객을 멈추게 만든다. 시를 쓰는 사람이 멈추어 무언가를 바라볼 때 관객 역시 스크린 속 인물과 같은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관찰은 아마도 시의 언어를 골라낼 때 맨 처음이 되는 행위일 것이다. 자연을 노래한 시인이자 산문가 메리 올리버가 지켜본 것처럼 자연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는 동시에 알수록 새로운 것이라 시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꺼내 자연 앞에 둘 때 그리고 마음과 풍경이 만나 대화가 시작될 때 그 순간들이 우리 앞에 서정시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닐까. 영화 속 패터슨이 동네 벤치 앞에 앉아 그 자연을 바라볼 때 어떤 일본인 시인이 그의 옆에 앉게 된다. 그리고 그는 '시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라는 패터슨의 물음에 자신은 '시로 숨을 쉰다'라고 말한다. 그 둘은 그 벤치에 앉아 한 곳을 바라보며 길지 않은 말들로 풍성한 대화를 이어간다. 이 범상하고 우연한 만남은 이 영화 속에서도 밖에서도 러닝타임 이상으로 머무른다.
장건재 감독의 영화 '한여름의 판타지아'는 산책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다. 일본의 고조시 작은 마을에서 촬영된 이 영화는 흑백의 1부와 컬러의 2부로 나뉜 작품으로 우연히 낯선 곳을 찾은 이들의 여정으로 이루어지는 영화다. 또한 이 영화 속 여름의 풍광을 온전히 담아낸 아름다운 장면들은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다리를 동동 거리게 만들기도 한다. '걷고 싶다'는 욕망을 이토록 청정하게 차오르게 한 영화는 이 영화가 처음이었다. 영화 속의 마을은 특별한 것이 없다. 그저 여름이라는 계절에 들어선 소란스럽지 않은 마을의 풍광이 펼쳐진다. 작은 가게들이 있고 거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의 소리와 길의 온도가 느껴지는 공간이다. 이 곳을 찾은 이들은 낯설지만 어렵지 않은 새로운 길들을 걷는다. 혼자 걸을 때도 있고 우연히 만난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도 있다. 특히 컬러로 촬영된 2부는 걷고 멈추고 바라보는 두 인물의 모든 것에 집중하는 영화다.

어쩌면 영화를 본다는 일 또한 유용보다는 무용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시의 언어를 만드는 것처럼 영화를 천천히 되새기고, 산책을 하는 자의 그것처럼 앞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주며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행복하다'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날이 과연 그리 많을까. 분에 넘치게 유용한 날들이었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제주영어교육도시 FSAA 국제학교 건축 허가 승인
- 2

다음달 토트넘 합류하는 양민혁 제주 외가 찾는다
- 3

'비공개 오찬' 오영훈 지사 음식값 1인당 3만원 초과
- 4

읍면동 예산 최대 40% '싹둑'… "이래 놓고 '민생 예산'?"
- 5

제주행 항공기 탑승 50대 착륙 후 의식 잃고 쓰러져 사망
- 6

"인구 더 많은데 예산은?"… 행정시 예산 놓고 의원 '설전'
- 7

제주시 아라2동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들어선다
- 8

'매각 무산' 927억 제주 주상복합용지 매매가 재산정 논란
- 9

제주도청 주변 삼다공원·녹지공간 묶어 '도민의 숲' 조성
- 10

'아우성'에도 제주 차고지증명제 폐지-유지 입장차 '팽팽'















 2024.11.30(토) 11:32
2024.11.30(토)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