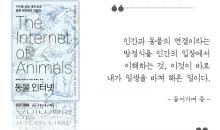[영화觀] 오픈 더 도어
- 입력 : 2022. 11.11(금)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영화 '탑'.
홍상수 감독의 28번째 장편영화 '탑'이 개봉했다. 홍상수 감독의 작품의 극장 개봉은 올해 봄 '소설가의 영화' 이후 6개월 만이다. 그는 지난해 '인트로덕션'과 '당신 얼굴 앞에서'로 두 편의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데 이어 올해 또한 2편의 장편 영화를 극장에 걸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과도 무관하게 느껴지는 창작자인 그는 외적인 상황이 어찌 되었건 여전히 영화를 만들고 매년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 성실한 창작자는 여전히 비슷한 듯 새로운 세계를 자신의 영화 안으로 들인 뒤 꺼내어 놓는다. 세계 안으로 그가 들어간 것인지 세계를 불러들인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것 또한 크게 상관이 없다. 그는 여전히 영화를 통해 세상을 만나고 그렇게 만든 세계로 관객들을 초대하는 이다. 그리고 이 초대장은 이제 어떤 관객들에게는 연례행사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겉치레도, 의구심도 없는 영화의 당연한 도착. 아마도 영화감독에게 관객들의 기다림이 길지 않게 하는 것 이상의 수고는 많지 않을 것이다.
'탑'은 성 안에 살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다. 평면 위에 세워진 것은 그것이 어떤 높이든 단차를 만들어낸다. 이 세상에 하나의 인간이 태어나 발생하는 모든 일들 또한 평평한 어떤 시간으로부터 굴곡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말이다. 홍상수의 영화가 관객들을 흥미롭게 하는 것은 생의 이치 위에 얹힌 공간의 운치 때문이기도 한데 '탑'은 그 운치의 서정을 드러내는 작품으로서 특히 매력적이다. 아마도 '탑'은 홍상수의 작품들 중 '풀잎들'과 함께 하나의 공간 자체가 이야기의 포문을 여는 작품으로도 기억될 것이다.
한 공간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시간이 흘러가고 흘러간 시간 동안 머무르거나 떠난 것들이 생기는 한 남자의 여정은 어느 누구의 인생 과도 닮아 있다. 좁은 폭의 높은 계단을 오르든, 넓은 폭의 낮은 계단을 오르듯 우리는 살면서 머물지 않고 어딘가를 향한다. 그리고 어떤 강도가 들던 다리를 움직여 다른 곳을 밟는 일에는 각기 다르게 힘이 든다. 그러다가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기도 한다. 한 사람이 타인을 만난다는 것은 문을 여는 일이다. 선뜻 문을 열어주는 이도 있을 것이고 문을 잠그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도 있을 것이다. 문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을 덮어버리는 다른 문의 열림도 찾아올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예상 밖의 시간들이 계단을 오른 문의 뒤에 펼쳐진다. 인생이 이야기 같다는 것은 이렇게 계단을 오르고 문을 만나는, 나를 움직여 타인 앞에 서는 순간들 때문이다. 하지만 또한 삶이 속절없다는 자조는 그 계단과 문이 존재한 공간이 사실 나라는 한 사람의 성 안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세상의 모든 탑들은 내가 쌓고 무너뜨린 시간이며 공간이다.
영화 '탑'은 이 자연스럽지만 불가해한 삶의 비밀로 둘러 쌓인 이야기다. 오르막과 내리막, 나아감과 머무름, 안도와 후회가 공존하는 이 세계는 홍상수 감독 특유의 고즈넉한 흑백의 무드를 통해 전개된다. 예의 그렇듯 인상적인 대화들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속내에 있던 겹겹의 의도가 드러나며 배우들의 사소한 움직임들은 리드미컬한 몸짓의 앙상블이 돼 세계 안을 유영한다. 특히 홍상수 감독의 전작 '그 후'를 통해 중년 남성의 심리를 탁월하게 그려냈던 배우 권해효는 '탑'을 통해 또 한 번 그의 새로운 표정과 음성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방금 내려온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어쩌면 홍상수의 세계 또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나쳐온 세계 속에 있던 것들을 그러모아 반죽한 이 작품의 탄력성은 엔딩으로 이를수록 놀라운 마법을 부린다. 감탄과 한숨이 동시에 나올 '탑'의 결말에서 또다시 계단을 오르고 다른 문을 열고 싶어지는 관객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진명현 독립영화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탑'은 성 안에 살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다. 평면 위에 세워진 것은 그것이 어떤 높이든 단차를 만들어낸다. 이 세상에 하나의 인간이 태어나 발생하는 모든 일들 또한 평평한 어떤 시간으로부터 굴곡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말이다. 홍상수의 영화가 관객들을 흥미롭게 하는 것은 생의 이치 위에 얹힌 공간의 운치 때문이기도 한데 '탑'은 그 운치의 서정을 드러내는 작품으로서 특히 매력적이다. 아마도 '탑'은 홍상수의 작품들 중 '풀잎들'과 함께 하나의 공간 자체가 이야기의 포문을 여는 작품으로도 기억될 것이다.
한 공간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시간이 흘러가고 흘러간 시간 동안 머무르거나 떠난 것들이 생기는 한 남자의 여정은 어느 누구의 인생 과도 닮아 있다. 좁은 폭의 높은 계단을 오르든, 넓은 폭의 낮은 계단을 오르듯 우리는 살면서 머물지 않고 어딘가를 향한다. 그리고 어떤 강도가 들던 다리를 움직여 다른 곳을 밟는 일에는 각기 다르게 힘이 든다. 그러다가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기도 한다. 한 사람이 타인을 만난다는 것은 문을 여는 일이다. 선뜻 문을 열어주는 이도 있을 것이고 문을 잠그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도 있을 것이다. 문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을 덮어버리는 다른 문의 열림도 찾아올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예상 밖의 시간들이 계단을 오른 문의 뒤에 펼쳐진다. 인생이 이야기 같다는 것은 이렇게 계단을 오르고 문을 만나는, 나를 움직여 타인 앞에 서는 순간들 때문이다. 하지만 또한 삶이 속절없다는 자조는 그 계단과 문이 존재한 공간이 사실 나라는 한 사람의 성 안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세상의 모든 탑들은 내가 쌓고 무너뜨린 시간이며 공간이다.
영화 '탑'은 이 자연스럽지만 불가해한 삶의 비밀로 둘러 쌓인 이야기다. 오르막과 내리막, 나아감과 머무름, 안도와 후회가 공존하는 이 세계는 홍상수 감독 특유의 고즈넉한 흑백의 무드를 통해 전개된다. 예의 그렇듯 인상적인 대화들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속내에 있던 겹겹의 의도가 드러나며 배우들의 사소한 움직임들은 리드미컬한 몸짓의 앙상블이 돼 세계 안을 유영한다. 특히 홍상수 감독의 전작 '그 후'를 통해 중년 남성의 심리를 탁월하게 그려냈던 배우 권해효는 '탑'을 통해 또 한 번 그의 새로운 표정과 음성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방금 내려온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어쩌면 홍상수의 세계 또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나쳐온 세계 속에 있던 것들을 그러모아 반죽한 이 작품의 탄력성은 엔딩으로 이를수록 놀라운 마법을 부린다. 감탄과 한숨이 동시에 나올 '탑'의 결말에서 또다시 계단을 오르고 다른 문을 열고 싶어지는 관객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진명현 독립영화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제주영어교육도시 FSAA 국제학교 건축 허가 승인
- 2

'비공개 오찬' 오영훈 지사 음식값 1인당 3만원 초과
- 3

제주행 항공기 탑승 50대 착륙 후 의식 잃고 쓰러져 사망
- 4

찬 바람 매서운 제주지방 산지 최고 15㎝ 폭설 쏟아진다
- 5

읍면동 예산 최대 40% '싹둑'… "이래 놓고 '민생 예산'?"
- 6

다음달 토트넘 합류하는 양민혁 제주 외가 찾는다
- 7

제주시 아라2동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들어선다
- 8

제주도청 주변 삼다공원·녹지공간 묶어 '도민의 숲' 조성
- 9

"인구 더 많은데 예산은?"… 행정시 예산 놓고 의원 '설전'
- 10

'아우성'에도 제주 차고지증명제 폐지-유지 입장차 '팽팽'















 2024.11.28(목) 20:36
2024.11.28(목)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