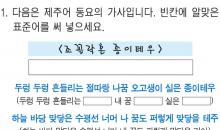[김영호의 월요논단] 2022 제주비엔날레의 역설적 성취
- 입력 : 2023. 02.06(월)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한라일보] 제3회 제주비엔날레가 이달 12일 폐막을 앞두고 있다.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이라는 주제 아래 16개국 55명(팀)이 참여해 제주도립미술관에서 가파도에 이르는 도내 6개 장소에서 165점의 작품을 펼쳐놓았다. 시의성 있는 주제와 예술감독의 전시기획 역량에 힘입어 성공적인 비엔날레로 평가될 것이다. 하지만 이 성공은 그동안 제주비엔날레의 파행과 부실을 극복하려는 도민들의 기대치를 염두에 두고 내린 역설적인 평가이기도 하다. 역설의 요지는 제주비엔날레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번 행사가 지속에 힘을 보태 주었다는 것이다. 감사한 일이다.
그동안 제주비엔날레의 파행적 운영은 독립된 전담 조직이 없이 제주도립미술관이 주최하면서 예견된 것이었다.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이 비엔날레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무리수를 둔 것이다. 미술관과 화랑의 기능을 하나로 묶을 수 없듯이 미술관과 비엔날레의 통합 운영은 일부 미술인에게 이득을 줄 수 있으나 건강한 미술 문화를 세우는데 저해되는 요소로 작동할 소지가 크다. 제주비엔날레가 시작부터 뒤틀리고 삐걱거려 온 것은 '말 안장(鞍裝) 올리는 시간과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다.
제주도는 1995년 8월 우리나라 최초로 비엔날레의 문을 열었다. 지방자치 원년을 계기로 미술협회 제주도지회가 주관하며 프레비엔날레의 이름을 달았으나 같은 해에 출범한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에 밀려 23년 동안 침묵을 지킬 수 밖에 없었다. '비엔날레 천국' 시대로 접어든 2017년 제1회 제주비엔날레가 제주도립미술관장의 발의로 개최되었으나 소송과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고 이후 2020년 5월에 계획되었던 2회 행사 역시 제주도립미술관장과 예술감독의 불협화음으로 무산되었다. 5년 만에 열린 제3회 비엔날레는 2회 없는 3회라는 점에서 상처와 트라우마를 계속해 끌어안아야 한다.
이제 파행의 시간을 반성할 때가 되었다. 제3회 제주비엔날레의 역설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비엔날레가 제주도립미술관 운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제주도립미술관 자체가 아직도 조직과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비엔날레라는 용광로를 끌어안으며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미술관 주최가 비엔날레의 특수성과 경쟁적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린 오판이었다는 언론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제주도립미술관의 월권으로 자율성과 권한을 침해 받았다'는 한 예술감독의 항변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민들의 노력으로 기사회생(起死回生)한 제3회 제주비엔날레는 정석을 두었다. 비엔날레의 가치와 미래비전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제주도립미술관과 분리된 독립 조직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는 제주도립미술관의 법률적 기능과 건강성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김영호 중앙대교수, 한국박물관학회장>
그동안 제주비엔날레의 파행적 운영은 독립된 전담 조직이 없이 제주도립미술관이 주최하면서 예견된 것이었다.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이 비엔날레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무리수를 둔 것이다. 미술관과 화랑의 기능을 하나로 묶을 수 없듯이 미술관과 비엔날레의 통합 운영은 일부 미술인에게 이득을 줄 수 있으나 건강한 미술 문화를 세우는데 저해되는 요소로 작동할 소지가 크다. 제주비엔날레가 시작부터 뒤틀리고 삐걱거려 온 것은 '말 안장(鞍裝) 올리는 시간과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다.
제주도는 1995년 8월 우리나라 최초로 비엔날레의 문을 열었다. 지방자치 원년을 계기로 미술협회 제주도지회가 주관하며 프레비엔날레의 이름을 달았으나 같은 해에 출범한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에 밀려 23년 동안 침묵을 지킬 수 밖에 없었다. '비엔날레 천국' 시대로 접어든 2017년 제1회 제주비엔날레가 제주도립미술관장의 발의로 개최되었으나 소송과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고 이후 2020년 5월에 계획되었던 2회 행사 역시 제주도립미술관장과 예술감독의 불협화음으로 무산되었다. 5년 만에 열린 제3회 비엔날레는 2회 없는 3회라는 점에서 상처와 트라우마를 계속해 끌어안아야 한다.
이제 파행의 시간을 반성할 때가 되었다. 제3회 제주비엔날레의 역설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비엔날레가 제주도립미술관 운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제주도립미술관 자체가 아직도 조직과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비엔날레라는 용광로를 끌어안으며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미술관 주최가 비엔날레의 특수성과 경쟁적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린 오판이었다는 언론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제주도립미술관의 월권으로 자율성과 권한을 침해 받았다'는 한 예술감독의 항변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민들의 노력으로 기사회생(起死回生)한 제3회 제주비엔날레는 정석을 두었다. 비엔날레의 가치와 미래비전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제주도립미술관과 분리된 독립 조직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는 제주도립미술관의 법률적 기능과 건강성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김영호 중앙대교수, 한국박물관학회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민주당은 왜 자당 소속 도지사를 비판하나
- 2

내년부터 '무관세' 만다린... 공격적 홍보에 제주 "어쩌나"
- 3

제주, 내년부터 손주돌봄수당 신설·생활임금 인상
- 4

“버스 타려면 한참”… 서광로 정류장 폐쇄에 시민 불편
- 5

제주도 "65세 이후 실제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면 20만 원"
- 6

양길현 제주대 명예교수 "도지사 선거 출마 결심"
- 7

제주도 칡덩굴 예산 뒷걸음질.. 체계적 관리 무색
- 8

제주지방 병오년 첫날부터 강추위 .. 산지 최고 20㎝ 눈
- 9

제주지방 내일부터 세밑 한파.. 새해 첫날 체감기온 영하권
- 10

제주은행 경영진 인사... 신임 전무 강소영, 상무 정성훈
- 02:30

[이방훈의 건강&생활] 제4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
- 02:00

[열린마당] 추자도 돈대산에서 새해 상생과 풍요…
- 01:00

[열린마당] 소방차 길 터주기, 안전을 위한 도민…
- 01:30

[김동현의 하루를 시작하며] 박진경과 반지성주…
- 21:10

[열린마당] 괜찮을 거라는 착각, 숙취운전이 더 …
- 01:30

[김윤우의 한라칼럼] 만다린… 진짜가 온다
- 01:00

[열린마당] 4·3현장을 찾은 미국 목사님들에게 …
- 01:00

[열린마당] 연말연시, 안전하고 건강한 해외여행…
- 03:30

[현승훈 문화광장] 새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 02:30

[열린마당] 노유자시설 안전에 ‘방심’은 금물!















 2026.01.01(목) 01:01
2026.01.01(목) 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