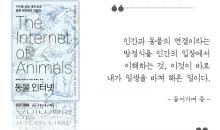[황학주의 제주살이] (43)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입력 : 2022. 07.19(화)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한라일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다. 가령 연못 건너편에서 한 사람이 무심히 앞을 보며 그냥 걸어가기만 했는데 감동이 오는 그런 일 말이다. 우아하고 왠지 모를 아련한 슬픔을 남기며 지나쳐가는 옆모습이 눈동자에 어리고 어쩐지 조금은 닮은 듯한 아픔이 있는 것도 같은 뒷모습이 여운으로 다가오면, 보는 사람의 마음은 좀 힘들어지기까지 하는 것이다.
둔한 제자 하나가 있다. 우리가 만난 지도 이십 년이 돼가지만 어쩌다 보는 편이고, 전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지금은 소품가게를 하고 있다. 내가 시를 가르칠 때 어깨 너머로 몇 번 배운 적이 있어서 만나면 "선생님"이라 부르고 스승의날이나 내 생일 같은 때 매번 선물을 보내오니까 어느 시점에서 자연 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런데 시를 쓰고 있느냐 물으면 미소를 지으며 대답이 없고, 시 몇 편을 가져와 보라 하면 마치 뒤로 물러나며 내게서 더욱 멀어지는 듯한 그런 사람이다. 잘 정리되지 않는 자신과 아직 보여주고 싶지 않은 시를 들고 집과 일터 사이를 맴도는 사람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근년에 자기가 누구고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뭔지 확실하게 떠오른다고 해서 아, 드디어 나도 선물을 할 때가 찾아왔나보다 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꼭 읽어야 할 젊은 시인들의 시집을 추천해 주고, 나라는 사람은 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려주기도 했다. 내 기억 속엔 무슨 일이든 티 내지 않고 조용조용 해내는 성품의 소유자이며 우아한 정경이 느껴지는 터라 저런 사람이 시를 쓰면 참 좋겠다.
얼마 전 서울 사무실에 출근해보니 책상에 등기로 부쳐온 큰 봉투가 있었다. 앞면에 "선생님께" 라고 펜으로 쓴 글씨가 너무 작고, 얼른 봐도 봉투는 세간에서 흔히 쓰는 봉투가 아니며 한지나 특수용지로 만든 특별하달 게 있는 봉투도 아닌데 뭔가 느낌이 있었다. 직접 종이를 자르고 접어서 만든 홈메이드 봉투이다. 소품 가게를 하며 각각의 상품에 맞는 봉투를 손수 만들어 쓴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그 봉투 또한 같은 데서 만든 것임이 틀림없다.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지금처럼 한 제자가 조금씩 조금씩 더디게 아주 오래 걸려서 시를 들고 오는 사례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시만 오는 게 아니라 삶과 삶의 형태와 내용까지 실려서 온다. 어느 연못 건너편에서 오래전에 지나쳤는데 아직도 여운이 남은 선생의 눈동자에 다시금 나타난 사람은 마흔이 되면 조금은 나은 시를 쓰겠지, 오십이 되면 조금은 나은 시를 쓰겠지, 라며 시를 계속 쓴 제자이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한마디뿐이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시인>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둔한 제자 하나가 있다. 우리가 만난 지도 이십 년이 돼가지만 어쩌다 보는 편이고, 전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지금은 소품가게를 하고 있다. 내가 시를 가르칠 때 어깨 너머로 몇 번 배운 적이 있어서 만나면 "선생님"이라 부르고 스승의날이나 내 생일 같은 때 매번 선물을 보내오니까 어느 시점에서 자연 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런데 시를 쓰고 있느냐 물으면 미소를 지으며 대답이 없고, 시 몇 편을 가져와 보라 하면 마치 뒤로 물러나며 내게서 더욱 멀어지는 듯한 그런 사람이다. 잘 정리되지 않는 자신과 아직 보여주고 싶지 않은 시를 들고 집과 일터 사이를 맴도는 사람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근년에 자기가 누구고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뭔지 확실하게 떠오른다고 해서 아, 드디어 나도 선물을 할 때가 찾아왔나보다 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꼭 읽어야 할 젊은 시인들의 시집을 추천해 주고, 나라는 사람은 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려주기도 했다. 내 기억 속엔 무슨 일이든 티 내지 않고 조용조용 해내는 성품의 소유자이며 우아한 정경이 느껴지는 터라 저런 사람이 시를 쓰면 참 좋겠다.
얼마 전 서울 사무실에 출근해보니 책상에 등기로 부쳐온 큰 봉투가 있었다. 앞면에 "선생님께" 라고 펜으로 쓴 글씨가 너무 작고, 얼른 봐도 봉투는 세간에서 흔히 쓰는 봉투가 아니며 한지나 특수용지로 만든 특별하달 게 있는 봉투도 아닌데 뭔가 느낌이 있었다. 직접 종이를 자르고 접어서 만든 홈메이드 봉투이다. 소품 가게를 하며 각각의 상품에 맞는 봉투를 손수 만들어 쓴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그 봉투 또한 같은 데서 만든 것임이 틀림없다.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지금처럼 한 제자가 조금씩 조금씩 더디게 아주 오래 걸려서 시를 들고 오는 사례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시만 오는 게 아니라 삶과 삶의 형태와 내용까지 실려서 온다. 어느 연못 건너편에서 오래전에 지나쳤는데 아직도 여운이 남은 선생의 눈동자에 다시금 나타난 사람은 마흔이 되면 조금은 나은 시를 쓰겠지, 오십이 되면 조금은 나은 시를 쓰겠지, 라며 시를 계속 쓴 제자이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한마디뿐이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시인>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제주영어교육도시 FSAA 국제학교 건축 허가 승인
- 2

다음달 토트넘 합류하는 양민혁 제주 외가 찾는다
- 3

'비공개 오찬' 오영훈 지사 음식값 1인당 3만원 초과
- 4

읍면동 예산 최대 40% '싹둑'… "이래 놓고 '민생 예산'?"
- 5

제주행 항공기 탑승 50대 착륙 후 의식 잃고 쓰러져 사망
- 6

"인구 더 많은데 예산은?"… 행정시 예산 놓고 의원 '설전'
- 7

제주시 아라2동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들어선다
- 8

'매각 무산' 927억 제주 주상복합용지 매매가 재산정 논란
- 9

제주도청 주변 삼다공원·녹지공간 묶어 '도민의 숲' 조성
- 10

'아우성'에도 제주 차고지증명제 폐지-유지 입장차 '팽팽'















 2024.11.30(토) 11:32
2024.11.30(토)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