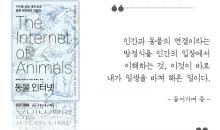[황학주의 제주살이] (59)산귤나무가 있는 집
- 입력 : 2022. 11.08(화)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한라일보] 수산리 살 때 옆 마을에 빈집이 나왔다고 해서 차를 몰고 가면서 빈집이 나왔다고 이렇게 달려가는 일은 뭔가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아닐까 싶었지만, 담장가에 구옥 지붕을 넘어 하늘로 솟구친 엄청난 크기의 산귤나무 한 그루를 보고는 나 자신을 용납하기로 했던 일이 있다. 100년 이상 굳건히 자라고 있는 산귤나무는 노란 귤 열매들이 꽃처럼 가득 달려 줄줄이 눈앞에 떠오르고 있었다.
마을의 중심이면서 길에서 살짝 구부려져 들어가 있는 듯 없는 듯한 조용한 골목 그 빈집을 구입하고 싶어 잠만 자고 나면 일어나 그 집에 가 산물낭이라 부르는 그 귤나무와 집과 마당, 텃밭에 딸린 감귤밭과 돌담 등을 만져보곤 했다. 정낭이나 대문이 없는 빈집에 햇볕과 바람이 지나다니고 나 또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이십 미터쯤 들어간 골목 끝집인데 골목 입구에서 보아도 산귤나무로 인해 집이 훤하고, 심지어 그 집에 이르는 길은 보존이 잘 된 옛 돌담길이었으며, 인근의 풍광은 인간의 목측을 가로막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듯 있는 그대로 그냥 예쁘기만 했다. 골목길은 비포장이며 길의 표면에 살짝 솟아 나온 돌부리들이 있었다. 나는 돌부리를 왼발로 차보기도 했다. 예로부터 제주에선 남자는 집에서 나와 왼발로 돌부리를 차면 운수가 좋고, 여자는 반대로 집에서 나와 오른발로 돌부리를 차면 운수가 좋다는 말이 있다. 저 집을 구입할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은 돌부리에 얻어걸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골목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하루는 드로잉북을 들고 가 그 빈집 우물가에 앉아 슬레이트집과 노란 귤이 무더기 무더기로 달린 산귤나무를 그렸다. 오래된 지붕은 슬레이트 용마루가 무너져 평평한 오름의 선처럼 단순한 아름다움으로 멎어 있고 마치 보이지 않는 띠로 겨우 덮어놓아 바람에 뜨려는 것도 같고, 혹은 띠줄로 얽어매어 마당에 더 눌러앉으려는 듯도 해보였다. 그 뒤로 높은 가지에 무성한 진귤들의 노란 색깔은 얼핏 같아 보이지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고유한 빛깔을 내며 하늘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었다.
10년 전에 보았던 그 집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다. 무엇보다도 산귤나무의 소식이 궁금하다. 살면서 오래된 것들이 좋고 그것에 마음을 주는 일이 잦아지는 것은 나름의 빛과 시간 속을 통과해 온 그런 종류의 것들에 스며들어 있는 애잔한 매력과 환상 때문일 것이다. 살아보고 놀아본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익음과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아주 할 수 없이 되면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집을 떠올리고 고향집의 감나무나 귤나무를 생각하게 된다. <시인>
마을의 중심이면서 길에서 살짝 구부려져 들어가 있는 듯 없는 듯한 조용한 골목 그 빈집을 구입하고 싶어 잠만 자고 나면 일어나 그 집에 가 산물낭이라 부르는 그 귤나무와 집과 마당, 텃밭에 딸린 감귤밭과 돌담 등을 만져보곤 했다. 정낭이나 대문이 없는 빈집에 햇볕과 바람이 지나다니고 나 또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었다.
이십 미터쯤 들어간 골목 끝집인데 골목 입구에서 보아도 산귤나무로 인해 집이 훤하고, 심지어 그 집에 이르는 길은 보존이 잘 된 옛 돌담길이었으며, 인근의 풍광은 인간의 목측을 가로막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듯 있는 그대로 그냥 예쁘기만 했다. 골목길은 비포장이며 길의 표면에 살짝 솟아 나온 돌부리들이 있었다. 나는 돌부리를 왼발로 차보기도 했다. 예로부터 제주에선 남자는 집에서 나와 왼발로 돌부리를 차면 운수가 좋고, 여자는 반대로 집에서 나와 오른발로 돌부리를 차면 운수가 좋다는 말이 있다. 저 집을 구입할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은 돌부리에 얻어걸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골목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하루는 드로잉북을 들고 가 그 빈집 우물가에 앉아 슬레이트집과 노란 귤이 무더기 무더기로 달린 산귤나무를 그렸다. 오래된 지붕은 슬레이트 용마루가 무너져 평평한 오름의 선처럼 단순한 아름다움으로 멎어 있고 마치 보이지 않는 띠로 겨우 덮어놓아 바람에 뜨려는 것도 같고, 혹은 띠줄로 얽어매어 마당에 더 눌러앉으려는 듯도 해보였다. 그 뒤로 높은 가지에 무성한 진귤들의 노란 색깔은 얼핏 같아 보이지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고유한 빛깔을 내며 하늘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었다.
10년 전에 보았던 그 집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다. 무엇보다도 산귤나무의 소식이 궁금하다. 살면서 오래된 것들이 좋고 그것에 마음을 주는 일이 잦아지는 것은 나름의 빛과 시간 속을 통과해 온 그런 종류의 것들에 스며들어 있는 애잔한 매력과 환상 때문일 것이다. 살아보고 놀아본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익음과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아주 할 수 없이 되면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집을 떠올리고 고향집의 감나무나 귤나무를 생각하게 된다. <시인>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제주영어교육도시 FSAA 국제학교 건축 허가 승인
- 2

다음달 토트넘 합류하는 양민혁 제주 외가 찾는다
- 3

'비공개 오찬' 오영훈 지사 음식값 1인당 3만원 초과
- 4

읍면동 예산 최대 40% '싹둑'… "이래 놓고 '민생 예산'?"
- 5

제주행 항공기 탑승 50대 착륙 후 의식 잃고 쓰러져 사망
- 6

"인구 더 많은데 예산은?"… 행정시 예산 놓고 의원 '설전'
- 7

제주시 아라2동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들어선다
- 8

'매각 무산' 927억 제주 주상복합용지 매매가 재산정 논란
- 9

제주도청 주변 삼다공원·녹지공간 묶어 '도민의 숲' 조성
- 10

'아우성'에도 제주 차고지증명제 폐지-유지 입장차 '팽팽'















 2024.11.30(토) 11:32
2024.11.30(토)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