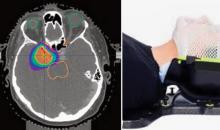[황학주의 詩읽는 화요일] (4)나무와 의자 (김수열)
- 입력 : 2023. 01.31(화) 00:00
-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나무와 의자
김수열
죽은 나무가 산 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동안
산 나무는 죽은 나무를 안쓰럽게 내려다본다
폭설경보 내린 눈발 흩뿌리는 겨울이었다
오는 이도 가는 이도 없는 하얀 날이었다
무릎 비운 의자가 발등 부은 나무에 눈길 주는 동안
의자를 꿈꾸는 나무는 제 몸 뒤척여 마른 잎 하나
한때 나무였던 의자 무릎에 가만히 내려놓는다

'물끄러미' 보고 '안쓰럽게' 보지 못하면 서로를 알 수 없고, 서로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살면서 사람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길'을 주는 행위이지요. 내가 눈길을 주지 못해 누군가 슬프고 한참을 죽어갈 수 있습니다. '눈길을 준다'는 것은 관심을 표한다는 말이지만, 그것은 또한 조심성이 내포된 섬세한 동사입니다. 그 조심성은 배려의 일종이지만, 생각의 다른 이름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 생각에 의해 이윽고 '마른 잎' 하나를 떨어뜨려 주는 해맑은 실천이 낳아집니다.
세상엔 폭설경보가 내리고, 눈발 흩날리는 날 눈앞에 두 그루 나무와 빈 의자가 있습니다. 모두 나란히 함께 있지만 그 속에 살고 죽는 엇갈림이 있고, 봄이 돌아와 누군가 무릎에 앉아 주기를 바라는 긴 기다림이 있습니다. 모로 돌아앉아 일부러 눈길을 피해 주는 나무도 하나 나지막히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소멸의 운명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해 취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젊은이에게 '마른 잎' 떨어뜨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꿈꾸는 누군가의 소박한 신생(新生)을 눈보라 맞으며 기도해주는 것이 대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시인>
김수열
죽은 나무가 산 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동안
산 나무는 죽은 나무를 안쓰럽게 내려다본다
폭설경보 내린 눈발 흩뿌리는 겨울이었다
오는 이도 가는 이도 없는 하얀 날이었다
무릎 비운 의자가 발등 부은 나무에 눈길 주는 동안
의자를 꿈꾸는 나무는 제 몸 뒤척여 마른 잎 하나
한때 나무였던 의자 무릎에 가만히 내려놓는다

삽화=써머
'물끄러미' 보고 '안쓰럽게' 보지 못하면 서로를 알 수 없고, 서로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살면서 사람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길'을 주는 행위이지요. 내가 눈길을 주지 못해 누군가 슬프고 한참을 죽어갈 수 있습니다. '눈길을 준다'는 것은 관심을 표한다는 말이지만, 그것은 또한 조심성이 내포된 섬세한 동사입니다. 그 조심성은 배려의 일종이지만, 생각의 다른 이름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 생각에 의해 이윽고 '마른 잎' 하나를 떨어뜨려 주는 해맑은 실천이 낳아집니다.
세상엔 폭설경보가 내리고, 눈발 흩날리는 날 눈앞에 두 그루 나무와 빈 의자가 있습니다. 모두 나란히 함께 있지만 그 속에 살고 죽는 엇갈림이 있고, 봄이 돌아와 누군가 무릎에 앉아 주기를 바라는 긴 기다림이 있습니다. 모로 돌아앉아 일부러 눈길을 피해 주는 나무도 하나 나지막히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소멸의 운명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해 취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젊은이에게 '마른 잎' 떨어뜨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꿈꾸는 누군가의 소박한 신생(新生)을 눈보라 맞으며 기도해주는 것이 대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시인>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오영훈 제주지사 광역단체장 하위 20% 감점 피했나
- 2

제주지방 주말 올 겨울들어 가장 춥다.. 최고 25㎝ 폭설
- 3

오영훈 지사 재선 도전 '시동'...책 출간으로 신호탄
- 4

제주도교육청 3월1일 정기인사... 교육국장에 윤철훈
- 5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가능성 낮아지나
- 6

더 빨라진 괭생이모자반의 습격… 제주바다 '몸살'
- 7

행안부·국회 제주도의원 정수 확대 신중.. 문턱 못넘나
- 8

제주 건설기계노동자 임금체불액만 2억5700여만원
- 9

제주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최대 50만원'
- 10

제주지방 2월 첫 주말 30㎝ 폭설.. 도로·공항 '비상'
- 20:43

원도심으로 간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 생…
- 10:04

[문화쪽지] 제주문학관, 멘토와 독서토론 '읽는 …
- 00:00

변화 준 입춘굿… "원형에 현대 의미 확장"
- 17:58

제주를 기억하다, 김택화 'of NOSTALGIA'
- 11:25

'악동' 캐릭터 작가 '나라 요시토모' 제주에 온다
- 17:56

발레 '돈키호테'에 국립극단 '스카팽'까지 … 서…
- 17:25

반세기 축적한 건축 언어 '제주체'… 제주 건축…
- 20:00

“액 가고 복 와라” 제주 봄 깨우는 입춘굿에 …
- 15:13

'2026 지역 대표 예술단체' 제주 2곳 선정
- 13:39

대한무용협회 지역 예술대상에 최길복 제주지회…















 2026.02.07(토) 14:01
2026.02.07(토)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