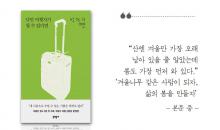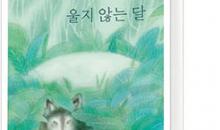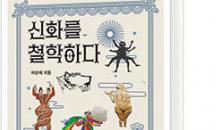[문영택의 한라칼럼] 비바람 부는 날의 다랑쉬굴 시혼제(詩魂祭)
- 입력 : 2024. 05.21(화)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한라일보] 지난 4월 3주 토요일 그리고 거센 비바람이 불던 날, '22회 다랑쉬굴 시혼제'에 참여하려 이생진(1929년 생) 시인과 그를 흠모하는 회원 10여 명, 구좌문학회와 구좌4·3유족회 회원 20여 명 등이 다랑쉬굴로 모여들었다. 최근 송이로 단장된 오솔길을 지나 도착한 다랑쉬굴 입구에는 '이생진 시인과 함께 하는 다랑쉬굴, 어머니의 숨비소리'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리고, 국화꽃 11송이와 제물도 진설되었다. 하지만 그날의 시혼제는, 마치 다랑쉬굴 안팎에서 생을 마감한 39위 영령들이 한마음 되어 울부짖듯, 진혼곡 연주자가 감정을 억제치 못해 파열음을 내듯 흩뿌리는 비바람으로 인해, 약식으로 진행되어야 했다.
뒤풀이에서 이대진 4·3유족회장께서 건네준 '다랑쉬굴 희생자 명단'에는, 굴 안팎에서 생을 마감한 3·4살부터 51세 사이 하도리·종달리 출신 39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날의 비바람은 다랑쉬굴 안과, 특히 밖에서 목숨 잃은 슬픈 영혼들이 안식에 들려는 절규의 소리는 아니었을까.
1948년 12월 18일 군경 토벌대는 먼저, 다랑쉬굴 밖 여기저기에 피신한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살하였다. 이어 굴 안으로 수류탄을 던지고 검불로 불을 피워, 굴 속 11명을 질식사 시켰다. 광란의 세월이 흐른 후 유족 등 관계자들은 시신을 찾으려 주변의 숲들을 뒤지고, 덤불을 헤치며 다녀도 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1991년 말 가까스로 찾은 다랑쉬굴에서 11구의 유골과 함께 무쇠솥, 그릇, 요강 등의 생활용품과 대검과 철창 등이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 뒤 11구의 유해는 한줌의 재로 변해 김녕 바다에 뿌려지고, 유물 등과 함께 굴 입구는 바위와 콘크리트로 다시 봉해졌다.
사건 당일 사지에서 나와 숨죽여 지내다, 다랑쉬굴의 슬픈 사연을 최초로 제보한 고 채정옥 님은, "다시 들어간 굴 안은 연기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돌과 땅 속에 코를 파묻거나 손톱이 없을 정도로 땅을 파다 죽어 있었고"라며 한스러움으로 남아있던 옛 일을 증언하기도 했었다.
한국전쟁 당시 제주에서 군 생활을 한 이생진 시인은, 다랑쉬굴의 슬픈 소식을 접하곤, 4월이 오면 제주를 찾았다. 그리고 구좌지역을 비롯한 전국 여러 곳에서 온 참배객들과 함께 사라진 다랑쉬마을 팽나무 아래에서, 아끈다랑쉬 오름에서 국화꽃과 막걸리 등을 차리고 시로 혼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곤 했다. 게다가 시인은 제주 도처를 다니며 시를 지었다. '그리운 바다 성산포'등의 시집을 낸 이생진 시인은 이후 제주도 명예도민이 되었다. 그분의 시 '다랑쉬굴 앞에서'의 일부를 다시 감상하며, 39위의 다랑쉬굴 안팎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또 빈다. "무명 시인들 모여 앉아 마치 그들이 저지른 죄인 양 뉘우친 목소리로 시를 읽네. 보리밭을 지나 대나무밭에 서면 그때 그 전율이 되살아나 발을 멈추네." <문영택 귤림서원 원장·질토래비 이사장>
뒤풀이에서 이대진 4·3유족회장께서 건네준 '다랑쉬굴 희생자 명단'에는, 굴 안팎에서 생을 마감한 3·4살부터 51세 사이 하도리·종달리 출신 39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날의 비바람은 다랑쉬굴 안과, 특히 밖에서 목숨 잃은 슬픈 영혼들이 안식에 들려는 절규의 소리는 아니었을까.
1948년 12월 18일 군경 토벌대는 먼저, 다랑쉬굴 밖 여기저기에 피신한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살하였다. 이어 굴 안으로 수류탄을 던지고 검불로 불을 피워, 굴 속 11명을 질식사 시켰다. 광란의 세월이 흐른 후 유족 등 관계자들은 시신을 찾으려 주변의 숲들을 뒤지고, 덤불을 헤치며 다녀도 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1991년 말 가까스로 찾은 다랑쉬굴에서 11구의 유골과 함께 무쇠솥, 그릇, 요강 등의 생활용품과 대검과 철창 등이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 뒤 11구의 유해는 한줌의 재로 변해 김녕 바다에 뿌려지고, 유물 등과 함께 굴 입구는 바위와 콘크리트로 다시 봉해졌다.
사건 당일 사지에서 나와 숨죽여 지내다, 다랑쉬굴의 슬픈 사연을 최초로 제보한 고 채정옥 님은, "다시 들어간 굴 안은 연기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돌과 땅 속에 코를 파묻거나 손톱이 없을 정도로 땅을 파다 죽어 있었고"라며 한스러움으로 남아있던 옛 일을 증언하기도 했었다.
한국전쟁 당시 제주에서 군 생활을 한 이생진 시인은, 다랑쉬굴의 슬픈 소식을 접하곤, 4월이 오면 제주를 찾았다. 그리고 구좌지역을 비롯한 전국 여러 곳에서 온 참배객들과 함께 사라진 다랑쉬마을 팽나무 아래에서, 아끈다랑쉬 오름에서 국화꽃과 막걸리 등을 차리고 시로 혼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곤 했다. 게다가 시인은 제주 도처를 다니며 시를 지었다. '그리운 바다 성산포'등의 시집을 낸 이생진 시인은 이후 제주도 명예도민이 되었다. 그분의 시 '다랑쉬굴 앞에서'의 일부를 다시 감상하며, 39위의 다랑쉬굴 안팎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또 빈다. "무명 시인들 모여 앉아 마치 그들이 저지른 죄인 양 뉘우친 목소리로 시를 읽네. 보리밭을 지나 대나무밭에 서면 그때 그 전율이 되살아나 발을 멈추네." <문영택 귤림서원 원장·질토래비 이사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제주은행, 올해 정기 인사... 31명 승진
- 2

"돌봄은 여성 몫인가요?" 제주 버스 홍보물 논란
- 3

"오영훈 지사 비서관 제주항공 채용 개입 의혹 진상 밝혀야"
- 4

제주 여성대표성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주력
- 5

여 "대통령 체포, 국격 무너져" vs 야 "법치 실현..구속해야"
- 6

동료 성폭행 미수·미성년자 추행 전직 경찰 징역 3년
- 7

올해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 지원 예산 708억..끼니당 단가 …
- 8

해양쓰레기 줍다 '아차차'... 제주 구좌읍서 차량 침수사고
- 9

제주경찰 7억원 상당 가상화폐 편취 40대 女 구속
- 10

'2025 한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3인 "저만의 글 쓸 것"
- 01:30

[김기춘의 현장시선] 제주 건설산업의 현주소와 …
- 01:00

[열린마당] 새해부터 시작된 스트레스를 해소해 …
- 05:30

[주현정의 목요담론] 제주경제의 자생력 회복을 …
- 04:00

[열린마당]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힘
- 03:30

[열린마당]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놓치지 마세…
- 03:00

[진관훈의 한라시론] 유유녹명
- 03:30

[김연덕의 건강&생활] 귤나무에 눈이 찔렸어요: …
- 01:30

[열린마당] 새해목표, 작심삼일이라도 세우는 게…
- 01:00

[열린마당] 함께하면 이루어지는 길, 협업의 가…
- 02:30

[허수호의 하루를 시작하며] 제주의 디지털 교육…















 2025.01.19(일) 07:55
2025.01.19(일) 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