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학주의 詩읽는 화요일] (74)그리운 바다 성산포*-이생진
- 입력 : 2024. 07.02(화) 04: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성산포에서는 바다를 그릇에 담을 순 없지만 뚫어진 구멍마다 바다가 생긴다
성산포에서는 뚫어진 그 사람의 허구에도 천연스럽게 바다가 생긴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은 슬픔을 만들고 바다는 슬픔을 삼킨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이 슬픔을 노래하고 바다가 그 슬픔을 듣는다
성산포에서는 한 사람도 죽는 일을 못 보겠다
온 종일 바다를 바라보던 그 자세만이 아랫목에 눕고
성산포에서는 한 사람도 더 태어나는 일을 못 보겠다
있는 것으로 족한 존재 모두 바다를 보고있는 고립
성산포에서는 주인을 모르겠다 바다 이외의 주인을 모르겠다
*'그리운 바다 성산포'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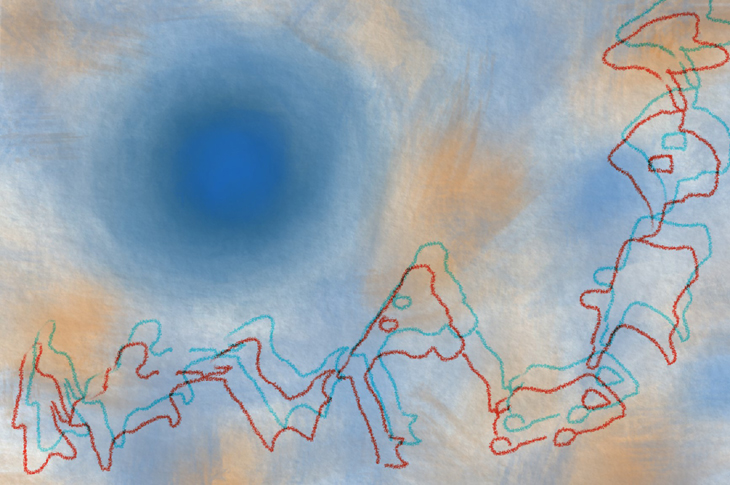
제주엔 검은빛 돌마다 구멍이 있고, 오름도 곶자왈도 뚫린 구멍을 가득 품는다. 시인은 말한다. 그 구멍이 모두 크고 작은 바다에 다름 아니고 심지어 인간의 '허구' 자체도 바다이며 그게 모여 하나의 성전을 이룬다고. 삶 자체의 멂과 가까움이, 높고 낮음이 일종의 알 수 없는 구멍이며 구멍마다 성산포가 고여 있다. 그 속에서 헤엄치는 뭇 존재들을 보라. 고립을 본능으로 가지고 바다 곁에서 익힌 눈썰미로 죽음을 바라보는 해녀의 물질하는 고립의 풍경 앞에 잠시 서보자.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죽어서 실컷 먹으라고" 묻은 보리밭도, "살아서 그리웠던 사람 죽어서 찾아가라고 짚신 두 짝 놔" 둔 섬 꼭대기도 바다로 파여 있다. "있는 것으로 족"하다는 말이 섬에서 죽은 자를 다른 데로 보낼 수 없어 한 사람도 죽는 일을 못 보겠다는 투로, 본질적으로 인간은 섬에 태어나서 한 사람도 섬 밖으로 못 나간다는 투로 빗대어 들리지만, 바다뿐인 성산포를 그리워하며 청람빛 바다 앞에서 늙어가는 유한한 인간은 성산포의 주인도 바다의 주인도 되지 못한 채, 이곳이 우리의 요람이며 무덤이고 바다가 우리의 너른 삶터이자 묘지라는 사실만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다 홀연히 성산포에서 깨어나곤 하리. <시인>
성산포에서는 뚫어진 그 사람의 허구에도 천연스럽게 바다가 생긴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은 슬픔을 만들고 바다는 슬픔을 삼킨다
성산포에서는 사람이 슬픔을 노래하고 바다가 그 슬픔을 듣는다
성산포에서는 한 사람도 죽는 일을 못 보겠다
온 종일 바다를 바라보던 그 자세만이 아랫목에 눕고
성산포에서는 한 사람도 더 태어나는 일을 못 보겠다
있는 것으로 족한 존재 모두 바다를 보고있는 고립
성산포에서는 주인을 모르겠다 바다 이외의 주인을 모르겠다
*'그리운 바다 성산포'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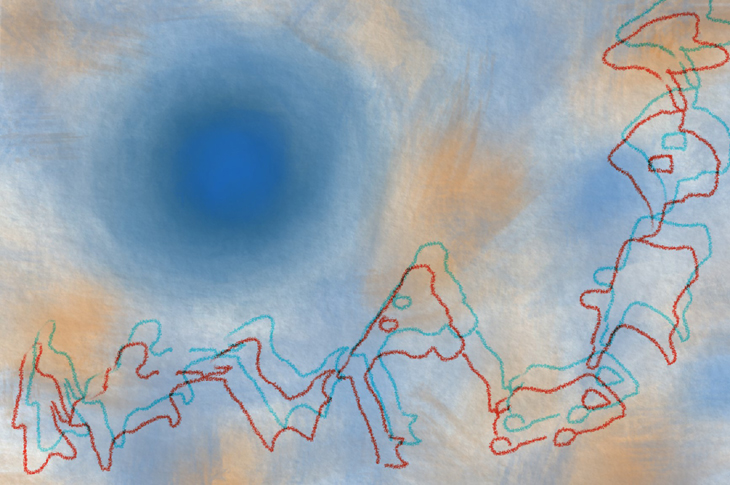
삽화=배수연
제주엔 검은빛 돌마다 구멍이 있고, 오름도 곶자왈도 뚫린 구멍을 가득 품는다. 시인은 말한다. 그 구멍이 모두 크고 작은 바다에 다름 아니고 심지어 인간의 '허구' 자체도 바다이며 그게 모여 하나의 성전을 이룬다고. 삶 자체의 멂과 가까움이, 높고 낮음이 일종의 알 수 없는 구멍이며 구멍마다 성산포가 고여 있다. 그 속에서 헤엄치는 뭇 존재들을 보라. 고립을 본능으로 가지고 바다 곁에서 익힌 눈썰미로 죽음을 바라보는 해녀의 물질하는 고립의 풍경 앞에 잠시 서보자.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죽어서 실컷 먹으라고" 묻은 보리밭도, "살아서 그리웠던 사람 죽어서 찾아가라고 짚신 두 짝 놔" 둔 섬 꼭대기도 바다로 파여 있다. "있는 것으로 족"하다는 말이 섬에서 죽은 자를 다른 데로 보낼 수 없어 한 사람도 죽는 일을 못 보겠다는 투로, 본질적으로 인간은 섬에 태어나서 한 사람도 섬 밖으로 못 나간다는 투로 빗대어 들리지만, 바다뿐인 성산포를 그리워하며 청람빛 바다 앞에서 늙어가는 유한한 인간은 성산포의 주인도 바다의 주인도 되지 못한 채, 이곳이 우리의 요람이며 무덤이고 바다가 우리의 너른 삶터이자 묘지라는 사실만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다 홀연히 성산포에서 깨어나곤 하리. <시인>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6:13

'2025 한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3인 "저만의 글 …
- 09:58

비대면으로 '하루 한 시간 책 읽기' 도전
- 18:28

제주 현장서 포착한 2024년 '순간의 기록'
- 18:26

곱닥헌 제주 아이들이 '베롱베롱'
- 18:13

"봄, 터졌소이다!"… 낭쉐 몰며 새봄 기원
- 21:00

조선 후기 제주출신 유학자 고문서로 읽는 시대…
- 18:02

"혹독했던 겨울… 새해에는 빛 밝히며 같이 가길…
- 13:14

제주민요보존회 '2025년 민요배움터' 참가자 모집
- 02:00

[황학주의 詩읽는 화요일] (100)수석-유수연
- 16:05

사라지는 '노동요' 제주섬 전역서 찾는다















 2025.01.16(목) 21:41
2025.01.16(목) 2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