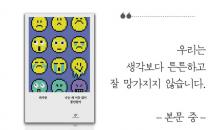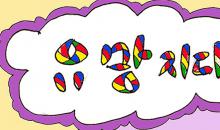묘비문 분석해 17~18세기 제주 사회상 살폈다
백종진 박사, 현존 200기 묘비로 당대 중·상층 삶 고찰
"제주인 남긴 1차 기록물 묘비" 통해 사료 부족 보완
건립 주도 세력· 혼인 연령· 남녀 평균 수명 등 확인
"제주인 남긴 1차 기록물 묘비" 통해 사료 부족 보완
건립 주도 세력· 혼인 연령· 남녀 평균 수명 등 확인
- 입력 : 2025. 02.17(월) 18:16 수정 : 2025. 02. 18(화) 17:5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백종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이 17~18세기 제주에 건립된 묘비를 찾아 비문을 살피고 있다.
[한라일보] 17~18세기 제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동안 제주지방사 연구자들이 호적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조선 시대 제주 사회상을 들여다봤는데 18세기 이전 제주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사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에 세워진 묘비를 통해 제주 사회상을 고찰한 논문이 나왔다. 최근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 학위 논문으로 인준 받은 백종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의 '17~18세기 제주지방 묘비 건립과 사회변화'다.
이 연구는 수년간 도내 곳곳의 현장을 답사하며 파악한 현존하는 묘비 200기를 대상으로 했다. 묘비가 조선 시대 제주 사람들이 남긴 1차 기록물이라는 점에 주목해 금석문으로서의 묘비문 등 종합적 분석을 거쳐 17~18세기 제주의 사회상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논문에 따르면 묘비 주인공의 대부분은 중·상층 부류 사람들이었다. 조선 전기 소수 특정 성관(姓貫)의 전유물이었던 묘비 건립은 18세기 후반에 40개 성관 109기로 급증했다. 묘비 주인공의 신분은 18세기 후반이 되면 양반 계층이 감소(34.23%)하는 반면 중·서인층의 비율은 점차 증가(63.97%)했다.
특히 17~18세기 묘비 건립을 주도한 주요 성관 집단에 의해 향촌 사회의 지배 체제가 재편됐다. 제주목의 광주김씨, 정의현의 김녕김씨·군위오씨·함덕강씨 등은 이 시기 제주 4성(姓)이라 불리는 제주고씨·제주양씨·제주부씨·남평문씨 등의 성관 집단과 동일한 수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면서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게 됐다.
혼인 연령을 보면 남자는 20.8~24.3세, 여자는 22.7~26.0세다. 이는 육지부에 비해 평균 수명이 높아 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제주 사회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부계 중심의 종법 질서가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정착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전통 혼인 풍속인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 상당 부분 잔존하는 가운데 초혼 부부가 혼인 후 남자 거주지에 머물러 사는 친영혼(親迎婚) 사례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 남자 주인공의 축첩 실태는 75.8%가 일부일처제를 준수했고 나머지 24.2%는 첩을 뒀다.
묘비문을 통해 평균 수명 파악도 가능했다. 남자의 평균 수명은 69.00세, 여자는 69.47세였다. 조선 시대 육지부 양반 가문의 남자 평균 수명 58.1세, 여자 평균 수명 45.3세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제주가 장수하는 노인이 많은 지방으로 소개되는 조선 시대 각종 문헌 기록에 대한 실증 결과다.
백종진 사무국장은 "이번 연구가 17~18세기 제주지방사의 공백 일부를 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논지 전개상 미진한 부분 등은 향후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연구는 수년간 도내 곳곳의 현장을 답사하며 파악한 현존하는 묘비 200기를 대상으로 했다. 묘비가 조선 시대 제주 사람들이 남긴 1차 기록물이라는 점에 주목해 금석문으로서의 묘비문 등 종합적 분석을 거쳐 17~18세기 제주의 사회상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논문에 따르면 묘비 주인공의 대부분은 중·상층 부류 사람들이었다. 조선 전기 소수 특정 성관(姓貫)의 전유물이었던 묘비 건립은 18세기 후반에 40개 성관 109기로 급증했다. 묘비 주인공의 신분은 18세기 후반이 되면 양반 계층이 감소(34.23%)하는 반면 중·서인층의 비율은 점차 증가(63.97%)했다.
특히 17~18세기 묘비 건립을 주도한 주요 성관 집단에 의해 향촌 사회의 지배 체제가 재편됐다. 제주목의 광주김씨, 정의현의 김녕김씨·군위오씨·함덕강씨 등은 이 시기 제주 4성(姓)이라 불리는 제주고씨·제주양씨·제주부씨·남평문씨 등의 성관 집단과 동일한 수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면서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게 됐다.
혼인 연령을 보면 남자는 20.8~24.3세, 여자는 22.7~26.0세다. 이는 육지부에 비해 평균 수명이 높아 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제주 사회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부계 중심의 종법 질서가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정착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전통 혼인 풍속인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 상당 부분 잔존하는 가운데 초혼 부부가 혼인 후 남자 거주지에 머물러 사는 친영혼(親迎婚) 사례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 남자 주인공의 축첩 실태는 75.8%가 일부일처제를 준수했고 나머지 24.2%는 첩을 뒀다.
묘비문을 통해 평균 수명 파악도 가능했다. 남자의 평균 수명은 69.00세, 여자는 69.47세였다. 조선 시대 육지부 양반 가문의 남자 평균 수명 58.1세, 여자 평균 수명 45.3세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제주가 장수하는 노인이 많은 지방으로 소개되는 조선 시대 각종 문헌 기록에 대한 실증 결과다.
백종진 사무국장은 "이번 연구가 17~18세기 제주지방사의 공백 일부를 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논지 전개상 미진한 부분 등은 향후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6:49

제주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정착 언제쯤
- 09:49

헌재 "'경고성·호소형 계엄'은 존재할 수 없어"
- 17:31

제주도 '창설 57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 개최
- 16:03

"대선 시간 촉박"..정치권 분주해진다
- 15:42

김상환 전 대법관 "헌재, 만장일치 대통령 파면 …
- 15:10

'불놓기 복원' 제주들불축제 조례 재표결 끝에 …
- 14:46

이상봉 제주도의장 "대통령 탄핵 결정, 재도약 …
- 13:44

국힘 제주도당 "헌재 선고 결과 수용… 무한한 …
- 13:26

더민주제주혁신회의 "위대한 국민의 승리… 4·3…
- 12:35

제주 야권 "윤석열 파면은 국민의 승리"















 2025.04.06(일) 19:01
2025.04.06(일)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