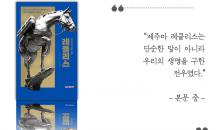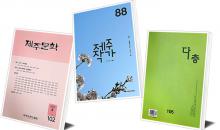[홍정호의 문화광장] 오케스트라 담당교사의 교원성과급
- 입력 : 2025. 04.08(화) 00:4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한라일보] 오케스트라 담당교사는 S·A·B 중 어떤 교원성과급을 받고 있는가? 음악 담당교사는 왜 오케스트라를 기피하려고 하는가?
예술은 아이들이 세계를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자신만의 표현 방식으로 삶의 경험을 정리해 나가는 통로다. 그중에서도 학교 오케스트라는 집단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과정이다. 인류가 축적해 온 문화유산을 경험하며 철학과 역사를 배우고 그 안에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오케스트라 공동체는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과 배려를 배운다. 또한 무대 위에서 성취감을 누리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음악교사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초·중·고 193개교 중 69개 학교에서 오케스트라가 운영 중이다. 이는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 덕분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관리자들의 낮은 이해도, 담당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 성과의 부인정 등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된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보통 학급의 2~3배의 학생으로 구성되는 오케스트라 운영은 절대 만만하지 않다. 학급 담임 업무량에 비해 과중하다. 학생관리, 강사관리, 악기관리, 악보관리, 오케스트라 연습, 행사계획, 팸플릿 작업까지 온전히 담당교사의 몫이다. 늘어나는 업무량과 노력 대비 인정받지 못하는 성과로 인해 교사들이 오케스트라 담당을 꺼리는 분위기다. 일부 학교에서는 열정 있는 특정 교사 한 사람에게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이 의존되는 구조도 나타난다. 이는 교사가 이동하거나 퇴직하면 오케스트라 자체가 침체기로 이어지는 문제로 이어진다.
“저는 음악교과 교사이지 오케스트라 담당교사가 아닙니다”라는 어느 선생님의 항변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첫째, 학교 문화를 유연하게 만드는 힘으로 예술을 바라봐야 한다. 오케스트라는 단순한 음악 수업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 지역사회가 함께 호흡하는 과정 속에서 협력과 소통의 민주적 문화를 경험하고 성취해 가는 체험적 과정이다.
둘째,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지금처럼 특정 교사나 관리자에 의존해선 안된다. 성과의 인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 전담 인력 배치, 행정 간소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현장 교사의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예술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다. 디지털화와 입시 중심 교육의 흐름 속에서 학교 오케스트라는 감정, 협동, 창의성이라는 가치를 다시 깨우는 역할을 한다.
제주는 이미 소중한 기반을 마련해 뒀다. 다만 오케스트라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예측 가능한 오케스트라 운영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이 더 오래 울려 퍼지기를 희망한다. <홍정호 제주아트센터운영위원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예술은 아이들이 세계를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자신만의 표현 방식으로 삶의 경험을 정리해 나가는 통로다. 그중에서도 학교 오케스트라는 집단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과정이다. 인류가 축적해 온 문화유산을 경험하며 철학과 역사를 배우고 그 안에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오케스트라 공동체는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과 배려를 배운다. 또한 무대 위에서 성취감을 누리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음악교사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초·중·고 193개교 중 69개 학교에서 오케스트라가 운영 중이다. 이는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 덕분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관리자들의 낮은 이해도, 담당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 성과의 부인정 등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된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보통 학급의 2~3배의 학생으로 구성되는 오케스트라 운영은 절대 만만하지 않다. 학급 담임 업무량에 비해 과중하다. 학생관리, 강사관리, 악기관리, 악보관리, 오케스트라 연습, 행사계획, 팸플릿 작업까지 온전히 담당교사의 몫이다. 늘어나는 업무량과 노력 대비 인정받지 못하는 성과로 인해 교사들이 오케스트라 담당을 꺼리는 분위기다. 일부 학교에서는 열정 있는 특정 교사 한 사람에게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이 의존되는 구조도 나타난다. 이는 교사가 이동하거나 퇴직하면 오케스트라 자체가 침체기로 이어지는 문제로 이어진다.
“저는 음악교과 교사이지 오케스트라 담당교사가 아닙니다”라는 어느 선생님의 항변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첫째, 학교 문화를 유연하게 만드는 힘으로 예술을 바라봐야 한다. 오케스트라는 단순한 음악 수업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 지역사회가 함께 호흡하는 과정 속에서 협력과 소통의 민주적 문화를 경험하고 성취해 가는 체험적 과정이다.
둘째,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지금처럼 특정 교사나 관리자에 의존해선 안된다. 성과의 인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 전담 인력 배치, 행정 간소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현장 교사의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예술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다. 디지털화와 입시 중심 교육의 흐름 속에서 학교 오케스트라는 감정, 협동, 창의성이라는 가치를 다시 깨우는 역할을 한다.
제주는 이미 소중한 기반을 마련해 뒀다. 다만 오케스트라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예측 가능한 오케스트라 운영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이 더 오래 울려 퍼지기를 희망한다. <홍정호 제주아트센터운영위원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제주대 미래융합대 둘러싼 갈등 격화... 교수들 삭발식
- 2

제주 사찰서 차량 전복사고... 운전자 병원 이송
- 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이재명 후보 공약에 왜 빠졌나
- 4

'알박기 논란' JDC 신임 이사장 임명 25일 확정되나
- 5

오영훈 제주도정 복지시책 잇단 제동.. 중앙 절충 '한계'
- 6

제주 고도지구 전면 해제… 상업지역 최고높이 160m 제시
- 7

이재명 "탄소 중립 K-이니셔티브, 제주에서 시작" 약속
- 8

"마지막 인사 전하려…" 제주서도 교황 추모 발길
- 9
[사설] 한라산 탐방 예약제 개선 소탐대실 안된다
- 10

제주 4·3희생자·유족 장례식장 사용료 50% 감면 확대
- 01:30

[홍웅기의 현장시선] 전력망 확충 위한 모두의 …
- 01:00

[열린마당] 제주 수돗물, 과학과 신뢰로 지켜갑…
- 03:00

[양상철의 목요담론] 디지털 시대, 손글씨와 서…
- 02:30

[열린마당] 로컬푸드, 지역 농산물이 주는 치유…
- 02:00

[열린마당] 국제안전도시 제주 위한 디지털성범…
- 00:00

[유동형의 한라시론] 겸손의 미덕
- 03:30

[신순배의 하루를 시작하며] 영채 노인
- 00:40

[열린마당] 수돗물, 그저 마실 수 있다는 놀라운 …
- 01:40

[이길수의 건강&생활] 하지부종과 정맥활성제, …
- 01:20

[열린마당] 도민 아이디어로 만드는 '여성친화도…















 2025.04.25(금) 12:48
2025.04.25(금)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