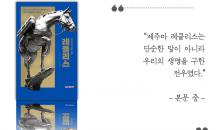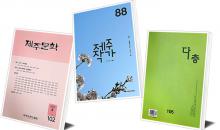[이종실의 하루를 시작하며] 청명과 한식에 갖는 생각
- 입력 : 2025. 04.09(수) 04:3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한라일보] 지난 4일과 5일은 각각 청명과 한식이었다. 양력 기준인 이 둘은 같은 날에 들 때도 있으나 대부분 올해처럼 하루 차이로 온다. 지난 25년을 살펴보니 둘이 한날일 때가 네 번 있었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속담도 있다. 하지만 청명과 한식은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다르다. 청명은 24절기 중 하나로, 태양이 황도를 따라 하늘의 적도와 만나는 춘분점에서 15도 더 돌아간 날이다. 한식은 지난 겨울의 동지가 지나고 105일째가 되는 날이다.
청명과 한식은 시기상 유사하지만 의미나 성격 면에서는 다르다. 청명은 농사와 관련된 절기이고, 한식은 조상을 숭배하는 명절이다. 청명은 하늘이 차차 맑아진다고 하여 봄 밭갈이와 함께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다. 이날은 땅에 부지깽이를 심어놔도 새싹이 난다고 했다. 그래서 식목일이 이날을 기준으로 정해졌을 것이다. 한편, 한식은 불을 때지 않고 찬밥을 먹는 날이란 뜻이다. 불이 귀했던 옛날에 화기를 금하고 식은 음식을 먹었던 풍습이 전해진 것이라고 한다. 한식이 중요한 명절로 치러지던 시대에는 떡과 술을 준비해서 조상의 산소에 성묘를 가는 날이었다. 제주에서도 청명이나 한식에는 산소를 손질해도 동티가 나지 않는다고 전해진다.
유의미한 절기와 명절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 각종 기념일과 행사는 양산되는 반면, 오랫동안 이어져 온 날들은 잊히고 있다. 식목일은 이미 청명만큼이나 그 의미를 잃고 있다. 기후 변화와 기술의 발달이 식수의 적기를 바꿔 놓았기 때문으로 본다. 예전에 식목 행사로 모든 국민이 '삼천리금수강산 애림녹화'에 나서던 추억이 생생하다. 오늘날의 짙푸른 산과 숲은 그 결과이다. 한식은 음력으로 치르는 설, 단오, 추석 등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명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명절도 단오와 함께 잊힌 지 오래다. 지금껏 이 명절이 치러지는 걸 본 기억이 없다. 이런 추세라면 추석도 성묘하는 날 정도로만 남을 것 같다. 양력이 대세인 이 시대에 설 명절은 무사할까.
절기와 명절이 거창하진 않아도 미풍양속을 기리는 날로 존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날들은 우리 선인들이 자연에 순응하고 감사하며, 자중하고 경계하면서 삶을 영위했던 전통과 문화의 소산이다. 지난달 하순, 경상남북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역대 최악으로 그 피해가 막심하다. 서울 크기의 80%에 달하는 면적의 산야가 불타고, 75명이 사상했다.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여러 마을이 전소돼 사라질 위기를 맞았다고 한다. 공교롭게 식목일의 기틀이 됐던 청명과 불을 금했던 한식의 가치를 절감한다.
지식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이기적인 물질문화가 득세하는 요즘, 참된 정신과 법도는 어른이 본을 보이거나 가르치고 아이들이 제대로 배울 기회를 잃고 있다. 절기와 명절을,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예지를 키우는 교육의 계기로 삼는 것은 어떨까. <이종실 제주문화원 부원장·수필가·시인>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청명과 한식은 시기상 유사하지만 의미나 성격 면에서는 다르다. 청명은 농사와 관련된 절기이고, 한식은 조상을 숭배하는 명절이다. 청명은 하늘이 차차 맑아진다고 하여 봄 밭갈이와 함께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다. 이날은 땅에 부지깽이를 심어놔도 새싹이 난다고 했다. 그래서 식목일이 이날을 기준으로 정해졌을 것이다. 한편, 한식은 불을 때지 않고 찬밥을 먹는 날이란 뜻이다. 불이 귀했던 옛날에 화기를 금하고 식은 음식을 먹었던 풍습이 전해진 것이라고 한다. 한식이 중요한 명절로 치러지던 시대에는 떡과 술을 준비해서 조상의 산소에 성묘를 가는 날이었다. 제주에서도 청명이나 한식에는 산소를 손질해도 동티가 나지 않는다고 전해진다.
유의미한 절기와 명절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 각종 기념일과 행사는 양산되는 반면, 오랫동안 이어져 온 날들은 잊히고 있다. 식목일은 이미 청명만큼이나 그 의미를 잃고 있다. 기후 변화와 기술의 발달이 식수의 적기를 바꿔 놓았기 때문으로 본다. 예전에 식목 행사로 모든 국민이 '삼천리금수강산 애림녹화'에 나서던 추억이 생생하다. 오늘날의 짙푸른 산과 숲은 그 결과이다. 한식은 음력으로 치르는 설, 단오, 추석 등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명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명절도 단오와 함께 잊힌 지 오래다. 지금껏 이 명절이 치러지는 걸 본 기억이 없다. 이런 추세라면 추석도 성묘하는 날 정도로만 남을 것 같다. 양력이 대세인 이 시대에 설 명절은 무사할까.
절기와 명절이 거창하진 않아도 미풍양속을 기리는 날로 존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날들은 우리 선인들이 자연에 순응하고 감사하며, 자중하고 경계하면서 삶을 영위했던 전통과 문화의 소산이다. 지난달 하순, 경상남북도에서 발생한 산불은 역대 최악으로 그 피해가 막심하다. 서울 크기의 80%에 달하는 면적의 산야가 불타고, 75명이 사상했다.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여러 마을이 전소돼 사라질 위기를 맞았다고 한다. 공교롭게 식목일의 기틀이 됐던 청명과 불을 금했던 한식의 가치를 절감한다.
지식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이기적인 물질문화가 득세하는 요즘, 참된 정신과 법도는 어른이 본을 보이거나 가르치고 아이들이 제대로 배울 기회를 잃고 있다. 절기와 명절을,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예지를 키우는 교육의 계기로 삼는 것은 어떨까. <이종실 제주문화원 부원장·수필가·시인>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01:30

[홍웅기의 현장시선] 전력망 확충 위한 모두의 …
- 01:00

[열린마당] 제주 수돗물, 과학과 신뢰로 지켜갑…
- 03:00

[양상철의 목요담론] 디지털 시대, 손글씨와 서…
- 02:30

[열린마당] 로컬푸드, 지역 농산물이 주는 치유…
- 02:00

[열린마당] 국제안전도시 제주 위한 디지털성범…
- 00:00

[유동형의 한라시론] 겸손의 미덕
- 03:30

[신순배의 하루를 시작하며] 영채 노인
- 00:40

[열린마당] 수돗물, 그저 마실 수 있다는 놀라운 …
- 01:40

[이길수의 건강&생활] 하지부종과 정맥활성제, …
- 01:20

[열린마당] 도민 아이디어로 만드는 '여성친화도…















 2025.04.25(금) 07:19
2025.04.25(금) 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