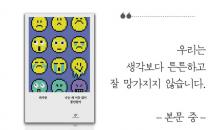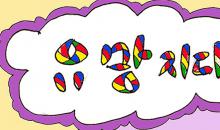[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9] 3부 오름-(78)금오름, 커다란 구덩이가 있는 오름
신(神)에서 유래한 신성한 오름? 허황한 이야기
- 입력 : 2025. 03.11(화) 03: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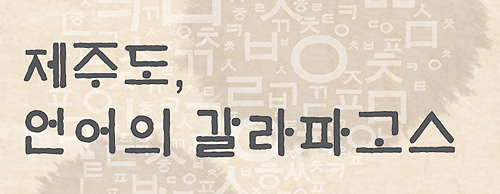
금오름, 신성한가 검은가
[한라일보] "'금오름'은 신(神)이란 뜻의 어원을 가진 호칭으로 해석되며, 옛날부터 신성시 되어온 오름임을 알 수가 있다." 제주도가 발행한 제주의 오름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금악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1-1번지다. 자체 높이 178m다. 고전에는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금물악(今勿岳)이라고 표기한 이래 여러 문헌에 나온다.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는 금오름으로 표기했다. 지금까지 검색된 지명은 검악(黔岳), 검은오름, 금물악(今勿岳), 금악(今岳), 금오름, 흑악(黑岳) 등 6개가 된다. 언뜻 보아서는 이 지명들이 무엇을 지시하는지 종잡을 수 없다. 검은오름은 '검다'라는 뜻일까? 금오름이라는 이름으로도 표기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한자로 표기한 지명 검악(黔岳), 금물악(今勿岳), 금악(今岳), 흑악(黑岳) 중에서 검악(黔岳)의 '검(黔)'은 '검을 검' 자라면서 흑악(黑岳)의 '흑(黑)'도 '검을 흑' 자니 '검은' 오름이라는 뜻이라 한다. 이런 해석이 맞다면 이 오름의 어디가 검어야 한다. 그러나 이 오름의 어디를 봐도 이런 특성은 찾을 수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렇다면 금물악(今勿岳)은 무슨 뜻이며, 금악(今岳)은 또 무슨 뜻인가.
한자로 표기한 지명 검악(黔岳), 금물악(今勿岳), 금악(今岳), 흑악(黑岳) 중에서 검악(黔岳)의 '검(黔)'은 '검을 검' 자라면서 흑악(黑岳)의 '흑(黑)'도 '검을 흑' 자니 '검은' 오름이라는 뜻이라 한다. 이런 해석이 맞다면 이 오름의 어디가 검어야 한다. 그러나 이 오름의 어디를 봐도 이런 특성은 찾을 수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렇다면 금물악(今勿岳)은 무슨 뜻이며, 금악(今岳)은 또 무슨 뜻인가.
금물악(今勿岳)과 금악(今岳)이란 지명에는 '검을 흑' 자도 없고, '검을 검' 자도 없다. 이 지명에 나오는 '금물'이란 말과 '금'이란 말은 한자의 뜻을 아무리 뜯어봐도 별도의 뜻을 찾을 수 없다.
이 지명은 한자를 음으로 읽되 그 본뜻을 버리고 표음자로만 차용한 차자 방식으로 썼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을 음가자라 한다. 결국 '금' 혹은 '검'이 무엇인가가 해독상의 쟁점이 된다.

금오름과 산굼부리는 커다란 구덩이
한자 표기든 순우리말 표기든 이 지명에 일관되게 표기한 '검', '금'이 과연 무엇인가? 그 해답은 바로 산굼부리에서 볼 수 있다. 산굼부리는 '산+굼+부리'의 구조다. 여기 나오는 '굼'은 '구멍'의 뜻이다. 바로 금오름의 '금'과 같은 말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 기획 45회를 참고하실 수 있다.
제주어 사전에는 '굼기'라는 표제어가 올라 있다. 고어 '구무'에 해당한다. 중세어에는 구멍, 구메, 구모, 구무, 굼긔 같은 말들이 나온다. 1728년 청구영언(靑丘永言)에 실린 고시조에는 '이별 나는 구메도 막히난가'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구메도 같은 뜻으로 사용했다. 1489년 구급간이방언해에 '왼녁 곳구모', 1569년 지장경언해에 '터럭 구모마다 자몯 광명을 폐샤 삼쳔 대쳔 셰계랄 비최시니'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구모도 같은 뜻으로 썼다. 1477년 석보상절에 '여래(如來)ㅅ 모매 터럭 구무마다 방광(放光)하샤', 1459년 월인석보에 '내 모미 하 커 수물 굼기 업서'에서처럼 구무가 구멍의 뜻으로 쓰였다. 굼긔와 굼기는 '구멍에'라는 뜻으로 쓰였고, 이의 독립형은 '구무'다. 오늘날의 구멍이란 뚫어지거나 파낸 자리를 지시한다. '굼'에 '엉'이라는 어미가 붙은 말이다. '굼부리'라고 할 때 '굼'은 구멍의 제주어다.
 퉁구스어에서 '굼-', 몽골어 '괴뮉', 일본어에서 '구마'가 어근으로 나타난다. 모두 구멍(cavity) 혹은 구덩이(hole)를 지시한다.
퉁구스어에서 '굼-', 몽골어 '괴뮉', 일본어에서 '구마'가 어근으로 나타난다. 모두 구멍(cavity) 혹은 구덩이(hole)를 지시한다.
금악 혹은 금오름이라고 부르는 이 오름의 정상엔 커다란 분화구가 있다. 이렇게 움푹 팬 커다란 구덩이를 제주어에선 '굼'이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구메', '구모', '구무', '굼긔'로도 발음했을 것이다. 물론 '금', '검'처럼 짧게 발음하기도 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발음을 한자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여기에서 떠오른 아이디어가 '굼'이라는 발음을 '금(今), 검(黔)' 등으로 표기하자는 것이다. 오름은 당연히 '악(岳)'이니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의 금오름은 '금오름'을 포함해서 '굼오름', '구모오름', '구무오름', '구므오름', '구메오름'. '굼긔오름' 등으로도 불렀을 것이다. '감올'이라고도 발음했을 것이다.
'생이물'은 새와 무관
나머지 해결해야 할 지명이 한 가지 더 있다. 금물악(今勿岳)이 무슨 말인가이다. 이 지명은 금물오름(今勿吾音)으로도 나타난다. 오음(吾音)이란 오름의 음가자 표기므로 악(岳)과 같다. 그럼 '금물(今勿)'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은 앞에서 설명한 '굼'에 오름의 고어형인 '올'이 붙은 형태다. 그러면 '금올'로도 발음하고 이걸 한자로 금물(今勿)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오음(吾音)'이 덧붙으면 금물오름(今勿吾音), 악이 덧붙으면 금물악(今勿岳)이 된다.
금오름'은 신(神)이란 뜻의 어원을 가진 호칭으로 해석되며, 옛날부터 신성시 되어온 오름 운운 식의 설명은 허황한 얘기이다. 금오름의 어원상 의미는 커다란 구덩이가 있는 오름이라는 뜻이다.
오름 탐방로 초입에서 못을 만나게 된다. 이 못을 '생이못'이라 한다. 제주도 내에 같은 지명이 여럿 있다. 대부분 새나 먹을 만큼 작은 물이라고 풀이한다. '생이'가 새의 제주어라는 데서 유도된 설이다. 그런 게 아니다. 트랜스 유라시안 여러 언어에서 '세이'가 얕은 물이 있는 곳이거나 자갈 같은 돌들이 있는 물을 지시한다.
 돌궐어 '세이'는 얕은 물이 있는 곳이다. 국어에서는 '샘'으로, 일본어에서는 '세이(せい)'라 한다. '우물 정(井)'이라는 한자를 '세이'로 읽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기원은 샘과 같지만 우물이라는 뜻으로 분화했다. 제주지명에 나타나는 '생이못'은 못을 '세이'라고 하는 언어집단의 유산일 것이다. 이게 '세이물'이라 하다가 '생이물'로 분화한 것이다. 생이못이란 샘이 있는 못이란 뜻이다.
돌궐어 '세이'는 얕은 물이 있는 곳이다. 국어에서는 '샘'으로, 일본어에서는 '세이(せい)'라 한다. '우물 정(井)'이라는 한자를 '세이'로 읽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기원은 샘과 같지만 우물이라는 뜻으로 분화했다. 제주지명에 나타나는 '생이못'은 못을 '세이'라고 하는 언어집단의 유산일 것이다. 이게 '세이물'이라 하다가 '생이물'로 분화한 것이다. 생이못이란 샘이 있는 못이란 뜻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한라일보] "'금오름'은 신(神)이란 뜻의 어원을 가진 호칭으로 해석되며, 옛날부터 신성시 되어온 오름임을 알 수가 있다." 제주도가 발행한 제주의 오름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금악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1-1번지다. 자체 높이 178m다. 고전에는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금물악(今勿岳)이라고 표기한 이래 여러 문헌에 나온다.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는 금오름으로 표기했다. 지금까지 검색된 지명은 검악(黔岳), 검은오름, 금물악(今勿岳), 금악(今岳), 금오름, 흑악(黑岳) 등 6개가 된다. 언뜻 보아서는 이 지명들이 무엇을 지시하는지 종잡을 수 없다. 검은오름은 '검다'라는 뜻일까? 금오름이라는 이름으로도 표기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금악 정상의 분화구, 규모가 매우 크고 장기간 가물지 않는 한 물이 고인다. 김찬수
금물악(今勿岳)과 금악(今岳)이란 지명에는 '검을 흑' 자도 없고, '검을 검' 자도 없다. 이 지명에 나오는 '금물'이란 말과 '금'이란 말은 한자의 뜻을 아무리 뜯어봐도 별도의 뜻을 찾을 수 없다.
이 지명은 한자를 음으로 읽되 그 본뜻을 버리고 표음자로만 차용한 차자 방식으로 썼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을 음가자라 한다. 결국 '금' 혹은 '검'이 무엇인가가 해독상의 쟁점이 된다.

탐방로 입구에 못, 생이물이라고 부른다. 김찬수
금오름과 산굼부리는 커다란 구덩이
한자 표기든 순우리말 표기든 이 지명에 일관되게 표기한 '검', '금'이 과연 무엇인가? 그 해답은 바로 산굼부리에서 볼 수 있다. 산굼부리는 '산+굼+부리'의 구조다. 여기 나오는 '굼'은 '구멍'의 뜻이다. 바로 금오름의 '금'과 같은 말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 기획 45회를 참고하실 수 있다.
제주어 사전에는 '굼기'라는 표제어가 올라 있다. 고어 '구무'에 해당한다. 중세어에는 구멍, 구메, 구모, 구무, 굼긔 같은 말들이 나온다. 1728년 청구영언(靑丘永言)에 실린 고시조에는 '이별 나는 구메도 막히난가'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구메도 같은 뜻으로 사용했다. 1489년 구급간이방언해에 '왼녁 곳구모', 1569년 지장경언해에 '터럭 구모마다 자몯 광명을 폐샤 삼쳔 대쳔 셰계랄 비최시니'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구모도 같은 뜻으로 썼다. 1477년 석보상절에 '여래(如來)ㅅ 모매 터럭 구무마다 방광(放光)하샤', 1459년 월인석보에 '내 모미 하 커 수물 굼기 업서'에서처럼 구무가 구멍의 뜻으로 쓰였다. 굼긔와 굼기는 '구멍에'라는 뜻으로 쓰였고, 이의 독립형은 '구무'다. 오늘날의 구멍이란 뚫어지거나 파낸 자리를 지시한다. '굼'에 '엉'이라는 어미가 붙은 말이다. '굼부리'라고 할 때 '굼'은 구멍의 제주어다.

금악, 정물오름에서 바라본 전경. 김찬수
금악 혹은 금오름이라고 부르는 이 오름의 정상엔 커다란 분화구가 있다. 이렇게 움푹 팬 커다란 구덩이를 제주어에선 '굼'이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구메', '구모', '구무', '굼긔'로도 발음했을 것이다. 물론 '금', '검'처럼 짧게 발음하기도 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발음을 한자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여기에서 떠오른 아이디어가 '굼'이라는 발음을 '금(今), 검(黔)' 등으로 표기하자는 것이다. 오름은 당연히 '악(岳)'이니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의 금오름은 '금오름'을 포함해서 '굼오름', '구모오름', '구무오름', '구므오름', '구메오름'. '굼긔오름' 등으로도 불렀을 것이다. '감올'이라고도 발음했을 것이다.
'생이물'은 새와 무관
나머지 해결해야 할 지명이 한 가지 더 있다. 금물악(今勿岳)이 무슨 말인가이다. 이 지명은 금물오름(今勿吾音)으로도 나타난다. 오음(吾音)이란 오름의 음가자 표기므로 악(岳)과 같다. 그럼 '금물(今勿)'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은 앞에서 설명한 '굼'에 오름의 고어형인 '올'이 붙은 형태다. 그러면 '금올'로도 발음하고 이걸 한자로 금물(今勿)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오음(吾音)'이 덧붙으면 금물오름(今勿吾音), 악이 덧붙으면 금물악(今勿岳)이 된다.
금오름'은 신(神)이란 뜻의 어원을 가진 호칭으로 해석되며, 옛날부터 신성시 되어온 오름 운운 식의 설명은 허황한 얘기이다. 금오름의 어원상 의미는 커다란 구덩이가 있는 오름이라는 뜻이다.
오름 탐방로 초입에서 못을 만나게 된다. 이 못을 '생이못'이라 한다. 제주도 내에 같은 지명이 여럿 있다. 대부분 새나 먹을 만큼 작은 물이라고 풀이한다. '생이'가 새의 제주어라는 데서 유도된 설이다. 그런 게 아니다. 트랜스 유라시안 여러 언어에서 '세이'가 얕은 물이 있는 곳이거나 자갈 같은 돌들이 있는 물을 지시한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김성훈의 백록담] 바가지요금이 추잡한 이유
- 2

[기획] '조기대선' 제주 현안 차기정부 반영 '과제'
- 3

취업난에 행정시 공무직 채용에 20~30대 몰렸다
- 4

[정구철의 월요논단] 77주년 맞은 제주 4.3, 의미있게 승화해…
- 5
[사설] 올해 첫 도정질문, 현안 해법 찾기 돌파구
- 6

이상기상 여파... 올해 노지감귤 착화량 '양극화' 우려
- 7

제주서 폐기물 무단 방치 골프장 무더기 적발
- 8
[사설] 윤석열 파면은 사필귀정… 이제는 대통합
- 9

제주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정착 언제쯤.. "권고할 뿐?"
- 10

대선 공약 채택 불발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실상 무산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23] 3부 오름-(82) 저…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22] 3부 오름-(81)모…
- 03:2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21] 3부 오름-(80)어…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20] 3부 오름-(79)고…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9] 3부 오름-(78)금…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8] 3부 오름-(77)각…
- 03:4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7] 3부 오름-(76) 단…
- 02: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6] 3부 오름-(75)남…
- 02: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5] 3부 오름-(74)돈…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4] 3부 오름-(73)녹…















 2025.04.09(수) 01:43
2025.04.09(수)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