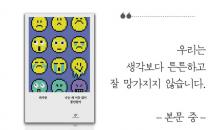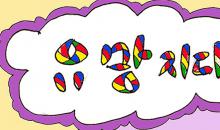[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20] 3부 오름-(79)고근산, 큰 구멍이 있는 오름
'고근오름’, ‘고근악’은 어디 가고 고근산만 있을까?
- 입력 : 2025. 03.18(화) 03: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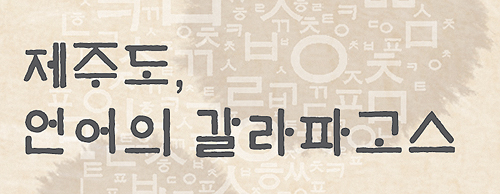
'고근', '고공', '호근'이 무슨 뜻?
[한라일보] 고근산은 표고 396.2m, 자체 높이 171m다. 서귀포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큰 오름이다.
이 오름에 대해서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시작으로 여러 고전들에 기록됐다.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는 고근산으로 표기됐다. 고근산이란 근처에 산이 없어 외로운 산이란 뜻이라고 자신 있게 제시한 책이 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고근산(孤根山)이라는 지명 하나만을 본 단견이다.
지금까지 기록상 나오는 지명은 고공산(古公山), 고공산(古空山), 고공산(高拱山), 고근산(古近山), 고근산(孤根山), 호근산(好近山) 등 6개다. 이 지명들은 한자표기가 모두 서로 다르다. 이러한 지명 표기로 볼 때 이 한자들은 음차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오름 지명해독의 핵심은 '고근', '고공', '호근'이 무슨 뜻인가? 어째서 이 오름에는 '오름'이라거나 '악(岳)'이 붙은 지명이 발견되지 않는가? 즉, '고근산오름', '고근산악' 혹은 고근오름'이라거나 '고근악'이 왜 없는가.
이 오름 지명해독의 핵심은 '고근', '고공', '호근'이 무슨 뜻인가? 어째서 이 오름에는 '오름'이라거나 '악(岳)'이 붙은 지명이 발견되지 않는가? 즉, '고근산오름', '고근산악' 혹은 고근오름'이라거나 '고근악'이 왜 없는가.
이 지명을 설명한 사례를 보면 우선 '외로운 산'이 있다. 어느 연구서에는 '고근산'으로 부르고, 고근산(孤根山), 고근산(古近山) 등으로 표기하며, 이 소리가 변하여 '고공산'으로도 부르고, 고공산(古公山), 고공산(古空山), 고공산(高拱山) 등으로 표기하기도 한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 표기들은 한자 차용표기라 했다. 그러나 정작 그 뜻은 모른다 했다. 그런데 호근산(好近山)만은 호근리에 있는 산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호근리라는 지명에 대해 설명한 자료들 역시 그 유래를 모른다고 한다. 호근리의 지명 유래를 모르면서 어떻게 호근산만은 호근리라는 지명에서 유래했다는 것인지 알쏭달쏭하게 만들어 놓았다.
밧줄을 이용해야 들어갈 수 있는 동굴
이러한 반론을 피해 가는 절묘한 설명도 있다. "호근리에 있는 산이라하여 호근산, 이 산 근처에는 산다운 산이 없고 외롭다고 하여 고근산, 마을 가까이에 높이 솟았다고 하여 고공산이라고 한다." 이 정도 되면 이 오름 지명 풀이는 완벽해 보인다. 그런 이 설명에도 피해 갈 수 없는 의문이 남는다. 바로 호근리의 지명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도 대답한 사람이 있다. 처음엔 호도(虎島)와 가까운 마을이라고 하여 호근(虎近)이라고 하다가 호랑이(虎)는 지명으로는 좋지 않다고 하여 동음 차자한 좋을 '호(好)' 자를 넣어 호근(好近)으로 고쳤다라는 것이다. 마치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제주도 고대인들은 고근산에서 어떤 인상을 받았을까?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 고근산(孤根山) 현 동쪽 57리 정의현 경계에 있다. 산꼭대기에 곧장 뚫린 큰 구멍이 있어 깊이를 알 수 없다. 둘레가 17리이다. 이런 기록은 이후 끊임없이 나온다. 1656년 동국여지지, 1765년 증보탐라지, 1866년 대동지지, 1894년 여재촬요에도 보인다. 거의 500년을 내려온 기록이다. 이 큰 굴이란 강생이굴을 지칭한다. 고근산 서사면 해발 320m에 깊이 15m, 길이 15m인 화산가스 분기공이다. 입구는 수직구조, 밧줄을 이용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얼마나 신비로웠으면 이렇게 역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겠는가. 이런 특징이야말로 지명에 반영하기 마련이다. 이 강생이굴이 무슨 뜻인가? 서홍동에 구시물이 있다. 구시물의 '구시'는 구유의 제주어다. 호근동에도 상예동에도 구시물이 있다. 이 밖에도 구시논, 구시목, 구시홈, 구시홈통 등 같은 기원의 지명이 여럿 있다.
얼마나 신비로웠으면 이렇게 역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겠는가. 이런 특징이야말로 지명에 반영하기 마련이다. 이 강생이굴이 무슨 뜻인가? 서홍동에 구시물이 있다. 구시물의 '구시'는 구유의 제주어다. 호근동에도 상예동에도 구시물이 있다. 이 밖에도 구시논, 구시목, 구시홈, 구시홈통 등 같은 기원의 지명이 여럿 있다.
구유란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길쭉한 그릇이다. 이 말의 제주어가 구시다. 이 말은 1482년 남명집언해, 1510년대 번역박통사 같은 책에 나오다가 멸종했다. 이후에는 구이, 구유, 귀유, 귀우, 구요 등으로 분화하고 1880년 한불자전에 '구유'로 표기한 한 후 현대 국어에서는 구유로 정착했다. 그러니 제주어 구시는 국어에선 이미 사라진 지 500년도 더 된 말이라 할 수 있다.
속이 비었거나 땅이 꺼진 오름
'구시'라는 말은 트랜스 유라시안 여러 언어에서 확인된다. 돌궐어권의 여러 언어에서 제주어와 어형이 유사하다. 현재 제주어에서 '구시'를 구유 같은 홈통, 구멍 혹은 땅이 꺼진 곳을 지시하기도 한다. 고대인들은 강생이굴이란 구멍 혹은 동굴, 속이 빈 곳, 땅이 꺼진 곳으로도 인식했을 수 있다.
 강생이굴은 '구시굴', '구신굴', '가신굴', '가신이굴', '가셍이굴', '강셍이굴'로 변화했을 것이다. 몽골어권에서는 '코구수'가 '비어 있는', '움푹 꺼진 곳'을 의미한다. 몽골문어에서는 '고구순'으로도 썼다. 칼카어 '호손', 부리야트어 '호오' 혹은 '호온', 칼미크어 '호슨'. 오르도스어 '호손', 모구르어 '호순', 다구르어 '호손', 동산어 '호순', 바오어 '호송' 등으로 대응한다. 여기에 나오는 '-수', '-순', '-손'이 후대에는 '산'을 연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산'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 관형격 어미 'ㄴ'이 붙으면 '고군산' 혹은 '고근산'으로 되는 것이다.
강생이굴은 '구시굴', '구신굴', '가신굴', '가신이굴', '가셍이굴', '강셍이굴'로 변화했을 것이다. 몽골어권에서는 '코구수'가 '비어 있는', '움푹 꺼진 곳'을 의미한다. 몽골문어에서는 '고구순'으로도 썼다. 칼카어 '호손', 부리야트어 '호오' 혹은 '호온', 칼미크어 '호슨'. 오르도스어 '호손', 모구르어 '호순', 다구르어 '호손', 동산어 '호순', 바오어 '호송' 등으로 대응한다. 여기에 나오는 '-수', '-순', '-손'이 후대에는 '산'을 연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산'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 관형격 어미 'ㄴ'이 붙으면 '고군산' 혹은 '고근산'으로 되는 것이다.
 고근산이라는 지명 형성에는 여러 언어사회가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중에서 몽골어권이 오늘날의 '고근산'에 근접한 언어를 사용했다. 인근 마을 '호근'이라는 지명은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고근산→호근산 혹은 호근순'으로 '호'로 발음하는 어휘로 분화한 언어권은 몽골어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근산은 '고+근+산'도 아니고 '고근+산'도 아니다. '구멍', '빈', '움푹 꺼진 곳'을 지시하는 몽골어 '고구순'에서 기원했다. '고구순'이라는 발음을 기록자들이 '고구+산'으로 받아들여 표기한 지명이 오늘날의 고근산이 됐다. 큰 구멍이 있는 오름이다. '호근' 역시 같은 기원이다.
고근산이라는 지명 형성에는 여러 언어사회가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중에서 몽골어권이 오늘날의 '고근산'에 근접한 언어를 사용했다. 인근 마을 '호근'이라는 지명은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고근산→호근산 혹은 호근순'으로 '호'로 발음하는 어휘로 분화한 언어권은 몽골어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근산은 '고+근+산'도 아니고 '고근+산'도 아니다. '구멍', '빈', '움푹 꺼진 곳'을 지시하는 몽골어 '고구순'에서 기원했다. '고구순'이라는 발음을 기록자들이 '고구+산'으로 받아들여 표기한 지명이 오늘날의 고근산이 됐다. 큰 구멍이 있는 오름이다. '호근' 역시 같은 기원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한라일보] 고근산은 표고 396.2m, 자체 높이 171m다. 서귀포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큰 오름이다.
이 오름에 대해서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시작으로 여러 고전들에 기록됐다.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는 고근산으로 표기됐다. 고근산이란 근처에 산이 없어 외로운 산이란 뜻이라고 자신 있게 제시한 책이 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고근산(孤根山)이라는 지명 하나만을 본 단견이다.
지금까지 기록상 나오는 지명은 고공산(古公山), 고공산(古空山), 고공산(高拱山), 고근산(古近山), 고근산(孤根山), 호근산(好近山) 등 6개다. 이 지명들은 한자표기가 모두 서로 다르다. 이러한 지명 표기로 볼 때 이 한자들은 음차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서귀포 방향에서 바라본 고근산 전경. 김찬수
이 지명을 설명한 사례를 보면 우선 '외로운 산'이 있다. 어느 연구서에는 '고근산'으로 부르고, 고근산(孤根山), 고근산(古近山) 등으로 표기하며, 이 소리가 변하여 '고공산'으로도 부르고, 고공산(古公山), 고공산(古空山), 고공산(高拱山) 등으로 표기하기도 한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 표기들은 한자 차용표기라 했다. 그러나 정작 그 뜻은 모른다 했다. 그런데 호근산(好近山)만은 호근리에 있는 산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호근리라는 지명에 대해 설명한 자료들 역시 그 유래를 모른다고 한다. 호근리의 지명 유래를 모르면서 어떻게 호근산만은 호근리라는 지명에서 유래했다는 것인지 알쏭달쏭하게 만들어 놓았다.
밧줄을 이용해야 들어갈 수 있는 동굴
이러한 반론을 피해 가는 절묘한 설명도 있다. "호근리에 있는 산이라하여 호근산, 이 산 근처에는 산다운 산이 없고 외롭다고 하여 고근산, 마을 가까이에 높이 솟았다고 하여 고공산이라고 한다." 이 정도 되면 이 오름 지명 풀이는 완벽해 보인다. 그런 이 설명에도 피해 갈 수 없는 의문이 남는다. 바로 호근리의 지명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도 대답한 사람이 있다. 처음엔 호도(虎島)와 가까운 마을이라고 하여 호근(虎近)이라고 하다가 호랑이(虎)는 지명으로는 좋지 않다고 하여 동음 차자한 좋을 '호(好)' 자를 넣어 호근(好近)으로 고쳤다라는 것이다. 마치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제주도 고대인들은 고근산에서 어떤 인상을 받았을까?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 고근산(孤根山) 현 동쪽 57리 정의현 경계에 있다. 산꼭대기에 곧장 뚫린 큰 구멍이 있어 깊이를 알 수 없다. 둘레가 17리이다. 이런 기록은 이후 끊임없이 나온다. 1656년 동국여지지, 1765년 증보탐라지, 1866년 대동지지, 1894년 여재촬요에도 보인다. 거의 500년을 내려온 기록이다. 이 큰 굴이란 강생이굴을 지칭한다. 고근산 서사면 해발 320m에 깊이 15m, 길이 15m인 화산가스 분기공이다. 입구는 수직구조, 밧줄을 이용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고근산 정상의 분화구 모습, 이 근처에 강생이굴이 있다. 김찬수
구유란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길쭉한 그릇이다. 이 말의 제주어가 구시다. 이 말은 1482년 남명집언해, 1510년대 번역박통사 같은 책에 나오다가 멸종했다. 이후에는 구이, 구유, 귀유, 귀우, 구요 등으로 분화하고 1880년 한불자전에 '구유'로 표기한 한 후 현대 국어에서는 구유로 정착했다. 그러니 제주어 구시는 국어에선 이미 사라진 지 500년도 더 된 말이라 할 수 있다.
속이 비었거나 땅이 꺼진 오름
'구시'라는 말은 트랜스 유라시안 여러 언어에서 확인된다. 돌궐어권의 여러 언어에서 제주어와 어형이 유사하다. 현재 제주어에서 '구시'를 구유 같은 홈통, 구멍 혹은 땅이 꺼진 곳을 지시하기도 한다. 고대인들은 강생이굴이란 구멍 혹은 동굴, 속이 빈 곳, 땅이 꺼진 곳으로도 인식했을 수 있다.

고근산 자락 호근마을 지명은 고근산의 또 다른 지명 호근산에서 기원했다. 김찬수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23] 3부 오름-(82) 저…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22] 3부 오름-(81)모…
- 03:2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21] 3부 오름-(80)어…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20] 3부 오름-(79)고…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9] 3부 오름-(78)금…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8] 3부 오름-(77)각…
- 03:4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7] 3부 오름-(76) 단…
- 02: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6] 3부 오름-(75)남…
- 02: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5] 3부 오름-(74)돈…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4] 3부 오름-(73)녹…















 2025.04.08(화) 14:54
2025.04.08(화) 14:54